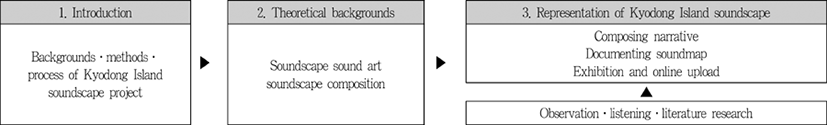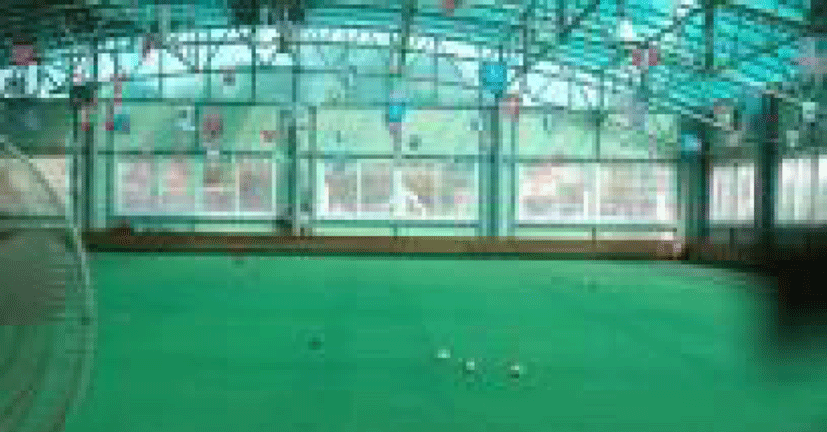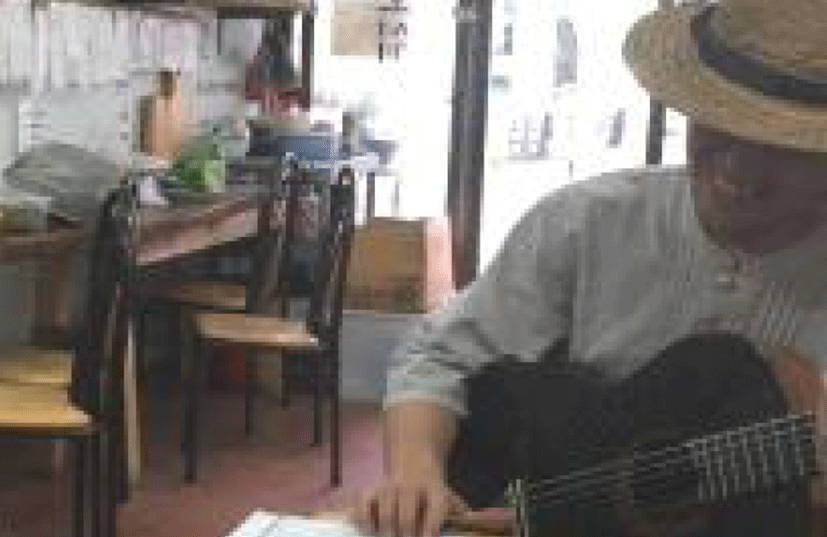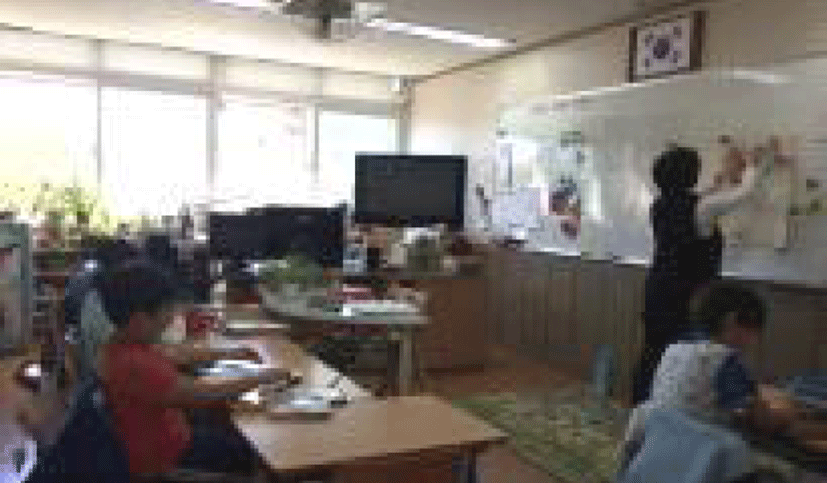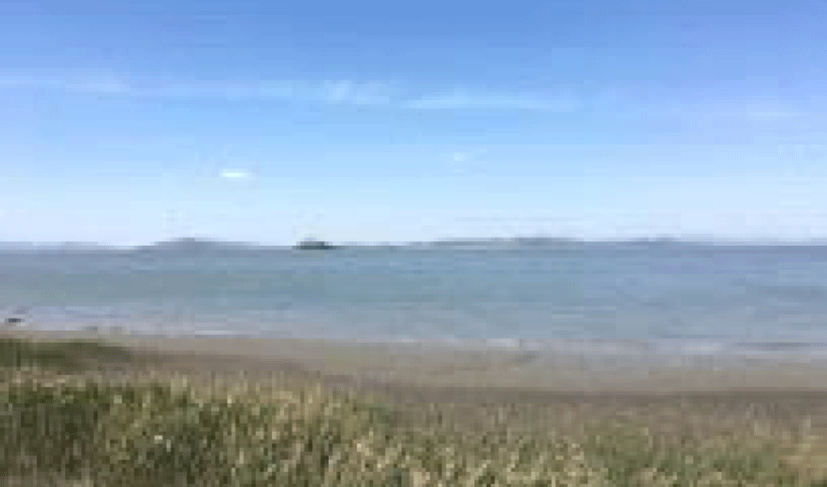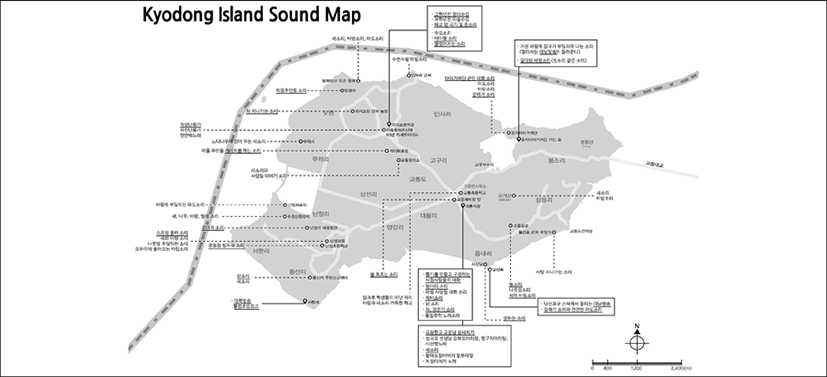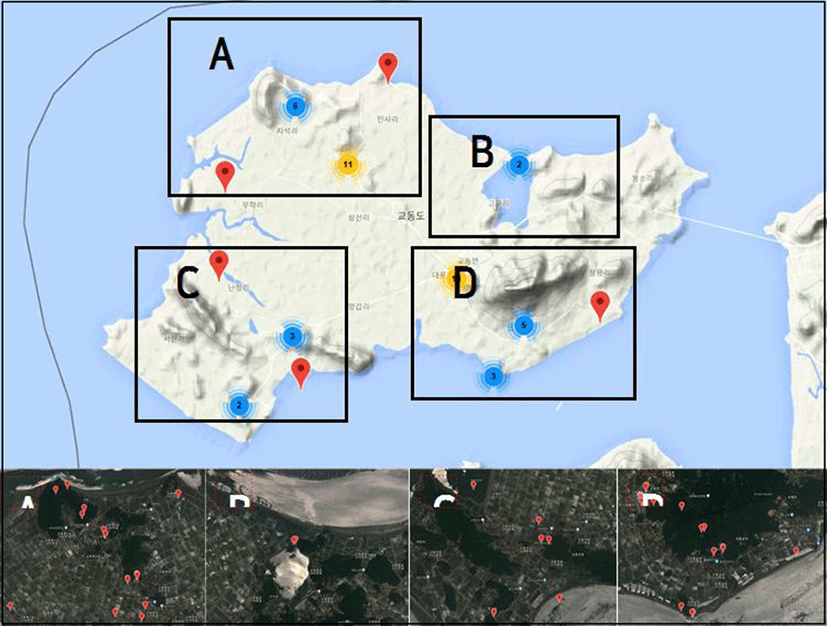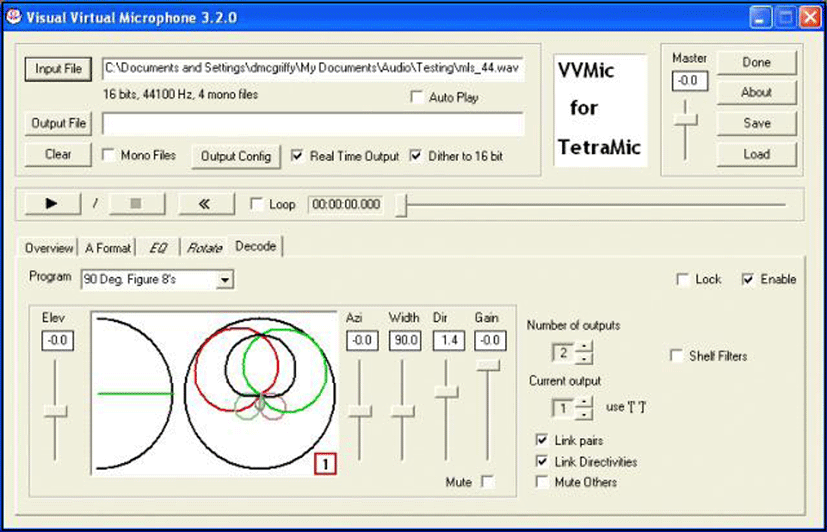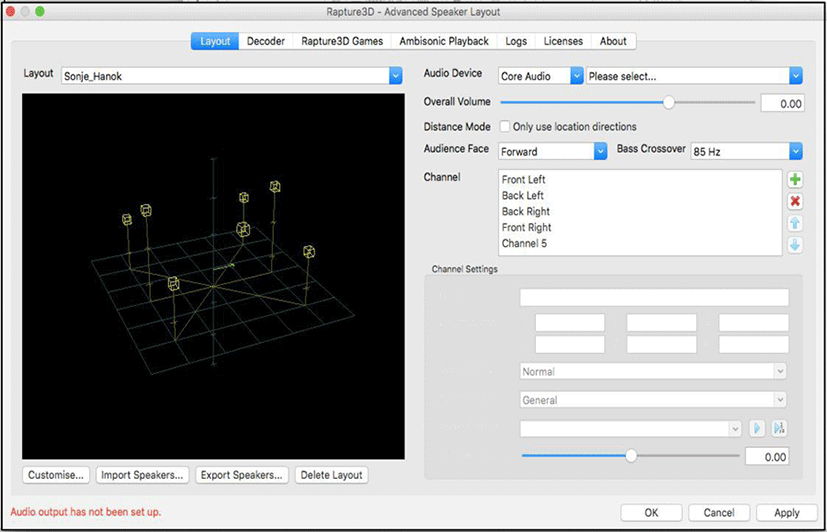I. 서론
사운드스케이프 연구는 시각 중심의 지역 및 도시계획에 대한 반성이자 전신감각적 사고를 되찾으려는 사고방식으로, 개인 혹은 특정의 사회가 사운드스케이프를 어떻게 지각하고 이해하고 있는가에 강조점을 두며, 특정 시대와 지역에서의 소리환경을 하나의 문화로서 파악한다(Han, 2013). 사운드스케이프 개념을 처음 제창한 R. Murray Schafer는 현대인이 시각적인 자극에 익숙해져 있지만, 환경은 단지 보이거나 소유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감각을 이용함으로써 환경 전체를 비판적, 미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고 했다(Schafer, 2008). 사운드스케이프는 소리가 발생하게 된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관심을 가지는 관점으로써 (Kelman, 2010) 지역연구의 프레임으로도 유용하다. 따라서 교동도의 보이는 풍경 이면에 축적되어 있는 다층적인 역사, 전통, 문화적 의미를 소리풍경을 통해 경험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한 문화관광자원 창출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Han et al. (2009)은 자연, 역사, 전통 및 문화를 기조로 그 지역의 독특한 소리경관자원을 발굴하여 소리문화로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운드스케이프 연구는 지역 소리문화의 정체성을 이끌어냄으로써 새로운 독자적 문화자원이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교동도는 DMZ 접경지역이자 섬 전체가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한국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격변을 겪었으며, 최근에는 지역활성화를 위한 민관의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한강하구중립수역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문화적으로 해석하여 ‘평화의 섬’으로서 새롭게 장소마케팅되고 있다. 주로 ICT 기술을 활용한 관광안내, 자전거 대여, VR체험 등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한편, 황해도 피난민들이 생계를 위해 개척한 ‘대룡시장’은 1960년대의 모습을 유지하며 관광객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기도 하다. 그 외에 교동향교, 연산군 유배지, 옛 교동교회 등이 관광지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교동도의 냉전경관과 자연풍광이 가지는 특성을 보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자원화하여 ‘평화의 섬’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DMZ 접경지역 평화예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DMZ 접경지역으로서 교동도가 가지는 고유한 장소성을 포착하고 예술적으로 재현하는 방식으로서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 에 주목하였다.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사운드스케이프 연구들은 사운드스케이프 개념정의 (Jang and Kook, 2008; Han and Oh, 2008c: 2011; Han, 2014), 지역의 소리환경 개선 (Jeon et al., 2004a: 2004b; Han and Oh, 2008a; Jo et al., 2010; Cho, 2010; Hong, 2016), 지역소리환경 및 소리경관자원 분석 (Shin et al., 2004; Han and Oh, 2008b; Han et al., 2009; Han, 2012: 2013; Park and Han, 2016)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분석된 소리경관자원들을 지도화하거나(Hong et al., 2014),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이라는 영역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한 연구(Jang et al., 2006)도 있다. 지역공동체의 인식을 바탕으로 소리환경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정적인 소리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고유의 자원으로 평가할 수 있는 소리들을 판별하는 연구가 많다. 대부분 보존할 가치가 있는 소리자원들을 나열하고 있는 한편, 지역특성과 미래비전을 고려한 연구자의 재해석은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해외에서는 지역 소리환경을 분석하는 연구(Haxel et al., 2013; Martin et al., 2017)들도 있지만 이용자들이 사운드스케이프를 인식하는 패턴을 분석하고(Axelsson et al., 2010; Jeon et al., 2011; Brambilla et al., 2013; Liu et al., 2013; Steffens et al., 2017; Ren et al., 2018), 이용자 패턴을 바탕으로 사운드스케이프를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도출 (Tse et al., 2012; Andringa et al., 2013)하는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사운드스케이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보다 이용자들의 주관적인 인식으로부터 사운드스케이프 경험의 경향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이용자들의 사운드스케이프 인식은 청각적 차원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의 다양한 요소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복합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Ren et al. (2018)의 연구는 사운드스케이프에 대한 관광객의 기대와 선호가 문화권별로 차이가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따라서 사운드스케이프를 청각적인 요소에 국한시키지 않고 주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총체적으로 의미가 발생되는 현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도 현상을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으로, 사운드스케이프의 역동성과 주관성을 고려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리요소들을 분류하여 부정적인 소리를 제거하거나, 소리를 특정 장소에 배치하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더 나아가, 학자와 예술가들의 해석이 개입되어 매력적인 콘텐츠로 가공함으로써 지역을 경험하는 새로운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사운드아티스트들의 장소특정적인 작업들은 장소를 재구성하고, 여러 층위의 가상공간을 구축함으로써 관람자의 청취경험을 다양하게 구성한다(Choi,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교동도 사운드스케이프를 조사, 분석하고, 사운드아트의 영역으로서 지역주민 교육과 방문객 경험을 위한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운드아티스트와 함께 사운드스케이프의 개념과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공유하는 워크샵을 실시하였으며, 사운드스케이프 녹음을 위한 현지조사를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3회에 걸쳐 6일간 진행하여 녹음파일 90개, 사진파일 927개, 영상파일 31개를 기록하였다. 현지조사는 관찰조사와 청취조사로 진행되었고, 이와 함께 지역전문가에 의해 축적되고 있는 소리 관련 기록물들에 대한 문헌조사를 병행하였다(Figure 1 참조)1). 관찰조사에 사용된 녹음기는 Tascam DR-680이고, 마이크는 SENNHEISER MKH-416P BOOMPOLE SET와 360도 3D 입체음장을 녹음하는 Tetra Mic를 사용하였다(Figure 2 참조). 관찰조사는 대룡시장 일대, 북부지역, 서남부지역, 동남부지역으로 나누어 녹음팀을 구성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각 팀별로 새, 바람, 파도 등 자연의 소리, 교동도 주민들의 이야기소리 및 노래소리, 대북방송과 대남방송, 지역명소에서 들리는 소리, 그 외 일상생활에서 들리는 독특한 소리들을 녹음하도록 하였다. 청취조사는 25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동도를 대표하는 소리, 교동도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 보존해야 하는 교동도의 소리, 교동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소리, 교동도에 잘 어울리는 소리, 계절별로 특징적인 소리 등을 질문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주로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대룡시장 일대에서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을 섭외하였으며, 주민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적합한 조사대상자를 추천받았다. 주로 교동도에 오래 거주하였거나 교동도에서 지역연구와 홍보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민간전문가들이었다. 교동도의 관광안내소 역할을 하고 있는 교동제비집, 어업활동이 남아 있는 낙산포, 지역문화를 전수하고 있는 교동향교, 지역의 명창으로 알려져 있는 주민의 자택 등에서도 청취조사를 실시하였다(Table 1 참조).
녹음결과물은 Schafer (2008)의 사운드스케이프 개념에 맞추어 기조음, 신호음, 표식음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2차원적 지도상에 맵핑하는 방식과 사운드맵 어플리케이션인 ‘Sound Around You’를 활용하는 두 가지 방식의 사운드맵으로 기록하였다. 사운드아티스트의 자문을 받아 교동도의 지역특성과 비전을 반영하여 사운드스케이프 작곡의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스튜디오 작업을 진행하였다(Figure 3 참조). 최종작품은 2017년 11월 17일부터 12월 3일까지 서울 소격동 아트선재센터 한옥에서 전시하였으며, 영상과 사운드스케이프 작업을 결합한 영상물을 YouTube에 게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에 게시된 작품을 감상한 관람객 중 교동도를 직접 방문한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작품 평가설문을 실시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지 검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사운드아트는 청각적인 요소를 공간과 조합하여 그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특성을 갖는 예술분야이다. 기존의 미술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 외부환경과 장소를 탐구하는 장소 특정적 미술의 특성을 가지면서 소리와 공간과의 상호관계를 청취라는 수용방식을 통해 다룬다는 특징을 갖는다(Choi, 2016). 사운드아트의 시작은 전화와 오디오 녹음기술의 발명으로 사운드와 이미지의 분리가 가능해지면서부터였다. 소리를 원래의 근원지로부터 분리해내고, 이것을 다른 공간에서 재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양한 미술적 시도가 이루어진 것이다(Licht, 2009). 사운드 조각(sound sculpture), 사운드 시 (sound poetry), 사운드스케이프와 같은 개념들은 사운드아트의 하위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사운드아트는 아트와 뮤직의 퓨전장르 중 하나이다(Andueza, 2009). 사운드아트가 음악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성은 타임라인이 없고 프로그램적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현대의 실험적 음악이나 기타 소리를 사용한 작업, 퍼포먼스 등과도 구분된다(Licht, 2009).
사운드아트가 등장하면서 한동안 유사하게 발달했던 소리생태학(sound ecology) 은 소음공해, 도시와 농촌의 사운드스케이프 비교 등의 이슈를 다루었는데, Schafer의 사운드스케이프 담론이 이를 대표한다. 소리환경 또는 소리경관으로 번역되는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는 이 개념을 처음 구체적으로 설명한 Schafer에 따르면 현실의 음환경을 지칭하기도 하고, 음악작품과 같이 추상적인 구축물을 의미하기도 한다(Schafer, 2008). 사운드스케이프는 어떤 음악작품이나 라디오 프로그램, 또는 어떤 음환경을 하나의 사운드스케이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랜드스케이프에 비해 사운드스케이프의 정확한 인상을 표현하는 것은 다수의 녹음과 측정 그리고 새로운 묘사수단이 필요하며, 역사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추론을 통해서만 전망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운드스케이프 연구는 현대의 녹음과 분석 기술뿐만 아니라, 문학, 신화, 인류학적⋅역사적 기록까지 활용해야 하는 분야라고 설명한다(Schafer, 2008).
소리를 유형별로 구분한 것으로는 Schafer (2008)가 기조음 (keynote sounds), 신호음 (signals), 표식음 (soundmarks) 으로 구분한 체계가 있다. Schafer의 소리 구분체계는 자연의 소리들을 음악작곡에 사용하기 위해 음악적으로 특징을 구분했다. 기조음 (keynote sounds) 은 음악용어로, 악곡의 조와 조성을 결정짓는 기반을 이루는 음을 의미한다. 다른 소리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조되어도 이 기조음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사운드스케이프 연구에서는 특정 사회에서 끊임없이 들리고 있는 소리 혹은 다른 소리의 배경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자주 들리는 소리를 기조음이라 한다. 기조음은 의식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곳곳에 존재하며, 어느 순간 듣는 습관 그 자체가 된다. 특정 장소의 기조음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어떤 지역의 고유한 기조음은 물, 바람, 숲, 평야, 새, 벌레, 동물 등 자연지형과 기후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로 인해 자연을 표현하는 언어적 표현 또한 풍부해지기도 한다. 신호음 (signals) 은 의식적으로 들리는 소리이다. 어떠한 소리도 신호음이 될 수 있지만, Schafer가 말하는 사운드스케이프 연구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벨, 기적, 경적, 사이렌 등 음향적인 경고수단으로 고찰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표식음 (soundmarks) 은 랜드마크(landmark)로부터 파생된 용어로, 공동체 사람들이 특히 존중하고 주의를 기울였던 특징을 가진 소리를 의미한다. 표식음은 보호될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된다(Schafer, 2008). 그 외에 소리생태학에서 Krause (1987)가 자연에서 들리는 복합적인 생명체로부터 나는 소리를 유기체의 소리인 biophony와 비생명체의 소리인 geophony로 구분한 사례도 있으며, 이에 덧붙여 Pijanowski et al. (2011)이 사람으로부터 기인한 소리인 anthropophony를 추가하였다.
Schafer와 그의 동료였던 Hildegard Westerkamp, Barry Truax 등은 세계의 여러 다른 사운드스케이프를 녹음하면서 현대의 소음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산업사회의 사운드들은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을 ‘세계 사운드스케이프 프로젝트(World Soundscape Project, 약칭 WSP)’라고 한다. 이들은 구체음악의 변용이기도 한 사운드스케이프 작곡(soundscape composition) 분야를 개척하기도 했다(Licht, 2009). WSP 작업은 사운드스케이프를 기록, 아카이빙하고 묘사, 분석하며, 듣기(listening) 와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를 통해 환경적 사운드(environmental sound) 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일깨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작곡활동도 함께 등장했던 것을 일컬어 Truax가 1984년에 처음 ‘사운드스케이프 작곡’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설명했다. 이것은 환경적 사운드와 맥락을 인식 가능하도록 하고, 사운드스케이프와 관련해서 청자가 연상, 기억, 상상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며, 사운드스케이프에 대한 관심을 육성하려는 WSP의 교육적 의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발전되었다(Truax, 1996).
Truax에 따르면 사운드스케이프 작곡의 또 다른 배경은 어쿠스틱 커뮤니케이션 (acoustic communication) 으로, 환경적 맥락 속에서 사운드가 만들어내는 복잡한 의미와 관계의 망을 이해하기 위한 프레임이다. 에너지 전달과 신호처리 개념에 기반을 두는 전통적 음향학 분야의 모델과 달리 어쿠스틱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정보교환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듣는 행위는 개인과 환경 사이에 정보교환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이 모델의 중심은 ‘청자 (listener)’이다. 듣기를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고, 그 중요성을 해석하는 고차원의 의식적 행위가 이루어지며, 다양한 수준의 의식적인 집중을 하게 된다. 사람들은 대부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배경으로써 음향적 정보를 처리하는데, 이러한 정보들은 의식의 환경적 맥락을 형성한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듣기(background listening)는 특징발견, 패턴인식, 기존 지식 및 환경적 시그니처와의 비교 과정을 포함하는 정교한 의식의 흐름이며, 새롭게 들어오는 사운드에 의식적으로 집중하도록 유인하는 중요한 행위이다. 환경적 사운드를 사용하는 사운드스케이프 작곡가들에게 어쿠스틱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은 개인적, 문화적으로 다층적인 사운드의 의미를 지각하도록 하여, 전자음향적 기술을 사용해 사운드를 추상적으로 다루게 되는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사운드의 맥락과 관계를 작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Schafer는 자신의 사운드 맵핑 작업을 지칭하고자 ‘사운드맵’이라는 개념도 소개하였는데, 1975년 유럽의 5개 마을에 대한 사운드스케이프 비교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그래픽으로 표현한 것이 시작이다(Jarviluoma eds., 2009; Radicchi, 2013에서 재인용).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 인터랙티브 플랫폼, GPS 추적시스템 등이 발달하면서 사운드맵을 만드는 방식도 크게 변화되어 왔다. 고정적이고 2차원적인 지도제작의 방식에서 벗어나, 소리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묘사하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적이고 감정적인 요소들도 담아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사운드맵은 인터랙티브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특정 장소의 시각적, 공간적, 청각적, 순간적 측면들을 전달할 수 있는 증강현실 및 유비쿼터스적 형태로 이해된다. 활용되는 기술에 따라 컴퓨터 통신망에 거치되어 있는지,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지, 고정적인지, 시시각각 변화하는지 등으로 현대 사운드맵을 분류할 수 있다(Radicchi, 2013).
그러나 ‘사운드스케이프’라는 용어가 다양한 맥락에서 소리를 경험하는 현상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어 오고는 있지만, Schafer의 사운드스케이프 정의가 사상적, 생태학적 메시지이기 때문에 본래의 심층적인 의미보다는 ‘모든 청각적 분야의 연구’라는 일반적인 의미로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Kelman (2010)은 Schafer가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 (acoustic design) 을 정의하면서 훈련된 청자 (listener)들에 의해 배경의 소음을 지우고 소리를 선별적으로 듣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리’와 ‘듣기’의 관계를 혼돈하게 되었으며, 사운드스케이프를 단순히 ‘배경의 소음’으로 취급하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Kelman에 따르면 Schafer 이후의 사운드스케이프 연구들은 소리와 사회적 현상의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로서 ‘사운드스케이프’를 사용하지만, Schafer가 애초에 정의한 내용과는 맞지 않는다. 이것은 Schafer의 설명이 방대하고 애매하여 소리의 사회성을 연구하는데 운용가능한 모델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사운드스케이프 연구는 ‘배경의 소음’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청각적 현상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소리는 그것이 발생하게 된 음향적, 문화적 맥락이 중요한 사회적인 과정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Schafer의 개념에 대해 소리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사회적, 문화적 삶의 중요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 점에서는 여전히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Kelman, 2010).
사운드스케이프는 문화경관 연구분야에서 Cosgrove를 대표로 하는 신문화지리학의 시각 중심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경관을 경험하는 다양한 감각을 재발견해야 한다는 새로운 사조로 인해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Lorimer, 2005; Jin, 2013에서 재인용). Andrews (2017)는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소리환경에 대한 구조주의적 분석과 함께 2000년 이후부터는 비재현이론(nonrepresentational theory) 의 관점에서 어떻게 사운드스케이프가 실제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지리학에서의 사운드스케이프는 ‘소리가 장소를 만드는 방식’으로 정의되어 왔으며, 음악뿐만 아니라, 도시 및 농촌환경에서 발견되는 모든 자연적, 인공적 소리를 포함한다고 정리한 바 있다. Smith (1994)는 지리학의 경관개념이 시각적 이데올로기에 빠져 소리, 특히 음악이 공간을 구조화하고 장소의 특성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간과했음을 지적하며, 문화적 사회지리 연구에서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의 균형을 추구할 것을 주장했고, 기억을 환기시키는 장치로서의 음악 (Anderson, 2004), 도시에서의 적절한 소음과 이웃관계 문제 (Bijsterveld, 2003) 등의 연구로 발전되었다. 이후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서의 사운드스케이프(Liu et al., 2014), 청각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계획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건축학적 연구(Leus and Herssens, 2015), 관광객의 장소경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소리환경 사례연구(Aletta et al., 2017) 등 더 좋은 지역 또는 장소를 만들기 위한 사운드스케이프의 활용에 대한 연구가 있어왔다. 즉, 경관이나 공간을 다루는 지리학, 건축학 등의 학문분야에서는 사운드스케이프가 특정 지역이나 장소에서의 구체적인 경험이라는 점에 집중하여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로 보는 경향이 있다.
III. 교동도 사운드스케이프 특성
교동도는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만나는 서해 관문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황해도, 동쪽으로는 강화도와 마주보고 있다. 남쪽으로는 석모도와 주문도 등 강화도의 부속도서들을 거쳐 경기만에 이를 수 있는 위치로, 삼국시대부터 정치, 교통, 해상무역, 군사활동의 요충지로 주목받아왔다. 고려시대의 수도 개성과 조선시대의 수도 한양의 관문이었고, 황해도, 경기도, 충청도 3도(道) 의 수군 요충지였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교동도와 가까운 예성강 하구는 고려시대 해상활동의 중심지였고, 교동도의 남산포구는 송나라 사신들이 개성으로 들어가는 뱃길의 중요한 길목이었다. 조선시대에도 조세와 공물의 주요 공급 해로를 담당하면서 해상에서의 교동도의 위상이 이어졌다.
교동도 내에는 조산 (祖山) 인 화개산이 동남쪽에 자리하고, 서쪽으로는 수정 모양의 수정산, 북쪽으로는 밤머리산이라고도 불리는 율두산이 있다. 화개산 정상에서는 북쪽의 연백평야가 조망되며, 교동도 전체의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다. 본래 화개산, 수정산, 율두산을 중심으로 하는 3개의 섬이었으나, 갯벌 충적과 간척사업으로 한 개의 섬이 되었으며, 중앙부에 드넓은 교동평야가 형성되었다. 간척사업은 고려시대에 몽고 침략으로 도읍지를 강화도로 옮기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자 이루어진 것으로, 이로 인해 섬이지만 어업보다 농업이 발달하여 쌀 생산으로 유명해졌다. 교동도는 현재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속해 있지만, 한국전쟁 이전에는 황해도 연백지역과 교류가 더 많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는 말투, 음식문화, 풍습 등이 강화도보다 황해도 연백군에 더 가깝다(Lee, 2016).
주민 청취조사 결과(Table 2, 3 참조) 에 따르면 교동도는 자연의 소리가 잘 어울리는 지역으로 인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섬 지역이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어 바람소리나 바람에 갈대, 억새 등이 흔들리는 소리가 다수 언급되었다. 자연의 소리는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청정한 지역이라는 특성과 결합되어 공감각적으로 경험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계절별로 다른 특징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 중에서 새소리는 관찰조사에서도 가장 많이 기록된 소리로, 주민들이 많이 인지하는 새소리는 주로 철새소리였다. 추수를 끝낸 논에서 철새들의 먹이활동 소리가 나는 시기와 장소에 대해 주민들은 비교적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새소리 중 제비소리는 보존해야 하는 소리로서, 주민들은 관광객 증가와 대룡시장 정비사업으로 인한 구조물 설치, 농약사용 등으로 교동도를 찾는 제비가 점차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 한편 바다와 관련된 소리에 대한 증언은 거의 없었다. 바다의 물살이 세고 철책선이 설치되어 있어 바닷가에서의 일상경험이나 어업활동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었다. 어업활동은 새우젓잡이가 유일하며, 근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뱃고동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특징도 발견되었다.
교동도를 대표하는 소리와 교동도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로는 농악소리, 농기계 소리, 대북방송과 대남방송, 행사시 사용되는 지역노래(교동도 노래), 황해도 사투리가 섞인 교동도 특유의 말투 등으로 나타나,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특징을 나타내었다. 농악소리와 농기계소리는 농사철이 되었음을 알게 하는 소리로 계절별 특징이 나타나는 소리로 조사되었다. 대북방송과 대남방송은 교동도를 대표하는 소리이지만 동시에 사라져야 하는 부정적인 소리로 가장 많이 언급되기도 하였다. 대남방송과 대북방송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대북방송과 대남방송에 대해 들리기는 하지만 점차 무신경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 중에서는 지역 문화가 변화하면서 점차 사라질 위기에 있는 소리도 있었다. 교동도는 농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농부들이 들에서 일할 때 부르는 노래인 ‘들노래’가 있었으나, 기계화로 인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계를 사용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함께 구령을 붙이거나 노동요를 불렀지만, 지금은 들을 수 없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많았다. 들노래가 성행했던 시절의 풍경에 대해 2003년 10월에 개최된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자료집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and Korean Broadcasting System, 2003) 에서는 “특히 구수한 풍물가락에 맞추어 들일을 할 때 누군가 부르는 들노래 소리에 하나되어 소리를 주고 받느라면 언제 힘들었냐는 듯이 서산에 해 기우는 줄도 모르고 열심을 다하는 농군들의 정아한 모습이 지금도 아른거리는 듯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 외에 상갓집에서 상주를 위로하기 위해 부르던 노래인 ‘곱새치기’ 등, 특정한 상황에서 부르던 전통적인 노랫가락들도 세대가 바뀌고 풍습이 달라지면서 전수가 되지 않고 있다.
교동도의 소리풍경이 변화하고 전통적인 소리들이 사라져 간 역사는 문헌에서도 엿볼 수 있다. ‘남북분단 이전의 교동도의 자연환경 중 멋진 풍경’을 의미했던 교동8경은 대부분 현존하지 않아 구 교동8경과 신 교동8경으로 구분된다(Lee, 2016). 신 교동8경의 6경 ‘虎浦齊月’(호두포의 청명한 달) 은 교동도 봉소리 호두포의 야경을 묘사한 것으로, 그 내용은 ‘碧落無雲雁影流(구름없는 푸른 하늘엔 기러기떼 흘러가고) 瀁東明月滴丁秋(동녘에 밝은 달은 가을이 어울리네) 墟姫唱送江南曲(저자의 가희들은 강남곡을 불러 보내고) 浦上遊人款酒樓(나루터 손님들은 주막에서 떠드네)’라고 하며, 노랫소리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로 가득한 포구의 풍경을 표현하였다. 신 교동8경의 6경은 구 교동8경의 5경 ‘遠浦稅帆’과 같이 포구의 풍경을 다루고 있지만, 선원들의 노래가 아닌 가희의 노래로 바뀌었다. 그 외에도 신 교동8경에서는 구 교동8경의 7경 ‘黍島漁燈’과 유사하게 새우잡이 배들의 철야조업 풍경을 다룬 4경 ‘末灘漁火(말탄포 어선들의 불빛)’가 포함되어 있지만 ‘어부가’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다(Table 4 참조).
청취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교동도 문화를 정리하면 Table 5와 같다. 주민들은 교동도의 ‘자연 친화성’, ‘풍요로운 농업지역의 특성’, ‘주민 단합과 신명’, ‘북한과 유사한 언어문화’를 중요한 지역의 특징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IV. 교동도 사운드스케이프의 재현
본 연구에서는 교동도의 지역이미지, 역사, 문화 등을 내러티브화하는 사운드스케이프 작곡 작업을 진행하였다. 전체 주제는 ‘화합과 평화에 대한 희망과 염원’으로, ‘평화의 섬’을 지향하는 교동도의 비전을 반영하였다. 크게 4가지 파트로 구분하여 교동도의 스토리를 소리풍경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자연의 소리를 작곡에 사용하는 형식적인 틀로서 Schafer의 소리 구분체계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Schafer의 소리 구분체계는 소리의 음향적인 특징만 반영하는 것이므로 소리의 내용적 특징을 다양하게 드러내기 위해 소리생태학의 소리 구분체계를 참고하여 배치하였다.
Schafer의 기조음은 음악의 주된 토대를 형성하는 배경이 되는 소리로서 충분히 자주 들려야 하고, 지역의 자연지형이나 기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찰조사에서 가장 많이 기록되었고, 교동도의 지리적 특성을 드러내는 소리인 파도소리, 새소리, 바람소리가 교동도의 기조음이 된다. 이것은 본 작곡 작업의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각각의 파트에 여러 가지 형태로 변주하여 배치하였다. 파도소리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에 위치한 교동도의 특성을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남한과 북한의 화합을 상징할 수 있는 소리풍경이기도 하다. 새소리는 교동도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고, 종류가 다양하여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교동도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으며, 바람소리는 주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분위기와 소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교동도의 역사적 아픔과 회복의 과정을 표현할 수 있는 요소로 활용하였다.
신호음은 의식적으로 들리는 소리 중 음향적인 경고수단이 되는 소리로 한정된다. 따라서 관찰조사 및 주민들의 청취조사 결과에 따라 주변 소리환경에 비해 크게 들리는 농기계소리, 자동차소리 그리고 경고수단으로 사용되는 새 쫓는 공포탄 소리, 대북방송 소리를 신호음으로 분류하였다. 신호음으로 분류된 소리들은 주민들이 긴장감과 불쾌함을 느끼는 소리가 많아, 교동도의 역사적 비극을 드러내기 위해 한국전쟁 당시의 기억과 분위기를 은유하는 요소로 활용하였다.
표식음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고, 교동도 주민들이 특히 존중하는 소리로, 랜드마크와 같은 기능을 한다. 따라서 현재 교동도를 상징하는 제비소리와 과거 교동도의 위상을 보여주는 사신당의 기도소리를 표식음으로 분류하였다. 대북, 대남방송은 신호음이지만, 교동도의 역사적 특징을 드러내는 표식음으로서의 가치도 있다. 다만 주민들이 소리를 존중의 대상으로 쉽게 떠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교동도의 지역적 특징 (Table 5 참조) 으로부터 표식음에 해당하는 소리를 유추해 내었다. 자연의 소리는 교동도의 기조음인 동시에 표식음이 되고, 다 같이 들일을 하면서 불렀던 ‘들노래’, 옛 노인들이 즐기던 ‘곱새치기’, 지역축제 때 공연하며 보존되고 있는 ‘농악’ 등 교동도의 언어와 문화를 담고 있는 소리들도 표식음이다. 표식음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있거나, 사라진 소리풍경이 많아 사운드스케이프 작품을 통해 의식적으로 재현하고 전수할 필요성이 있었다.
작품의 내러티브는 전체 주제인 ‘화합과 평화에 대한 희망과 염원’을 표현하기 위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간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를 위해 교동도가 겪었던 전쟁의 비극과 현재의 평화로운 일상을 대조적으로 드러내었다. 도입부는 교동도의 전체 분위기를 표현하여 주부를 위해 분위기를 만들고, 관람객의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자연스럽게 주제에 접근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악곡의 문법을 따랐다. 피날레는 전체 작품의 주제를 집약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첫 번째 파트는 ‘교동도와의 만남’으로, 교동도의 첫인상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소리풍경들을 나열하였다. 자연풍광이 좋은 교동도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자연의 소리들을 주로 사용하고, 지역 고유의 전통노래를 포함하는 등 교동도 소리풍경의 기조음과 표식음을 활용하였다(Table 6 참조). 파도소리는 북부지역보다 서남부지역에서 기록된 소리가 보다 잔잔한 인상을 주어, 교동도의 첫인상이자 남한과 북한의 화합을 상징하는 바다로서의 소리는 서남부지역에서 녹음된 소리를 사용하였다.
교동도에는 교동향교 교장, 지역에서 활동하는 음악인 등 지역의 역사와 전통에 관심이 많고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지역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젊은 세대나 외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교동도 및 강화도의 전통음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 지역의 명창으로 알려진 주민은 황해도 난봉가, 연백평야 들노래 등 황해도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는 소리들을 전수하고 있다. 황해도에서 피난 와 황해도식 강정을 만들어 판매하는 주민은 황해도 민요를 기억하고 있으며, 포구 근처에 위치한 사신당에서는 과거 사신들의 안전한 귀환을 염원했던 기도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등, 교동도 고유의 전통 소리를 다수 기록할 수 있었다. 이중 ‘교동도와의 만남’ 파트에서는 교동향교에서 전수하고 있는 ‘곱새치기 노래’를 사용하였다. 이는 교동도의 상갓집에서 들을 수 있었던 노래로, 상을 치르느라 고생하는 상주를 위로하기 위해 손님들이 일부러 신나는 노래를 불러주었다는 사연이 얽혀 있어 단합이 잘 되는 교동도 사람들을 표현함으로써 교동도를 대표하는 소리라고 해석하였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전쟁과 긴장’을 표현하였다. 한국전쟁과 분단의 비극을 은유하여 교동도가 평화롭고 아름다운 섬이지만 실향민의 아픔을 품고 있는 민간인 통제구역이라는 현실을 감상자로 하여금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는 전쟁의 긴장감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소리풍경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찰조사에서 기록된 소리풍경 중 긴장감을 은유할 수 있는 소리들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바닷가에서는 파도소리가 지배적으로 들리고 바람소리가 더 거칠게 들린다. 바람이 부는 것에 따라 갈대나 초등학교의 시설물들이 흔들리는 소리도 강렬하다. 특히 초등학교에 게양되어 있는 국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학교의 종이 불규칙적으로 울리는 소리가 다른 바람소리에 비해 긴장감을 표현하기에 적절하였다. ‘교동도와의 만남’ 테마에서 ‘전쟁과 긴장’ 테마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두 번째 파트의 첫 번째 소리로 사용하였다. 이때의 바람소리는 자연의 소리이지만 표식음의 성격은 없고 기조음으로서 쓰였다(Table 7 참조). 한편으로 새소리는 테마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배경으로 삽입하여 교동도의 장소적 분위기를 이어나가도록 하였다. 이때의 새소리는 기조음이다.
군인들이 총기를 점검하는 소리와 불법조업 어선들을 경고하는 방송소리는 신호음으로, 그 자체로 교동도의 군사적 긴장상황을 표현하기에 적절하여 두 번째 파트에 포함하였다. 그 외에는 소리의 분위기나 유사점을 활용하였다. 대룡시장 일대는 공사를 하거나, 자동차가 지나가는 인공적인 소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불쾌함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자동차소리는 탱크소리로 은유하여 사용하였다. 스프링클러가 돌아가는 소리, 마을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치는 소리는 일상의 소리이지만, 각각 기관총소리와 폭탄 터지는 소리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보아, 포스트작업을 통해 약간의 편집을 거쳐 전쟁 상황을 묘사하는 소리로 사용하였다. 벌 소리와 개 짖는 소리는 각각 기조음과 신호음으로서 듣는 이로 하여금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로 활용하였으며, 군인들의 행군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운동장 걷는 소리를 일부러 연출하기도 했다. 두 번째 파트의 마지막은 교동도의 표식음인 무속인의 기도소리를 배치하여 앞서 표현된 긴장감을 해소하는 장치로 사용하였다. 사신당의 기도는 안전한 귀환을 기원했던 것으로써 전쟁을 끝내고 화해와 평화를 기원하는 소리로 재해석하였다.
세 번째 파트는 ‘교동도의 일상’을 묘사하여 전쟁의 상처가 아물어가고 활기가 넘치는 현재를 나타내었다. 빗소리와 유사한 바람소리를 사용하여 긴장감을 ‘식힌다’는 메타포를 담았으며,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기조음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교동도의 여러 일상생활 장소들에서 들리는 소리들로 주민들의 현재 삶을 표현하였다. 교동도의 중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대룡시장 일대의 소리가 대부분 사용되었다. 대룡시장 일대는 교동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람들의 이야기소리가 가장 많이 들리는 지역이다. 상인들과 손님들의 이야기소리, 웃음소리가 유쾌하고, 주변에 교동초등학교가 있어 아이들의 소리도 들을 수 있다. 이런 소리들은 기조음, 신호음, 표식음의 개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대룡시장의 제비는 실향민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존재이자 교동도 주민들이 애착을 가지는 대상으로서 제비소리는 표식음이라고 할 수 있다(Table 8 참조).
네 번째 파트는 ‘화합과 평화를 찾아서’라는 테마로 첫 번째 파트와 유사한 파도소리와 새소리를 사용하여 ‘평화의 섬’ 이미지와 작품의 주제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사라져가는 전통소리를 재현함으로써 지역문화를 보전함과 동시에 전쟁 이전의 평화로웠던 과거를 상기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 파트에 사용된 자연의 소리는 기조음이 되고, 사라져가는 전통소리는 표식음이다(Table 9 참조).
대북방송, 대남방송은 청취조사에서 사라져야 하는 부정적인 소리로 언급되어 지역주민들이 존중하는 소리라고는 할 수 없지만, 북한과의 접경지역으로서 교동도의 역사와 지역특성을 드러낸다. 네 번째 파트에서는 대남방송으로 들려오는 ‘고향의 봄’ 노랫소리를 통해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던 대북, 대남방송이 점차 평화를 염원하는 소리로 전이되어 가고 있다고 재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남북을 자유롭게 왕래하는 존재로서 ‘평화’의 전도사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새의 소리를 통해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북한으로 전하고자 함을 표현하였다.
관찰조사를 통해 기록된 소리들은 작품 내러티브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사운드맵으로 기록하여 지역의 소리풍경을 그래픽으로 남겼다. 교동도의 모든 소리를 기록한 것은 아니며, 현지조사 중 주관적으로 아름다움이 느껴지거나 특이하게 여겨지는 소리들을 장소별로 표기한 것이다. 사운드맵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첫 번째는 2차원적 지도상에 맵핑을 하는 방식으로 한 눈에 소리풍경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Figure 4 참조). 두 번째는 사운드맵 어플리케이션 ‘Sound Around You’에 장소별로 소리 녹음 파일을 업로드하여 소리풍경의 실제 분위기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총 90개 녹음 파일 중 유사한 소리들은 제외하고, 51개를 선별하여 업로드 하였다(Figure 5,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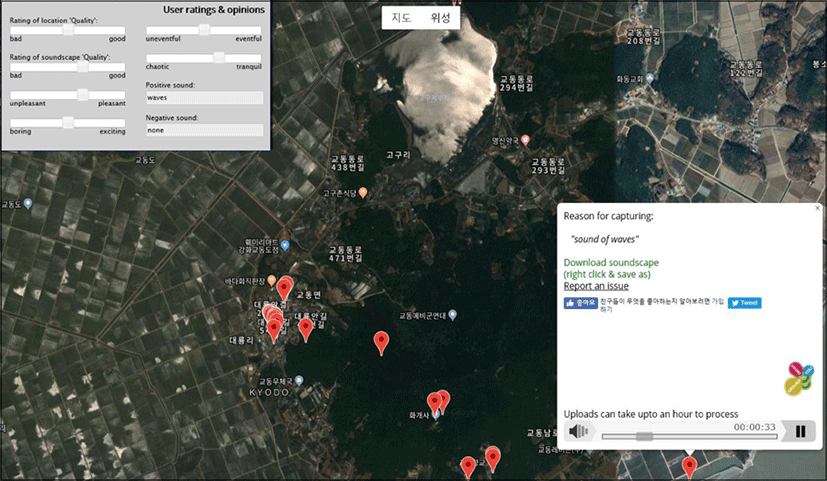
사운드스케이프 작곡 작업의 결과물은 사운드와 영상을 분리하여 재생하는 방식으로 전시되었다. 사운드는 Mac Mini를 사용하여 6채널로 재생하였으며, 영상은 Dvix Player로 상영되었다. Tetra Mic를 사용하여 녹음한 4채널의 엠비소닉 A-format은 변환 소프트웨어 ‘VVMIC’를 통해 W, X, Y, Z의 사운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엠비소닉 B-format으로 인코딩하였다(Figure 7 참조). W는 전 방향의 마이크 출력, X는 전/후, Y는 좌/우, Z는 상/하의 오디오 정보를 의미한다. 이후 ‘Rapture 3D Advanced’를 사용하여 6개의 스피커 조합으로 디코딩하였다(Figure 8 참조). 영상은 교동도의 장소적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한 사진 및 동영상으로 구성하였다. 사운드와 영상은 일치되지 않도록 별개의 작업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관람자가 시각적 이미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운드스케이프에 온전히 몰입하게 하기 위한 의도였다. 영상이 나오는 공간은 간단한 가림막으로 분리하여 영상 없이 사운드만 듣는 경험과 사운드와 영상을 함께 감상하는 경험을 각각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운드의 러닝타임은 13분 2초, 영상의 러닝타임은 16분 8초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감상하여도 사운드와 영상은 계속 어긋나게 된다. YouTube상으로는 이렇게 사운드와 영상이 일치하지 않도록 구성한 의도를 반영하기 위해 러닝타임을 조정하지 않고 원 작품의 사운드와 영상을 반복해서 배치하는 형태로 동영상을 제작하였다(http://youtu.be/lElmDwHKlKU).
본 작품이 관람객들로 하여금 교동도의 지역특성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지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작품을 감상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평가설문을 실시하였다. 작품은 2018년 5월 15일에 업로드되어 10월 24일 기준 343회 재생되었고, 평가설문은 2018년 7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15일간 집중적으로 진행되어 총 71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오프라인 전시와 같은 환경에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전시 때 배포되었던 전시소개글을 평가설문지에 첨부하였다. 본 작품이 문화관광 콘텐츠로서 지역특성을 전달하는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71명 중 교동도에 살고 있거나, 자주 방문한다고 응답한 2명, 교동도를 방문해본 경험이 있는 8명을 제외하고, 교동도를 전혀 모르거나 가보지 않았다고 응답한 61명의 샘플을 대상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작품은 지역의 사운드스케이프를 재구성하여 의도적으로 내러티브와 주제를 전달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평가항목을 선정하였다. 먼저 작품의 구성 측면에서 전반적인 주제 전달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작품의 내러티브 이해효과, 사운드와 영상의 불일치로 인한 사운드 몰입효과를 조사하였고, 2차원적 형태와 인터랙티브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형태라는 두 가지 형식의 사운드맵이 작품의 주제 전달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각각의 형식별로 사운드맵을 통한 교동도의 지역분위기 이해효과를 조사하였다. 다음은 작품을 통한 지역의 이해도를 조사하기 위해 4가지의 관점으로 항목을 구성하였다. 가장 직접적인 감상으로서 1차원적인 이해효과, 지역 전반에 대한 보다 추상화된 이해효과, 구체적인 지역의 역사적 배경 이해효과, 앞의 3가지 관점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종합적이고 성찰적인 지역의 미래비전 이해효과이다. 모든 평가항목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였다.
작품의 내러티브 이해도는 평균 78.4점으로 작품구성의 전달력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사운드와 영상을 고의적으로 불일치시킴으로써 사운드에 보다 몰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한 효과는 65.8점으로 비교적 높게 평가되었으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운드스케이프를 통한 주제전달은 전시소개글과 시각적인 영상의 도움이 여전히 필요한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운드맵을 매개로 한 지역분위기 이해효과는 2차원적 형태에 대해서는 73.5점, 웹사이트에 업로드된 형태에 대해서는 80.1점으로 Schafer가 처음 만들었던 2차원적 형태의 사운드맵보다 최근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인터렉티브한 인터페이스가 더 효과적이었다. 작품을 통한 교동도의 지역분위기 상상효과는 85.5점으로 매우 높았으며,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효과도 83.3점으로, 단순히 분위기를 상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지만 여전히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적인 배경과 미래비전에 대한 이해효과는 이보다 더 낮은 76.0점, 74.9점으로 각각 조사되어, 교동도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적 맥락에 대한 부차적인 설명자료가 보완될 필요성이 보였다(Table 10 참고). 요컨대 전반적으로 본 작품을 통해 교동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지역의 문화콘텐츠로서 사운드스케이프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부가적인 설명 또는 시각자료가 있을 때 관람객과의 소통을 더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운드스케이프를 통해 시각적으로 보이는 현재의 풍경 이면에 축적되어 있는 지역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전통을 경험할 수 있으며, 사운드스케이프를 문화⋅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특히 기존의 사운드스케이프 연구들이 ‘자원’이 될 수 있는 소리풍경들을 선별하는데 그쳤던 것에서 더 나아가, 사운드아트의 영역으로서 소리풍경의 새로운 내러티브를 창조하여 지역의 미래비전을 반영한 문화예술콘텐츠로 재구성하는 사운드스케이프 작곡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사운드스케이프는 교동도의 역사 및 지역정체성을 드러내는 자원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사운드스케이프 작곡의 결과물은 DMZ 접경지역의 자연환경과 장소성을 보존하면서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매체가 된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DMZ 접경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의 중요성에 대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경우, 사운드스케이프 작곡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대북방송, 대남방송은 지역주민들이 두려워하거나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소리이지만, 교동도의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맥락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실제로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북, 대남 확성기가 철거되면서 대북방송과 대남방송이 모두 중단됨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는 DMZ 접경지역의 특징적인 소리풍경이었던 대북, 대남방송을 기록하고, 그 의미를 후대에 전하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 다만 해당 소리만을 단편적으로 방문객에게 들려주는 방식은 지역의 아픈 기억을 흥미 위주의 관광상품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담은 내러티브에 따라 사운드스케이프를 재현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적 특성을 보존함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사운드스케이프 개념을 처음 이론적으로 설명한 Schafer는 자연의 소리를 중심으로 설명하였지만, 본 연구를 통해 재구성한 교동도의 소리풍경 작업에 있어서는 사람으로부터 기인해 나는 소리인 anthropophony의 역할이 중요했다. 특히 지역의 역사적 맥락과 과거의 상처를 극복한 현재의 모습, 지역자원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운드마크, 전체 작품메시지를 축약하는 소리는 사람으로부터 기인해 나는 소리를 사용했을 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운드스케이프 및 사운드아트의 영역에서 자연의 소리뿐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내는 소리에도 주목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사운드스케이프는 문화경관 연구에서 재현적 경관이론을 벗어나고자 등장한 비재현적 경관이론의 연구주제로서, 본 연구는 이를 실제 현장에서 직접 실행하면서 지역경관을 이해하는 시도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동안 사운드스케이프 연구들은 소리의 특성을 긍정적인 속성과 부정적인 속성으로 구분하고, 부정적인 소리들을 제거함으로써 전체 소리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소리환경을 평가, 분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소리의 특성을 긍정 또는 부정으로 분류하는 것을 지양하고, 그 자체로서 소리가 발생하는 장소 및 지역에 대한 스토리를 전달하는 매체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소리자원의 재구성을 통해 지역의 특성과 메시지를 전달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으로 인지되는 소리들도 사운드스케이프 작곡의 내러티브 구성에 따라 지역의 역사자원이자 메시지 전달의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로써 사운드스케이프 작곡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사운드아트는 작품이 전시되는 공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예술분야로, 향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사운드스케이프 작곡의 결과물이 전시되는 방식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사운드맵은 2차원적 형식으로 기록되는 것에서 진화하여 인터랙티브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증강현실 및 유비쿼터스적 형태로 다양하게 변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후자의 방식이 사운드스케이프의 주제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최근 시도되고 있는 LPS (Local Positioning System)를 활용한 장소특정적 사운드 설치는 어떤 공간 내의 특정 지점과 특정 사운드를 매칭함으로써 소리와 공간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하고 관람객의 실천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사운드맵의 확장적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운드와 공간, 그리고 관람객의 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을 통해 작품의 내러티브와 메시지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뒷받침한다.
사람들은 지역을 시각적인 요소에만 의지해서 경험하지 않고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며, 이러한 경험은 지역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Landry, 2006) 사운드스케이프는 공간디자인 및 환경디자인 분야에서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교동도의 중요한 사운드스케이프를 발견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증언과 의견이 필수적이었으나, ‘소리’를 노래나 가락으로만 이해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사운드스케이프는 낯설고 어려운 개념이었다. WSP의 주된 목적이 사운드스케이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증진시키고자 했던 교육적인 성격이었듯이 본 연구의 결과물은 관광자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자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의의도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다양하고, 가치 있는 지역의 사운드스케이프를 발굴하고 보존시켜 나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