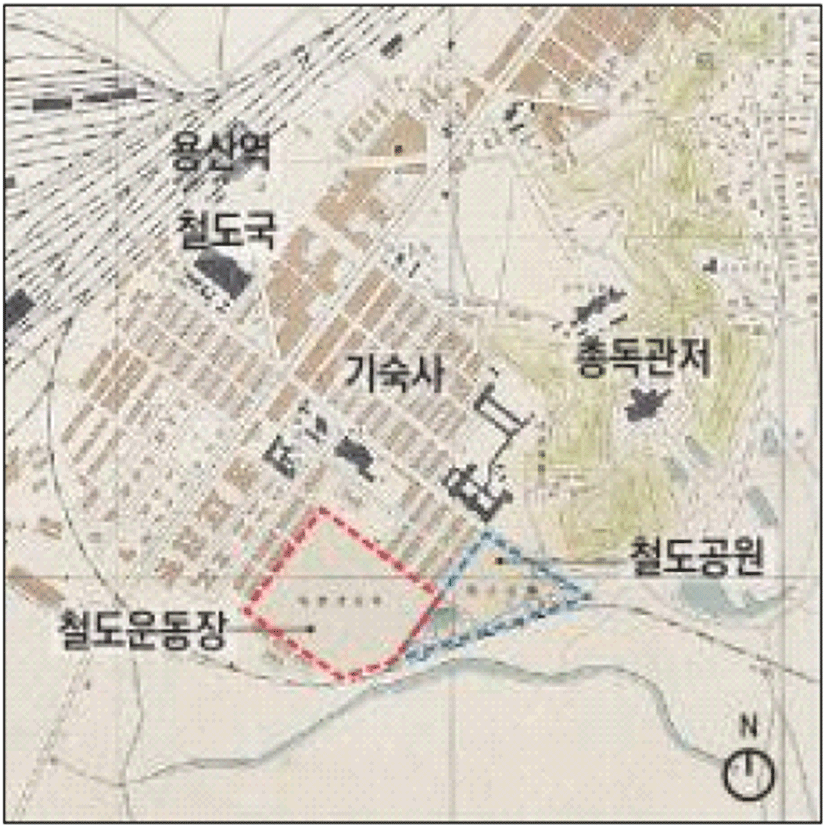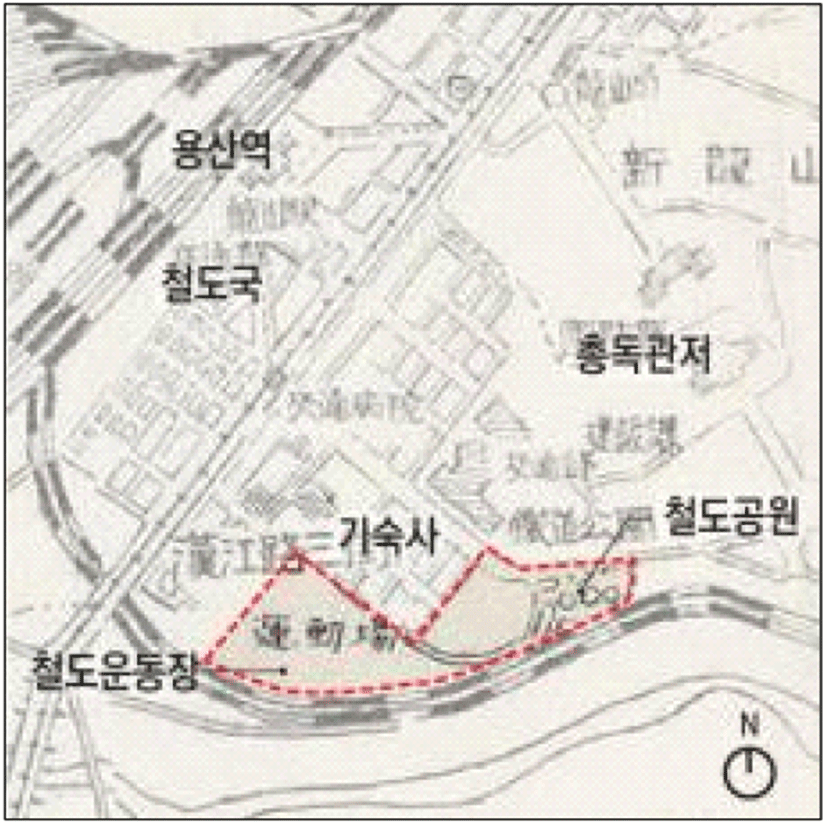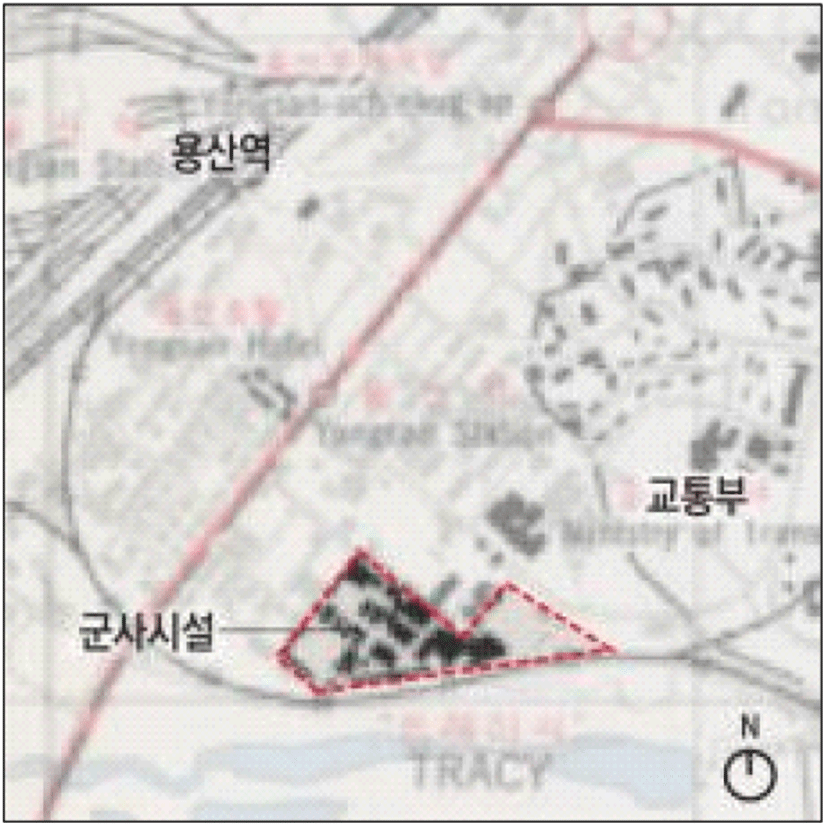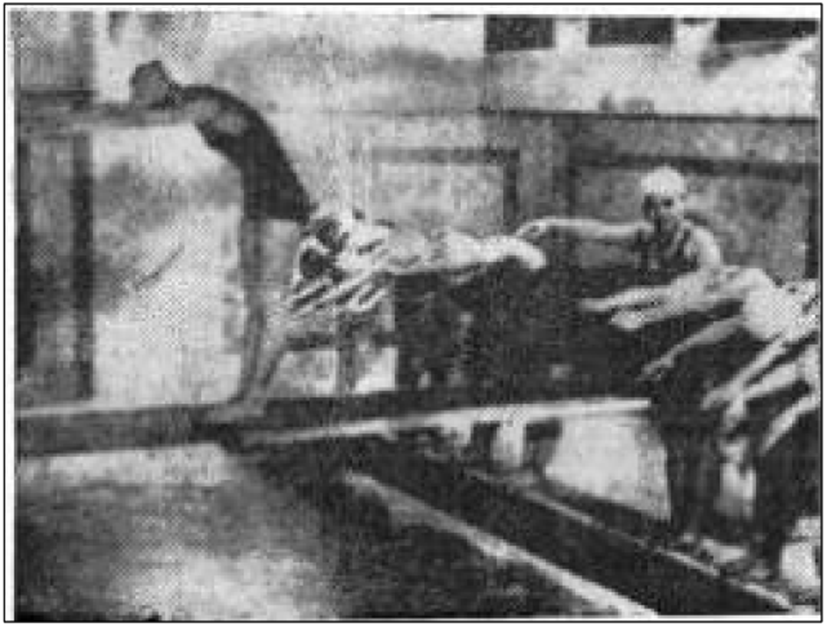Ⅰ. 서론
조경사 관점에서 일제강점기는 근대적 공원과 녹지의 개념이 제도적으로 정립되어 새로운 도시의 구조로 자리 잡은 근본적 변화의 시기이면서, 타의에 의해 강제적으로 전통과 괴리된 채로 근대를 맞이해야 했던 단절의 시기이기도 하다. 최근 근대기의 성과와 의미를 재발견하려는 노력이 나타나면서 조경 분야에서도 근대기의 도시공원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대한제국 시기에 조성된 공원으로서는 탑골공원과 독립공원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Park, 2003; Kim et al., 2013; Lee, 2008), 남산공원의 의의와 변화를 다룬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Son and Seo, 2012; Seo and Son, 2013; Seo, 2015; Park, 2015). 일제강점기에 지정된 주요한 공원인 훈련원공원, 장충단공원, 사직공원과 함께 궁궐로서 공원의 역할을 했던 창경원에 대한 연구도 제시된 바가 있다(Son, 2003; Lee, 2005; Kim, 2008; Woo, 2009; Kim and Choi, 2013; Kim et al., 2014; Kim, 2015; Kim and Kim, 2016). 선행연구들은 학계뿐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서울의 주요한 공원이자 문화 공간을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많은 근대의 공간들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며, 근대 조경에 관한 연구는 다른 시대에 비해 성과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철도공원(鐵道公園)을 분석하고, 계획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철도공원이 선행연구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바는 아니나, 존재의 유무와 위치 정도만 언급이 될 뿐 구체적인 내용이 다루어진 적은 없다1). 철도공원의 경우, 부지의 지적경계는 유지되고 있으나, 현재 공원이 아닌 다른 시설로 이용되고 있어 연구자들이 큰 주목을 한 공원은 아니었다. 최근 김영민과 조세호(Kim and Cho, 2019; Cho and Kim, 2019)의 연구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동안 공원현황은 총 8편의 도시계획 문헌에 등장하며, 현황표를 검토하면 중복되는 내용이 나타나 총 6번의 실제 현황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2). 일제강점기의 공원들은 문헌의 시기에 따라 구분과 명칭에 변화가 있으나, 종합하면 녹지와 특수정원을 제외하면 총 9개의 공원이 경성부에 존재하고 있었다(Table 1 참조). 후일 철도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만철공원은 1915년에 개설된 공원으로 대한제국 시기에 개설된 한양남산공원과 파고다공원을 제외하면 일제강점기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공원이다. 현황이 거의 그대로 유지된 다른 공원과 달리 철도공원은 공식적인 계획도서에서 기존 공원이 아닌 계획 공원으로 편입되어 여러 차례 명칭과 영역이 변경된다. 이는 철도공원이 일제강점기의 공원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특수한 계획적 개념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철도공원이며, 만철공원은 철도공원으로 변경되기 전의 명칭으로 동일한 장소를 지칭한다. 공원의 현황과 계획적 사안은 조선총독부와 경성부의 도시계획서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선별된 문헌은 1925년 「경성도시계획조사자료(京城都市計劃調査資料)」, 1927년 「경성도시계획자료조사서(京城都市計劃資料調査書)」, 1928년 「경성도시계획조사서(京城都市計劃調査書)」, 1930년 「경성도시계획서(京城都市計劃書)」, 1932년 「경성도시계획자료조사서(京城都市計劃資料調査書)」, 1936년 「조선도시문제연구회의록(朝鮮都市問題硏究會議錄)」, 1938년 「경성부도시계획요람(京城府都市計画要覧)」, 1938년 「경성부토목사업개요(京城府土木事業槪要)」, 1940년 「경성시가지계획공원결정안(京城市街地計劃公園決定案)」이다. 1940년 공원결정안의 경우, 전문이 번역된 1968년의 「서울도시계획공원 기본계획보고서」를 함께 참조하였다. 또한, 도시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1930년의 “경성도시계획서 공원배치도”, 1930년대 후반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경성부공원계획지도”, 1940년의 “경성시가지계획공원 공원배치도”를 별도로 참조하였다. 1930년의 “경성도시계획서 공원배치도”는 1930년 「경성도시계획서」에 포함된 부도로 추정되지만, 국내의 1차 자료에는 소실된 것으로 판단된다3). 하지만 일부 선행연구에서 부도가 제시되고 있어, 일본에는 부도가 포함된 1차 자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선행연구의 자료를 재인용하였다4).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된 “경성부공원계획지도”는 명칭과 제작연대가 불확실하며, 1920년대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되어 있다5). 하지만 지도에는 1937년 발표된 「경성시가지계획결정이유서(京城市街地計劃決定理由書)」에서 확정된 도로체계가 나타나며, 표시된 공원의 수와 배치를 볼 때 1938년의 「경성부도시계획요람」의 공원계획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Figure 11 참조). 따라서 이 지도의 제작연대는 1937년에서 1938년 사이로 추정된다.
도시계획서와 관련된 부도 외에 철도공원, 철도그라운드. 철도운동장 등으로 신문에 실린 공원과 관련된 기사와 사진을 분석하여 공원의 이용행태를 파악하였으며, 철도공원에 대해서는 한국철도청의 자료들을 함께 참조하였다. 공원의 위치와 경계를 파악하고, 물리적 시설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일제강점기와 1950년대의 지도를 현재의 항공사진을 비교하였다. 참조한 지도는 1927년 “용산시가도(龍山市街圖)”, 1936년 “대경성부대관(大京城府大觀)”, 1936년 “대경성정도(大京城精圖)”, 해방이후 1940년대 후반 추정의 “서울특별시가도”6), 1950년대 중반 추정의 “서울시가지도”7)이다. 이 중 “대경성부대관”은 대경성을 조감도 형식으로 제작한 지도로서 2015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복원하였기 때문에 이전의 연구에서는 널리 활용되지 못했던 사료이다. “대경성부대관”은 경성 시가지, 용산, 영등포 일대의 녹지와 건물을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어 근대 1936년 이전의 경성부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연구는 물론 공원녹지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서 큰 가치가 있다. 오늘날의 현황은 국토지리정보원(NGII)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과 Google Map의 항공사진을 활용하였다.
II. 철도공원의 특징
철도공원은 경성부가 처음 공원녹지의 현황을 조사한 1925년 「경성도시계획조사자료」에서 만철공원(満鐵公園)으로 최초의 명칭이 나타나며, 이후의 문헌에서는 철도공원으로 기록되고 있다. 일제의 주요 공원 관련 계획 문헌의 현황 일람표에 나타나는 철도공원은 1936년까지는 공원으로 분류되었고, 1940년의 현황 일람표에서는 운동장으로 분류된다8). 1925년 현황 일람표의 만철공원은 1915년 10월에 개설되었으며, 한강통(漢江通)에 위치한다고 기록되어 있다(Gyeongsung-bu, 1925). 공원이 위치했던 한강통 16번지는 현재 용산구 한강로3가 65번지 일대이다. 해방 후에는 미군 헌병대대(Camp Tracy)가 주둔한 것으로 “서울시가지도”를 통해 파악되었으며, 이후 국군복지단과 육군부대, 용산세무서가 공원부지를 점유하였고, 현재는 용산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면적은 약 25,000m2로 문헌에 따라 수치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기록의 오류 정도로 보아도 무방한 작은 차이이다(Table 2 참조). 지도에는 정확한 구역계가 없으므로 철도공원과 철도운동장의 공간 구분을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시설물 현황과 신문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북측의 철도운동장으로 표현된 구역까지 같은 공간으로 인식하고 이용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7 개의 도시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경성운동장이 독립된 운동장으로 구분되지만, 철도공원과 철도운동장의 경우 명확한 구분이 없이 사용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도 철도운동장은 철도공원의 구분은 명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Figure 2 참조).
총공사비는 5,410.670円으로 개설 이후 추가적인 공사비가 지출된 기록은 없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동안 공원의 확장이나 축소는 이루어지지 않고 변동 없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현황자료에서 평균 유지비가 567円으로 평당 0.07円로 나타난다. 1925년의 파고다공원의 평당 유지비가 0.65円인 것과 비교하면 적지만, 훈련원공원이 0.05円, 남산공원 0.03円인 것과 비교하면 당시의 다른 공원과 비교해 유지비가 높은 편이었다9). 1925년, 1927년, 1928년, 1932년의 시설개요에 철도공원의 시설은 “공원 내 운동장, 대로, 회유, 산책도로, 연못, 축정(築庭), 잡목식재, 화훼원 설비, 정자와 걸상, 배수설비, 조혼비(助婚砒), 원숭이 우리, 기타”로 동일하게 기술되어 있다(Gyeongsung-bu, 1925; 1927; 1928; 1932). 또한, 신문기사를 통해 수영장이 설치되어 이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다른 공원의 시설개요의 내용과 비교할 때 철도공원은 다양한 양질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비록 계획 문헌상에서는 공원으로 기록되지만, 1915년 조성 당시 철도공원은 공공공간이 아닌 철도 관사단지 내의 부대시설로 만들어졌다. 당시의 철도산업 종사자는 최고의 전문가 계층으로 여겨졌으며, 철도국은 일본인 직원들이 조선의 생소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본의 철도 관사를 전형으로 삼아 철도 관사단지를 제공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철도국은 전국에 철도 관사단지를 건설하였으며, 경성지역에는 화천동관사, 근정관사, 합정동관사, 수색관사, 청량리관사 그리고 용산관사의 6개 단지가 조성되었다(Li and Jung, 2017:203). 1907년 통감부의 철도관리국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경성의 외곽 지역이었던 용산역 일대에는 철도국, 철도병원, 철도공장, 철도원양성소, 관사가 모인 특수한 대단위 도시 생활권이 조성된다10). 용산의 관사단지에는 1906년부터 1908년까지 120동의 집단주택이 건설되었고, 1925년까지 654동의 집단주택이 추가로 건설되었다(Li and Jung, 2017:221). 철도공원은 용산관사가 급격하게 확장되면서 근린주구 형식의 계획에 따라 단지 내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철도공원의 조성 주체는 조선총독부의 철도국이었으며, 1917년부터 1925년까지 용산관사의 관리 주체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경성관리국이 맡게 된다11). 관리 주체의 명칭에 따라 1925년까지 만철공원이 정식 명칭이었으나, 1925년부터 1943년까지 조선총독부 철도국으로 관리 주체가 변경되면서 철도공원으로 명칭이 바뀐다(Gyeongseong-bu, 1938:77). 정확한 공원 이관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계획 문헌과 신문기사를 검토해볼 때 1925년 철도와 관사단지의 경영이 남만주철도주식회사에서 조선총독부로 이관됨에 따라 철도공원은 경성부의 공원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12). 따라서 1925년의 만철공원과 그 이후의 문헌의 철도공원은 동일한 공원이다.
1920년대 후반의 항공사진은 관사단지와 철도공원의 공간적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Figure 1 참조). 관사단지와 공원을 구분하는 명확한 경계는 보이지 않으며, 관사단지와 공원은 주변의 철도로 외부의 지역과 명확히 구획된 하나의 도시 조직으로 보인다. 또한, 철도공원 내에 정식 규격의 야구장과 육상경기장이 조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1927년의 “용산시가도”에서는 철도공원의 물리적 경계와 평면상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Figure 2 참조). 시가도에서 철도공원은 운동장과 공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운동장과 공원 사이에 수공간이 있지만 두 공간이 연결되어 있어 분리된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1936년의 “대경성부대관”은 시가도에 비해서 철도공원 내부와 주변 건물군들이 상세하게 표현되어 공원의 시설과 동선, 수목의 배치까지 파악할 수 있다(Figure 3 참조). 경성부대관에서도 철도운동장과 철도공원은 별도의 명칭으로 구분되지만, 공간적 경계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운동장에는 관람석을 갖춘 야구장과 육상경기장이 확인되며, 공원에도 정구장으로 추정되는 4개의 운동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운동장의 북측으로는 아동회관과 거주민들의 위락을 위한 공공시설인 구락부(俱樂部), 궁장(弓場)이 위치하여 운동장과 공원은 공공시설들과 함께 단지 내의 중심 커뮤니티 공간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해방 이후에 작성된 “서울시특별시가도”에서는 운동장과 철도공원의 명칭이 나타나고, 공원 내의 동선이 표시되고 있어 공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확인된다(Figure 4 참조). 하지만 주변 건물들의 변화가 나타나 공원과 관사단지의 관계는 일제강점기와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미육군극동지도국에서 발행한 1950년대 중반에 발행된 “서울시가지도”를 보면 철도공원 부지에 군사시설들이 들어서면서 공원의 형태가 사라진다(Figure 5 참조). 관사단지의 가로 구조가 유지되었던 “서울시특별시가도”와 비교하면, 공원 주변 건물과 가로의 배치와 형태가 완전히 변화하여 과거의 모습을 찾기는 힘들다. 현재의 도시공간 구조와 과거의 구조를 비교하기 위해 1936년 대경성부대관과 현재 항공사진을 중첩하여 공간적 변화를 분석하였다(Figure 6 참조). 중첩분석의 결과, 철도공원과 운동장 일대에 국군복지단과 육군부대, 용산세무서, 아파트, 주택 등이 들어서 있다. 특히 철도운동장의 야구장 일부는 육군부대의 연병장으로 이용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1920년부터 1943년까지의 신문기사의 내용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철도공원의 이용행태는 운동경기와 체육 관련 행사이다(Table 3 참조). 1915년 최초의 전국 규모의 야구대회인 전조선야구대회가 철도공원에서 열렸으며(Figure 7 참조)13), 1921년에는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조선체육회 주최의 야구대회14), 1934년에는 전국체전 성격의 전조선종합경기대회의 경기 일부도 철도공원에서 개최되었다15). 이 외에도 신문 기사화가 될 정도의 운동경기가 여러 번 개최되었던 것을 보아 철도공원은 일제강점기 초반 종합운동경기장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철도공원은 1925년 동양 최대 규모의 경성운동장이 건립되기 전까지 경성에서 야구장이 조성된 소수의 공공공간 중 하나였으며, 일제강점기 통틀어 경성운동장 이외에 공식 체육대회가 가능한 규모의 공간은 얼마 되지 않았다16). 정식 대회는 아니지만 30여 종의 운동경기를 철도운동장에서 개최했다는 기록도 나타나며17), 용산철도 공원 내 수영장에서 최초로 여자 수영강습회가 열렸다는 기록도 있다. 지도나 도면상에서 확인이 되지 않지만, 수영장 시설까지 갖춘 것으로 보인다(Figure 9 참조)18).
운동경기 외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용행태는 철도와 관련된 기념행사이다(Table 3 참조). 철도 관련 순직자들을 기리는 철도조혼제(鐵道弔魂祭)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었고, 철도국 관련 전시나 견학 행사도 열렸던 것으로 나타난다(Figure 8 참조). 1925년 철도공원의 관리운영 주체가 조선총독부가 도시공원의 성격을 갖게 되었지만, 여전히 관사단지에 부속된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철도공원이 일반 시민들도 이용 가능했다고는 하나, 입지상 철도국 직원과 관사 거주민 외에는 이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용산지역은 용산역이 경인선, 경의선, 경원선의 시발역이 되면서 1900년대 초에 이미 상당히 시가화가 진행되었으나, 대부분은 철도시설과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어 경성의 외곽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철도공원은 남측으로는 경의선 철도에 의해 주변과 단절되어 있었고, 동측으로는 구릉지에 위치한 총독부관사와 병영이 있었기 때문에 철도 관사단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접근이 불가능하였다(Figure 2 참조). 따라서 철도공원에는 다른 경성의 공원에 비해 상당히 우수한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성 시민들의 일상적인 이용보다는 운동경기, 철도 관련 행사, 음악회 등 큰 규모의 행사를 위한 용도로 주로 활용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철도공원이 대형 행사만을 위한 공원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철도공원은 대다수의 경성 거주민들이 이용하기는 불편했으나, 용산의 철도 관사단지는 774동의 주택이 건설된 대규모 계획 주거지로 그 자체로 상당한 인구가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III. 철도공원의 계획적 의의
일제강점기 경성의 첫 공식 공원계획안은 1930년 「경성도시계획서」를 통해서 제시된다. 1930년의 계획안에서는 도시공원, 근린공원, 운동공원, 아동공원, 자연공원 5종의 유형이 제시되었으나, 자연공원은 산지 등 기존의 자연녹지를 의미했기 때문에 실제의 계획 공원 유형은 4종이었다(JGGK, 1930:211). 도시공원, 근린공원, 운동공원, 아동공원은 기능상의 구분이기도 했으나, 규모에 따른 유형이기도 하여 순서대로 대형공원에서 소형공원으로 구분되는 위계를 갖고 있었다. 총 38개소의 계획 공원이 제시되었고, 이중 철도공원은 용산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16번 계획 공원으로 지정되었다(Figure 10 참조). 이때 용산공원의 계획 면적은 58,800m2로 철도공원의 원면적 24,941m2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JGGK, 1930:214). 기존의 철도공원을 확장하여 계획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나, 부도에서 명확한 확장 구역과 방식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1930년의 공원계획에서는 철도공원 외에도 이미 조성된 남산공원, 장충단공원, 효창공원, 파고다공원, 사직단공원이 계획 공원으로 지정되어 대부분의 기존의 공원이 계획 공원으로 편입되었다. 또한, 공원으로 구분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의 궁이었던 경복원과 창덕원도 계획 공원으로 지정된다. 장충단공원과 파고다공원은 기존의 면적과 계획 면적이 거의 같으나, 남산공원, 효창공원은 상당히 면적이 증가했으며, 사직단 공원은 면적이 줄어들었다(JGGK, 1930:213-215). 이는 1930년의 공원계획에서 기존의 공원을 지정하거나 확장, 축소하여 계획 공원을 확보하는 방식이 철도공원에만 적용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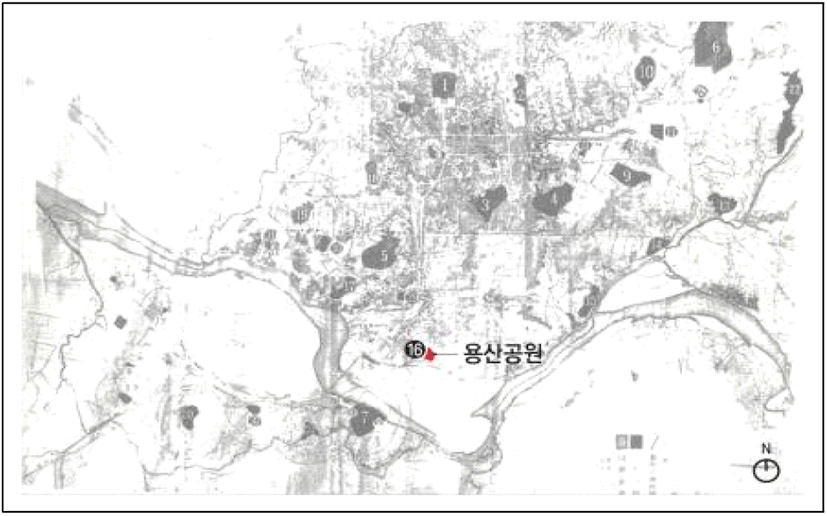
철도공원은 근린공원과 아동공원으로 중복지정되어 있었다. 공원 내 우수한 운동시설이 있었음에도, 철도공원은 운동공원으로는 지정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철도공원을 새로운 계획 공원으로 편입하였지만,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만 수용하여 재조성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철도공원은 당시 다른 경성의 공원에 비해 양질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재정 상황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이를 철거하고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1930년의 운동공원의 개념이 오늘날의 체육공원처럼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이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1930년의 계획서에서 운동공원의 정의는 “중심으로서 청소년의 체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JGGK, 1930:206). 또한, 계획서의 기준표에서도 운동의 역할보다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운동시설 관련 시설에 대한 요건은 나타나지 않는다(JGGK, 1930:211). 1930년의 계획안에서 운동공원으로 지정된 남산공원, 장충단공원, 효창공원, 사직단공원은 당시 제대로 된 운동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1932년의 현황시설 개요를 보면 장충단공원에 경기장이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1930년까지는 공터에서 체육활동이 일어났던 정도의 수준으로 파악되며(Kim and Choi, 2013:103), 남산공원, 효창공원, 사직단공원 역시 시설이 이와 수준은 비슷해서 당시 철도공원의 운동시설 수준에는 상당히 미치지 못했다(Kim et al., 2014; Park, 2015).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1930년까지는 운동을 위한 특수 목적의 공원으로서 운동공원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운동공원으로서 철도공원의 중요성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1940년에 발표된 「경성시가지계획공원결정안」은 여러 단계로 진행된 경성시가지계획의 마지막 계획안이었다. 1940년의 공원계획안은 1932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 근거하여 수립된 법정 계획안으로 1930년 도시계획안의 틀을 계승하고 있지는 않다19). 1930년대 경성의 공원계획은 1940년의 공식 안이 확정되기까지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최종안과는 다른 안들이 제시되었다. 1937년에서 1938년 사이에 제작되었다고 추정되는 “경성부공원계획지도”는 1940년의 최종 공원계획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계획안이라고 판단된다. 지도에서 나타나는 공원 체계의 구조는 1940년의 계획안과 유사하나, 계획 공원의 개수가 적으며, 일부 공원의 위치가 다르다20). 또한, 공원의 구분 체계와 위계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지도의 범례는 자연공원, 계획운동장, 계획근린공원, 계획대공원, 개설운동장 및 공원의 다섯 유형으로 구분된다. 자연공원은 1940년의 공원계획안의 자연공원과 별도의 계획안으로 수립된 풍치지구 계획안의 보안림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자연공원은 신규 조성되는 공원이라기보다는 1930년의 계획안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자연녹지를 지정하는 방식의 공원 유형으로 판단된다. 신규 조성되는 계획 공원은 대공원, 근린공원, 운동장의 3종으로 위계가 구분되어있다.
철도공원과 관련하여 계획안에서 주목할 점은 운동장에 대한 강조이다. 계획안은 운동장을 독립된 계획 공원으로 구분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대규모의 시설을 갖춘 경성운동장과 규모가 유사하거나 더 큰 운동장 4개소를 제시하고 있다(Figure 11 참조). 이는 운동공원이라는 공원의 유형이 제시되었으나, 운동의 기능 자체는 강조되지 않았던 1930년의 계획안과 달라진 인식을 보여준다. 계획운동장은 대부분 경성의 도심부가 아니라 1936년 행정구역 확장에 따라 편입된 경성의 외곽 지역에 계획되어있다. 경성의 기존 행정구역에 속했으나, 외곽 지역으로 인식되었던 용산 일대에도 대규모 경기장이 계획되었으며, 이는 철도공원과 인접하고 있다. 철도공원 동측으로 경기장과 함께 계획 공원도 함께 조성되어 기존의 공원과 경기장, 신설 공원이 하나의 공간을 이루는 것이 확인된다(Figure 13 참조). 이를 하나의 공원으로 보면 산지인 자연공원을 제외하면 경성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형공원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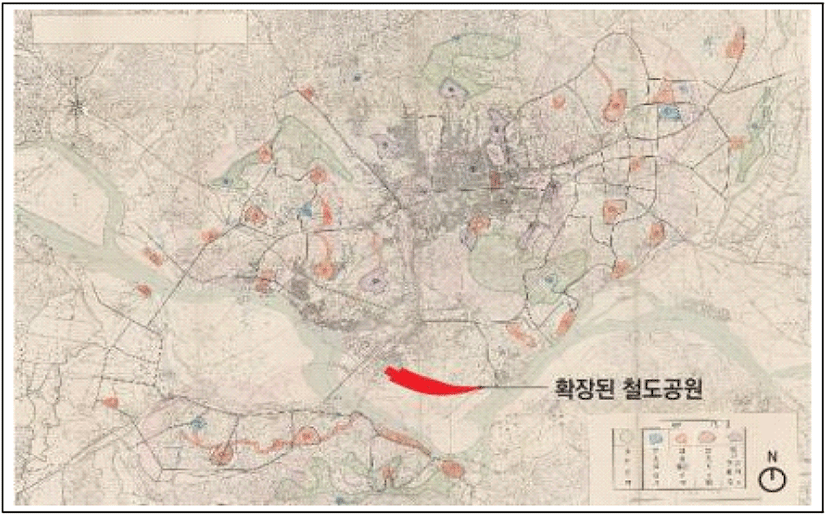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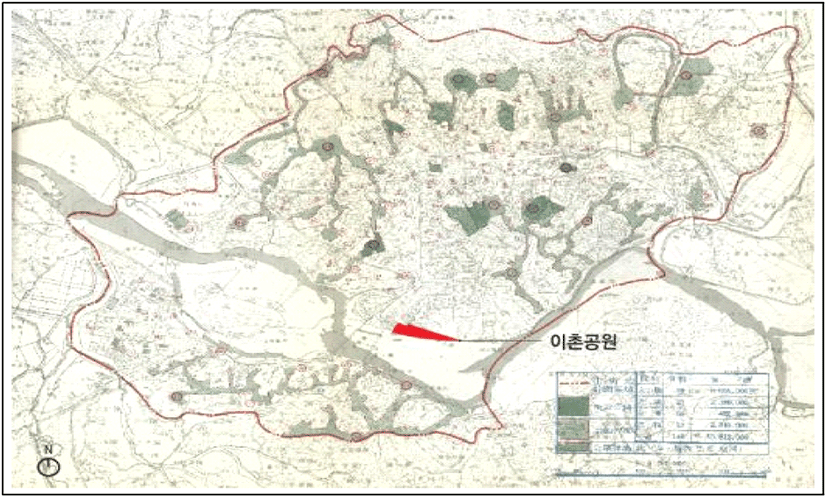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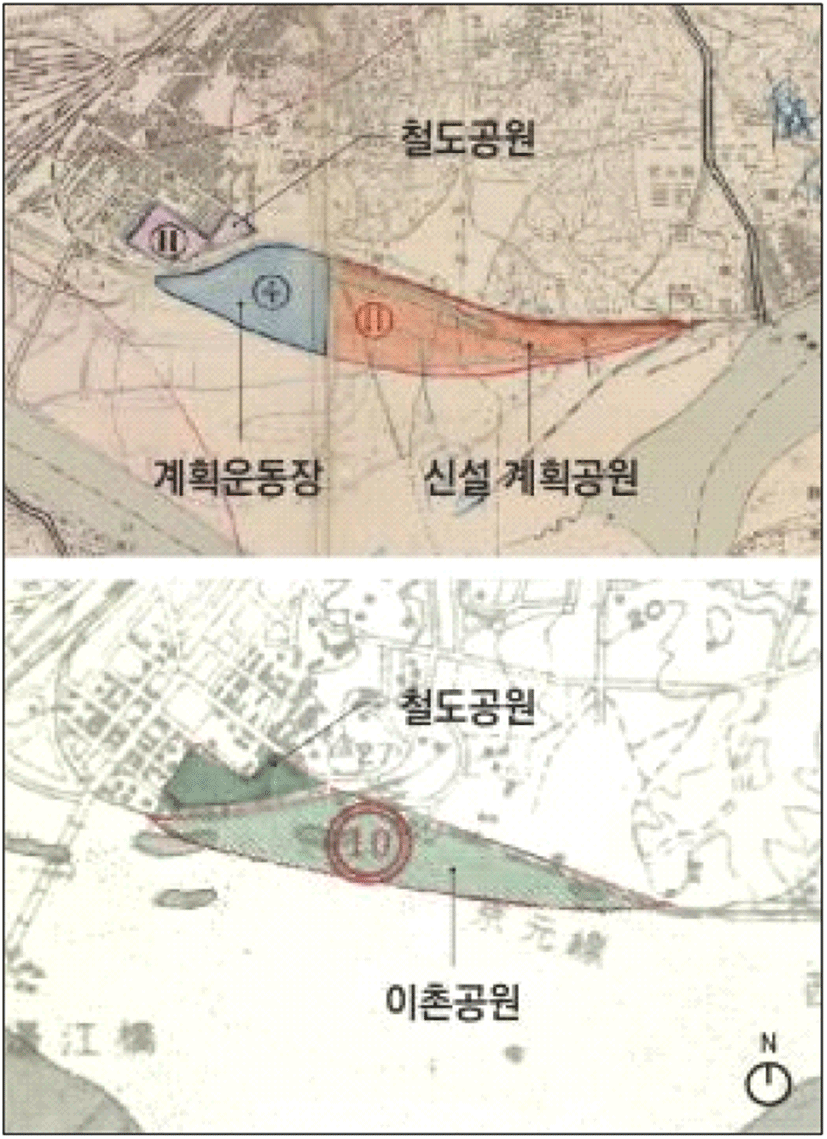
1940년의 “경성부 내 공원현황 일람표”에서 철도공원은 공원이 아닌 운동장으로 구분되어있다(JGGK, 1940:89). 하지만 1940년의 공원계획안의 계획 공원 일람표에는 철도공원은 나타나지 않으며, 철도공원 부지는 10번 계획 공원으로 지정된 이촌 공원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Figure 12 참조). 계획도 상위 위치 뿐 아니라, 계획 공원표를 보면 이촌공원의 토지소유권을 구분한 소관(所管)란에 “국유지․철도용지”로 기술되어 이촌공원이 기존의 철도공원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JGGK, 1940:105). 1940년 공원계획안에서 계획 공원은 규모에 따라 대공원과 소공원으로 구분된다. 다시 대공원은 보통공원, 운동공원, 자연공원의 3종으로, 소공원은 근린공원, 아동공원, 유아공원의 3종으로 구분된다. 이촌공원은 대공원으로 분류되며, 세부 유형으로는 운동공원, 근린공원, 아동공원으로 중복지정되어 있다. 이때, 140개의 계획 공원 중 운동공원은 청량공원, 신길공원, 이촌공원의 3개소밖에 없으며, 기존의 경성운동장은 운동공원이 아닌 운동경기장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40년의 공원계획 체계를 따르면 모든 대공원은 소공원을 포함한다. 따라서 대공원으로 계획된 공원은 소공원에 해당하는 근린공원과 아동공원으로 중복지정되며, 실질적으로 대공원의 유형은 자연공원, 보통공원, 운동공원으로 구분된다. 이중 자연공원은 산림을 포함하는 공원이며, 보통공원은 일반적인 대형 도시공원을 의미한다. 이촌공원이 해당하는 운동공원은 전체 공원 중 3개소에 불과하여 특수 목적의 공원임을 알 수 있다. 공원계획서에서 운동공원의 정의는 “주로 운동에 공용되는 것”으로 간략하게만 기술되나, 요구되는 시설은 “육상경기장, 야구장, 사예장(射藝場), 경구기장, 수구장, 체조장, 조정(漕艇), 기지(其地)의 운동시설 및 체육관 등” 구체적으로 나타난다(JGGK, 1940:90-91). 운동의 기능이 강조되지 않는 1930년 계획안의 운동공원과 비교하면 1940년의 공원계획안에서 운동공원에 대한 인식과 규정이 달려졌음을 알 수 있다.
철도공원와 통합된 이촌공원의 경계와 형태는 1930년대 후반 “경성부공원계획지도”의 신규 계획된 철도공원과 유사하다(Figure 13 참조). 이를 통해 “경성부공원계획지도”의 계획안이 1940년 「경성시가지계획공원결정안」의 전 단계의 구상임을 알 수 있다. 1940년의 공원계획과 비교하면 “경성부공원계획지도”에서 계획된 4개소의 운동장 중 2번 경기장은 1940년의 계획안에서 사라졌고, 1번 경기장은 4번 청량공원의 일부가 되었으며, 3번 경기장은 위치가 변경되어 17의 신길공원으로 통합되었다. 그리고 철도공원과 연결된 4번 경기장이 동측의 공원과 통합되어 이촌공원이 되었다. 1930년 이후의 공원계획에서 나타나는 철도공원의 변화를 종합하면, 1930년 이후 운동공원이라는 특수 목적의 공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나타났으며, 기존의 양호한 운동시설이 갖추어져 있던 철도공원을 경성의 운동공원으로 재편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40년의 계획안에서 이촌공원으로 확장 재편된 철도공원은 일제가 양적인 공원녹지 확보의 방향에서 벗어나 프로그램적인 측면을 고려한 발전된 공원계획을 구상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형 운동공원으로서 이촌공원이 갖는 한계도 존재한다. 1940년에 제시된 경성 공원녹지의 체계를 보면 대규모의 대공원과 중규모의 근린공원이 배치되고, 이를 일종의 연결녹지인 도로공원이 연결하면서 사이를 소규모의 아동공원이 다수 배치되는 구조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촌공원은 주변의 철도시설과 군사시설로 단절되어 다른 공원과 연결되지 못하고 고립되기 때문에, 확장된 규모와 새로운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체계의 관점에서 도시 전체에 기여하기는 어렵다.
IV. 결론
본 연구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철도공원의 현황, 이용행태, 공간적 변화를 파악하고, 두 공원이 지니는 공원계획적 의미를 운동공원과 아동공원의 개념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가 철도공원에 대해 알아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철도공원은 조성 당시 만철공원이라는 이름의 철도 관사부지 부대시설이었으며, 1925년 철도 및 관사 운영권이 조선총독부로 이관되면서 도시공원의 역할을 하게 된다. 당시 철도공원은 정식 규격의 야구장과 육상경기장과 같은 운동시설이 갖추어진 공원으로 경성운동장과 함께 경성의 종합운동장의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다양한 대형 행사들을 수용하였다. 철도공원은 경성 중심 시가지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일반 시민들의 이용이 쉽지는 않았으나, 관사단지에 500~700호 가량의 대규모 주거동이 조성되어 충분히 생활권 공원의 역할도 할 수 있었다. 철도공원은 1930년과 1940년의 공원계획안에서 새로운 계획 공원으로 재지정된다. 1940년의 공원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철도공원은 이촌공원으로 명칭을 변경, 확장되어 경성의 중심적인 대공원의 역할을 하도록 계획된다. 1930년대 후반부터는 이용 가능한 공원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운동공원의 유형이 제시된다. 철도공원은 새로운 운동공원의 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철도공원은 실패한 계획안으로 여겨지던 일제강점기의 공원계획안을 다른 관점에서 재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철도공원은 근대 공원계획이 양적 면적의 확충에서 이용 가능한 도시 프로그램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1930년의 계획안에서 운동공원의 개념이 제시되지만, 계획 기준과 실제 지정된 공원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공원을 프로그램적으로 고려하는 현대적 의미의 공원계획 개념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며 건강과 여가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등장하면서 1940년의 공원계획에는 이전의 계획서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교화, 훈육, 위락, 여가 등의 프로그램적인 공원의 의의와 기능이 담긴다21). 본 연구에서 살펴본 철도공원의 계획적 변화는 운동공원 개념의 정립과 무관하지 않으며, 철도공원은 1930년대와 1940년대의 양적 공원계획의 모델에서 프로그램의 개념이 도입된 질적 공원계획의 모델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또한, 철도공원은 신규 공원의 조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에서 대한제국 소유의 공간이나 산림을 전유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공원 조성 실행의 방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철도공원은 사적 영역의 시설을 공적 영역으로 전환하는 대안적 계획 방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철도공원은 일제강점기 공원계획과 공원에 대한 인식의 한계도 함께 보여준다. 철도공원을 경성의 중요한 거점 공원으로 만들려는 공원계획은 주변의 도시적 맥락과 장기적인 도시화의 방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보인다. 철도공원 일대는 침수지와 인접하고 있었고, 산업시설과 군사시설로 둘러싸여 도시적 확장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1930년대의 새로운 택지개발 지역도 용산 일대에는 계획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철도공원이 확장되어 대공원으로 조성되었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접근이 쉽지는 않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많은 인구가 이용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