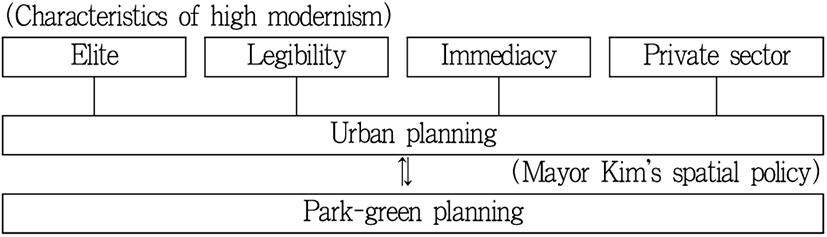Ⅰ. 서론
2016년 7월 1일 1960년대 후반 서울 개발을 회고하는 전시회가 열렸다. 이 전시를 주체하는 서울역사박물관은 그 제목을 『도시는 선이다: 불도저시장 김현옥』이라고 지었다. 이 전시회는 형식적으로 서울 근대화의 주역 김현옥 서울시장(1966년 4월 1일 ~ 1970년 4월 15일) 취임 5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었지만, 내용적으로 서울의 거칠고 빠른 변화를 대중에게 알리는 자리였다. 이보다 앞서 손정목 교수는 김현옥 시장 덕분에 “공기(工期)의 약속”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등장하였고, 그의 적극 행정은 전국 시장·군수의 자세에 영향을 주었던 만큼 우리나라 도시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도의 입장에서 1966년 김현옥의 등장에 주목할 것을 주문하였다(Son, 2002). 그럴 만도 한 것이 김현옥 서울시장은 1960년대 서울시 토지구획정리사업 80%를 시행하였고, 서민주택 공급과 도로망 확충에 역대 시장보다 적극이었다(Kwon et al., 2012). 여의도 개발, 강변북로, 북악스카이웨이, 남산1, 2호터널, 강남 계획 등 그의 과업은 현재 서울의 유산으로 남고 있다. 그중 청계고가와 세운상가는 후대의 상상력이 결합하여 공원녹지로 변하였거나 모색 중에 있다. 반면, 서민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무리한 강제 이주정책과 와우아파트 붕괴사고는 오히려 불량주택지를 확산시키는 오점을 남겼다.
그의 도시개발 업적에 대한 평가는 공과가 함께 하지만, 공원녹지로 국한하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당시 경향신문은 계획공원 대비 부족한 조성공원과 무허가 건물이 난립한 공원의 실태를 고발하였고1), 도심 내 아동공원 매각은 큰 실책이라고 지적하였다.2) 또한 역사성이 높은 도시공원에 수영장과 도서관을 설치하였고, 도로와 대형 상업시설 건축으로 공원 내 문화재를 훼손시켰다. 이 때문에 동아일보는 그의 도시계획 맹점을 “어린이공원과 유원지 조성을 도외시하”3)는 것이라고 지적하였고, 1960년대 서울 도시계획의 이슈와 과제를 정리한 서울연구소의 연구보고서(Kwon et al, 2012)도 공원녹지 분야를 “김현옥 시장의 재임 중 가장 소홀히 다룬 분야”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국내 조경학계에서 김현옥의 공원녹지에 대한 “반성적 평가(Pae, 2003)”는 논의 자체가 공백인 상태이다. Kang and Jhang(2004)은 전임 윤치영 서울시장이 퇴임한 1963년까지만 다루었고, Pae(2003, 2011)와 Cho et al.(2018)은 청와대에 조경담당비서관이 임용된 1970년대 이후를 근대 조경의 기점으로 보고 연구하였다. 국내 도시공원사 연구들은 1960년 말의 공원녹지 관련 제도와 양적 변화에만 주목하였지, 이 시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회피하였다.4)
김현옥 서울시장의 공원녹지 정책의 공과 과를 발견하고, 논의할 수 있는 이론적 준거는 근대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조국 근대화는 박정희 대통령의 열망이자 신념이었다. 5·16 군사 정변의 공신도 아닌 김현옥을 서울시장으로 발탁한 것은 부산시장 시절(1962년 4월 21일 ~ 1966년 3월 30일 재임)에 보여준 괄목할 만한 도시개발 성과가 박 대통령의 의중과 맞았기 때문이었다(Son, 2002). 김현옥 서울시장은 취임사에서도 “수도 서울특별시의 건설과 발전이 조국 근대화와 민족 번영에 직결되게(Seoul Museum of History, 2016)” 하는 것이 그의 임무라고 밝혔다. 부산시장 때부터 불린 “불도저 시장”이라는 별명과 1967년 “건설 돌진의 해”로 정한 시정 구호는 그의 서울 근대화의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1968년 그가 직접 저술한 수필집 『푸른 유산』에서는 서울 생활에서 정원 일의 즐거움을 기록하였지만, 정작 책명을 정하는 이유에 대해 “썩은 연륜을 단죄하여 그 위에 오롯한 푸른 입을 길러(Seoul Museum of History, 2016)야 한다며”, “푸른”을 과거와의 단절과 분절의 상징으로 표현하였다.
김현옥 서울시장이 강조한 근대화는 이론적으로 몇몇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세계전쟁 이후 권위주의적 근대화를 특정하여 데이비드 하비(Harvey, 1989)는 하이 모더니즘(high modernism)이라 명명하였다. 하비의 이론을 발전시킨 제임스 스콧(Scott, 1998)은 20세기 근대화 계획의 하나로 시행된 대규모 국가 주도 사회 건설에서 하이 모더니즘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진단하였다(Scott, 1998). 특히 하이 모더니즘을 인용한 연구들은 특정 관료에 의해 주도한 권위적(국가 또는 도시) 개발 현상에 주목하였다. 1960년대 후반 사회 내 지배 권력의 중심에서 근대화 과업을 수행하였던 김현옥 서울시장은 1860년대 파리 재건을 주도하였던 오스망(Baon Haussman)과 1930~60년대 뉴욕의 마스터 빌더(master builder)라 불리었던 모세스(Robert Moses)와 견줄만한 관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조경의 태동도 국가 통치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정부 권력의 강력한 주도로 시작하였기에(Pae, 2011), 1960년 말기의 공원녹지 정책은 하이 모더니즘과 관련지어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현재 조경학계에 공백상태로 있는 김현옥 서울시장의 공원녹지 정책들을 발굴하고 목록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김현옥 서울시장의 공원녹지 정책과 도시개발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그 경로를 추적하는 것이다. 마지막 목적은 근대 한국 조경을 반성하고 남겨진 유산을 살펴보기 위해 하이 모더니스트로서 김현옥 서울시장의 공원녹지 정책의 특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초통계, 보고서, 공문서 그리고 신문 기사 등의 문헌 고찰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기초통계 자료는 1961년부터 1975년까지『서울통계연보』에 실린 도시공원 현황과 도시공원 결정 관련 건설부 고시(139건) 등에서 수집하였다. 그리고 1966년『서울도시기본계획』과 1968년『서울도시계획공원 기본계획보고서』는 서울도서관에서 입수하였다. 우리는 관련 공문서를 수집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서 1965년부터 1970년까지 총 140여 건의 문건을 열람하여 93건의 유의미한 사본을 취득하였다. 그중 1969년 8월 서울시가 건설부에 제출한『도시계획공원 기본계획』 조서는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정부 및 서울시에서 생산된 문건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사실과 여론은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서 ‘공원’과 ‘김현옥’으로 검색한 208건의 기사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외 서울역사발물관에서 발행한『도시는 선이다: 불도저시장 김현옥』과『돌격 건설! 김현옥 시장의 서울』 그리고 서울사진아카이브와 서울역사아카이브 등에서 사진과 지도를 참고 및 인용하였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3단계로 나누어 전개하였다. 우선 제2장은 본 연구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 모더니즘과 하이 모더니스트로서 김현옥 서울시장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였고, 본 연구를 전개하기 위한 틀을 설정하였다. 제3~5장은 하이 모더니즘을 특징할 수 있는 요소들로 구분하여 김현옥 서울시장의 도시개발과 공원녹지 정책에 관한 사실들을 분석하였다. 제6장은 본 연구의 고찰 및 결론에 해당한 부분으로 김현옥 서울시장에 의한 공원녹지 정책의 경로와 특성을 고찰하였고, 그가 현대에 남긴 공원녹지 정책의 유산을 결론으로 남겼다.
Ⅱ. 이론적 고찰
데이비드 하비가 명명한 하이 모더니즘(high modernism)은 모더니티(modernity)의 마지막 단계이다(Harvey, 1989). 첫 단계의 모더니티는 정치적 도시 운동 단계로 세계대전 이전 사회 불안정에 대한 반작용으로 탄생하였다. 두 번째는 영웅적(heroic) 모더니즘 단계로 강력한 군국주의와 민족주의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두 단계의 공통된 특징은 창조적 파괴를 통해 불멸의 도시공간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이론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이 모더니즘(또는 본격 모더니즘)5)은 전후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영원한 도시에 대한 갈망과 신화적 구상이 옅어진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권력에 의한 진보적 또는 인간해방을 위한 계몽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또한 국제 권력 시스템 자체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기로 국제 정치와 무역을 통해 제3세계의 근대화를 촉진시켰다. 이러한 상태에서 권력자, 권력기관 그리고 기술자들로 구성된 엘리트들은 이상적 사회질서와 합리적 계획에 대한 믿음이 유난히 강하게 작용하였다(Harvey, 1989).
제임스 스콧(Scott, 1998)은 하이 모더니즘의 시작을 자연에 대한 행정적인 질서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연을 근대적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여 우리의 복지와 자유를 유도하거나 소수 집단을 제거하는 정책기반으로 활용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가 밝힌 하이 모더니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이 모더니즘은 완벽한 사회질서를 지향하는 디자인을 수립하기 위해 가독성(legibility)을 중시하였다. 가독성은 직선적 도시계획과 수종 계량을 통한 산림계획과 같이 단순한 질서를 창조하려는 통치 의지의 표현이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가독성은 국가에 의한 과학적 조림, 측정(계량) 기술, 지적도, 기하학 등의 기술을 고안하였다(Scott, 1998).
둘째, 목표 달성 수단으로서 근대국가의 힘을 통제하지 않은 채 사용하여 국토 및 도시개발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갖추었다. 이에 따라 공권력만이 가능한 사유재산의 강제수용, 반의사 인구배치와 대규모 자금 유입 등이 가능하였다. 결과적으로 하이 모더니즘식 도시개발은 주민 삶을 규격화하였고, 행정 편의적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도시계획의 실질적 효율과 효과보다는 계획 자체의 실현에 방점을 두었다.
셋째, 하이 모더니즘은 신념이기도 하지만 이익을 공여할 수 있도록 민간참여를 모색하였다. 즉, 대규모 국가 주도 건설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자본주의 신봉자들의 이익 현실화에 관여하거나 그들이 국가사업에 개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이 때문에 하이 모더니스트들은 시각적이고 미학적인 견지에서 ‘건설되는 도시’의 스펙타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Yum, 2014), 지리적 인류학적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았다(Li, 2005).
근대화 과정과 현상을 탐구하는 하이 모더니즘 연구는 특정 인물에서 출발하는 경향이 있다.6) 이는 권위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관료조직과 그들을 지원하는 엘리트들에 의해 추진된다는 하이 모더니즘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의 하이 모더니즘은 만주국 출신의 관료, 생계형 개발 그리고 서울의 지위 향상이라는 세 가지 경로와 맞닿으며, 학자들은 김현옥 서울시장을 하이 모더니스트로 지목하였다. 우선 첫 번째와 두 번째 경로는 왜 한국의 하이 모더니즘을 1960년대로 특정하는 것이다. 그 첫 번째 경로는 만주국을 지배하였던 관동군 출신들이 박정희 정권에 참여하면서이다(Han, 2012). 우리나라 근대화는 식민주의에서 출발한 것으로 당시 만주국은 일본에서 이루어질 수 없던 철도 건설과 도시계획을 어떠한 방해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하였다. 그 과정을 경험하였던 인물들이 한국 재건의 속도전에 참여하면서 한국 하이 모더니즘의 기원을 이루었다. 실례로 박정희 정권 초대 건설부장관 박임항은 박 대통령과 같이 만주국군 출신으로 “1963년까지 전국 국토계획을 완성하라”고 독촉하였고, 1961년 말부터 1962년 초까지 의회 부재 상태에서 건설 관련 법들을 무더기로 제정하였다(Han, 2012).
두 번째 경로는 기아로부터 탈출하고 땅을 개간하여 무언가를 생산해야 한다는 1960년대 한국 국토계획의 이면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도시개발은 산업 생산성과 직결하였고, 매립사업은 국토의 확장과 함께 식량 증식에 목적에 두었다(Han, 2012). 결국 1960년대 건설 사업은 국가의 가독성을 높이고, 표준화, 대형화로 공간을 변형시키는 “하이 모더니즘적 욕구”가 반영된 것이었다(Han, 2012).
이 연장선상에서 세 번째 경로는 어떠한 계기로 한국의 하이 모더니즘이 서울을 지목하게 되었는가이다. Kim(2017)은 1963년 서울시 행정구역 확장과 수도권의 탄생 과정에서 발생한 서울의 지위 변화에서 답을 찾았다. 이 변화는 가시적인 영토 확장 이외에도 권력의 중심으로서 영토의 모범으로서 수도 서울, 근대국가의 관료제 특성을 일반화하는 조직관 그리고 중앙집권적 영토 조직화와 같은 국가 기획이 서울 근대화를 촉발시키는 도화선이 되었다.
이처럼 1960년 서울로 집중하는 한국 하이모더니즘의 경로를 바탕으로 서울의 대규모 공간 재편을 추진하였던 김현옥은 하이 모더니스트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다. 특히 Park(2015)은 김현옥 서울시장의 서울 근대화는 중산층의 도시로 만들려는 거대한 외과수술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의 도시개발 속도전은 “사물에 대한 배치를 바르게 했다고 믿으면 그 자체로 실제 그 기능도 제대로 발휘될 것이라고 전제하는 하이 모더니즘 정신에 입각한 사고의 방식”이라고 진단하였다.
위 이론들을 종합하면 하이 모더니즘은 근대 국가의 행정질서에 대한 신념 또는 열망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산업화라는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 설정과 관련한다. 이 배경에는 조속한 전후 복구와 재건이라는 사회적 상황과 더불어 발전된 과학·기술에 대한 믿음, 진보적 사고에 따른 계몽 의식, 자연의 통제 등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권위주의의 힘이 작동하였다. 이에 따라 하이 모더니즘의 특징은 ① 국가 권력을 지원하는 엘리트들의 참여, ② 완벽한 사회질서를 디자인하는 가독성, ③ 목표 달성을 위한 신속성 그리고 ④ 자본주의 신봉자들의 이익 실현을 위한 민간공여로 압축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 식민지 근대화 과정을 경험한 관료들에 의한 주도와 국가의 공간 권력을 서울에 집중하면서 자연스레 김현옥 서울시장은 하이 모더니스트로 지목받았다.
한편, 하이 모더니즘과 도시의 공원녹지의 상관관계는 제임스 스콧이 주창한 자연을 “국가처럼 보기(seeing like a state)”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박정희 대통령 체제하에 시작한 도시와 산업의 급속한 건설은 자연에 대한 근본적인 개조를 통해 이루어졌다(Jin, 2016). 그리고 국가 주도하에 관료들은 계획 합리성에 따라 자연과 도시의 공간적 통합성을 추진하였다(Park and Kim, 2013). 산업화와 자연개조 또는 도시화와 자연의 공원화는 서로 별개의 과정이라기보다는 도시 개조를 위한 통합 작업이었다. 따라서 도시의 개발과 공원녹지에 대한 문제의 틀은 “국가자연(national nature)”의 보다 광범위한 문제 설정으로 심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Whitehead et al, 2007).
이러한 내용은 당시 우리나라 제도에서도 잘 나타났다. 김현옥 서울시장 임기 중에 제정된 「공원법」은 “도시공원”이라는 법적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당시 법률은 도시공원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시설로서 설치하는 공원 및 녹지를 말한”것 이라고 명시하였다. 이 근거로 말미암아 도시의 자연은 도시계획에 귀속된 자산 또는 자원으로서 그 위계가 정립되었다. 사실상 자연이지만 도시의 일환으로서 자연을 기획하는 공원녹지 정책의 경로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또는 개발)과 연결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틀(frame)은 엘리트(elite), 가독성(legibility), 신속성(immediacy), 민간참여(private sector)로 압축할 수 있는 하이 모더니즘의 특정 요소들을 기반으로 김현옥 서울시장의 도시개발과 공원녹지 정책의 인과관계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Figure 1 참조).
Ⅲ. 엘리트에 의한 가독성 프로젝트
Um and Jung(2020)에 따르면 1960년대 우리나라 도시계획 및 설계 그룹은 4개의 조직이 있었다. 이 그룹의 주요 인물들은 일본과 미국의 도시계획 및 설계 기법을 학습하였고, 국제 원조 프로젝트를 통해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인 한국의 서울에서 실험할 기회를 가졌다(Kang, 2020).
첫 번째 그룹은 1959년에 조직한 국토계획학회이었다. 이 그룹의 중심인물인 주원은 일본에서 도시계획을 배웠고, 1962년 서울시『도시계획 기본자료조사서』 연구에 참여하였다.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위원으로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 청계천 복개, 국회의사당 입지 선정 등의 작업을 주도하였다.
두 번째 그룹은 미국국제협조처 자금을 받아 주택건설 자금을 융자해 주었던 한국산업은행의 ICA(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주택자금 기술실 도시계획가들이었다. 이 그룹을 주도하였던 박병주와 주종원은 미국의 단지계획과 근린주구 이론에 주목하였다.
세 번째 그룹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이다. 이 그룹의 리더인 김수근은 김현옥 서울시장 재임 기간에 맞춰 1966년부터 1969년까지 이 조직을 이끌면서 여의도 종합개발계획, 남대문 시장 도시계획, 세운상가 개발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네 번째 그룹은 1966년 오스왈드 내글러(Oswald Nagler)가 창설한 주택·도시 및 지역계획연구소(Housing, Urban and Regional Planning Institute, HURPI)이다. 이 연구소는 우리나라 건설부 소속이었지만 미국 아시아재단(The Asia Foundation)에서 재정·운영의 지원을 받았다. HURPI는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주거모델을 개발하는데 집중하였다.
당시 주원이 회장으로 있었던 국토계획학회와 ICA 출신이자 홍익대학교 교수인 박병주는 1966년 8월에 개최한 ‘대서울도시계획전시’에 서울시기본계획을 출품하였다(Figure 2 참조). 두 계획안 모두 서울의 도시 확장과 인구 분산 배치 및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의 분산 배치를 제안하였다. 국토계획학회안은 영등포와 난지도를 잇는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경인운하를 연결하는 항구계획을 포함하였다(Seoul Museum of History, 2016). 당시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박병주의 ‘새서울백지계획’은 무궁화형 서울 외곽을 갖춘 것으로 워싱턴 D.C.와 유사한 중심공간구조와 미국 도시교외를 이상적 모델로 삼은 외곽지구 계획을 제안하였다(Um and Jung,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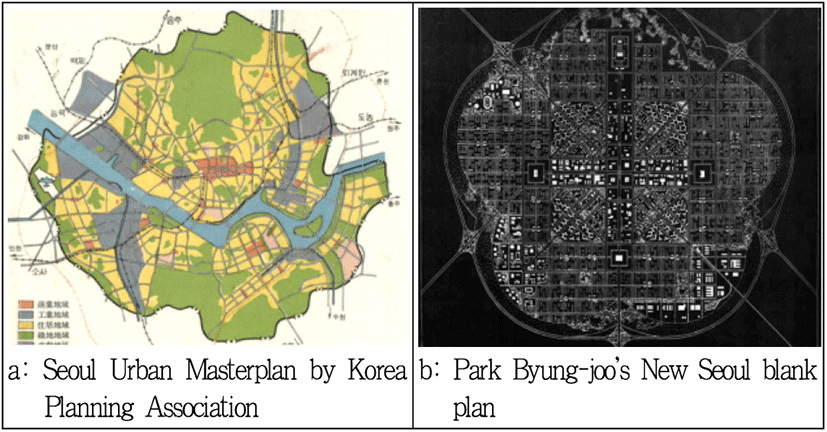
한국전쟁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는 인구집중 현상과 행정구역 확장은 서울 근대화를 촉진시켰다. 1952년 서울의 인구는 72만 명이었지만, 10년이 지난 1962년에는 298만 명, 1965년 347만 명, 김현옥 서울시장이 재임한 1966년에는 380만 명에 도달하였다. 폭증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1963년 8월 28일 정부는 서울시 행정구역을 268.35km2(1949년)에서 613.04km2로 결정하였다(건설부고시 제524호). 이에 따라 1965년 서울시는 1975년 계획인구를 500만 명으로 설정하였지만 1970년에 이미 서울의 인구는 552만 명에 도달하였다(Table 1 참조).
Source: Seoul Statistical Year Book.
김현옥 서울시장은 확장된 행정구역을 개발하기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로 건설에 매진하였다(Figure 3 참조). 육군본부 수송 차감 출신인 그는 “도시는 선이다”라는 구호를 내세워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방사선 도로, 외곽과 외곽을 연결하는 순환도로 그리고 도심의 주요 간선도로를 개설 및 확폭하였다(Seoul Museum of History, 2016). 1960년대 전반기에 14개 구간 42.9km에 불과하였던 도로건설사업은 김현옥 서울시장에 의해 45개 구간 217.8km가 개통되었다. 이 과정에서 하천복개사업과 입체고가사업이 추진되었고, 북악스카이웨이, 남산1,2호터널 그리고 한강종합개발계획(1968년)에 따른 강변북로와 윤증로가 건설되었다(Kwon et al.,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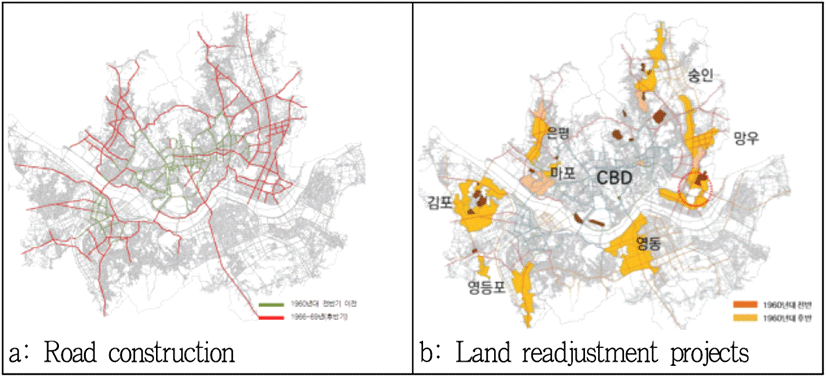
김현옥 시장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1965년「시정10개년계획」에 따라 추진하였다. 이 계획은 1963년 시역 확장으로 포함된 숭인, 은평, 망우, 천호, 영동, 영등포을 대상으로 2,986만 평에 이르렀고, 이중 영동구획정리 예정지가 1,786만 평(59.8%)을 차지하면서 훗날 강남의 기원이 되었다. 김현옥 서울시장은 196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80% 이상을 추진하였고 마포와 김포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추가시켰다.
서울의 계획공원은 일제강점기 말 140개소(13.8km2, 조선총독부고시 제208호, 1940년 3월 12일)로 시작하였다. 이후 1958년 국립경기장 건설 후보지였던 용마공원·뚝도공원(7.8km2·2.6km2)에 대한 결정(내무부고시 제413호)과 1962년 궁궐과 현충원이 포함된 계획공원 제정비7)를 거치면서 25.0km2대 계획공원 면적이 1967년까지 유지하였다. 1961년부터 1965년까지 52개소의 도시계획공원에서 0.26km2만 추가되었고, 1.61km2나 해지되었다. 이후 김현옥 서울시장 임기 5년 동안 총 55건의 고시를 통해 110개소의 도시공원에 30.36km2가 추가되었고, 6.59km2가 해지되면서 급격한 양적 변화가 발생하였다(Table 2 참조). 그의 도시계획공원 확충은 서울시의 확장과 관련하여 1968년과 1971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Seoul, 1965a: 344-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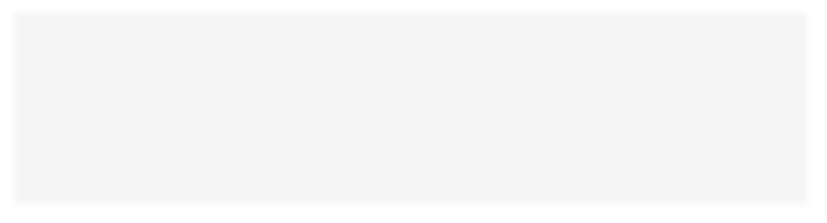 : Under the Kim Hyeon-Ok’s Mayoralty.
: Under the Kim Hyeon-Ok’s Mayoralty.
우선 1968년 건설부는 전년도보다 약 30km2가 증가한 55.8km2의 도시공원을 결정·고시하는데 이는 1965년 전임 윤치영 서울시장(1963년 12월 17일~1966년 3월 30일)이 추진한 도시공원계획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 결정으로 1949년 서울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은평, 숭인, 구로 등의 지구에 청량, 백운, 정릉, 월곡, 봉산, 불광동, 비봉, 백련, 성산 9개소 30.2km2의 도시공원이 확보되었다. 당시 대공원 지정 기준은 등고선 80m 이하 주택조성 가능지역을 제외하였고, 명승고적, 유원지 등으로 이용이 가능할 경우로 설정하였다(Seoul, 1965b).8) 이때부터 서울 외곽공원은 기존 북악산과 인왕산 일대에서 북한산과 도봉산 일대로 이동하였다.
다음 단계인 1971년 건설부고시는 김현옥 서울시장이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 이로서 87.8km2 증가한 140.5km2의 도시공원 결정·고시는 현 서울시 공원면적(168.9km2)에 근접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강남, 노원, 목동 등 한강 이남 영역으로 확장된 1963년 서울시 행정구역 변화가 공원녹지계획에 반영되었다. 그리고 이 공원녹지계획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국토계획학회는 서울의 토지이용계획 제1의 목적을 인구 분산 계획에 따른 학교와 공원을 계획함으로써 인구의 집중으로부터 일어나는 기능 저하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였다(Seoul, 1966). 그들은 새로운 서울을 일상 생활권(5km 반경), 주말 생활권(15km 반경), 월말 생활권(45km 반경)으로 구분한 6개 광역도시계획권을 설정하였다. 생활권 변경에 따라 공원녹지 구상의 원칙은 첫째, 근교녹지체계(green belt)를 본 계획에 참고해야 할 것, 둘째, 현재 녹지를 재활용할 것, 셋째, 계획공원을 적정 분배할 것으로 적시하였다(Figure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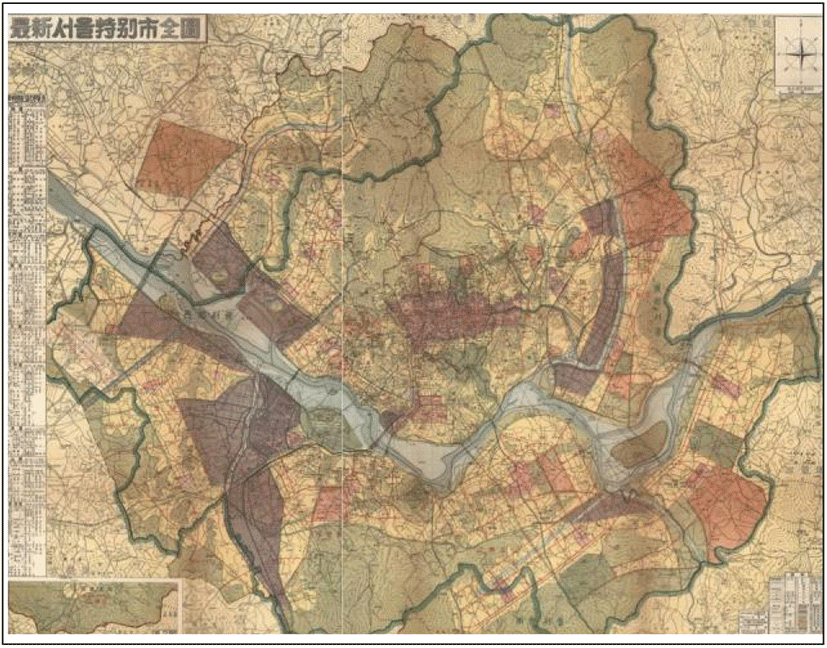
공원녹지계획(안)의 구체적 목표와 방안은 ① 북쪽 북한산과 남쪽 관악산 및 남한산성 영역으로 둘러싸인 자연녹지대를 기반으로 서울과 인천 간의 연담화와 도시생활권의 과잉 개발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② 지형상 개발이 불가능한 자연공간을 남북축과 동서축으로 양분하였다. 북한산-북악산-종묘-남산-한강-국립묘지-관악산을 연결하는 남북의 녹지축 설정은 중심시가지와 일상 생활권에 자연공원과 대공원을 연결하였다. 개화산-난지도-한강-미사리로 연결하는 동서의 하천녹지축 설정은 한강 연안 토지이용계획에 자연녹지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③ 자연녹지 확보 기준은 등고선 80~90m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신 편입지구 중 지형이 평탄한 창동, 은평, 과천, 시흥지구에서는 40~50m 이상이어도 자연녹지를 공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원칙에 따라 국토계획학회는 262.0km2(500만 인구 1인당 53m2)의 공원녹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이 계획안은 1966년부터 1983년까지 총 4단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고, 공원사업비용으로 총 66억 원(구시가지: 20억, 4개 지구: 12억, 신편입지구 34억)을 책정하였다.
1968년 도시공원계획은 인구배분계획에서 출발한 것으로 서울시 관내 9개 구 613.04km2, 390만 명 외에도 경기도 관내(고양군 신도면, 시흥군 서면과 과천면, 부천군 오정면) 127.6km2, 4만 6천 명을 포함해 계획대상 면적 총 740.7km2와 계획인구 약 400만 명을 전제로 하였다. 그리고 서부, 북부, 동부, 강남, 영등포, 김포 등 7개 주말 생활권, 21개의 일상 생활권과 주거, 상업, 공업 등의 수용인구를 고려한 공원 배치와 규모를 결정하였다.
이 계획은 공원녹지를 존재녹지의 기능, 사회적 이용 개념, 유치거리와 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대공원(자연공원, 보통공원, 운동공원), 소공원(근린공원, 아동공원)으로 분류하였고, 최소 공원면적을 39.5km2로 산출하였다(Table 3 참조). 더불어 문화재, 보전지 및 명승, 역사물, 사찰뿐만 아니라, 하천, 해안, 산악 등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녹지를 포함하는 특별공원(도로공원, 묘지공원, 문화재공원)과 준공원(보존녹지, 유원지)을 추가하였다. 준공원을 마련한 것은 사유지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공원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고자 하였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9)
Source: Seoul, 1968: 169, 170.
서울시는 1966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한 남북축과 동서축의 방사환상식의 광역녹지계통을 기본으로 하였다(Figure 5 참조). 공원계획의 일반기준은 ① 공원녹지계통을 근간으로 자연공원 및 보존녹지는 표고 120m, 보통공원 100m, 근린공원 60m 이하를 계획선 한계로 설정, ② 존재(자연)녹지 중 시가지화 경향을 고려하여 이용권에 벗어난 것을 보존녹지로 계획, ③ 사유지는 되도록 제외, ④ 역사물이 있는 지역은 공원으로 계획, ⑤ 골프장, 운동장 등은 운동공원으로 계획, ⑥ 공원의 경계는 자연지물, 하천, 도로 등을 한계선으로 계획 ⑦ 위락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장래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 유원지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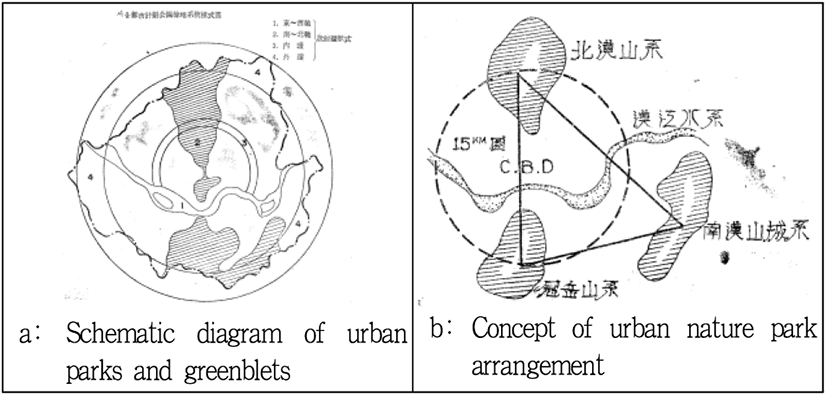
공원녹지 배치기준과 인구분배에 따라 1968년 서울시는 계획공원을 557개소 206.5km2로 설정하였다(Table 4, Figure 6 참조). 그중 경기도 관내(고양, 부천, 시흥)에 위치한 지정, 진관, 구파발, 철산, 남태령 등 18개소 31.5km2의 보통 및 근린공원과 북한산과 관악산으로 구성된 자연공원 일부가 공원계획에 포함되었다.
Source: Seoul, 1968: 214.
전체 계획공원 중 자연공원, 보존녹지 그리고 보통공원이 각각 34.2%, 17.0% 그리고 32.2%를 차지하여 약 80% 이상의 공원이 시 외곽에 배치되었다. 이에 따라 1962년까지 서울시의 경계에 위치하였던 안산, 인왕, 와룡, 삼청, 남산, 응봉, 행당 등의 보통공원은 도심권 공원으로 위치가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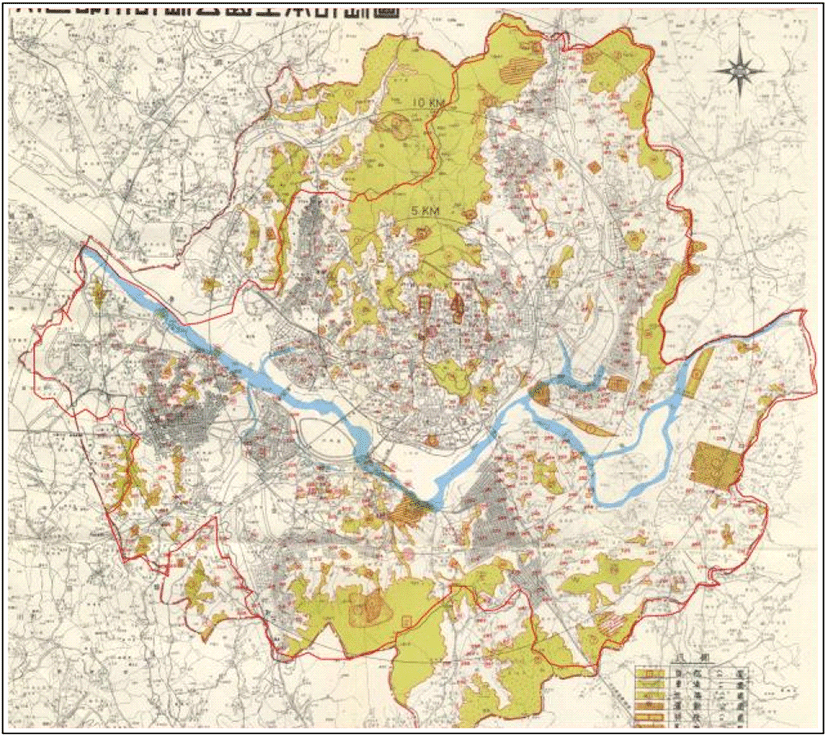
남서울지구와 목동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서울은 방배, 서초, 우면, 봉은, 삼성, 대모, 길동, 거여 등의 보통공원과 반포, 남태령, 목동 제1·2, 철산, 시흥, 항동, 가양 등의 근린공원이 신설되었다. 1962년 박정희 정권에 의해 근린공원으로 귀속하였던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와 원각사 13층 석탑이 있는 탑골공원 총 6개소 1.3km2는 특별공원에 해당하는 문화재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고양군 신도, 성북구 수락산, 영등포구 우면산, 성동구 인능산, 시흥군 도덕산, 구름산 청계산 총 7개소 35.2km2가 준공원에 해당하는 보존녹지로 지정되었다.
1969년 8월 서울시는 위 보고서를 토대로 95개소 107.3km2에 해당하는 “신시내신설공원” 조서를 작성하여 건설부에 신청하였다. 1969년 공원조서와 1968년 공원계획의 차이점으로 자연공원으로 설정되었던 북한산과 관악산 면적은 38.2km2로 축소되었다. 대신 일부 면적이 조정된 보존녹지 7개소와 도봉산(5.1km2)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문화재공원으로 지정된 궁궐과 탑골공원은 기존 근린공원으로 유지하였다.
약 2년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1971년 8월 건설부는 신설공원을 결정·고시하였다. 심사가 지체된 배경에는 첫째, 광역도시계획 인구 배분 구상에서 중심시가지 2백만 명에 대한 근린공원과 아동공원에 대한 건설부의 재검토 요구10)와 둘째, 남서울지구에 대한 공원녹지 비율 기존 5~10%에서 3%로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 지연11) 때문이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건설부는 1971년 총 89개소 91.39km2의 신규공원을 결정·고시하였으나, 관악산(19.5km2)은 제외되었다(Table 4 참조).12)
Ⅳ. 신속한 주택공급과 공원녹지의 전용
판자집과 무허가건축물은 해방과 한국전쟁과 같은 격동기를 거치며 자연적으로 발생하였다. 1970년 불량건축물의 수는 불과 5년 전보다 6만 동이나 급증한 18만 7천 동에 이르렀다(Table 1 참조).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지만, 김현옥 서울시장은 이전과 달리 주택공급에서 해법을 찾고자 주택공급에 방점을 두었다. 이에 외곽지역의 국공유지 20여 곳에 이주정착촌과 광주대단지(25,267세대 124,356명)를 조성하였고, 도심 주변에 대규모 시민아파트를 건설하였다.
그는 196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민아파트 사업을 추진하였고, 3년 동안 40여 개 판자촌 지구 78만 평에 2천 동의 시민아파트를 계획하였다.13) 공급 속도도 매우 빨라 1969년 7월에 320동이 실제 완공되었고, 김현옥 시장 재임 기간 내 32개 지구 434동 17,402호가 건설되었다(Seoul Museum of History, 2016). 그러나 이 사업이 지나친 속도전으로 추진되면서 시민들은 강제 이주가 불가피하였고, 건설 비용까지 상당 부분 부담지게 되었다. 그리고 직장과 주거와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교통난이 발생하였고, 인프라시설의 부재로 인하여 생활고가 더 높아졌다. 특히 서울시의 재정 지원 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시민아파트는 불량주택지로 전락하였다.
당시 도시공원을 규정하였던「공원법」은 공원의 방치와 잠식을 타계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제 8조는 공원을 “폐지하거나 구역변경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다. 동시에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나 공원으로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제가 가능하다는 예외적 규정도 함께 명시하였다. 따라서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에 의한 시설로 설정되었기에(Oh, 2018) 김현옥 서울시장은 공익적 사유를 들어 임기 내 6.59km2에 해당하는 도심 내 공원을 사라지게 하였다.
김현옥 서울시장은 도시계획공원의 외부로의 확장을 통해 현대 서울의 공원녹지의 기틀을 다졌지만, 급격한 도시개발을 추진하면서 1940년에 결정된 최초 공원의 흔적을 지워갔다. 1966년 8월 산천공원에서 시작한 김현옥 시장의 공원 해제는 1968년『서울도시계획공원 기본계획』 수립까지 총 3.76km2에 이르렀다. 건설부고시에 표기된 주요 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낙산공원 등 총 5개소 0.25km2는 학교 용지로, 삼청, 청량공원 등 총 16개소 0.7km2는 풍치지구로 전환되었다. 특히 공원 예정지를 풍치지구로 전환함으로써 서울시는 공원 내에서 설치할 수 없는 주택용도 허가와 공원 내에 난립하였던 무허가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었다.14)
한편, 도시계획 현실화를 사유로 숭인, 서린, 동안 제2, 송월, 동대문, 명동, 상용, 남대문, 공덕공원이 전부 해제되었다. 서울시는 명동, 서린, 동대문, 숭인공원(총 11,943m2)에 대하여 공원 이용률이 낮아 현실화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영세민 아파트 건립에 필요한 자금 10억 원 중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매각되었다.15),16)
한편, 이 도시공원 매각에는 절차적 하자도 있었다.「도시계획법」제4조(일부개정 1967년 3월 14일)에 따라 도시공원에 필요한 모든 결정 사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부 장관이 결정하는 절차와 형식을 갖추도록 하였지만, 김현옥 서울시장은 명동공원을 정부의 결정(1969년 9월 22일, 건설부고시 제515호)보다 앞선 1967년 7월에 이미 3.4억 원에 매각하였다.17) 이후 이러한 전철을 통해 서울시는 한남, 개운, 금호, 신설 제1 · 2공원이 추가 매각을 시도하여 제3차 추경예산으로 1.5억 원을 확보하고자 하였다.18)
재임 후반기 김현옥 서울시장은 더욱 과감한 도심지 공원 해제를 단행하였다. 1969년『서울도시계획공원 기본계획』 조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아파트 건설, 학교용지 확충, 타부처(중앙정부) 특별회계 재산으로 재산확보, 서울시 재원확보, 기타 등의 사유를 들어 총 79개소, 4.5km2(7.2%)에 달하는 공원 해제를 건설부에 신청하였다(Table 5 참조).
Source: April, 1970 Official document of Ministry of Construction [건설부, “서울도시계획공원변경(재정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안건,” 의결번호 제 4-1-1호]
이와 같은 도시계획공원에 대한 해제 신청은 당시 공원녹지의 심각한 잠식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서울시의 무허가건축물 양성화지구는 총 1.37km2, 44,493동이었고, 도시공원 내 무허가건축물 양성화지구는 0.71km2(51.9%) 17,478동(39.3%)이었다(Seoul, 1968). 특히 응봉공원(1,204,408m2, 1967년 확정면적)이 149,327m2, 4,192동으로 가장 많이 잠식되었고, 문화재인 창경공원(183,300m2, 1963년 확정면적)과 사직공원(192,400m2, 1963년 확정면적)도 각각 2,460m2(142동) 63,210m2(30동)나 잠식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 기록은 무허가건축물 양성화지구만 해당한 것으로 실제 공원 잠식 현상은 이보다 심각하였다.
서울시는 1969년부터 2월부터 무허가건축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아파트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당시 주택공급계획은 총 50개 지구에 822동(34,520세대)으로 결정되었다. 그 중 청운, 회연, 낙산, 금화 등 총 10개 지구는 인왕산공원, 인왕도로공원, 낙산공원, 응봉공원 등 15개 공원에 위치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1969년 8월 283동의 시민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공원면적 457,494m2을 풍치지구로 전환해줄 것을 건설부에 신청하였고, 건설부는 1971년을 마지막으로 456,894m2을 해제하였다(Table 6 참조).
1969년 8월 처음으로 완공된 금화지구 시민아파트는 안산, 금화, 북아현제1아동공원을 포함한 2,830세대, 112동의 대규모 단지였다(Figure 7 참조). 이 지구는 서울시와 HURPI가 선정한 시범도시계획 후보지(남서울, 금화, 수원, 대구 A, B)로서 이미 ‘고밀도 도시개발’이라는 지침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민아파트를 공급한 것이었다. 당시 HURPI는 금화지구를 표준주택공간 규모보다 작은 공간으로 설정하여 연립주택과 저층아파트를 복합적으로 개발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자조·자가 소유 주택모델’로 계획하였다(Kang,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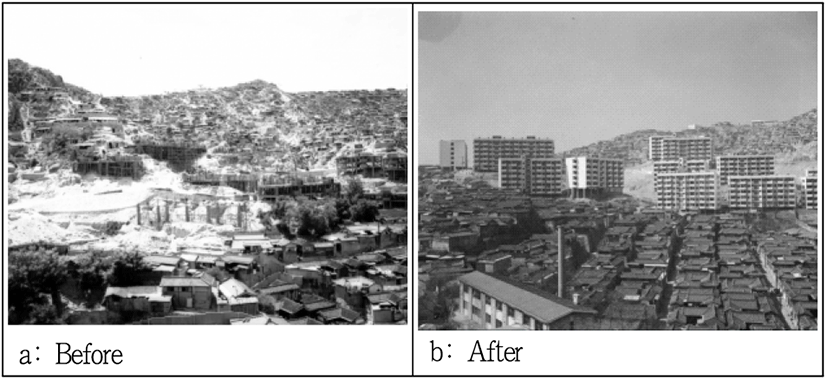
1970년 4월 8일 와우공원 내 시민아파트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건설부는 1970년 4월 14일 해당 공원 변경에 대한 결정·고시를 서둘러 완료하였고, 동년 제 4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공원 내 아파트 건설 금지를 의결하였다.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1970년 7월 음월도로공원, 인왕산공원, 낙산공원 등 7개 공원 내 33동의 시민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73,813m2를 추가 해제할 것을 신청하였다. 이 공원의 아파트들은 1969년 12월에 이미 착공하여 7개월 만에 85% 이상 건축된 상태였다. 붕괴사고가 발생한 와우아파트도 1970년 6월 17일에 다시 착공하여 1개월도 안 돼서 35%의 공정률을 기록하였다.20)
마지막으로 시민아파트가 건설된 전농공원은 제일생명이 무허가건축물 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를 건립하되 4,941㎡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진행하였다.21)
Ⅴ. 민자유치사업의 정립과 장소의 소거
김현옥 시장의 등장은 서울시 예산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1965년까지 80억에 못 미쳤던 예산 결산 규모는 1966년 들어 2배 가까운 135억 원이었고, 1970년에는 494억 원에 이르렀다. 예산 급증 현상은 건설비용 증가가 반영된 것인데 1966년과 1967년에는 일반회계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1968년과 1969년에는 대부분 건설비용 항목으로 구성된 특별회계예산이22) 전년도보다 2배 이상 증액되었다(Table 7 참조). 이에 총 건설사업비는 1967년 158억(74.7%), 1968년 198억(78.3%)으로 책정되어 전체 예산의 75% 가까이 차지하였다.23) 1969년부터 특별회계 규모가 일반회계 규모보다 높게 잡아 김현옥 서울시장은 재정지출을 즉흥적으로 운영하였다(Park, 2015).
Source: Seoul Statistical Year Book.
김현옥 서울시장은 건설사업에 의한 재정적자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개념을 바꿀 때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24) 그는 ‘공공사업=공공투자’라는 등식에서 벗어나 민간자본 유치라는 당시로서 낯선 해법을 제시하였다. 차일석 부시장에 따르면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급격한 도시성장을 방지할 것이 아니라, 자본과 노동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도시개발계획 수립의 일환으로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도시재정의 경제권과 사회권을 기업경영방식으로 전환하여 일정 수익 담보를 보장하고, 투자자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건설부 국토계획과장 김의원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은 민주적 절차가 부족하므로 민간자본을 유인하여 공공에 투자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이처럼 공공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입이라는 새로운 사고 전환을 기획한 김현옥 서울시장은 1967년부터 민간자본을 시예산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민간유치사업을 75억원, 순민간사업을 300억원으로 책정하여 중앙도매시장 현대화, 시청 앞 지하서울 건설, 세운상가, 무교동 등 6개 도심지구 도시개조사업, 불량주택 개량사업(1만 동) 등을 우선 계획하였다.26) 1968년에는 예산사업으로 350건만 시행하고, 나머지 647건을 도시계획사업을 비예산사업 및 민간자본유치사업으로 확대하였다.
1960년대 중후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조성공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계획공원은 약 25km2(1964년)에서 약 55km2(1968년)까지 성장하였지만, 조성공원은 2.1km2(1964년)에 불과하였다(Table 2 참조). 당시 서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던 공원은 삼청, 효창, 남산, 와우공원 등 대공원 6개소, 어린이놀이터와 풀장이 마련된 파고다, 사직, 서울운동장 3개소, 그리고 아동공원 13개소 등 불과 22개소에 불과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성된 공원은 1950년 말 제 1중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만든 수표, 명동, 동대문, 묵정공원이었고, 김현옥 시장이 취임하기까지 공원조성은 전무하였다.27) 이러한 상황에서 1967년 8월「수도서울 5개년계획 전시장」에서는 남산공원개발, 장충단공원에 다목적경기장과 순환입체교차로 신설, 관악산을 비롯한 10개소 공원지구에 관광기지 조성, 남산에 뉴서울타워 건립, 사직·효창·삼청공원 유료공원화 등 공원조성 조감도가 전시되었다.28) 그중 파고다공원과 사직공원은 그의 임기 중에 완공되었다.
김현옥 서울시장은 "공원에 관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원법, 1967년 3월 3일 제정)을 최초로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에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던 것처럼 공원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하였다.「공원법」 제 12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원사업을 집행하거나 공원관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의 관리를 할 수 있다”와 동법 제 14조 “공원사업을 집행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건설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당해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집행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민간부분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제도적 지원과 김현옥 시장의 적극적인 의지로 인하여 1967년 이후 민간자본에 의한 공원이 탄생하였고, Table 8에 정리된 것처럼 그는 공원조성 비용 상당 부분을 민간자본에 의존하였다.29) 서울시는 효창, 불광, 정동공원 등을 시 재원 없이 민간자본만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파고다공원에 아케이드형 상가를 조성하여 180여 개의 점포를 분양하였고, 장충단공원에는 손기정 체육관을 건립하여 일본 재벌의 자본을 유치하고자 하였다.
| Park name | Building sizes | Purpose of facility funded privately | City budget (KRW) | Private capital (KRW) | Source |
|---|---|---|---|---|---|
| Gwanaksan [관악산] | 200,000,000 | Sale of housing site | Feb. 28, 1967. Dong-A | ||
| Pagoda [파고다] | (A): 380py., (B): 2F. | Commercial facility | 34,630,880 | 137,253,230 | Park, 2002: 53-56. |
| Sajik [사직] | Pool, golf | May 21, 1968. Dong-A | |||
| Samcheong [삼청] | (A): 7,000py., (B): 5F. | Pool, golf, complex building | 109,900,000 | 394,250,000 |
Aug. 14, 1967. Dong-A Sept. 11, 1968. Dong-A |
| Hyochang [효창] | Pool, golf | - | 50,000,000 | Dec. 22, 1967. Chosun | |
| Namsan [남산] | (A): 5,500py, (B): 6F. | Recreation center, hotel |
1,675,500,000 - |
1,555,790,000 379,000,000 |
May 24, 1966. Chosun, Aug. 16, 1967. Dong-A |
| Bulgwang [불광동] | (A): 188py | - | 10,000,000 | Dec. 26, 1968 Maeil Business | |
| Jeongdong [정동] | (A): 500py, (B): 6F. | - | 150,000,000 | Mar. 28, 1969 Official document of Seoul25) | |
| Jangchungdan [장충단] | (A): 12,000py | Sports stadium, hotel, pool | 500,000,000 |
3,500,000,000 2,356 |
Jul. 9, 1968. Dong-A Sept. 3, 1968. Maeil Business |
| Tourism baseization [관광기지] | 165,000,000 | 6,790,000,000 | Jun. 27, 1967. Kyunghyang (남산, 뚝섬, 관악산, 북한산성, 우이-송추, 정릉, 세검정) |
(A): building area (B): number of stories.
한편, 서울시는 준공원에 속하는 유원지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으나, 법령의 높은 벽 때문에 민간투자의 어려움을 겪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4조의4는 도시공원에 효용하는 시설은 매우 정적인 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유원지에 요구되는 동적이고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의 도입을 억제하였다.30) 이 때문에 1967년 10월 서울시는 관악, 도봉, 우이, 정릉, 세검지구의 일부 16.3km2를 유원지로 사용하기 위해 비교적 건축이 자유로운 풍치지구로 용도 전환할 것을 건설부에 신청하였다. 동시에 「유원지운영규칙(안)」을 제정하여 공원에 설치할 수 없는 스케이트장, 관광호텔, 식당, 골프장, 관람차 등 위락시설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유원지(또는 민영녹지)를 합리화하려는 서울시는 준공원에 속하는 유원지와 그 모체에 해당하는 도시계획공원을 서로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민간부분의 투자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31)
김현옥 서울시장 때 이루어진 급격한 도시개발은 과거의 전통적 질서를 훼손시켰다. 그와 함께 서울 도시계획을 함께 연구하였던 UHRPI는 도시재개발과 도시계획의 혼동과 인간의 정주 패턴을 무시한 동심원적 방사선 도로계획을 추진하는 서울시와 늘 갈등하였다(Youn and Jung, 2009; Kang, 2020). 김현옥 서울시장의 도시근대화 논리는 근대화와 개발을 당면 과제로 설정하여 시민의 편익을 위해 문화재와 장소의 희생이 불가피한 ‘시대의 요청’이라고 주장하였다(Kim, 2020).
김현옥 서울시장은 공원사업에 민간자본의 투자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지만, 도시공원의 장소적·문화적 특성에 무관심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도시공원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규정은 매우 정적인 시설만을 나열하였거나 추상적인 법 문구로 인하여 행정 적용의 모호성을 남겼다. 또한 공원시설에 대한 종류만 나열하였지, 그 규모에 대한 기준마저 부재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적 미흡과 정책적 흠결로 인하여 김현옥 서울시장은 장소의 특성보다 투자 이익 중심의 대형 법외시설을 도시계획공원 내에 설치하여 논란을 키웠다.
파고다공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공공에 의해 건설된 공원(1899년 완공)이자 3·1운동의 근원지로 이곳에 아케이드 건립은 김현옥 시장의 “대표적인 실정”으로 꼽고 있다(Park, 2002). 미국에서 공원문제를 연구한 장문기 교수가 이 공원설계를 담당하며 경계부 내측에는 3·1운동을 기념하는 부각상을, 외측에는 높이 2층, 연면적 1,020평 규모의 상가건축물을 설치하여 폐쇄적인 공원으로 만들었다. 180여 개 상점이 들어선 이 건축물은 공원 공사비의 80% 이상 차지하며 순수 민간자본으로 계획되었다.32) 이를 두고 “위기에 처한 서울의 유적”이라는 비판에 대하여 차일석 부시장은 전시시설이 있어서 좋은 사례가 될 것이고 “건설을 통해 문화재를 더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3) 더불어 파고다공원 중수공사의 문제는 위법적 조치였다는 것이다. 당시 건설부는 “① 공원 목적 이외에 쓰지 말 것, ② 시설물의 출입구는 공원 안에서도 출입할 수 있도록 늘릴 것, ③ 도시계획과 종합 검토해서 건축할 것”을 승인조건으로 결정하였다.34) 한편, 아케이드 상가시설은「공원법」과「건축법」상 공원 내에 설치 불가 시설이었지만, 서울시는 아케이드 상가를 3.1운동 열사가 새겨진 전시시설이라고 우겨 건설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철회할 수 없었던 이유는 건설부 결정에 앞서 이미 50% 이상 건축되었고, 360평 가량 도시계획선을 침범한 상태였다.
사직공원은 해방 후 제의공간으로서 정체성을 제대로 찾지 못한 대표적인 문화유적 공원이었다(Kim, 2020). 1964년 사직공원 부정불하사건은 대표적인 정치스캔들로 기록되었고, 1967년 공원용지가 모두 회수되자마자 새로운 국회의사당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1964년에 착공된 사직터널 공사는 1967년 감현옥 서울시장에 의해 완공되었는데 그 과정에 사직단 정문(보물 177호)이 이축되었다. 1967년 7월 유료 풀장이 개장(사직, 인현, 묵정, 영등포 제2공원)되어 2시간에 3원씩 입장료를 받았다. 한편, 사직공원 소유자인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시가 풀장 개설공사 과정에 관리시설 외에도 휴게실과 주택 건설을 위해 공원림을 훼손하였다고 항의하였다. 8월에는 기존 파고다공원에 있었던 종로시립도서관을 이관(연면적: 810평, 높이: 3층)하기 위해 기공식이 열었고, 10월에는 12만 평 부지를 계단식 정원으로, 나머지 5천 평에 잔디광장, 어린이놀이시설, 소동물원으로 개발한 “공원미화전시장”을 조성하였다. 한편, 1968년 2월에는 사직공원을 포함한 5개의 역사적 공원(효창, 삼청, 와우, 우이, 정릉) 내에 민간자본에 의한 골프연습장 건설을 허가하였지만, 사회종교단체 대표들이 박정희 대통령께 건설 중지를 요구하면서 하루 만에 이 허가를 철회하기도 하였다.35)
1966년 김현옥 서울시장과 UHRPI는 당시까지 개방하지 않았던 장충단을 포함한 남산 일대를 대규모 레크레이션센터를 만들고자 1968년 2월「남산공원재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레크레이션센터 부지에 민간이 추진하는 관광호텔(5,500평, 3억 8천만원) 사업이 논란이 되었다. 이 시설(숙박시설)은 도시공원 내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중구청이 레크레이션센터 부지 내 사유지를 토지소유자와 상급기관과의 협의와 허가 없이 기공식부터 진행하였다. 그 결과, 언론은 민간자본 공원시설을 “특정인의 오락시설”이라고 규정하였고, “공원에 개인의 영리적 목적이 게재되면 시민과의 소외감이 더욱 크다”는 남산개발 반대 여론을 형성시켰다.36) 한편, 이 건물에 대한 위법성은 골조 공사가 완성된 상태에서 제기되었고, 이후 이 골조를 이용하여 회현제2시민아파트로 변경하면서 해당 부지는 공원면적에서 해제되었다(Park, 2002). 이외에도 김현옥 서울시장 임기 내 중부소방서, 외인아파트, 군장교 주택지, 이대병원과 같은 법외시설들이 남산공원에 설치되었다.
남산 동측에 위치한 장충단은 을미사변(1895년) 충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으로 김현옥 시장에 의해 개방되었다. 그런데도 김현옥 서울시장은 이 공원에 1971년 아시아게임에 대비할 수 있는 대형경기장(12,000평)을 세우기로 계획하였다. 실내수영장과 빙싱경기장, 스포츠백화점과 호텔 등을 갖춘 이 시설을 손기정기념체육관이라 불렀고, 건너편 장충실내체육관과 서울운동장을 하나의 스포츠 클러스터로 계획하였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근거로 일본 무역회사 이또주(伊藤忠)상사가 민자 35억 원 중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밝혔다. 계약조건은 체육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서울시에 기부체납하는 것이었고, 숙박시설(스포츠맨호텔)을 손기정이 관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였고, 대신 이 일대는 롤러스케이트장, 수영장, 제일광장, 동대축구장, 궁도장, 베이비야구장, 골프연습장 등 체육공원 형태로 명맥을 유지하였다.37)
20,476m2에 불과한 정동공원은 아관파천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으로 당시까지 러시아(구 소련)의 소유부지(1844년 이후)였다. 1960년 정부는 이 부지를 대법원 청사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장기간 방치하면서 512동의 무허가건물(845세대, 4,697명)들이 정동공원을 잠식하였다. 한편, 1969년이면 무단 점유기간이 20년을 도과하여「민법」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에 따라 해당 점유자들에게 불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38) 이에 따라 정부는 무주재산인 정동공원 토지를 국유화하면서도 추후 소련과의 관계 회복시 협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서울시가 “공공의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서 서울시는 이 부지를 아동공원으로 토지이용을 결정하여 1969년 6월 25일까지 점유자들의 이주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공원조성안으로 아동공원 설치안(민자 26.4백만 원, 풀장 포함), 도서관 설치안(민자 150백만 원) 그리고 운동시설 설치안(민자 150백만 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무주재산인 이 공원은 민간 이익단체의 압력으로 그 본질이 흐려졌다. 1969년 11월 제87회 국무회의에서는 이 부지를 아동공원 대신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고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한국법조회관, 학생 아카데미하우스, 외국인전용 아파트를 설치하여 서울시가 이 시설에 대한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이후 토지 점유자인 한국법조인협회는 무주토지에 대한 점용료를 낼 수 없고 한국대학생선교회는 승공사상 함양 등 공익법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 점용료가 과하다는 진정성을 제출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1970년 3월 정동공원을 폐지할 것을 건설부에 신청하였다. 동년 5월 국무회의는 해당 부지를 점유자에게 양여할 것을 서울시에 지시하였고, 동년 6월에는 3,499평을 신문회관건립을 위해 양여하는 것으로 다시 지시하였다.39)
Ⅵ.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1960년대 후반 서울 근대화의 초석을 이룬 김현옥 시장의 공원녹지 정책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도시재건과정에서 나타난 하이 모더니즘의 관점을 인용하였다. 하이 모더니즘은 통제받지 않은 권위주의에 의지한 “건설되는 도시”의 스펙터클을 읽어 낼 수 있는 유용한 근거이다. 한편, 하이 모더니스트 김현옥 서울시장은 인구 폭증에 따른 도시 확장기에 발생한 것으로 방사순환방식의 도로선형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위성도시 구축을 통해 도시의 가독성을 제공하였다. 또한 서울의 주요 도시문제인 무허가건축물을 제거하기 위해 다량의 시민아파트를 속도전으로 처리하여 강제적인 인구 재배치를 추진하였다. 도로건설과 주택공급으로 압축할 수 있는 김현옥 서울시장의 도시계획은 4개 단체 엘리트들의 합리적 계획에 근거하였고 계획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김현옥 서울시장의 공원녹지 정책의 경로는 인구 급증이라는 도시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에 의해 잠식당한 공원문제에서 출발하였다(Figure 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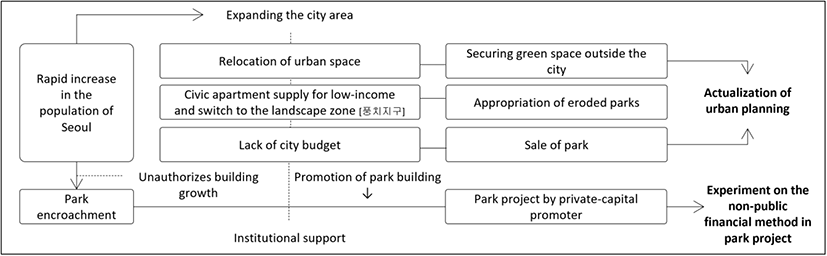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원에 대한 첫 번째 정책 경로는 도시공간의 재배치에 맞춰 시 외곽의 녹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는 전임 시장이 추진한 서울 북·동부 확장과 본인이 추진한 서울 남·서부 확장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현재 서울의 공원면적과 유사한 면적을 확보하였다.
공원녹지에 대한 두 번째 정책 경로는 서울의 주택공급과 관련된 것으로 공원에 시민아파트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본래의 용도와 달리 전용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본래 공원부지에 적용하였던 엄격한 건축규제를 해체시켜 공원과 녹지를 잠식하였던 물건을 기존 판자집에서 아파트로 대체하였다.
공원녹지에 대한 세 번째 정책 경로는 엄청난 건설경기로 소진된 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도심 아동 또는 소공원들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었다.
위 세 가지 공원녹지 정책의 경로는 도시계획 현실화에 맞추기 위해 공원을 활용한 것이라면, 공원에 대한 그의 마지막 정책 경로는 공원 내 무허가건축물을 제거하기 위해 공원의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공원법」 제정이라는 제도적 지원이 있었고, 김현옥 서울시장은 민간자본공원에 대한 실험을 진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김현옥 서울시장에 의한 공원녹지 정책의 궁극적 목표은 도시계획 현실화와 비재정방식의 실험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공원 매각, 공원 내 시민아파트 건축, 공원 해제 그리고 서울 외곽으로 공원 배치 등의 김현옥 서울시장의 공원 정책은 “공지로서의 목적을 포기하고 유보지로서 기능을 규제하는(Lhee, 1976)” 공원녹지 정책의 무정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김현옥 서울시장은 공원녹지 정책도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하이 모더니스트로서의 특징을 반영하였다.
우선 서울시의 공원녹지 계획은 국토계획학회가 주축으로 하는 엘리트 그룹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였고, 1966년「대서울도시계획전시」와 1967년「수도서울5개년계획전시」를 통해 대중에게 알렸다. 국토계획학회는 확장된 시 경계에 맞춘 새로운 도시계획을 추진하면서 서울의 자연을 동서남북의 축으로 교차시켰고, 일정한 표고를 기준으로 구획함으로써 공원녹지의 가독성을 구상하였다. 또한 거리와 규모 중심의 일제강점기 공원배치기준을 발전시켜 향후 도시계획지구와 일상생활권의 인구 규모를 반영한 합리적인 계획 기법을 연구하였다.
국토계획학회가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면 HURPI는 금화공원과 남산공원을 주 대상으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금화공원은 공원계획이 아닌 주거계획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선택하여 잠식된 공원을 복원의 대상이 아닌 신속한 인구수용의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장문기는 당시 공원 전문가로서 파고다공원에 최초로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주조합방식(분양공모)을 설계에 반영하였다. 하지만 역사적인 장소와 상업시설이라는 불합치성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윤정섭은 “바닥난 재원에 의욕만 앞선” 불도저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40)
이처럼 하이 모더니스트로서 김현옥 서울시장의 공원녹지 정책의 특성은 국토계획학회, HURPI 그리고 장문기로 대표하는 엘리트들의 참여와 사방위의 축과 표고 기준 설정, 인구 예측을 고려한 합리적 계획을 통해 공원녹지의 가독성을 구축하였다.
둘째, 급변하는 도시계획 현실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원부지의 용도를 전용하였다. 그는 강력한 공권력을 이용하여 공원 내 시민아파트를 건립하여 공원을 인구 재배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강력한 공권력으로 공원녹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법절차를 경시하였고 공원조성에 관한 제도적 구속력을 초월하였다.41)
셋째, 민간자본을 유치한 다수의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적극적으로 실행하였지만, 장소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소거하여 도시의 이벤트와 스펙타클을 과시하였다. 한편, 정동아동공원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이익단체가 공공의 토지이용 정책에 개입하여 공원을 그들의 활동 공간으로 변질되기도 하였다.
하이 모더니즘이 반영된 김현옥 서울시장의 공원녹지 정책은 공원녹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공지로서 또는 녹지로서의 기능과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롯되었다. 이 때문에 하이 모더니즘 시기의 공원녹지는 도시계획(현 도시관리계획) 하위에 있는 체제의 염격성에 집중한 나머지 공원 자체의 문제보다 도시문제의 해결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하이 모더니즘은 역사속에 사라진 일회성의 신념이 아니다. 이 신념을 처음으로 주장한 하비(Harvey, 1989)는 하이 모더니즘의 헤게모니는 모너니티에서 포스트 모더니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과정이자 포스트 모더니티의 토대를 남겼다고 보았다. 공간사회학자 최병두(Choi, 2007)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권위주의적 공간개발은 현재의 신자유주의에 소멸되었다기보다는 “내면화된 제도적 틀, 정책 레짐, 규제 관행 그리고 정치적 투쟁 등의 잔재들에서 맥락적 착근성(contextual embeddedness)”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하이 모더니스트로서 김현옥 서울시장의 공원녹지 정책은 반성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현 공원녹지 정책의 토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이 모더니스트로 김현옥 서울시장의 공원녹지 정책 유산은 분명히 잘못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의 공원녹지 정책은 수정·보완하면서 현재의 기조로 이어졌다.
첫째 김현옥 서울시장과 그의 엘리트들은 공원 이용권과 공원 이용자의 수용력을 반영한 최초의 공원계획을 연구하여「서울도시계획공원 기본계획」이라는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행정영역으로 확장시켰다. 특히 당시의 외곽녹지의 개념은 개발제한구역(1971년 신설)을 발전하였고 남과 북을 잇는 녹지축의 설정은 현재 서울의 공원녹지기본계획에도 유용하다. 그리고 생활권 중심의 공원 배치는 1980년 「도시공원법」 제정 이후 도시공원 배치에 필요한 제도적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다.
둘째, 김현옥 서울시장이 시작한 민간자본유치에 의한 공원사업 실험은 장소성을 소거하는 부작용도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유효한 방식이다. 이 실험에서 그는 다수가 참여하여 조합을 구성하는 방식, 특정한 개인(또는 기업)이 사업자로 공모하는 방식,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방식 등 여러 방안을 공원사업에 적용하였다. 그 중 전농공원과 관악산에서 보여준 (시민)아파트 개발과 연계한 기부채납 방식은 기부채납공원과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기원이 되었다.
셋째, 그의 공원녹지 정책의 오점이 현재의 반면교사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장소성을 배제한 공원사업의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내용이 후속 법률에 반영되었다. 1980년에 제정된 「도시공원법」에는 구체적인 공원시설과 관련 설치 기준이 마련되었다. 그 법률에 근거하여 파고다공원(1982년)과 사직공원(1985년)에 대한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84년도부터 남산복원사업이 추진되면서 그가 건축 허가한 외인아파트(1994년)가 철거되었고, 정동공원(1988년)을 잠식하였던 민간 건축물들이 이전하면서 다시 공원으로 복원되었다. 현재는 그가 수립한 공원계획에 반영된 남북의 녹지축을 연결하기 위해 공교롭게도 그가 건립한 세운상가 및 주변 도시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이상 김형옥 서울시장으로부터 출현한 공원녹지 정책은 당시의 새로운 지형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후대의 우리는 그의 결함을 수정·보완하며 새로운 대안을 발전시키는 중이다. 김현옥 서울시장의 근대화는 현재의 공원녹지 정책에도 고려되고 있으며, 그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역할이 공원녹지 정책의 전환기 또는 차별적 성장(differential growth)를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