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현재 도시는 건축물이 과밀해지고 지표면은 점점 적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녹지의 면적은 점차 줄어들고, 도시 내 아스팔트로의 토지 피복 등 불투수층 면적의 증가와 콘크리트 건물표면의 증가로 도시의 열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도시기후와 도시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Wong et al., 2010; Pan et al., 2018). 그러나 이러한 현 상황과는 반대로 도시민들은 도시에서 녹지공간과 쾌적함을 원하고 있으며, 녹지의 중요성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Belmeziti et al., 2018). 그래서 녹지의 확보가 어려운 조밀한 도시에서 수직적 공간을 이용하여 벽면녹화를 하기 시작하였다(Jim and He, 2011). 벽면녹화는 입면에 식물을 식재함으로써 자연 속에 있는 듯한 쾌적감을 만들어주고 건물에너지 절감에도 영향을 주며(Jeon et al., 2014), 도시열섬 저감, 건물에 부는 바람을 막는 차단제로도 작용한다(Jang et al., 2015). 또한, 도심에서의 녹화량은 늘리고, 생물 서식공간 제공 등 도시의 생태적 환경을 증가시키기에 좋은 대안이다(Russo et al., 2018). 벽면을 녹화하여 녹의 양을 늘리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고 경제적인 방법이며(Cho, 2006), 단열기능을 개선하여 전력사용저감, 에너지 절약 효과 매우 효율적인 역할이 가능하다(Daemei et al., 2018; Ouyang et al., 2019). 벽면녹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벽면녹화에 대한 연구, 제도 및 지침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국내 벽면녹화에 관한 연구로는 벽면녹화 유형에 따른 복사에너지 변화특성 연구(Lee et al., 2020), 벽면녹화가 도시기온 저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Park and Kim, 2011), 벽면녹화 식재기반 재질별 에너지저감 성능분석(Kwon et al., 2013), 옥상 및 벽면녹화가 건축물 온열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Park et al., 2014)등이 있다. 대부분 벽면녹화에 관한 연구는 에너지 및 도시기온 저감에 관한 내용이며, 벽면녹화 식물이 아닌 벽면녹화가 적용되는 건물 및 도시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식물종과 관련된 연구도 있었지만 덩굴식물의 미세먼지 저감 능력 평가(Jeong et al., 2018), 벽면녹화를 통한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Yang et al., 2020)등과 같이 식물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대부분이었으며, 식물종과 관련된 연구는 적은 실정이다. 실제 벽면녹화를 도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벽면녹화 식물종의 생장특성 및 방위에 따른 생장차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앞서 방위와 관련된 벽면녹화의 선행 연구, 제도 및 지침에 대해 알아보았다. 선행연구로는 Kim et al.(2012)은 다섯 가지 덩굴식물을 선정하여 벽면의 재질별 부착 유무와 남·북향에서의 생장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Kim(2013)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방위에 따른 피복률을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는 1998년 환경부에서 녹화 지침을 발간하면서 벽면녹화의 도입이 되었다. 벽면녹화와 관련된 제도 및 지침들을 살펴보자면 ME(1998)는 남쪽벽면은 낙엽성 식물, 북쪽․서쪽․동쪽벽면은 상록성 식물을 식재하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었으며, MOLIT(2012)는 입면의 방위에 따른 설치방향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식물을 선택하고 식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Sejong Metropolitan Autonomous City Building Code(2018) 4조 4항 4호에는 옥상, 벽면, 테라스 등 다양한 녹화기법을 권장하며, 북측입면의 벽면녹화는 지양한다는 지침이 있다. 세종시에서 볼 수 있듯이 약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벽면녹화에 대한 지침에서는 방위별로 식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방위와 관련된 국내 벽면녹화 지침과 제도에서 방위별로 식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별로 생육의 차이를 알아보는 연구는 매우 적으며, 실제 8방위별로 식물의 생육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연구는 전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벽면녹화에 많이 식재되고 있는 식물 3종을 대상으로 8방위별 식물의 생육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연구대상 식물은 저비용과 저 관리가 가능하며, 환경부(2008)의 “도시인공지반의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모니터링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벽면녹화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담쟁이덩굴(Parthenocissus tricuspidata), 송악(Hedera rhombea), 금빛줄사철(Euonymus radicans cv. aueonmarinata Rehd) 3종을 차례로 선정하였다. 또한, 3종 모두 한반도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도시화지역인 수도권지역에서 벽면녹화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Lee et al., 2003).
담쟁이덩굴은 낙엽성으로 내한성은 강하며, 내서성은 중간정도이다. 종의 특성상 흡착근으로 벽면을 피복하고 기근을 내리기 때문에 부착력이 강하다. 생육이 왕성하여 거대 벽면에의 이용에 적합한 특성이 있다.
송악은 내한성, 내서성, 부착력 및 내음성이 강하다. 하지만 생육이 느려 작은 면적의 피복에 적합하며, 빠른 피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금빛줄사철은 줄사철나무를 개량한 녹화품종이다. 내한성은 강하며, 내서성은 중간정도이다. 연간 70~120cm 정도 자라는 특성이 있다(ME, 2008).
실험에 사용한 식물의 평균 초기 신장 값은 담쟁이덩굴 3.93cm, 송악 2.27cm, 금빛줄사철 10.64cm이었다.
토양재료는 인공배합토((주)참그로 튼튼나무(대묘용))를 사용하여, 8방위 지반 모두 동일하게 처치하였다.
실험 장소는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실험장(36°40'12.3"N 126°51'21.7"E)에서 진행하였다. 실험은 생육이 왕성한 시기인 2020년 5월 9일부터 9월 26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실험기간동안의 총 강수량은 1,344.2mm, 평균기온은 23.08℃이었다. 실험벽체의 규모는 한 면이 50cm×100cm(가로×높이)인 8방위로 총 3개를 제작하였으며, 목재판재에 시멘트를 발라 실제 도시건물의 표면과 유사하게 하였다(Figure 1 참조). 또한, 식물의 식재 전 벽면녹화 보조재로서 매쉬 약 18mm, 두께 1mm의 PE 넷트를 벽체에서 50mm 이격하여 설치하였다. 그림자의 길이를 고려하여 실험벽체구조물의 간격은 2m 간격으로 설치하였고, 식재 후 실험 기간 동안 무관수하였고, 시비도 하지 않았다.
모니터링 기간은 가장 먼저 1m 높이의 벽체 피복이 완성되는 시기로 하여, 식재 후 5월 9일부터 9월 26일까지 주 1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 시간 간격으로 식물 생육에 가장 중요한 조도, 벽체 표면 온도를 방위별로 측정하였고, 식물이 방위별로 얼마나 다르게 생육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매주 피복률과 식물의 길이를 매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2021년 2월 19일 식물의 길이와 피복률을 최종적으로 측정하였다.
데이터는 MS Office Excel 2016을 활용하여 정리하였다. 온도계는 BENETECH GM320을 사용하였고, 조도계는 BENETECH GM1010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식물의 길이는 벽체의 세로 길이인 100cm를 초과하면 수치를 100으로 입력하였다. 피복률은 방위별로 식재된 식물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후 포토샵을 활용하여 픽셀 수에 의해 산출하였다. 수집한 표면온도와 조도 데이터는 Figure 2, Figure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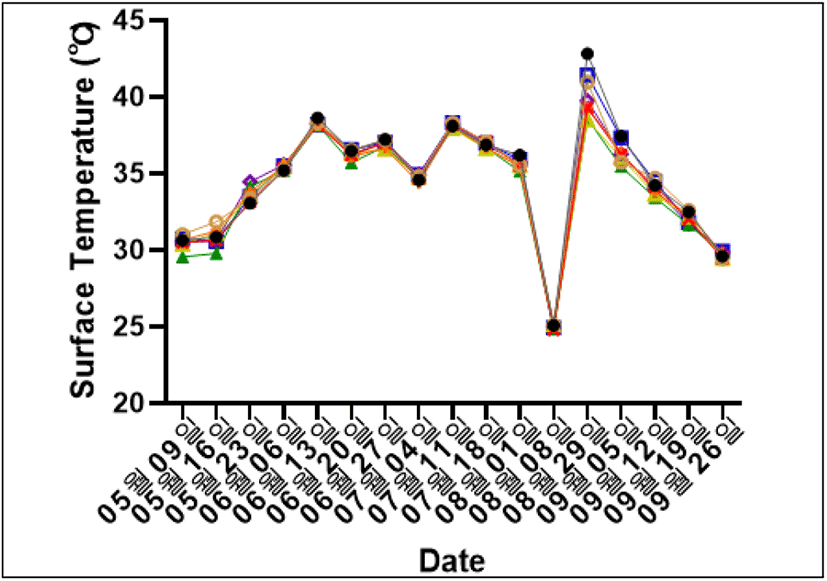
 S
S  SE
SE  E
E  NE
NE  N
N  NW
NW  W
W  SW.
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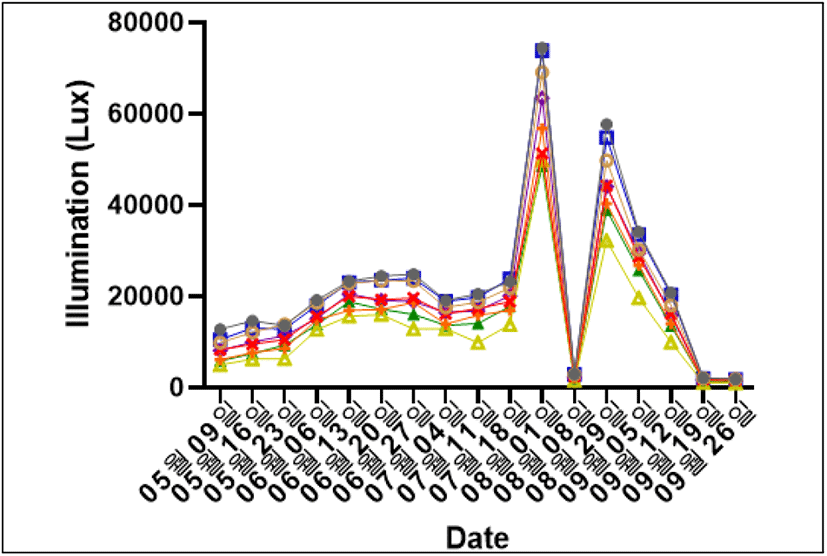
 S
S  SE
SE  E
E  NE
NE  N
N  NW
NW  W
W  SW.
SW.
Ⅲ. 연구결과
5월부터 9월까지 방위별로 표면온도와 조도를 측정 및 분석한 결과는 각각 Table 1, Table 2와 같다. 측정값은 측정 기간 중 기온이 가장 높았던 8월 29일과 장기간의 강수로 기온이 낮았던 8월 8일을 제외하고 방위별로 차이가 적었다. 평균표면온도는 남서향이 34.59℃로 가장 높았으며, 북서향이 33.98℃로 가장 낮았고, 차이는 0.61℃이다. 평균표면온도는 식물별 기온에 따른 생장차이는 다르지만, 식물은 어느 정도 열환경에 적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기온 17-28℃에서 생육을 활발히 한다(Loveys et al., 2002; Atkin and Tjoelker. 2003). 본 연구의 값과 비교해 보았을 때, 평균기온이 26.6℃이었던 6-7월에 생육이 왕성한 결과가 나왔다. 평균조도는 남향이 22,899.51Lux로 가장 높았으며, 북향이 13,300.12Lux로 가장 낮았으며, 차이는 9,599.38Lux이다. 빛은 식물생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Nozue and Kloof, 2006), 태양 복사가 감소함에 따라 식물의 광합성과 성장속도는 점차 감소한다(Matsui et al., 2018). 본 연구의 값과 비교해 보았을 때, 송악과 금빛줄사철이 태양복사가 감소하는 북, 북서향에서 생육이 부진한 결과가 나왔다.
5월부터 9월까지 방위에 따른 생장 차이를 살펴본 결과, 담쟁이덩굴의 경우 북향에서 생육이 왕성하였으며, 8방위 모두 6~7월에 생육이 가장 왕성하였다. 또한 담쟁이덩굴의 방위별 생육 차이를 살펴보자면 생육이 왕성했던 6~7월에 비교적 북향보다 서향에서의 생육이 늦었다. 송악과 금빛줄사철의 경우, 남향에서 생육이 가장 왕성하였다(Figure 4 참조). 이는 담쟁이덩굴이 기온 약 20-26℃ 사이에서 생장을 왕성하게 하는 특성(de Capite. 1955)이 있어 복사열이 비교적 적은 북향에서 생육이 왕성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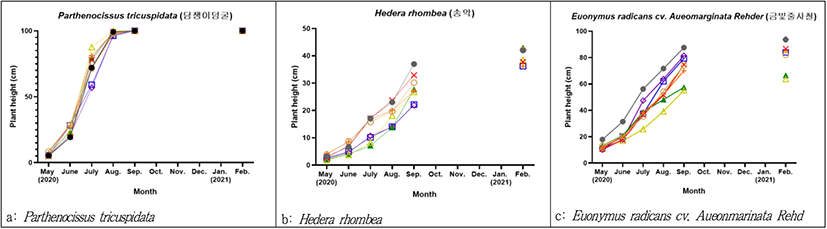
 S
S  SE
SE  E
E  NE
NE  N
N  NW
NW  W
W  SW.
SW.
남향과 북향 두 가지 향에 국한하여 실시된 기존 연구(Kim et al., 2012)와 비교해서 송악의 경우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송악의 방위별 생육차이를 살펴보자면 생육이 왕성했던 6~7월 사이 남향에서 생육이 왕성하였고, 비교적 북향과의 차이가 많이 났다. 그 후 모든 방위에서 완만한 생장을 이어 갔다. 송악의 경우 그림자가 많이 생기는 곳에서는 줄기의 지름과 길이가 성장하지 못하는 특성(Jeong and Kim. 1999)을 가졌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남향에서 생육이 왕성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빛줄사철도 남향에서 생육이 왕성하였다. 금빛줄사철은 그늘을 잘 견디는 식물이지만 빛을 좋아하는 특성(Song and Li. 2016)을 함께 가졌기 때문에 빛과 관련하여 초반 생육은 남향에서 후반생육은 북향과 남향 모두에서 생육이 왕성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는 기존 연구(Kim et al., 2012)에서 금빛줄사철의 초반 생육은 남향에서 후반 생육은 북향에서 미소하게 큰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기존 연구가 남향과 북향 두 가지 조건에서 비교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8방위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동북향, 북향, 북서향에서보다 서향, 서남향, 남향, 남동향, 동향에서 생장이 왕성하였다. 결과적으로 초반 생육은 남향에서 후반생육은 남향과 북향 모두에서 왕성하여 총 생장량은 남향에서 분명하게 컸다.
5월부터 9월까지 식재한 식물의 생장변화를 살펴본 결과, 생장속도가 담쟁이덩굴, 금빛줄사철, 송악 순으로 빨랐으며, 피복률도 담쟁이덩굴, 금빛줄사철, 송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담쟁이덩굴은 초장 생육 및 피복의 속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금빛줄사철과 송악은 초장 생육과 피복률이 낮게 나타났다(Figure 5 참조). 이와 같은 결과는 담쟁이덩굴의 흡착근은 표면에 강력 착생하여 벽면을 피복하며 거의 모든 방향으로 생장(Lee and Kim, 2011)하여, 수직·수평적 성장률이 모두 왕성한 특징(Korea Highway Corporation, 1999)을 가졌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송악의 경우 수직의 성장보다는 지면을 덮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최종적으로 담쟁이덩굴은 2021년 2월까지 북향에서 86.67%로 최대의 피복률을 보였으며, 평균 81.18%의 피복률을 보였다. 금빛줄사철은 2021년 2월에까지 남향에서 44.89%로 최대의 피복률을 보였으며, 평균 30.88%의 피복률을 보였다. 송악은 2021년 2월까지 남향에서 26.56%로 최대의 피복률을 보였으며, 평균 18.04%의 피복률을 보였다(Figure 6 참조). 기존 연구(Kim et al., 2012)와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는 금빛줄사철의 생장이 송악보다 더 왕성했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피복률은 기존 연구(Kim et al., 2012)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표면을 덮는 송악의 생육적 특성으로 인해 수직적 생장이 금빛줄사철보다는 늦어져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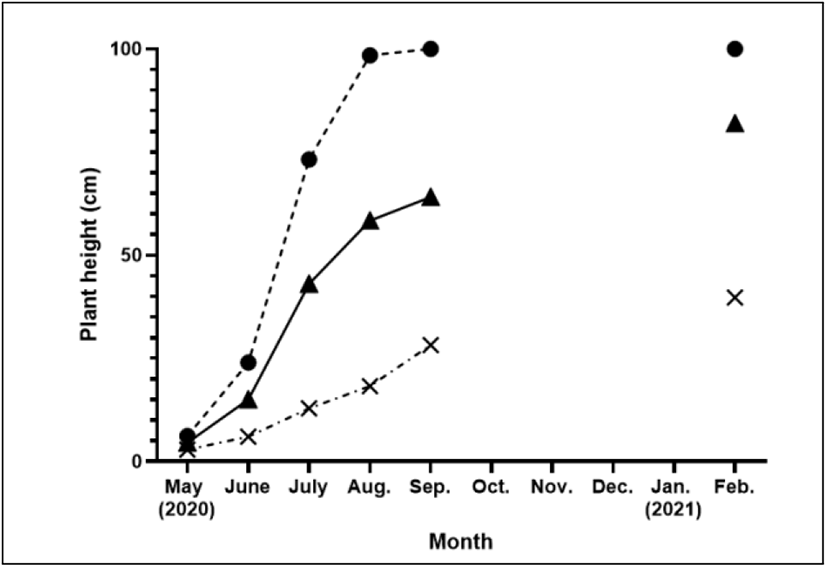
 Parthenocissus tricuspidata(담쟁이덩굴)
Parthenocissus tricuspidata(담쟁이덩굴)
 Hedera rhombea(송악)
Hedera rhombea(송악)
 Euonymus radicans cv. Aueonmarinata Rehd(금빛줄사철)
Euonymus radicans cv. Aueonmarinata Rehd(금빛줄사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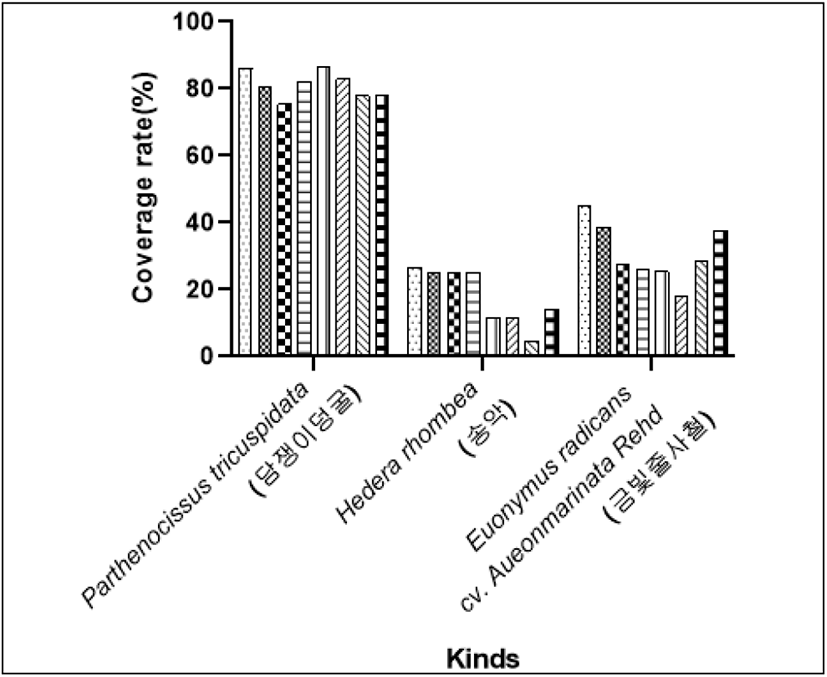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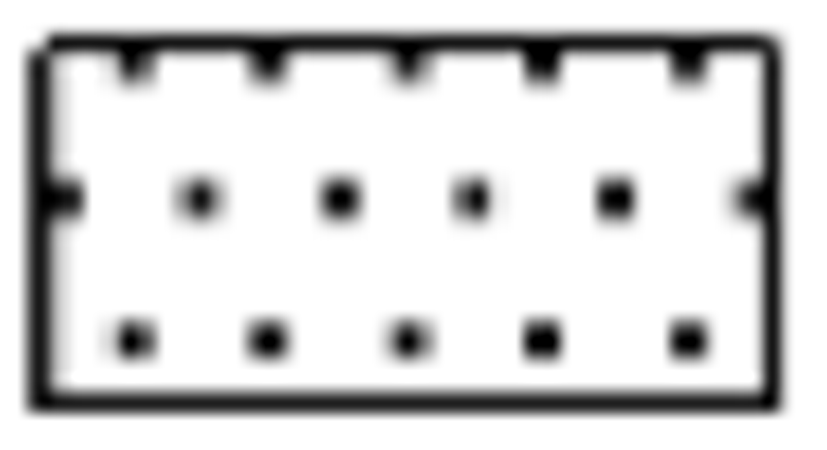 S
S  SE
SE  E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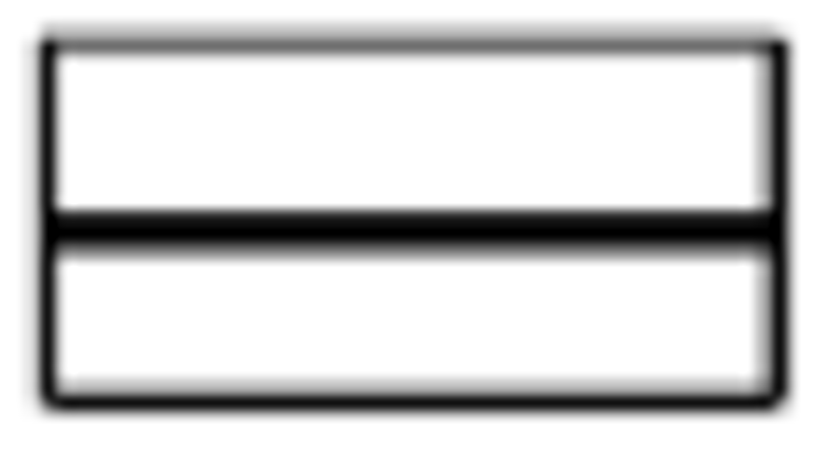 NE
NE  N
N  NW
NW  W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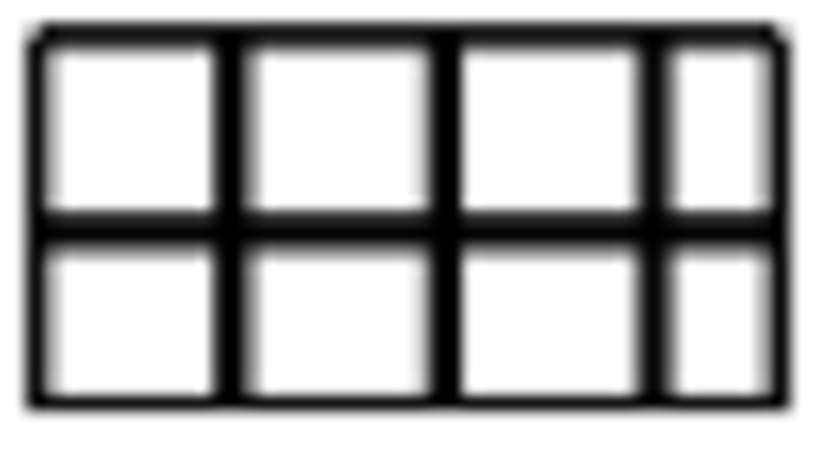 SW.
SW.
Ⅳ. 결론
본 연구는 벽면녹화에 자주 식재되는 식물 중 3종을 선정하여 방위별 생육을 나타내는 생장 및 피복률 차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은 5월 9일부터 9월 26일까지 진행하였으며, 담쟁이덩굴, 송악, 금빛줄사철 3종의 식물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위별 생장 특성을 살펴보면, 담쟁이덩굴의 경우 방위별 생장은 차이가 없었으며, 송악의 경우 방위별 생장은 남향에서 왕성하였고, 최종 생장 차이는 6.77cm이었다. 금빛줄사철의 경우 생장은 마향에서 생육이 왕성하였고, 최종 생장 차이는 29.87cm이었다. 둘째, 방위별 피복률을 살펴보면, 담쟁이덩굴의 경우 북향에서 86.67%로 가장 많이 피복하였고, 동향에서 75.36%로 가장 낮았다. 금빛줄사철의 경우 남향에서 44.89%로 가장 많이 피복하였고, 북서향에서 18.15%로 가장 낮았다. 송악의 경우 남향에서 26.56%로 가장 많이 피복하였고, 서향에서 4.66%로 가장 낮았다. 셋째, 식물종간 생장 특성을 살펴보자면 3종 모두 6~7월 사이 생육이 왕성하였으며, 담쟁이덩굴, 금빛줄사철, 송악 순으로 높았다. 담쟁이덩굴과 송악의 최종 생장차이는 57.03cm이었다. 넷째, 식물종간 피복률을 살펴보자면 담쟁이덩굴은 평균 81.18%를 피복하였고, 금빛줄사철은 평균 30.88%를 피복하였으며, 송악은 평균 18.04%를 피복하였다. 따라서 식물종간 피복률은 담쟁이덩굴, 금빛줄사철, 송악 순으로 높았다. 다섯째, 연구결과를 보아 벽면 녹화에 사용되는 모든 식물이 동일하게 생장하지 않으며, 방위로 인한 영향보다 식물생육 특성에 따라 생장특성이 더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앞서 국내 벽면녹화 지침을 살펴보자면 ME(1998)와 Sejong Metropolitan Autonomous City Building Code(2018) 4조 4항 4호가 방위별로 식재를 제한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낙엽성 식물인 담쟁이덩굴은 북향에서 생육이 왕성하였고, 3종의 식물 모두 북향에서의 생육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벽면녹화를 방위별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식물의 생육 특성을 파악하여 방위별로 알맞은 식물을 식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실험을 위해 제작된 벽면면적이 작아 방위별 표면온도와 조도의 차이가 작았고, 그에 따라 실험 환경으로서 표면온도와 조도가 식물생육에 미치는 영향 범위가 현실의 다양하고 큰 변이를 모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덩굴식물은 벽면녹화 방식에 따른 벽면녹화 보조재의 재료 및 재질과 일조시간이 연구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벽면녹화 보조재(PE 넷트)가 식물생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생육특성이 비슷한 식물종의 수를 다양하게 하고, 벽면을 크게 제작하여 다양한 변이의 표면온도, 조도, 일조, 재료 및 재질에 따른 식물생육의 차이 분석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