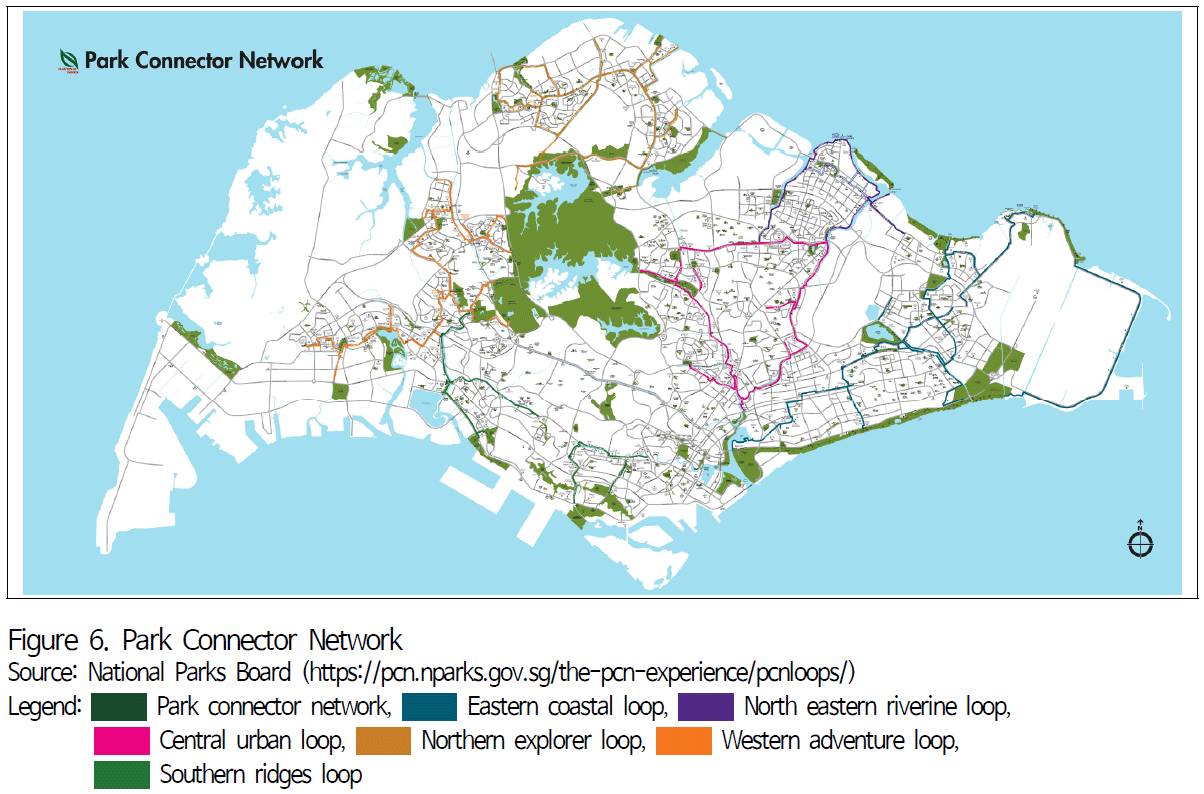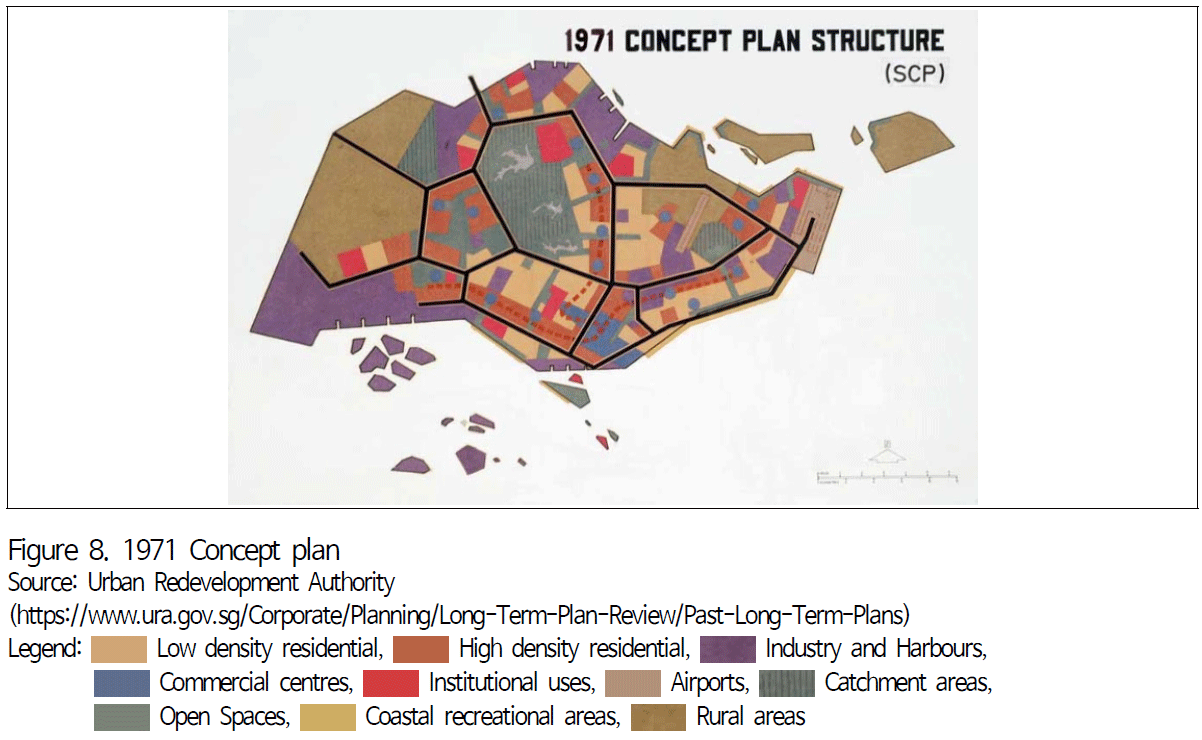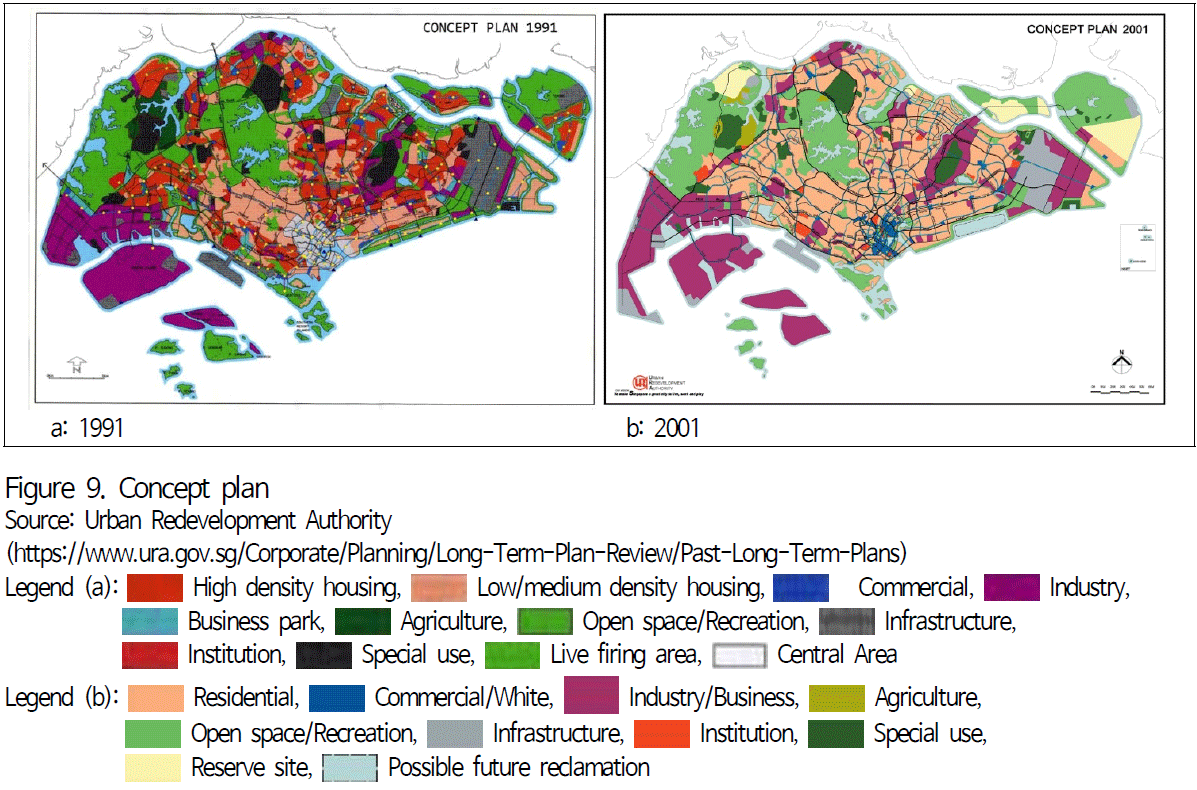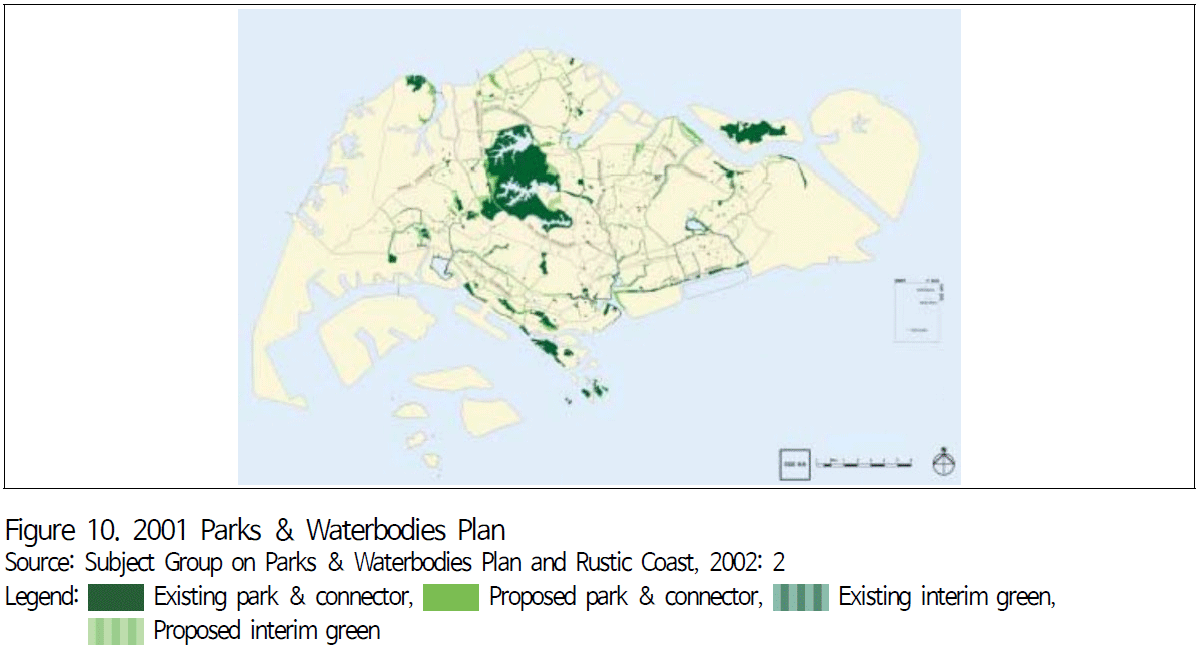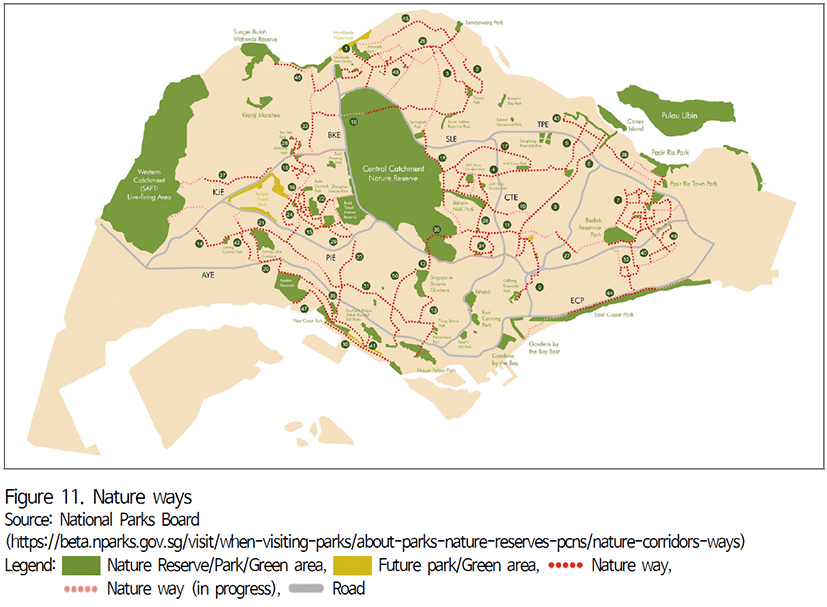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국에는 최근 ‘정원도시’ 붐이 불고 있다. 순천만 국가정원을 품은 생태도시 순천부터 태화강 국가정원 중심의 정원도시 울산, 해남의 정원도시 솔라시도, 서울의 정원도시 선언까지 최근 들어 30곳 넘는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정원을 도시 정책과 공간 정치의 전면에 내세웠다. 한국에서 정원과 도시의 결합은 비교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정원은 긴 시간동안 다양한 도시에서 호출되었고 특히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도시의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때 정원은 수목과 화초, 녹지와 같은 물리적인 요소로 도시 내부에 구현될 뿐만 아니라 정원에 담긴 개념과 정신이 상징적, 비유적으로 전체적 도시 개발을 이끌고 그 방향성을 설명하기도 한다. 정원이 도시적 맥락에서 계속해 동원되는 현상은 그 활용에 의의가 있음을 시사한다. 정원도시가 장식적이고 외면에만 치중한다거나 시대적 유행의 산물일 뿐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럼에도 정원은 계속해서 정치가와 행정가, 설계가에 의해 더 많은 도시에서 소환되고 있다. 사례가 계속해 축적되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다양한 선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원이 도시에 등장하는 맥락, 정원을 호출하는 의도와 연결되는 정책 기조 등을 면밀하게 탐구함으로써 현재의 정원도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평가하고 발전시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원도시의 대표적 선례인 싱가포르의 정책사를 해석한다. 싱가포르는 이미 1960년대부터 가로수, 수자원, 도시 위생, 기반 시설 등 다층적 맥락에서 친환경 도시 개발을 추진했다. 이를 대변하는 슬로건인 ‘가든 시티(Garden City, 정원도시)’가 1967년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했고, 이후 ‘시티 인 어 가든(City in a Garden, 정원 속 도시)’과 ‘시티 인 네이처(City in Nature, 자연 속 도시)’로 이어졌다. 법률 제정, 캠페인 진행, 정부 기관 신설, 개발 계획 등 다양한 정책이 이 슬로건 아래에서 일관되게 통합 진행되었다. 정원을 중심에 둔 친환경 도시 정책은 동남아시아의 작은 저개발국가 싱가포르가 금융․관광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기반이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핵심 비전으로 작동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사례는 친환경 정책을 통해 친환경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경제 개발, 국가 정체성 등을 통합한 선례로 남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인근 국가에서 교본처럼 활용되기도 했다. 싱가포르의 사례는 성공적 정책으로 광범위하게 평가받고 있을 뿐 아니라, 인민행동당의 연속적 집권에 따라 계획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왔고 다양하고 다층적인 정책 자료가 체계적으로 보관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연구 대상으로 적합하다.
정책 실현이 성공적으로 평가되며 연구 자료로서 일관성과 접근성을 가진다는 점 외에 더욱 중요한 것은 싱가포르의 도시 정책이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정원을 넘어 정원의 상징과 정신을 반영해왔다는 점이다. 싱가포르는 자국의 도시 개발 방향성을 설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원 개념을 동원했는데, 이는 오랜 기간 정책을 대변하는 슬로건이었던 ‘가든 시티’와 ‘시티 인 어 가든’에 공통적으로 등장할 뿐 아니라 다양한 정부 보고서와 홍보물에도 반복해 사용되었다. 이처럼 싱가포르 정부의 정원은 물리적 장소를 나타내는 개념을 넘어 각 시기와 맥락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기조를 담고 있는 개념이며, 따라서 중요한 해석의 대상이 된다.
본 연구는 정원 개념에 토대를 둔 슬로건의 변화를 중심으로 싱가포르의 친환경 도시 개발 정책1)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특히 구체적 정책 예시와 전반적 정책 기조가 정원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하고자 하며, 정책이 전개됨에 따라 자연과 도시의 관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리고 그러한 관계가 어떻게 슬로건과 정책에 반영되는지 조회하고자 한다. 정부 설립부터 현재까지 싱가포르의 정책에서 정원, 자연, 도시가 어떻게 부각되고 어떤 관계를 맺는지 해석함으로써 정원이 도시와 자연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다양한 양상을 파악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관점과 자료
싱가포르의 도시 개발과 정책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싱가포르 정부, 싱가포르국립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관련 국가 기관에 의해 진행되어왔다2). 정책 전개 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거나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정책의 양적 성과를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지만, 특별한 관점으로 정책을 해석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이를테면 릴리 콩과 브렌다 여(Kong and Yeoh, 1996), 벨린다 유엔(Yuen, 1996), 다니엘 고(Goh, 2001), 기옥 링 우이(Ooi, 2002), 피터 테오(Teo, 2004), 스티븐 벨리그리니스와 리처드 웰러(Velegrinis and Weller, 2012) 준이 옹(Ong, 2016)과 한희진(Han, 2017)은 정부의 성격과 역할, 자연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싱가포르의 친환경 도시 정책을 연구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연구 경향을 파악했으며, 관련 정책들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해석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에 더해 시기와 방법, 대상과 관점을 확장해 선행 연구를 보완하며 관련 연구 지형을 발전한다.
벨린다 유엔(Yuen, 1996)의 연구는 1960~1990년대 싱가포르 공원 정책의 발전 과정과 양상을 살피며 주요 시기와 요소를 밝혔으며, 준이 옹(Ong, 2016)의 연구는 1967년부터 2010년까지 친환경 도시 정책의 흐름을 정리하며 각 시기 정책의 중심을 논한다. 두 연구는 전반적인 정책의 흐름을 정리했으나 특정한 관점으로 장기간의 정책을 심층 해석하기보다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경향성 위주로 파악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더불어 벨린다 유엔의 연구는 1990년대에 이루어졌기에 그 이후 정책 변화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들을 정책 전반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기초 자료 정도로 참고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들도 있다. 예컨대 다니엘 고(Goh, 2001)는 비정부 비영리 환경주의 단체인 싱가포르 자연 협회(Nature Society Singapore, NSS)와 정부 사이의 역학을 하버마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했고, 기옥 링 우이(Ooi, 2002)는 환경 보전 정책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발전우선주의를 재검토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한희진(Han, 2017)은 발전주의 정부의 도시 개발에서 나타난 환경주의의 권위주의적 양상을 분석한다. 이러한 류의 연구는 공통적으로 구체적인 정책 사례를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했다. 다양한 시기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심층적 해석을 담고 있어서 본 연구도 기초 자료로 활용했지만, 각 연구가 다룬 시기와 사례, 관점이 한정적이라는 한계도 존재한다.
싱가포르 도시에서 자연이 인간의 시선에서 자원화되었음을 지적하는 릴리 콩과 브렌다 여(Kong and Yeoh, 1996)의 연구, 그리고 친환경 정책 중 하나인 ‘깨끗한 녹색 주간(Clean and Green Week)’에 사용된 슬로건 14개를 분석해 정부의 의도를 재검토한 피터 테오(Teo, 2004)의 연구는 본 연구와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정책과 도시 개발 양상에는 해당 시기의 가치와 목표가 담겨 있으며(Kong and Yeoh, 1996), 특히 국가적 캠페인은 정부가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를 반영하며 이를 강화하고 전파하므로(Teo, 2004) 각 시기의 정부 정책이 표상하는 성격을 재해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1990년대 정책까지만 다룬 릴리 콩과 브렌다 여의 연구와 한 정책만의 슬로건을 분석한 피터 테오의 연구를 시기와 범위의 측면에서 확장하고자 한다.
스티븐 벨리그리니스와 리처드 웰러(Velegrinis and Weller, 2012)의 연구는 정원 개념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의 도시 개발을 살핀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와 깊이 관련된다. 특히 이 연구는 자연과 문화가 균형을 이루고 정신적 합일을 이루는 정원도시에 대해 언급하며 싱가포르가 과연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정책이 아닌 도시의 물리적 외관과 구체적 설계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삼았으며 각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이를 주로 경관 개념과 연결했다는 점에서 싱가포르의 도시 정책에서 나타나는 정원 개념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해당 연구에서 싱가포르 정부의 정원 개념 사용을 실용주의적이지만 다소 평면적이고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정부 정책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설계자와 설계 회사를 중심으로 6개의 프로젝트만 검토했기에 비판점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정원 개념을 중심에 두고 싱가포르의 정책을 해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오랜 기간 정부가 수집하고 정리한 싱가포르 국립아카이브(National Archives of Singapore)에 보관된 정부 간행물과 자료, 그밖에 관련 부서와 인사가 집필하고 발행한 자료 등이다. 싱가포르 국립 아카이브는 정부 수립 3년 후인 1968년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국립도서관위원회(National Library Board) 산하 기관인 싱가포르 최대의 정보 기록관이다. 싱가포르의 정치․사회․경제적 역사와 관련된 각종 정부 회의 자료, 관련 인사의 연설문 등과 같은 공식 문서를 비롯해 사진과 건축 도면, 지도, 포스터, 영상 등 다양한 매체의 공식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특히 해당 아카이브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 대부분은 아카이브 온라인(Archives Online)을 통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접근할 수 있으며, 키워드, 자료 유형, 날짜를 기준으로 관련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국립도서관위원회가 운영하는 신문 아카이브 웹페이지인 뉴스페이퍼에스지(NewspaperSG)에서는 1827년 이후 발간된 모든 신문을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앞의 두 자료원을 이용해 주요 연구 자료를 수집했다. 가든, 가든 시티, 시티 인 어 가든, 시티 인 네이처 등의 키워드로 검색된 자료 중 도시 개발 정책과 캠페인, 슬로건 등과 관련된 자료를 선별해 사용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싱가포르의 도시 개발 관련 정부 부처인 국토개발부(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국립공원위원회(National Parks Board), 도시재개발청(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환경청(National Environment Agency), 살기좋은도시센터(Centre for Livable Cities)의 웹페이지, 싱가포르 정부가 운영하는 싱가포르 역사 온라인 정보 웹페이지(HistorySG), 싱가포르 관련 백과사전 웹페이지(Singapore Infopedia)의 관련 자료 또한 참고했다. 싱가포르 초대 총리이자 초기 발전을 이끈 리콴유(Lee Kuan Yew)의 자서전『From Third World to First: Singapore and the Asian Economic Boom』(Lee, 2000), 살기좋은도시센터의 연구소장으로 다수의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리민 희(Limin Hee)가 피터 로에(Peter G. Rowe)와 공동 집필한 『A City in Blue and Green』(Rowe and Hee, 2019), 국립공원위원회가 편찬한『Living in a Garden: The Greening of Singapore』(Auger, 2013) 역시 연구의 주요 자료로 사용했다. 정부 기관이 관리하고 제공하는 이러한 자료들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정책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자료다. 또한 정부의 성격이 크게 바뀌지 않고 일관적으로 유지된 싱가포르의 정치적 특성상 관련 인물들의 저서는 특히 유효한 연구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헌 자료들 외에 본 연구는 싱가포르 식물원(Singapore Botanic Gardens)의 헤리티지 박물관(Heritage Museum)과 CDL 그린 갤러리(CDL Green Gallery)의 전시, 싱가포르 도시 갤러리(Singapore City Gallery)의 영구 전시와 2022년 7월 6일부터 8월 4일까지 개최된 장기 계획 리뷰(Long-Term Plan Review) 전시의 내용 또한 연구 자료로 사용했다. 이러한 전시들은 싱가포르의 도시 변화 과정, 도시 녹화를 위한 노력,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 등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장기 계획 리뷰 전시는 도시 개발 계획 수립에 대한 시민 피드백을 위해 도시재개발청이 기획한 것으로, 가장 최신의 도시 개발 동향과 미래 방향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 자료로서 큰 가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1960년대 초기 정책부터 현재까지 싱가포르의 친환경 도시 정책의 흐름과 정원 개념의 변화 양상을 파악했으며, 각 자료에 사용된 용어와 표현을 재정리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정리와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앞의 선행 연구들을 참고해 각 시기 정부의 정책 전개 방식을 도출한 후 이를 정원 개념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구분해 관련 정책의 변화 양상을 해석했다(3-5장).
3. 초기: 자연의 관리・통제와 이상적 자연의 외관 형성
1959년 싱가포르 정부가 수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친환경 도시 정책이 시작된다. 당시 싱가포르의 도시 경관은 지금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Figure 1 참조). 1819년부터 지속된 영국의 식민 지배 이래로 싱가포르의 녹지 훼손이 진행되어 우림과 맹그로브의 98%가 사라졌으며(Velegrinis and Weller, 2007), 도시화와 산업화가 낳은 급속한 인구 증가, 주택 부족, 기반 시설 부족, 황폐화 등 다양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었다(Kong and Yeoh, 1996). 이런 역사적 과정을 통해 1960년대의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슬럼을 가지게 되었다(Yuen,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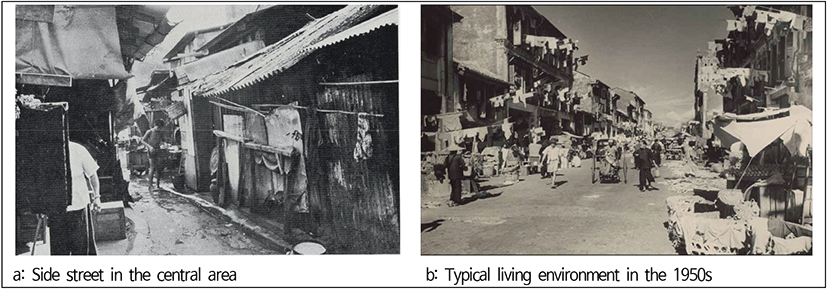
이를 배경으로 싱가포르의 초대 총리이자 초기 도시 설계를 주도했다고 평가받는 리콴유는 ‘깨끗한 녹색(clean and green)’ 싱가포르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나선다. 그는 대중 연설과 각료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친환경 도시 개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1963년부터 이미 진행된 나무 심기 캠페인을 필두로 1967년부터는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1967년 5월 선언한 가든 시티 캠페인(Garden City Campaign)은 전 국가 단위의 대형 녹화 프로젝트였는데,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공공사업부(Public Works Department) 산하에 특별 분과인 공원 및 수목 분과(Parks and Trees Division)가 설립되었다. 이어 1970년에는 국토개발부 산하에 정원도시실행위원회(Garden City Action Committee)가 신설되어 정원도시 캠페인과 관련된 각 정부 기관의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리콴유의 목표가 ‘깨끗한 녹색 도시’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 정화는 도시 녹화와 더불어 정원도시 캠페인의 중요한 축이었다. 이와 관련해 정원도시 계획이 발표되고 4개월 후인 1967년 9월에는 거리의 쓰레기를 치우는 공공 캠페인이, 1968년 10월에는 ‘싱가포르 깨끗하게 만들기(Keep Singapore Clean)’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1969년 1월 2일에는 공공장소의 위생 기준, 쓰레기 처리 방법, 쓰레기 투기에 대한 처벌 등 도시 청결과 위생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환경공공보건법(Environmental Public Health Act)이 제정되었다.
초기의 이러한 정책들은 풍성한 식재와 깨끗함이라는 정원의 외관을 재현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리콴유의 목표인 정원도시는 주요 도로와 거리를 따라 나무를 빼곡히 심고 가로등과 육교 등의 시설이 식재로 ‘위장(camouflage)’되어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다(Yuen, 1996)(Figure 2 참조). 중앙 분리대 등의 도로 시설물과 주차장 역시 위장의 대상이 되었다. 이때 식물들은 밝은색 꽃과 잎이 있는 것, 그리고 ‘인스턴트 나무’라 불릴 정도로 초기 생장 속도가 빠른 것으로 선별되었다. 도시 녹화에는 공공뿐 아니라 사적 영역도 동원되었는데, 정부는 상점 주인들이 가게 바깥에 화분을 비치하도록 유도했으며 특히 중심가에서는 이와 관련해 세금 공제 혜택도 주어졌다(Yuen, 1996). 1971년 첫 식목일에는 학생과 군인이 동원되어 당일에 3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기도 했다. 이 시기의 목표는 빠르고 아름답게 도시를 식물로 덮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Figure 3 참조). 초기 정책 전반을 이끈 공원 및 수목 분과의 설립 당시 해당 분과에 기대된 역할 역시 도시에 아름다운 경치를 부여하는 데에 조언하는 것이었다(The Straits Times, 1967. 4. 19.). 도시의 ‘녹색’은 장식을 위한 소재이자 수단으로 동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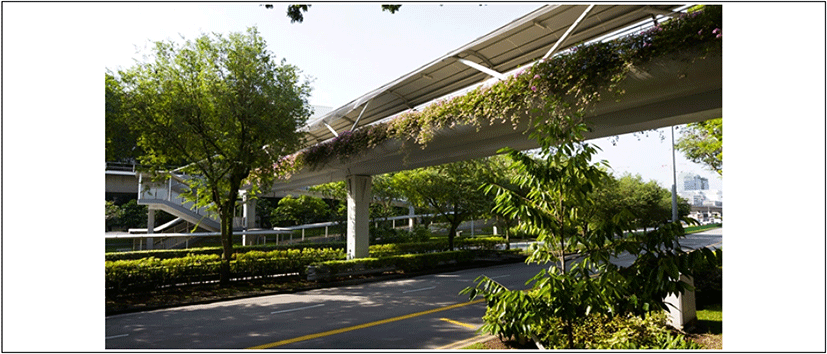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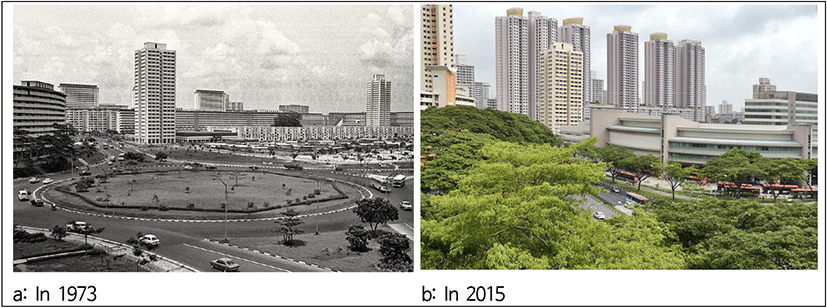
정화 정책에서도 도시의 외관을 빠르게 변모시키는 것이 초기 정책의 중심이었다. 1967년 시작된 거리의 쓰레기 치우기 캠페인은 싱가포르를 매력적이고 깨끗한 정원도시를 바꾸기 위한 것으로 홍보되었으며, 이 캠페인은 주민들이 공공 청소에 참여할 것을 강하게 독려했다. 환경공공보건법은 다양한 내용의 규제를 담고 있었는데, 말 그대로 ‘공공보건’을 위한 의료 허가제와 음식 판매 위생 규제뿐만 아니라 거리 미관을 위한 규제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 법의 도입으로 거리에 무분별하게 산재했던 야외 상점들이 하나의 구역으로 옮겨졌으며 도시 시설을 더럽히는 껌의 판매가 금지되었다. 쓰레기 투기에 대한 벌금이 크게 높아졌으며, 건물과 주택 단지 내부의 초목이 과도하게 자라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건물주의 법적 책임이 되었다. 택시 허가제를 통해 도로변에 정차하던 ‘불법’ 택시의 수를 줄였다. 이렇듯 환경공공보건법은 공공보건만큼이나 거리 미관과 도시 경관을 통제하기 위한 법령이었다. 해당 법률의 입법 과정에서 당시 보건부 장관(Minister for Health)은 정부의 목적을 “싱가포르를 깨끗한 녹색 도시로 변모시키는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다(Parliament of Singapore, 1968: col. 396). 도시의 정화에 청결을 넘어 정돈됨과 질서의 의미가 함축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도시가 외적으로 이상적인 정원의 모습을 갖추도록 한 초기 정책들은 외부자의 시각에 기준을 두고 있다. 실제로 초기 정원도시 비전의 목적은 외적 기준의 성취와 깊이 연관되었는데, 리콴유 총리에게 깨끗한 녹색 싱가포르 개발은 제3세계와 싱가포르를 구분하고 선진국 수준을 달성해 동남아시아의 산업․관광 중심지가 되기 위한 전략이었다(Lee, 2000). 그는 싱가포르 깨끗하게 만들기 캠페인 개시 연설에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깨끗하고 푸르른 도시라는 자리를 얻는 것보다 확실하고 의미 있는 성공 보증서는 없다”고 말했다(Ministry of Culture, 1968). 그는 또한 잘 정리된 녹색 도시를 보여주는 것이 외국 고위층과 기업인에게 싱가포르 정부가 효율적이고 믿을 만하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Teo, 2004; Rowe and Hee, 2019)이며 그들로 하여금 싱가포르를 매력적인 투자처로 여기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로 1971년 1월, 26개국 정상이 모이는 영연방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리콴유 총리는 공항에서 도심지로 이어지는 도로의 녹화를 꼼꼼하게 점검했으며, 방문객들에게 싱가포르의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을 정부 관리들에게 요구했다(Lee, 2000). 공항에서 이어지는 도로가 한 나라의 중요한 첫인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런 흐름은 이후에도 일관적으로 이어졌는데, 1981년 문을 연 창이공항(Changi Airport)은 처음부터 건물 외부에 15,754 그루의 교목과 76,472 그루의 관목을 심은 상태로 운영했으며, 1988년 리콴유 총리는 다른 나라와의 차별성을 위해 야자수를 심을 것을 특별히 지시하기도 했다(Auger, 2013)(Figure 4 참조). 국가 이미지 재고를 위한 총리의 이러한 요구가 그의 자서전 ‘싱가포르 녹화하기(Greening Singapore)’ 장에 담겨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싱가포르의 초기 정원도시 정책을 외부에 이상적이고 통제된 경관으로 비추어지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해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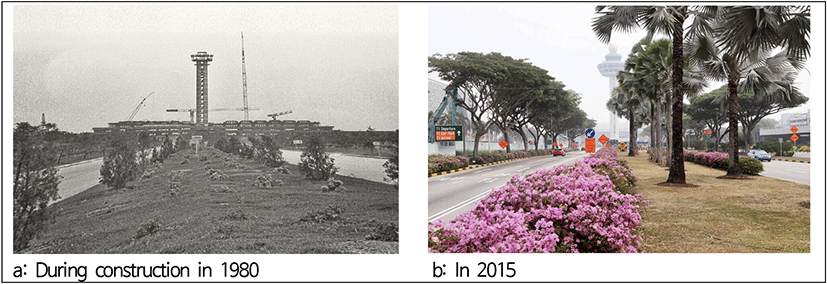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어 그 대상이 해외 관광객으로 확장되었으며(Goh, 2001), 싱가포르 관광진흥위원회(Singapore Tourist Promotion Board)를 비롯한 정부 기관은 관광 포스터와 상품 디자인에서 지속적으로 녹지와 열대 동식물 등 푸르른 도시의 모습을 강조하였다(Figure 5 참조), 1987년 싱가포르 관광진흥위원회는 관광 분야의 최고 기여상(Outstanding Contribution to Tourism Award)을 공원 및 여가부(Parks and Recreation Department)에 수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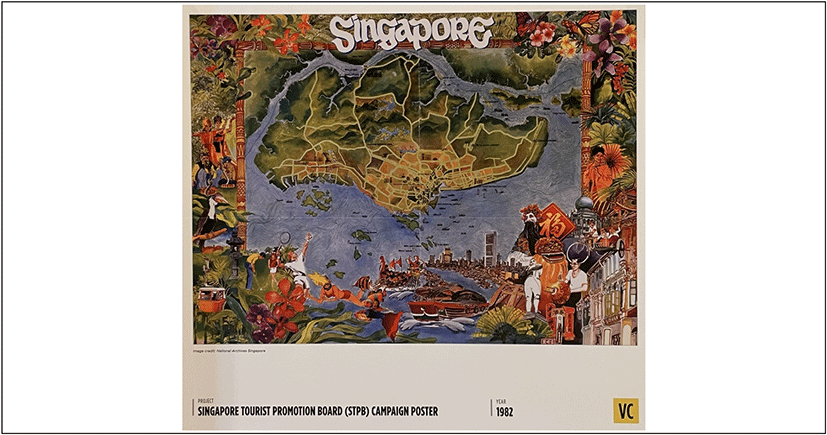
깨끗한 녹색 싱가포르, 정원도시 싱가포르를 향한 초기의 노력들에 대해서는 비판이 공존한다. 벨린다 유엔은 그러한 정책이 “환경적이기보다는 경제적이고, 자연적이기보다는 인위적이며, 생태적이기보다는 표면적”(Yuen, 1996: 957)이라고 비판했으며, 스티븐 벨레그리니스와 리처드 웰러(Velegrinis and Weller, 2007)는 싱가포르의 도시 개발 양상을 정원도시가 아니라 그저 정원처럼 보이는(gardenesque) 도시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인간의 통제와 관리로 이상적 외관의 자연을 가꾸는 데 치중한 정책 기조는 장식적 공간으로서 정원의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으며 질서정연하고 외적으로 아름다운 정원의 이미지를 투영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초기 정책에 정원의 표면적이고 평면적인 이미지가 투영된 것은 분명하지만,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정원이라는 수사(rhetoric)의 사용에 정책적 효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정원 같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정책은 녹지와 관련 시설의 물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도시인의 생활 양식과 가치관까지도 변화시키는 대규모 도시 정화․개편 정책이었다(Craig, 2008). 그 출발점에서 시민들이 정책에 동조하고 따르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원은 정책의 목적을 시민들에게 시각적으로 전달하고 정부가 어떤 목표로 관련 정책을 펼치는지 파악하게 하는 효과적인 수사였다. 1960~1970년대 싱가포르에서 ‘자연적’이나 ‘자연친화적’ 도시는 적절한 수사가 아니었을 것이다. 리콴유는 그의 이상인 정원도시는 토착의 자연(native) 지역보다 깨끗하고 푸르른 곳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Lee, 2000). 당시 자연이란 개발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은 더러운 날것이었으며 정원에 반대에 위치했다. 싱가포르 강(Singapore River)은 오염되어 악취가 났으며 도심의 빈 땅과 녹지는 황폐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원은 눈앞에 있는 자연과 달리 아름답게 관리된 도시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끔 하는 개념으로 시민들에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처럼 정원이라는 수사를 통해 싱가포르 정부는 정책 목표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정원과 함께 연상되는 정원사(gardener) 개념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가치관 변화를 유도했다. 일례로 1967년에 정부는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나무 심기 캠페인이 성공적이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대중의 관리와 관심 부족을 지적하면서 시민들을 도시라는 정원의 정원사로 호출하며 수목에 대한 돌봄의 마음을 가지고 집 근처 수목을 돌볼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The Straits Times, 1967).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원을 동원한 싱가포르의 초기 정책은 정원의 단편적 특질을 앞세우고 자연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놓으며 정원의 외관에 집중했다. 하지만 동시에 정원은 당시 맥락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사 장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이 시기의 장식적 정원 개념을 경유해 싱가포르의 친환경 도시 정책이 발전해나갔다는 점이다.
4. 전개: 인프라스트럭처와 체계, 인간으로 중심 이동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친환경 도시 개발 정책의 중심이 도시의 미관과 녹화에서 규모와 구조가 훨씬 커진 녹지와 수자원의 통합 체계로 조금씩 이동해간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체계를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 즉 여가의 이슈가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정부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1970년에는 총리실 산하에 반오염부서(Anti-Pollution Unit)가, 1972년에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가 신설되었으며 1986년에는 이 두 부서가 통합된다. 1989년에는 도시재개발청 산하에 수자원 설계 부서(Waterbodies Design Panel)가 신설되어 주요 수자원의 설계와 미적 측면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게 되었다. 2001년에는 전기, 수도, 가스를 총괄하던 기존의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Board)가 수도국으로 개편되어 수도와 수자원만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2002년에는 환경부의 정책 실천 부문을 새롭게 담당할 환경청이 개설되어 정책의 계획과 실천을 각각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 2004년에는 환경부가 환경수자원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Water Resources)로 이름을 변경한다. 녹지 및 공원과 관련해서는 1975년에 기존의 공원 및 수목 분과와 싱가포르 식물원이 국토개발부 산하의 공원 및 여가부로 합병된다. 1990년에 두 개의 국립공원과 자연보호구역(nature reserves)을 관리하는 국립공원위원회가 만들어졌고, 1996년에는 공원 및 여가부까지 통합해 모든 업무를 국립공원위원회가 담당하게 되었다.
약 30년 동안 정부의 많은 관련 부처가 신설되고 통합되었지만, 중요도가 높아진 업무를 세부적으로 담당할 단위를 만들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단위를 재구성하는 등 업무 분장의 효율성을 추구한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공원 및 녹지 차원에서는 여가 측면의 중요도가 새롭게 인식되었으며 수목과 녹지, 공원과 자연보호지역을 단일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다루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 환경부와 국가환경청의 설립은 기존의 오염이나 정화와 같은 세부 문제 위주의 정책 전개 단위에서 환경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단위로의 이동을 나타낸다. 수자원을 담당하는 단위가 별도로 만들어진 변화 역시 이의 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커졌으며 수자원을 기능뿐 아니라 다차원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친환경 도시 개발 정책을 한층 더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려는 움직임은 구체적인 실행 정책에서도 발견된다. 녹지와 관련해서 싱가포르 정부는 도시의 녹화를 장식적이고 부가적인 것으로 간주하던 차원에 더해 이를 도시 개발의 필수적인 차원으로 인식하고 자체적인 체계를 수립한다. 가장 근간이 되는 공원 및 수목법(Parks and Trees Act)은 1975년에 제정되며 국가 개발과 사적 개발에서 녹지 확보를 법제화함으로써 녹지를 도시 개발의 필수적 요소로 포함시켰다. 녹지의 관리에 있어서 정부는 가로수부터 근린공원, 도시공원, 국가공원의 위계를 수립하고 각 층위에 맞는 정책을 실행한다. 다양한 성격과 위계의 녹지를 연결하는 공원 연결망(park connector) 개념이 등장하며 각 녹지를 특성에 맞게 세부적으로, 그리고 국토 전체를 아우르는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다루는 녹색 인프라 계획이 수립된다. 이런 체계를 기반으로 세부 녹지에 대한 관리 계획과 신규 개발 계획이 운영된다. 개념적 도입 외에도 1992년에는 최초의 물리적 공원 연결망인 칼랑 공원 연결망(Kallang Park Connector)이 만들어져 비샨-앙모키오 공원(Bishan-Ang Mo Kio Park)과 칼랑 강변 공원(Kallang Riverside Park)을 실제로 연결하였다(Figure 6 참조). 또한 녹지 관리에 있어 보전이 중요한 차원으로 등장하는데, 1990년 국립공원법(National Parks Act)으로 부킷 티마(Bukit Timah) 자연보호구역과 센트럴 캐치먼트(Central Catchment) 자연보호구역이 최초로 지정되었다. 이어서 1991년에는 공원 및 수목령(Parks and Trees Order)으로 맥리치(MatRichie)와 창이(Changi)에 수목보전지역(Tree Conservation Area)이 지정되었다. 2001년에는 유산수목계획(Heritage Tree Scheme)과 유산도로계획(Heritage Road Scheme)을 통해 사회적, 역사적, 미학적, 문화적 가치가 충분한 대형 수목과 가로가 보존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예전에는 자연과 녹지, 수목 개체가 도시를 치장하여 개발하는 외적 수단으로 동원되었다면, 이제는 자체적인 도시 체계의 필수 요소가 되거나 보호해야 하는 사회문화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
수자원 체계에서도 큰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1977년 싱가포르 강과 칼랑 분지(Kallang Basin)를 정화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는데, 이 정화 활동은 정책 초기 단계의 도시 정화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단순히 경관이나 청결의 차원만이 아니라 수자원의 차원에서 접근되었기 때문이다. 리콴유는 그의 자서전(Lee, 2000)에서 싱가포르 강과 같은 대형 수자원의 정화는 빗물을 모아 재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그러한 정화의 실행은 결국 삶의 질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해당 지역의 정화 계획은 쓰레기를 치우는 기초적인 작업뿐만 아니라 주변 관련 산업체와 가구의 입지 및 생활 방식을 바꾸는 더욱 근본적인 작업을 포함한다. 1986년에 강가를 따라 산책로가 조성되었고 주변 조경 작업이 함께 진행되면서 1987년 9월 2일 공식적 정화 작업이 종결된다(Figure 7 참조). 해당 장기 계획으로 시작된 수질 관리는 전 국토 차원의 수로와 수역 관리로 발전되었고, 공공사업위원회가 전국의 수로와 수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주체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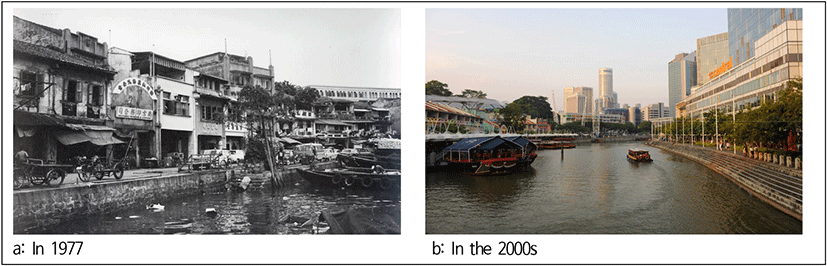
녹지와 수자원을 통합적인 체계로 접근하는 이런 정책적 변화는 장기적 국가개발계획인 기본 구상(Concept Plan)과 종합 계획(Master Plan)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3).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계획들에 녹지와 수자원이 중요한 도시 체계의 일부로 포함되었으며 이들의 체계와 연결망의 개념이 담겼다. 1971년과 1991년, 2001년에 발표된 기본 구상을 살펴보면, 각 계획에서 자연과 녹지, 수자원을 다루는 방식에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1971년 계획에서는 자연과 녹지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요 녹지와 저수지만 대략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반면(Figure 8 참조), 1991년과 2001년 계획에서는 구체적인 녹지의 위치와 수자원, 그 사이의 연결이 표현되어 있다(Figure 9 참조). 이에 더해 1991년에는 녹색 푸른색 계획(Green Blue Plan)이, 2001년에는 공원과 수자원계획(Parks and Waterbodies Plan)이 별도로 만들어져 전체 체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Figure 10 참조). 이 계획에서 녹지는 생태, 접근성 등에 따라 3단계로 분류되었으며 지역별 주요 녹지와 수자원의 구조가 구체적으로 다루어졌다. 이와 같이 정책의 중심이 이동하면서 수자원과 녹지는 더 이상 개별적이고 분리된 대상이 아닌 하나의 통합적 도시 체계의 일부로 기능하게 된다.
녹지와 수자원의 체계화와 더불어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의 참여가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 점이다. 1990년 설립된 국립공원위원회는 공원을 계획하며 대중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찾고자 했으며 공원이 사람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노력했다. “(공원이) 기존에는 정부에 의해 하향식으로 제공되었다면, 이제는 대중의 요구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인다”(Auger, 2013: 60). 가령 이들은 부킷 티마 자연보호구역을 관리하면서 1991년 방문객 설문을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시설을 정비해 방문하기 더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려 했다. 동시에 방문객으로 인한 동식물 개체군 감소와 토양 침식 등을 해결하기 위해 내부의 주요 동선들을 수정했다. 자연보호구역에 있어서도 방문을 억제하기보다 방문자와 녹지를 어떻게 조율할 건지의 문제가 관리의 중요한 전제가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수자원과 관련해서 도시재개발청의 도시수변기본계획(Master Plan for the Urban Waterfronts) 및 싱가포르강 재개발계획(Singapore River Redevelopment Plan) 구상안의 목표는 주요 수체를 “야외 여가 활동을 위한 커다란 무대(setting for outdoor activity)”로 만드는 것이었다(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1990: 13). 비슷하게 2001년 실행된 수자원 공급, 배수, 하수, 및 전체 수자원 순환을 관장하는 ABC(Active, Beautiful, Clean) 수자원 계획은 자원의 하나로 물을 관리하는 것과 더불어 경계를 허물고 주위 녹지와 통합되도록 관리(Ng Lang, 2008; Centre for Liveable Cities, 2017)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수자원은 단순한 기반 시설을 넘어 사람들이 물을 접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대중의 참여를 도시 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독려하는 것은 초기의 정원도시 개념과 정원사 정신과 비교할 때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1990년 진행된 깨끗한 녹색 주간 착수식에서 제2대 싱가포르 총리인 고촉통(Goh Chok Tong)은 나무 심기 캠페인의 성공을 축하하면서도 도시의 청결과 질서를 위해서는 시민 개인의 내적 동기와 질서가 필수적임을 이야기한다(Ministry of Information and Arts, 1990). ‘깨끗한 녹색’이라는 같은 문구로 진행되는 정책이지만 이에 담긴 정원과 정원사의 개념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기존의 정책 초기 단계에서 시민들은 정원사가 되길 요구 받았지만 수목과 녹지는 그들이 경험하고 접하는 존재라기보다는 관리하고 가꾸어야 하는 존재였다. 외관을 훼손하지 않는 것, 이상적인 외양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가 시민들에게 정원사로서 부여한 목표였다. 가령, 타인의 소유물을 관리하는 것처럼 권위적 정부가 소유하는 수목과 녹지를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반면 정책의 중심이 이동하면서 시민들은 녹지와 수자원에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장려된다. 직접적 경험을 통해 수목과 녹지는 점점 시민들의 정원이 되며, 그러한 정원의 경험은 자연과 접촉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녹지를 가꾸거나 수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정원 안의 식물 개체와 호수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상호보완적이고 유기적인 하나의 세계를 돌보고 구성하는 차원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은 슬로건의 변화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2013년 싱가포르 정부는 기존에 사용하던 ‘정원도시(가든 시티)’ 대신 ‘정원 속 도시(시티 인 어 가든)’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정원도시에서 변화한 정원 속 도시를 공원과 가로 경관으로 이루어진 도시의 빈틈없는 녹색 인프라가 싱가포르 국민의 삶, 가정, 일터, 놀이터의 필수적 부분이 되는 곳이라고 설명한다(Auger, 2013). ‘정원도시’에서 정원은 도시를 설명하기 위해 동원된 대상으로, 정원도시는 정원 요소들이 있는 도시 혹은 정원처럼 보이는(또는 생긴) 도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 있듯, 깨끗하고 녹색이 가득한 도시의 외형을 정원에 빗대어 정원도시라는 이상으로 제시한 것이다. 반면, 한 발 나아간 비전인 ‘정원 속 도시’에서 정원은 도시의 기반이다. 정원이라는 체계 속에 도시가 놓이게 된다. 이때 정원은 더 이상 시각적, 장식적 장소가 아닌 하나의 판(surface)이자 사람들이 활동하고 교류하는 장(field)의 지위를 획득한다.
물론 이런 변화 속에서도 초기 정책에서 보이는 외관 중심적 양상이나 인간의 효용 위주로 자연을 대하는 양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1992년 싱가포르 녹색계획(Singapore Green Plan)에 제시된 자연보존지역 선정의 기준은 “토지 사용의 기회비용, 주변 개발과의 공존 가능성, 여가, 교육, 연구 가능성”(Ministry of Environment, 1993: 49; Goh, 2001 재인용) 등으로, 이에 따라 지역의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유용하고 가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세노코(Senoko) 지역의 조류 서식지를 개발해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건설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환경부는 새들이 “빈 땅을 점유하고 소유권을 주장했다”며 “새보다 싱가폴 국민의 필요가 우선이다”고 말했다(Goh, 2001: 19). 또한 환경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윤을 이유로 부킷 티마 자연보호구역과 센트럴 캐치먼트 자연보호구역 사이의 고속도로 건설이 강행되었다. 초기의 외부적 요인에 중심을 둔 경제적 동인이 아니더라도, 인간에게 자연이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경험적 효용에 중심을 둔다는 점에서 여전히 외부적인 정원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경제적 요인이 크고 외관을 중요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유효한 개념적 변화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앞에서 논의한 바 있듯 새로운 중심에 초점을 두고 이전 시기와는 이질적이고 변화된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이 활발히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시기에 진행된 중심 이동은 이후 한층 더 자연친화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 즉 도시와 자연의 거리를 더욱 좁힐 수 있게끔 한 배경이 된다. 정원의 외향을 재현하는 것에만 집중하던 ‘정원도시’에서 정원의 특질을 체계로 구성해 이를 도시의 기반으로 놓는 ‘정원 속 도시’로의 변화에서 정원은 도시와 자연 사이의 다리, 즉 경유지가 된다.
5. 도약: 자연으로 돌아가는 도시
싱가포르 녹색계획 2030(Singapore Green Plan 2030)을 발표하면서 싱가포르는 ‘정원 속 도시’에서 한 걸음 더 도약해 ‘자연 속 도시(시티 인 네이처)’라는 세 번째 슬로건을 내세운다. 이는 정원 개념을 자연으로 확장시키며 자연과 인간의 접점이었던 정원에서 나아가 아예 자연 속으로 도시를 삽입할 것을 이야기한다. 이 새로운 슬로건은 이르게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루어진 정책적 변화를 반영한다. 이 단계에서 싱가포르는 지속가능한 바이오필릭(biophilic) 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
환경 문제에 대한 전 지구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싱가포르는 다른 국가들보다 조금 일찍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한 계획인 싱가포르 녹색계획을 1992년 유엔 환경계획(UNEP)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에서 발표했다. 이 계획은 대기 오염이나 온실가스 방출을 극복해 깨끗한 녹색 도시를 만들겠다는 기존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이를 기반으로 2002년에 새로 발표한 SGP 2012부터는 ‘지속가능성’ 개념을 새롭게 담게 된다. 특히 이 계획에는 녹지와 관련해서 생물다양성과 녹지축 구성이 처음으로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이후 이러한 경향성이 이어진다. 이후 정책 개발에 있어 그 방향성에 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2005년, 2009년, 2014년에 각각 SGP의 후속인 SGP 2012 개정안과 지속가능한 싱가포르 청사진(Sustainable Singapore Blueprint), 지속가능한 싱가포르 청사진 2015가 발표되었다. 가장 최근인 2021년에는 SGP의 세 번째 개정안인 SGP 2030이 발표되었다. 정부 부처와 기관의 차원에서는 2008년 6월에 설립된 살기좋은도시센터가 현재까지도 지속가능성, 삶의 질, 도시 녹지 및 여가 등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2020년에 들어서 환경수자원부는 그 명칭을 지속가능환경부(Ministry of Sustainability and the Environment)로 변경하며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을 정부가 강하게 인식하고 있을 보여주었다.
2005년 개정된 공원 및 수목법은 주요 녹지에 완충 녹지를 조성할 것, 생물다양성과 생태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 정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규정했다. 2013년부터 조성한 자연길(Nature Way)은 동식물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도시 생태계의 기능을 촉진하게 한 길이며 생태적 고려에 토대를 두고 있다(Figure 11 참조). 같은 해 부킷 티마와 센트럴 캐치먼트 두 자연보호구역을 가로지르는 부킷 티마 고속도로에 에코링크(Eco-Link@BKE)라는 생태 통로가 건설되기도 했다. 또한 2020년에는 로니 자연 코리더(Lornie Nature Corridor)가 최초의 자연 코리더로 조성되어 공원 연결망, 자연길, 자연보존구역을 통합적으로 묶어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자연길은 그 조성의 목적이 인간의 이용이나 경제적 효용이 아닌 동물과 식물, 그리고 이들이 구성하는 전반적인 생태계를 위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구성된 자연 코리더에서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 정책과 이 외 자연 행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 함께 체계를 이루어 동등한 중요도로 다루어지는 것이다. 이어서 2021년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생태 프로파일링(Ecological Profiling Exercise)이 진행되어 행위자기반모델링(agent-based modeling)과 최소저항경로(least-resistance pathway) 등 과학적 방법론을 동원해 주요 서식지와 완충 서식지, 생태 코리더 등 추후 계획의 기반이 될 생태 현황을 조사했다. 2022년 6월에서 8월까지 추후 10년의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한 대중 피드백을 받기 위해 도시재개발청이 진행한 전시는 생태 프로파일링의 심화, 자연길과 자연보호구역 등 녹지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재야생화, 생물다양성 촉진을 위한 대안 서식처 형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의 방향성은 도시의 중요한 요소인 건물에도 적용되었다. 2009년 10월 싱가포르 녹색건물협의회(Singapore Green Building Council)가 꾸려졌고 건물 녹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금을 제공하는 건물녹화인센티브제(Skyrise Greenery Incentive Scheme)가 실행되었다. 2011년에는 싱가포르 녹색건물협의회 녹색마크인증제(SGBC Green Mark Certification)가 시작되어 더욱 적극적으로 건물 녹화와 친환경 자재 사용을 장려했다. 녹지와 수자원 같이 도시가 아닌 자연이라고 여겨지던 대상에 국한되던 친환경 정책이 건물에도 확장되면서 싱가포르 정부는 도시 속 자연을 잘 관리하기 위한 친환경 정책에서 도시 전반의 운영 원리와 구성을 환경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친환경 정책으로 그 기조를 바꾸기 위한 시도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변화와 함께 세 번째 슬로건인 ‘자연 속 도시(시티 인 네이처)’가 2020년 발표된다. 현재 싱가포르 친환경 도시 개발의 중심 기관 중 하나인 국립공원위원회는 기관 목표를 ‘자연 속 도시’ 슬로건으로 내걸며 녹지와 오픈스페이스, 수자원 체계의 구축과 지속적 재정비를 실행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강조되던 녹지의 확대와 연결, 수자원의 확장, 대중 이용 장려의 차원과 비슷해 보이지만 구체적인 정책 실천이나 사용된 기술, 정부에서 제공한 설명 등을 살펴보면 그 중심이 명확하게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자연길을 통해 녹지를 연결하는 정책은 기존 녹지 연결망과 개념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전과 달리 연결 대상 지역을 생태적으로 면밀히 분석해 내부의 주요 서식처와 완충 서식처를 파악한 후 길을 설계했다는 점, 단순한 도로 녹화와 달리 해당 지역의 새와 나비를 고려한 다층 식재로 계획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도시 공간의 형태를 보기에는 녹화된 길이라는 점에서 정원도시, 정원 속 도시 시기의 정책과 동질적으로 보이지만, 도시의 목표상과 세부 방법론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가로 녹화 정책도 초기 시기에는 가로의 위장과 이상적인 외관 형성, 중간 시기에는 전체 녹지 체계에서 해당 가로의 역할과 시민들의 이용을 중심에 두고 계획되고 실행되었다면 현재 시기에는 이에 더해 가로 녹지의 생태적인 영향, 이를 이용하는 곤충과 동물의 이동과 영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는 점에서 각 시기의 정책을 동질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싱가포르는 지난 50여 년간 성공적으로 도시를 녹화하고 자연화하며 친환경 도시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간척 사업, 늪지 메우기, 언덕 평탄화, 인위적 저수지 조성 등으로 원래 존재하던 생태를 파괴했으며 이런 상황에서 자연보전지역과 국립공원을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했더라도 그 외 대부분의 도시 생태는 매우 빈약해 결코 자연 도시라고는 할 수 없다는 비판(Chun, 2006)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미 국가의 반 이상이 도시화된 싱가포르는 도시를 다시 자연화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시를 자연 속에 삽입한다는 ‘시티 인 네이처’ 슬로건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도시 속 작은 녹지의 생태적 기능을 다시 살리고, 가장 ‘비자연적’인 건물까지도 환경 정책에 포괄하며 싱가포르는 도시와 자연의 경계를 흐리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정원 속 도시’는 자연이 도시의 자원과 기반 체계로 사용되며 도시민의 삶에서 의미를 획득하는 단계였다면, 이를 넘어 도시의 삶이 곧 자연 속 삶이 되는 단계가 바로 ‘자연 속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기존 단계에서 도시민들이 녹지와 수자원 같은 정원적 요소를 통해 자연을 접했다면, 이제는 이를 넘어 자연의 생태계를 도시 속으로 도입해 도시의 운영 원리와 체계를 변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현재 정책에서 정원은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자연이라는 개념으로 대체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단순한 도시 녹화와 정화에서 생태적이고 자연적인 도시로의 발전 과정에서 정원이 중요한 거점이자 경유지가 되어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 싱가포르의 도시 정책은 정원의 외양을 모방하는 데에서 시작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정원을 기반 시설로 발전시켜 나아갔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싱가포르는 도시와 자연의 중간 지대인 정원을 건너 도시가 자연 속에 직접 위치하는 것을 지향한 것이다. 이렇게 자연의 변화와 역동성을 한층 민감하게 인식하게 되면서 지속가능성이 도시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이자 가치가 되었다. 자연과 도시를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던 패러다임을 넘어 이제 도시가 정원을 거쳐 자연과 융화되며 자연과 도시의 동행이 시작되고 있다.
6. 결론
본 연구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실행되고 있는 싱가포르의 친환경 도시 개발 정책을 검토하여 각 정책에 담긴 이상적인 도시의 모습과 개발 방향성을 읽어 내었다. 이를 기반으로 각 시기의 정원에 담긴 상징과 정신, 즉 특정 시기의 정책 기조가 정원을 그려내는 방식을 분석했으며 세 가지 주요한 흐름을 도출했다. 싱가포르 초기의 정책은 ‘정원도시’ 슬로건을 중심으로 자연이 통제되고 관리되는 이상적 도시를 지향했다. 이 시기 정부가 사용한 정원 개념에는 시각적이고 장식적인 특질만이 강조되어 있었다는 한계가 있지만, 분명 당시 도시민들에게 정원은 효과적인 수사로 기능했다. 이후 정책 중심은 이전에 만들어진 녹지와 수체를 유기적 체계로 연결하는 쪽으로 점차 이동한다. 이런 체계는 사람들이 보는 것을 넘어 직접 이용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다음 슬로건인 ‘정원 속 도시’에 반영된다. 이때 정원은 도시의 외면보다 그 기능과 운영에 연관된다. 녹지와 수체가 만드는 유기적 정원을 기반으로 도시가 작동한다. 이를 발판삼아 이후 싱가포르는 ‘자연 속 도시’를 향해간다. 싱가포르의 도시는 정원의 외양을 갖춘 후 정원의 유기성과 체계까지 구성해내었고 이런 정원 속 도시를 기반으로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더해 정원을 넘어 자연까지 도약을 시작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싱가포르는 자연을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장식으로 관리되는 존재에서 도시적 생활의 기반 시설과 체계로, 나아가 도시적 삶 그 자체로 변화시키는 데에 정원을 적절히 활용했다.
싱가포르의 녹색 도시 개발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정원을 은유와 상징,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정책의 경제적, 사회적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더해 싱가포르의 정책에서 시대적 변천, 특히 정원 개념의 변용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원의 표면적 특질만 드러냈다는 점은 유효한 비판이지만, 이는 시대 상황 속에서 효과적 수사로 작동했고 더욱 중요하게도 이후 약 40년간 싱가포르의 친환경 정책이 발전하는 기반이 되었다. 싱가포르 정부는 1960-1970년대에 효과적이었던 수사와 정책에서 멈추지 않고 자연과 교류하고 자연을 경험하는 장으로서의 정원 개념을 도시에 도입했고,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자연 자체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도시 개념을 이끌어냈다.
싱가포르 정부는 같은 정원 개념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도시 정책을 기획하고 전개했지만, 그것을 동질적이고 평면적으로 지속하기보다 계속 개발하고 발전시켰다. 도시의 외양을 넘어 기반 시설 차원으로 정원의 활용과 가치를 확장한 것이다. 현재 싱가포르가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한 데에는 이처럼 정원 개념을 확장적으로 활용한 시간이 필수적인 기반이 되었다. 같은 정부에 의해 사용된 같은 정원 개념이 시대적으로 다른 의미와 정신을 담고 있다는 점은 한국의 정원도시 열풍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정원 개념을 도시에 도입하는 그 자체보다 해당 시기와 맥락에서 정원에 담을 수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원을 도입함으로써 어떤 방향으로 도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고민은 정원도시를 선언할 때만 한 차례 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도시를 꾸리고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에서 계속되어야 할 핵심 과제이다.
싱가포르 도시 정책의 변천사는 정원 개념이 도시적 맥락에서 도시와 자연의 대립만이 아닌 자연을 통한 도시성의 강화 또는 도시를 통한 자연의 확장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며 도시에서 정원 개념의 잠재력을 시사한다.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적 흐름에서, 그리고 정원도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한국의 이례적인 상황에서 싱가포르의 선례에 대한 다각적 평가와 다층적 해석은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