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021년 대한민국 정신질환 수진자 수는 인구 10만명 당 5,152명으로 전년도 대비 10.57%P 증가하며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https://www.ncmh.go.kr). 이 중 우울장애 환자는 전체 정신질환 수진자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2023년 기준 2018년 대비 정신건강 관련 세입 예산을 96% 증액하는 등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https://seoulmentalhealth.kr). 그러나 2021년 기준 서울특별시 우울장애 수진자수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황이다(https://www.ncmh.go.kr).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나뉜다. 내적 요인에는 성별, 연령, 직업 및 소득, 학력 등 개인 특성이 포함되며, 외적 요인은 거주환경, 보행 및 근린환경, 가족 구성 등 주변 환경을 의미한다(이해종 등, 2014; 정슬기와 김지선, 2021; 남예인 등, 2023). 특히 외적 요인 중 보행환경은 도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으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보행환경이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Tang and Long, 2019; Wu et al, 2021; Chen et al, 2022; 구본유 등, 2024).
선행연구에서는 보행환경을 구성하는 경관 요소를 규모에 따라 인간척도 이상의 거시적 경관 요소와 그보다 작은 규모의 미시적 경관 요소로 분류하였다(Harvey and Aultman-Hall, 2016). 보행환경 평가 시에는 주로 녹시율, 개방률, 위요율, 교통량과 같은 거시적 경관 요소를 분석하였다(Dai et al, 2021). 이러한 요소들은 주로 거리뷰 이미지 및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모델을 통해 추출하게 되는데(남예인 등, 2023; Dai et al, 2021; Koo et al, 2022), 거시적 경관 요소를 추출할 때에는 공개된 사전 학습 모델을 활용하여 경관 요소를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다.
반면, 쓰레기 등의 미시적 경관 요소는 크기가 작고 모양이 불규칙하므로 자체적으로 훈련 데이터세트를 구축하고 CNN 모델을 학습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많은 시간과 인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개별 요소들이 정확하게 추출되지 않아 변수화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모양이 불규칙하고 감지하기 어려운 쓰레기, 전선 또는 경관의 복잡도와 같은 미시적 경관 요소를 추출하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어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시적 경관 요소는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Remigio et al, 2019). 기존 연구에서 다룬 미시적 경관 요소로는 전선, 쓰레기 등이 있으며, 이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eralis et al, 2020). 전선의 존재는 보행 경관의 심미성을 저하시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쓰레기는 보행환경을 불결하게 만들어 정신적 불편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Keralis et al, 2020). 또한 경관의 복잡도는 주변 거주민의 우울감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졌다(구본유 등, 2024).
미시적 경관 요소의 정신건강 영향이 요소 추출의 어려움으로 과소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포함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 동종 연구에서 활발히 활용되던 PSPNet(pyramid scene parsing network)와 DeepLabV3+ 등의 CNN 모형에서 진일보된 비전 트랜스포머(vision transformer, ViT) 모형의 일종인 SAM(segment anything model)을 활용하여 미시적 경관 요소를 추출하고, 이와 거주민 우울감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비전 트랜스포머는 학습하지 않은 클래스에 대해서도 의미론적 이미지 분할을 수행하므로 이를 활용하면 추가적인 학습 없이도 미시적 경관 요소 추출을 자동화할 수 있다(Kirillov et al, 2023).
본 연구의 목표는 선행연구에서 과소평가 되었던 미시적 경관 요소가 도시 거주민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 보행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및 미시적 경관 요소를 파악하고, (2) 보행자들이 경관 요소들을 자주 접할 때 정신건강에 미치는 강화 효과를 증명한다. 연구 대상지는 서울특별시이며, 분석 시점은 구글 스트리트 뷰 이미지의 촬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2018년으로 설정하였다. 거시적 경관 변수는 녹시율, 개방률, 건물 비율, 이동수단 비율로 구성하였고, 미시적 경관 변수는 전봇대, 쓰레기, 경관의 색상 복잡도로 구성하였다. 이때 CNN 방식으로 추출하기 어려웠던 요소들을 포함하여 분석하기 위해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하였다. 또한, 보행자 수와 경관 요소의 교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한 매개변수를 추가하여 각 경관 요소를 자주 접했을 때 각각의 경관 요소가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자세히 확인하였다. 이후 영 팽창 포아송 모델을 활용하여 각 경관 요소와 경관 요소-보행자 수의 교호작용이 거주민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과소평가 되어 온 미시적 경관 변수가 거주민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해소하였다. 특히, 미시적 경관 변수와 도보 이용률의 교호작용을 함께 고려하여 경관 요소를 자주 접할 때 각 요소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보행환경은 거주민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구성하는 요소는 근린 요소와 경관 요소로 나눌 수 있다(Harvey and Aultman-Hall, 2016). 근린 요소는 인구 밀도와 토지 피복률 등 도시 단위의 환경 요소들을 포함하며, 경관 요소는 보행 중 시각적으로 접하는 요소를 의미한다(Koo et al, 2022). 경관 요소는 규모와 분석 방식에 따라 거시적 및 미시적 요소로 나눌 수 있다. 거시적 경관 요소는 녹지, 하늘, 건물 등과 같은 인간척도 수준의 보행도로 구성 요소들을 의미하며, 미시적 경관 요소는 거시적 경관 요소보다 크기가 작은 도시 시설물이나 물리적 크기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관의 복잡도 등의 요소를 의미한다(Koo et al, 2022).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근린 요소와 거시적 경관 요소를 사용하여 보행환경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였다. Zhou et al(2019)은 녹시율, 포장률, 위요율, 장애물 비율 등의 거시적 경관 요소를 활용하여 도시의 보행만족도를 정량화하였으며, 보행 만족도 예측값이 실제 보행 만족도 설문자료와 유사한 점수를 가짐을 밝혔다. Wang et al(2019)는 PSPNet와 텐센트 맵 이미지를 사용하여 녹시율과 천공률을 보행환경 변수로 계산하였으며, 녹시율이 높고 천공률이 낮을수록 우울감이 감소함을 밝혔다. 남예인 등(2023)은 주변 시설의 밀도를 근린 요소로, 도로, 녹지, 천공률 등을 거시적 경관 요소로 사용하여 보행환경을 정량화하였으며 도로가 우울감 증가, 녹지, 천공률, 주요 시설 밀도가 우울감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위 선행연구들을 통해 근린 요소와 거시적 경관 요소가 보행환경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으며, 보행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시적 경관 요소는 정량화의 어려움으로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왔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Remigio et al(2019)는 모바일 설문을 통해 전선과 쓰레기가 존재하는 거리를 파악하고, 이러한 미시적 경관 요소를 활용하여 추정한 보행 만족도가 실제 만족도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고 밝혔다. Keralis et al(2020)는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눈에 보이는 전선 등의 경관 요소가 당뇨, 신체적 및 심리적 스트레스, 신체 장애, 폭음 등의 유병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그러나 쓰레기 등 미시적 경관 요소 중 일부는 CNN 모델을 사용하여 추출하는 데 한계가 있어 분석에서 제외되었음을 명시하였다(Keralis et al, 2020). Echeverra et al(2008)은 쓰레기 등을 포함한 거주지 평가 설문지를 통해 각 거주지의 환경 문제를 점수화하고, 환경 문제가 심각할수록 우울증과 흡연이 증가하며 걷는 시간이 감소함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들은 미시적 경관 요소가 보행경관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대부분 훈련 데이터를 직접 만드는 등 노동 집약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미시적 경관 요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량화하고 이를 분석에 포함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보행도로를 구성하는 경관 요소를 얼마나 많은 보행자가 접하는지 또한 보행자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Hematian and Ranjbar(2022)는 도로를 보행자 전용 도로와 차량 위주의 도로로 분류하고, 각 도로의 경관 요소가 보행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보행자 전용 도로와 차량 위주의 도로에서 보행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경관 요소와 이용자수 사이의 상호작용 또는 매개효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본유 등(2024)은 보행자수와 녹시율의 교호작용을 매개변수로 활용하여 녹지가 풍부한 보행도로를 자주 걸을수록 우울 완화 효과가 강화됨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보행도로의 경관 상태와 보행자 수를 함께 고려할 때 각 경관 요소의 우울 저감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 중 녹시율 외에 다양한 경관 요소, 특히 미시적 경관요소와 보행자 수의 매개효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아직 부족하다.
경관 요소를 추출하는 방법은 인력 중심의 방법에서 딥러닝을 활용한 자동화 방법으로 발전해왔다(Tang and Long, 2019). 초기에는 주관적 인터뷰와 직접 스크리닝 등의 인력에 의존한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으나(McGinn et al, 2007; Rundle et al, 2011), 합성곱 신경망 모델의 발전으로 경관 요소 추출을 자동화할 수 있게 되었다(Gong et al, 2019; Yang et al, 2023).
먼저 경관 요소를 추출하기 위해 관찰자가 특정 도로의 상태를 평가하는 주관적 인터뷰 방식과 직접 스크리닝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McGinn et al(2007)는 전화 설문을 사용하여 보행에 방해가 되는 건설 환경요소를 파악하였다. Rundle et al(2011)는 구글 스트리트 뷰(Google street view, GSV) 이미지를 사용하여 경관의 미적 상태와 장애물 여부를 육안으로 평가하고 근린환경을 점수로 변환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식은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며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모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
이후 거리뷰 이미지(street view image, SVI)와 컴퓨터 비전의 발전으로 경관 요소의 추출을 자동화하는 연구 프레임워크가 제안되었다. SVI와 CNN 모델을 활용하여 의미론적 이미지 분할을 수행하면 인력 기반의 방식보다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도 경관 요소를 추출할 수 있다. Yang et al.(2023)은 바이두 온라인 맵(Baidu online map)의 거리 뷰 이미지와 DeepLabV3+ 모델을 사용하여 가로 녹지 및 천공률 분석을 자동화하였다. Gong et al(2019)은 PSPNet 모델을 사용하여 위요율, 천공률, 녹시율 변수 구축을 자동화하였다. 두 연구 모두 CityScape 데이터세트를 활용하여 모델을 학습시켰다. 남예인 등(2023) 또한 ADE20K 데이터세트를 seg-former 모델로 학습하여 거리뷰 이미지에서 도로, 건물, 하늘, 녹지를 추출하였다. 따라서 많은 선행연구에서 이미 공공에 개방된 대량의 이미지 데이터세트와 CNN 모델을 활용하여 거리뷰 이미지에서 경관 요소를 추출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에 개방된 대량의 이미지 데이터세트에 의존하게 되면 추출할 수 있는 경관 요소가 한정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CNN 모델은 학습한 데이터세트가 제공하는 라벨에 대해서만 경관 요소를 추출할 수 있다. 또한 CNN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수천에서 수십만 장에 이르는 대규모 훈련 이미지 데이터세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CNN 모델인 ResNet에서 90% 이상의 정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최소 6천 장 이상의 데이터세트를 활용한 학습이 필요하다(Luo et al, 2018). 따라서 선행연구에서는 직접 훈련 데이터세트를 구축하기보다는 Cityscape, ADE-20K 등 공개된 대형 데이터세트를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하였으며(Dai et al, 2021; Yang et al, 2023), 이로 인해 분석에 이용된 경관 요소가 기 학습된 클래스로 제한된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전선이나 쓰레기 같은 미시적 경관 요소는 대형 데이터 세트의 라벨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크기가 작고 모양이 불규칙하므로 대량의 자체 훈련 데이터세트를 구축하거나 해당 클래스 추출 전용 CNN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선행연구에서는 미시적 경관 요소를 추출할 때 인터뷰 또는 직접 모니터링의 방식을 사용하였다(Remigio et al, 2019).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3년 이후로 발달한 비전 트랜스포머 분야의 제로-샷 이미지 분할(zero-shot image segmentation)과 open-set object detection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제로-샷 이미지 분할은 대량의 이미지와 텍스트 데이터세트를 결합한 트랜스포머 모델을 활용하여 학습되지 않은 클래스에 대해서도 의미론적 이미지 분할을 수행하는 기법이다(Kirillov et al, 2023). 대표적인 모델로는 SAM(segment anything model)이 있으며, 특히 의료계에서는 SAM을 사용하여 다양한 환부를 감지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Huang et al, 2024; Zhu et al, 2024). 제로-샷 이미지 분할 모델을 활용하면 CNN 모델로 추출하기 어려웠던 경관 요소까지도 추가적인 학습 없이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다. 그러나 경관 영향 평가 분야에서는 제로-샷 이미지 분할 모델을 활용한 연구는 아직 진행된 바가 없다.
3. 자료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거주민의 정신건강을 정량화하기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자가보고 우울감 점수를 종속 변수로 사용하고, 분석 범위를 주거지역으로 한정하였다. 독립변수로 경관 변수, 보행자수, 교호작용 변수, 통제 변수를 설정하였다. 2018년 구글 스트리트뷰 이미지를 사용하여 경관 변수를 구축하였으며, 경관 변수와 보행자수의 교호작용 항을 생성하여 보행도로의 사용 빈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강화효과를 확인하였다. 성별, 연령, 거주지 생활권 등의 개인 및 거주지 특성은 통제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후 영 과잉 포아송 모델(zero inflated Poisson, ZIP)을 적용하여 보행도로의 경관 품질과 경관 접촉 빈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흐름은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는 2018년 서울특별시의 주거 인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특별시의 인구는 2023년 12월 기준 938.6만 명이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이다. 이때 실거주민의 사용률이 높은 경관을 추출하기 위하여 주거지역만을 대상으로 경관을 평가하였다. 주거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2에서는 연구 대상지인 서울특별시 내 주거지역을 표현하였다.
거주민의 우울 분석을 위해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변수를 구축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질병관리청 주관 하에 지역보건사업 및 의료계획수립 기반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매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체 응답 22,908개 중 “응답 거부” 또는 “모름”으로 표시된 응답은 제외하여 총 18,690개의 유효 응답을 사용하였다. 이 응답을 통해 종속변수와 정신건강, 신체 정보, 학력, 혼인 상태, 생활운동 상태 등의 통제 변수를 구축하였다. 전체 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1과 같다.
종속변수인 우울 점수는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우울증 선별 검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문항의 점수 합을 사용하여 도출하였다. PHQ-9은 우울증 진단에 널리 활용되는 지표이며, 영 과잉 모델을 활용하기 위해 최소 0점에서 최대 27점을 가질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구본유 등, 2024).
개인 통제 변수는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연령, 성별, 거주지, 구직 상태, 학력, 혼인상태, 보행 빈도, 가계소득 응답을 기반으로 구축하였다. 거주지역으로 인한 영향을 제어하기 위해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울시 생활권을 더미변수로 구축하였다. 해당 변수는 각 생활권의 서로 다른 소득수준 및 소득 수준에 따른 가로 경관 차이를 통제할 수 있다(남진과 김진하, 2015).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 기본통계에서 제공하는 각 자치구별 아파트 면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면적 비율을 변수로 추가하였다. 전체 면적 대비 아파트 면적 비율이 높은 자치구일수록 아파트 거주 인구가 많을 것으로, 그렇지 않은 자치구일수록 빌라나 주택 주거 인구가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자치구 주거 유형에 따른 우울감을 통제하였다. 구직 상태에서는 소득이 없는 학생, 주부, 무직자를 무직 상태로 분류하고, 그 외 소득이 발생하는 직업군을 구직 상태로 분류하였다. 학력은 무학 및 서당,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2년제, 4년제, 대학원)로 구분하였다. 혼인 상태는 기혼, 미혼, 가정해체 상태(이혼, 별거, 사별)로 분류하였다.
매개 변수로는 자치구별 보행자수를 사용하였다. SK 지오비전 유동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자치구의 일 평균 유동인구 수를 계산하였다. SK 지오비전 유동인구 데이터는 50 제곱미터의 영역에서 시간당 보행자 통행량을 제공한다(Choi et al, 2019). 해당 자료를 기준으로 각 자치구별 일 평균 유동인구 수를 계산한 뒤 표준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경관 변수는 거시적 경관 요소와 미시적 경관 요소로 분류하였다. 거시적 경관 요소는 녹지, 하늘, 건물, 이동수단을 포함하며, 미시적 경관 요소는 쓰레기, 전봇대, 경관의 색상 복잡도를 포함한다. 해당 경관 요소를 추출하기 위해 구글 스트리트뷰 이미지를 이용하였다. 주거지역 내부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50m 간격으로 이미지를 수집하였으며, 2018년에 촬영된 데이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2018년에 촬영된 이미지만을 사용하였다. 이때 도로 중심선이 다수의 직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직선에 대해 50m 등간격으로 추출하여 육안 상 50m 등간격이 아닌 점들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계절에 따른 수목 상태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 3월부터 9월까지 촬영된 이미지만을 수집하였다. 총 94,719개의 이미지를 수집하였으며, 이중 고가도로나 터널 등 사람이 걷기 어려운 환경의 이미지는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91,176개의 이미지를 변수 구축에 사용하였다. 추출한 촬영 지점의 분포는 그림 3과 같다.
구글 스트리트 뷰 이미지에서 경관 요소를 추출하기 위해 제로-샷 의미론적 이미지 분할 모형 중 하나인 SAM 모형을 사용하였다. SAM의 분할 속도를 높이기 위해 open-set object detection 모델 중 하나인 grounding DINO 모델을 활용하였다. SAM은 경계 상자(bounding box)를 함께 사용했을 때 최대 94%의 시간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Mumuni and Mumuni, 2024).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grounding DINO를 사용하여 입력한 클래스에 대한 경계 상자를 생성하고, 해당 구역에서 이미지 분할을 실시하였다. 모델의 구조는 그림 4와 같다. 해당 모델 구조를 활용하여 나무(tree), 건물(building), 이동수단(vehicle), 도로(road), 전봇대(telegraph pole), 쓰레기(trash)를 추출하였다. 이미지를 추출한 결과는 그림 5와 같으며 클래스별로 이미지가 잘 분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도로 폭이 넓을수록 물체가 작게 촬영되는 원근 왜곡을 보정하기 위해 최소-최대 정규화를 적용한 도로 폭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각 경관 점수에 곱하였다. 하늘은 배경 요소로서 원근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개방률 변수에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때 가중치로 인해 경관 변수의 값이 매우 작아지는 현상이 나타나 각 자치구의 경관변수를 최대-최소 정규화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도로폭 보정에 대한 계산은 수식1에 나타내었다.
수식 1에서 각 이미지 i에 대한 도로 픽셀 수를 Ri라 했을 때, 전체 이미지에 대한 도로 픽셀 수 집합 R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사용하여 최대-최소 정규화를 진행하여 각 이미지 i에 대한 가중치 αi를 생성하였다. 이후 각 이미지 i에 대한 경관 요소 픽셀 수 Xi에 대하여 가중치 αi를 곱해준 뒤 전체 이미지의 픽셀 수 N으로 나눈 뒤 평균값을 구하여 경관 요소 변수 Ŷk를 각 자치구 k별로 구축하였다. 이후 자치구에 대한 경관 요소 변수 집합을 Ŷ라 할 때, 각각의 경관 요소 변수 Ŷk에 대해 최대-최소 정규화를 진행하여 최종적인 경관 요소 변수 집합 Y를 구축하였다.
미시적 경관 요소 중 하나인 색상 복잡도는 각 이미지 내 색상의 다양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색상이 다양하고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을수록 경관을 복잡하다고 평가한다(Zhou et al, 2015). 색상 복잡도를 점수화하기 위해 엔트로피 계산 식을 활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이는 수식 2와 같다.
수식 2에서 각 색깔 i에 대해 해당 색깔을 가진 픽셀의 개수 ni를 구하고, 엔트로피를 활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색상 복잡도 Cs라고 한다. 이후 분석에서는 색상 복잡도를 최소-최대 정규화하여 사용하였다. 서로 다른 경관에 대한 색상 복잡도 변수 구축 결과는 그림 6과 같으며, 색상 복잡도 변수는 실제 사람이 느끼는 색상 복잡도를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관 요소의 효과가 보행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경관 요소와 보행자수 데이터를 곱하여 교호작용 변수를 구축하였다. 교호작용 변수로 인한 다중공선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각 변수를 평균 중심화한 후 교호작용 변수를 산출하였다(구본유 등, 2024).
본 연구는 영 과잉 포아송(ZIP)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ZIP 모델은 포아송 분포를 기반으로 하며, 종속 변수에 0 값이 과도하게 존재할 때 이를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0 값이 전체 약 48%를 차지하며 작은 값에 집중된 형태를 보이는 카운트 변수이므로 이에 적합한 영 과잉 포아송 (ZIP)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ZIP 모델에서 영 과잉 모델은 우울감을 보고하지 않을 확률을 설명하고, 카운트 모델은 우울감을 보고한 응답자 중 우울감의 증가 추세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최종적으로 사용한 ZIP 모델은 수식 3과 같다.
종속변수는 자가 보고 우울 점수, 독립변수는 경관 변수, 보행자 수 변수, 교호작용 변수, 개인 통제 변수를 포함한다. 이때 경관 변수들 사이 상관계수가 높아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분석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모델 1에는 경관변수 중 녹시율, 건물 비율, 이동수단 비율, 전봇대 비율, 색상 복잡도를, 모델 2에서는 경관변수 중 개방률과 쓰레기 비율을 분석하였으며, 그 외 종속변수, 보행자 변수, 통제 변수는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두 모델 모두 교호작용 변수를 제외한 주요 변수에서 ViF 계수가 10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교호작용 변수의 경우 ViF 계수가 10을 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오류를 의미하지 않는다(Kalnins and Praitis Hill, 2023).
수식 3에서 응답자 i의 우울점수를 yi라 하며, yi가 0일 확률을 πi라고 한다. yi가 0 이상인 경우에는 포아송 분포를 보임을 가정한다. β0와 γ0는 y 절편을 의미한다. Xi는 각 모델에서 응답자 i에 대한 독립변수의 집합을 뜻하며, xij는 각 응답자 i에 대한 j번째 독립변수를 나타낸다. 이때 모델 1은 녹시율, 건물 비율, 이동수단 비율, 전봇대 비율, 경관의 색상 복잡도, 보행자수, 나이, 성별, BMI, 월 평균 소득, 학력, 직업, 혼인 상태, 보행빈도, 거주 생활권, 아파트 면적, 녹시율과 보행자수의 교호작용, 건물 비율과 보행자수의 교호작용, 이동수단 비율과 보행자수의 교호작용, 전봇대 비율과 보행자수의 교호작용, 경관의 색상 복잡도와 보행자수의 교호작용 변수를 포함하였다. 모델 2는 개방률, 쓰레기 비율, 보행자수, 나이, 성별, BMI, 월 평균 소득, 학력, 직업, 혼인 상태, 보행빈도, 거주 생활권, 아파트 면적, 개방률과 보행자수의 교호작용, 쓰레기 비율과 보행자수의 교호작용 변수를 포함하였다.
4. 결과
자가 보고 우울점수 중 0점을 보고한 경우는 전체 응답 18,696개 중 8,930개로 전체 응답의 47.76%를 차지하므로 우울점수는 영 과잉 분포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성별 구성에서 여성 응답자는 56.13%로 남성 응답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연령은 최저 19세, 최고 109세이며, 평균 연령은 51.39세이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생활권은 동북권과 서남권 순으로 나타났다.
녹시율은 중구, 강남구, 송파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개방률은 중구와 노원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높은 건물이 적을수록 하늘의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가로 건물 비율은 광진구, 관악구, 송파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보행자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는 주요 직장 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승하차 인구가 많은 강남역, 역삼역 등이 위치하므로 높은 유동인구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 과잉 포아송 모델(ZIP)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우도비 검정(likelihood ratio test, LR)을 실시한 결과, 모델 1과 모델 2 모두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모델 1 Log likelihood = -37,915, LR Chi-square=3,936.8, p<2.2e-16; 모델 2 Log likelihood = −37,887, LR Chi-square=3,965.1, p<2.2e-16). 분석 결과는 표 2 및 표 3에 기술하였다.
모형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거시적 및 미시적 경관 변수는 모두 자가 보고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1에서는 도로폭 가중치가 적용된 녹시율, 건물 비율, 이동수단 비율, 전봇대 비율, 경관의 색상 복잡도를 분석하였으며, 이중 녹시율, 건물 비율이 거주민의 자가 보고 우울감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폭 가중치가 적용된 녹시율이 1단위 증가할 때 우울증세가 0일 로그오즈(log odds)가 2.771만큼 높게 나타났다(β=2.771, p=0.000). 이는 녹지가 많이 보이는 가로경관일수록 주변 거주민이 우울할 가능성이 낮아짐을 의미하며, 녹지로 인해 조성된 쾌적한 보행환경이 거주민의 정신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James et al., 2015). 카운트 모델에서는 도로폭 가중치가 적용된 녹시율이 우울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녹시율은 이미 우울감을 느끼는 거주민의 우울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건물이 많은 보행도로 주변에 거주할 때 우울할 가능성과 우울감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β=3.199, p=0.000; γ=−0.480, p=0.000). 도로폭 가중치가 적용된 건물 비율이 1단위 증가할 때 우울 증세가 0일 로그오즈는 3.199 증가하였고, 로그화된 우울 점수는 0.480 감소하였다. 해당 결과는 다양한 용도의 건물이 보행활동을 촉진하고, 이로 인해 증가한 신체 활동의 우울 완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류은혜와 김은정, 2023; 임하나 등, 2016). 또한 해당 결과는 다목적으로 쓰이는 보도가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고 보행자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바, 긍정적 심리상태를 이끌어낸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부합된다(조월과 이수기, 2021; Renalds et al, 2010).
반면 경관 변수 중 이동수단 비율, 전봇대 비율, 경관의 색상 복잡도는 거주민의 자가 보고 우울감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운트 모델에 의하면 도로폭 가중치가 적용된 이동수단 비율은 1단위 증가할 때 로그화된 우울점수가 0.306 상승하였는데(γ=0.306, p=0.000), 이는 차량 등의 이동수단이 보행도로 주변에 많을수록 소음, 매연, 안전문제, 보행공간의 협소함 등으로 인한 보행자 스트레스 및 거주민 우울이 증가함을 시사한다(남예인 등, 2023). 영 과잉 모델에서는 도로폭 가중치가 적용된 이동수단 비율이 우울 증세가 0일 로그오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전봇대 비율이 높을수록 주변 주민들이 우울감을 느낄 확률은 높아졌으나, 우울감 악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0.367, p=0.014). 도로폭 가중치가 적용된 전봇대 비율이 1단위 증가할 때 우울 점수가 0일 로그오즈가 0.367만큼 감소하였는데, 해당 결과는 전봇대의 모습이 경관적 심미성을 저하할 뿐만 아니라 안전 사고 가능성 등의 불안감을 야기하여 거주민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인다(Remigio et al,, 2019). 카운트 모델에서는 종속변수와 전봇대 비율 변수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가시권에 들어오는 전봇대의 모습은 이미 우울함을 느끼는 거주민의 우울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색상이 복잡한 보행도로의 경우, 거주민이 우울함을 느낄 가능성과 우울감 증가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경관의 색상 복잡도가 1단위 증가할 때 우울 점수가 0일 로그오즈가 2.424만큼 낮게 나타났으며, 로그화된 우울점수가 0.549 높게 보고되었다(β=−2.424, p=0.000; γ=0.549, p=0.000). 이는 복잡한 색상이 시각적 피로를 유발하여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모델 2에서는 개방률과 도로폭 가중치가 적용된 쓰레기 비율을 분석하였으며, 이중 개방률이 거주민의 우울 증세 완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률은 거주민의 우울할 가능성과 우울감 감소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구체적으로 개방률이 1단위 증가할 때 우울 점수가 0일 로그오즈는 0.839 상승했으며 로그화된 우울 점수는 0.215 감소하였다(β=0.839, p=0.000; γ=−0.215, p=0.000). 이는 보행자가 하늘이 많이 보이는 환경에서 심미적 아름다움을 느끼고,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보행환경이 우울 완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남예인 등, 2023).
한편, 거주민이 보행도로 주변에 놓인 쓰레기에 자주 노출될수록 우울함을 느낄 가능성과 우울감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217, p=0.001; γ=0.009, p=0.007). 보행도로에 존재하는 쓰레기는 보행자로 하여금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깨진 유리창 이론에 의해 위험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변 거주민의 우울감이 악화될 수 있다(Wu et al., 2014).
앞서 언급하였듯, 본 연구에서는 보행도로 이용률을 고려하여 경관 변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교호작용 변수를 이용하였으며, 두 모델에 들어간 모든 교호작용 변수는 거주민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모델 1에 의하면, 이용률이 높은 보행도로에서 녹시율과 건물 비율이 높을수록 우울 완화 효과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 과잉 모델에서 나타난 녹시율과 보행자수의 교호작용 변수 결과는, 보행도로에 보행자가 한 명 늘어날 때 주변 거주민의 우울점수가 0일 로그오즈가 녹시율 계수에 1.143을 더한 만큼 증가함을 의미한다(β=1.143, p=0.000). 이는 녹지를 오랜 시간 접할수록 거주민의 우울 완화 효과가 강화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보행자가 많은 보행도로에 녹지를 조성하는 것이 더 큰 우울 완화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구본유 등, 2024). 건물 비율과 보행자수의 교호작용 변수 또한 1단위 증가할 때 우울점수가 0일 로그오즈는 4.761 상승하며 로그화된 우울 점수는 0.712만큼 감소한다(β=4.761, p=0.000; γ=−0.712, p=0.000). 이는 보행자가 많은 거리에 건물 비율이 높아질수록 거주민의 우울감이 더 크게 완화되며 우울하지 않음을 보고할 확률 또한 더 크게 상승함을 보여준다.
반면 모델 2에서 우울 완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개방률의 경우, 보행자수와의 교호작용 변수가 증가할 때 우울할 가능성은 증가하지만, 우울감은 감소하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β=−1.306, p=0.014; γ=−0.164, p=0.000). 이는 이용률이 높은 보행도로의 개방률이 높을수록 거주민의 우울 저감 효과는 강화되지만, 우울할 확률은 오히려 높아짐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는 개방감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우울감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반면, 과도한 개방감은 도시의 생동감을 낮추고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Dai et al, 2021). 이때 서울시는 대표적인 고밀도 도시임을 고려할 때 개방감이 우울감을 완화한다는 결과가 더욱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호작용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구글 스트리트 뷰 이미지가 가로 공간이 아닌 차량 도로를 기준으로 촬영되어 실제 보행자가 느끼는 개방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기인할 수 있다(Ki and Lee, 2021).
두 모델에서 우울감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던 이동수단 비율, 전봇대 비율, 쓰레기 비율, 경관의 색상 복잡도 변수와 보행자수 간의 교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모두 거주민 우울 악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모델 1에서 이동수단 비율과 보행자수의 교호작용 변수가 1단위 증가할 때 우울 점수가 0이 될 로그오즈가 1.858만큼 감소하며, 로그화된 우울 점수는 1.056만큼 증가하였다(β=-1.858, p=0.000; γ=1.056, p=0.000). 전봇대와 보행자수의 교호작용 변수 또한 우울할 확률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β=0.414, p=0.000), 경관의 색상 복잡도와 보행자수의 교호작용 변수는 우울 점수가 0이 될 로그오즈 감소 및 로그화된 우울 점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β=−2.353, p=0.000; γ=0.261, p=0.000). 모델 2에서 쓰레기 비율과 보행자수의 교호작용 변수는 1단위 증가할 때 우울 점수가 0이 될 로그 오즈가 1.156 감소하고 로그화된 우울 점수는 0.127 상승하였다(β=-1.156, p=0.005; γ=0.127, p=0.000). 위 결과를 종합했을 때, 이동수단 비율, 전봇대 비율, 쓰레기 비율, 경관의 색상 복잡도와 같이 우울을 악화한다고 나타난 요인은 보행자 수와의 교호작용 변수에서도 우울 악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듯 교호작용 항이 포함된 모형을 통해, 가로를 경험하는 이용자 수가 많아질수록 가로의 영향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보편적 원리를 밝힐 수 있다.
결과적으로 거시적 및 미시적 경관 요소가 모두 거주민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시율, 개방률, 건물 비율은 우울감을 완화하였으며, 이동수단 비율, 쓰레기 비율, 전봇대 비율, 경관의 색상 복잡도는 우울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교호작용 변수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개방률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관 요소는 보행자수와의 교호작용을 통해 각 경관 요소의 완화 또는 악화 효과를 강화하였다. 개방률과 보행자수의 교호작용의 경우, 우울 저감 효과가 강화되었으나 우울할 확률의 저감 효과는 약화되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5. 결론
본 연구는 보행도로의 거시적 및 미시적 경관 요소가 보행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보행도로의 이용률을 고려하여 경관요소가 거주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보행도로와 경관 요소의 교호작용을 고려하였다. 이때 open-set object detection과 제로-샷 이미지 분할 모델을 활용하여 미시적 경관 요소를 자동으로 추출함으로써 기존 CNN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인 경관 요소 분석 방법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가로 경관 조성 시 거시적 및 미시적 경관 요소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였으며, 보행자가 경관 요소를 많이 접할수록 그 영향이 강화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관 요소 중 녹시율, 개방률, 건물 비율은 거주민 우울감을 완화하였다. 녹지가 제공하는 쾌적한 환경이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하며 보행자의 스트레스 해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많은 선행 연구에서 밝혀온 바이다(Alcock et al, 2014; 장인수와 김홍석, 2016).
구글 스트리트 뷰에서 하늘의 비율을 의미하는 개방률의 분석 결과는 하늘이 넓게 보이는 가로일수록 보행자의 심미성을 향상시켜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로 뒷받침된다(Dai et al, 2021). 또한 보행도로 주변에 건물이 많을수록 우울감이 완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건물이 많은 보행도로는 주변 거주민의 보행 활동을 촉진하며, 이로 인해 증가한 신체활동의 활력 증진, 신체 건강 증진 효과는 보행자의 우울감 감소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Nagata et al, 2020). 또한 다양한 목적의 보행 도로가 도시를 활력 있게 만드므로 보행자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조월과 이수기, 2021). 특히, 건물 비율은 모델 1에 포함된 거시적 경관 요소 중 가장 높은 계수 값을 보였으며 거주민의 우울 가능성과 우울감 감소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해당 결과는 서울시와 같은 고밀도 도시 환경에서 가시권에 들어오는 건물의 정도가 유사하더라도 보행자의 양이 많은 곳 주변에서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이동수단 비율, 전봇대 비율, 쓰레기 비율, 경관의 색상 복잡도는 거주민의 우울감을 상승시켰다. 보행도로 주변 이동수단이 많을수록 우울감이 높게 보고된 결과는 매연과 소음 등 스트레스 요인과의 접촉이 증가하여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이 있으리라 추정되며,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Dai et al, 2021). 미시적 경관 요소 중 전봇대와 쓰레기는 가로의 심미성을 저하시키고 불쾌감을 유발하는 등 보행자에게 시각적 스트레스를 제공하여 우울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Remigio et al, 2019). 불법 주차, 정리되지 않은 전봇대와 전선, 그리고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도시 가로환경을 구성하는 흔한 요소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보여주듯, 해당 요소들은 가로환경을 이용하는 도시민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가로환경 관리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관의 색상 복잡도 또한 높을수록 시각적 피로를 유발하여 우울감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간판에서 외벽색과 간판 색채가 보색 관계일수록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관에 다양한 색상이 존재할 때 시각적 피로가 유발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에 의해 뒷받침된다(김현정 등, 2009). 본 연구 결과는 가로환경은 개별 건물과 상점들이 구성하는 복합적 이미지이나, 가로 차원에서의 통일성 있는 경관 계획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이미옥과 이임정, 2023). 특히 거주민의 우울감을 악화하는 전봇대와 같은 요소는 전선 지중화 사업을 통해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의 전선 지중화 사업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은평구와 서대문구 등의 강북 지역은 강남 3구의 절반 수준의 지중화율을 보였다(https://www.dnews.co.kr). 전선 지중화 사업이 시행될 때 거주민의 우울감 악화를 유발할 수 있는 전봇대 비율이 감소하므로, 지중화율이 낮은 강북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했을 때 서울시의 우울감 감소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하는 등의 미관 정책은 거주민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여 우울감을 완화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가로 보행량을 분석에 고려하여, 실제 가로 이용에 의한 거주민의 정신건강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정량화하였다. 개방률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관 요소에서, 유사한 경관이라도 많은 인구가 보행하며 해당 경관을 경험한다면 우울감 완화 효과가 높아짐을 밝혔다. 이는 경관의 효과를 실제 보행량을 감안하여 분석한 결과로 선행연구에서는 상당히 드물게 시도되었다 (구본유 등, 2024). 따라서 정책 결정자는 거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보행도로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보행도로의 경관 요소를 특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다수의 도시 거주민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도시 거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
개방률의 경우, 많은 보행자들이 개방된 공간을 걸을 때 우울감은 더욱 감소하는 반면, 우울할 확률은 오히려 증가하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구글 스트리트뷰 이미지가 차량을 기준으로 촬영되어 사람들이 실제로 걷는 보행 환경을 완벽하게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한다(Ki et al, 2023). 특히 보행도로에 가로수가 있을 경우, 가로수의 수폭에 의해 도로와 보행도로 간의 개방률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구글 스트리트 뷰 보정 등의 방법을 통해 보행자의 실제 가시권에 가까운 가로 이미지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보행자 수 데이터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응답자와 개인별로 연결되지 않아, 응답자가 실제로 접하는 경관 상태와 자치구별 경관 상태에 차이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성별, 연령, 주거지 등 개인 특성이 포함된 이동 및 보행 데이터를 이용하여 더욱 정확한 변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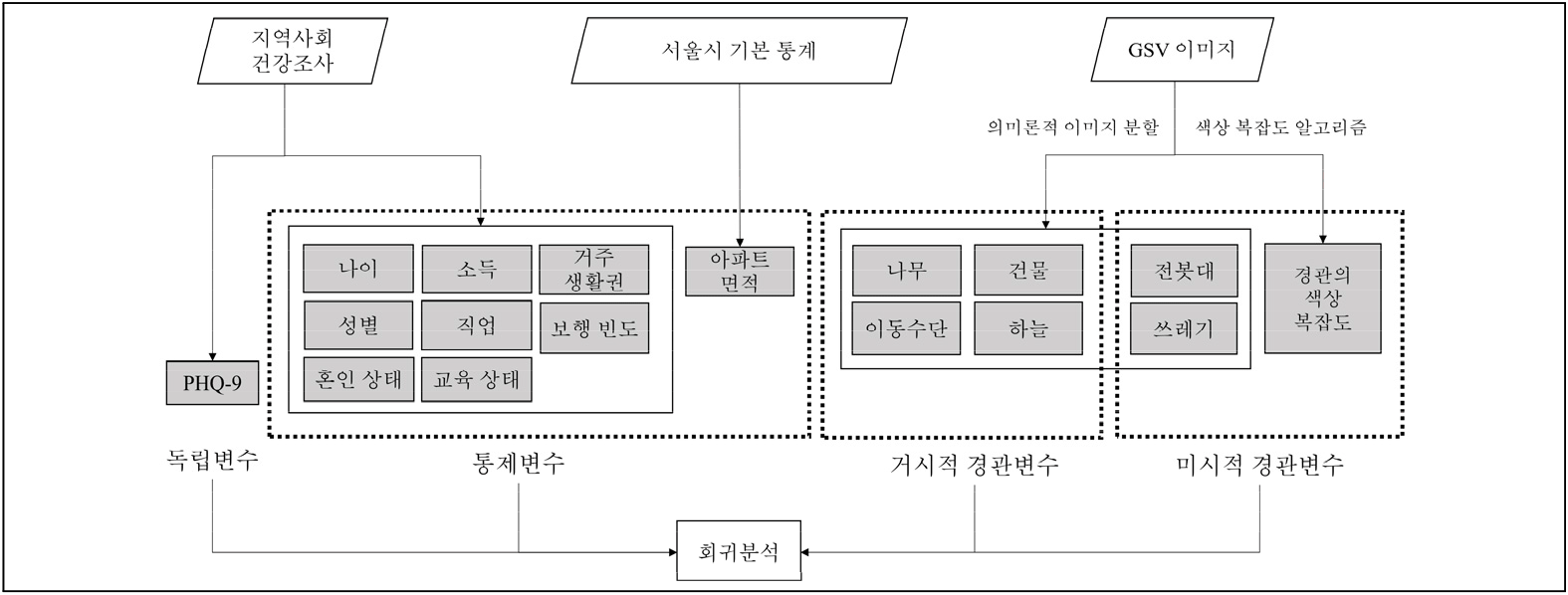
 원 데이터,
원 데이터,  모델,
모델,  변수
변수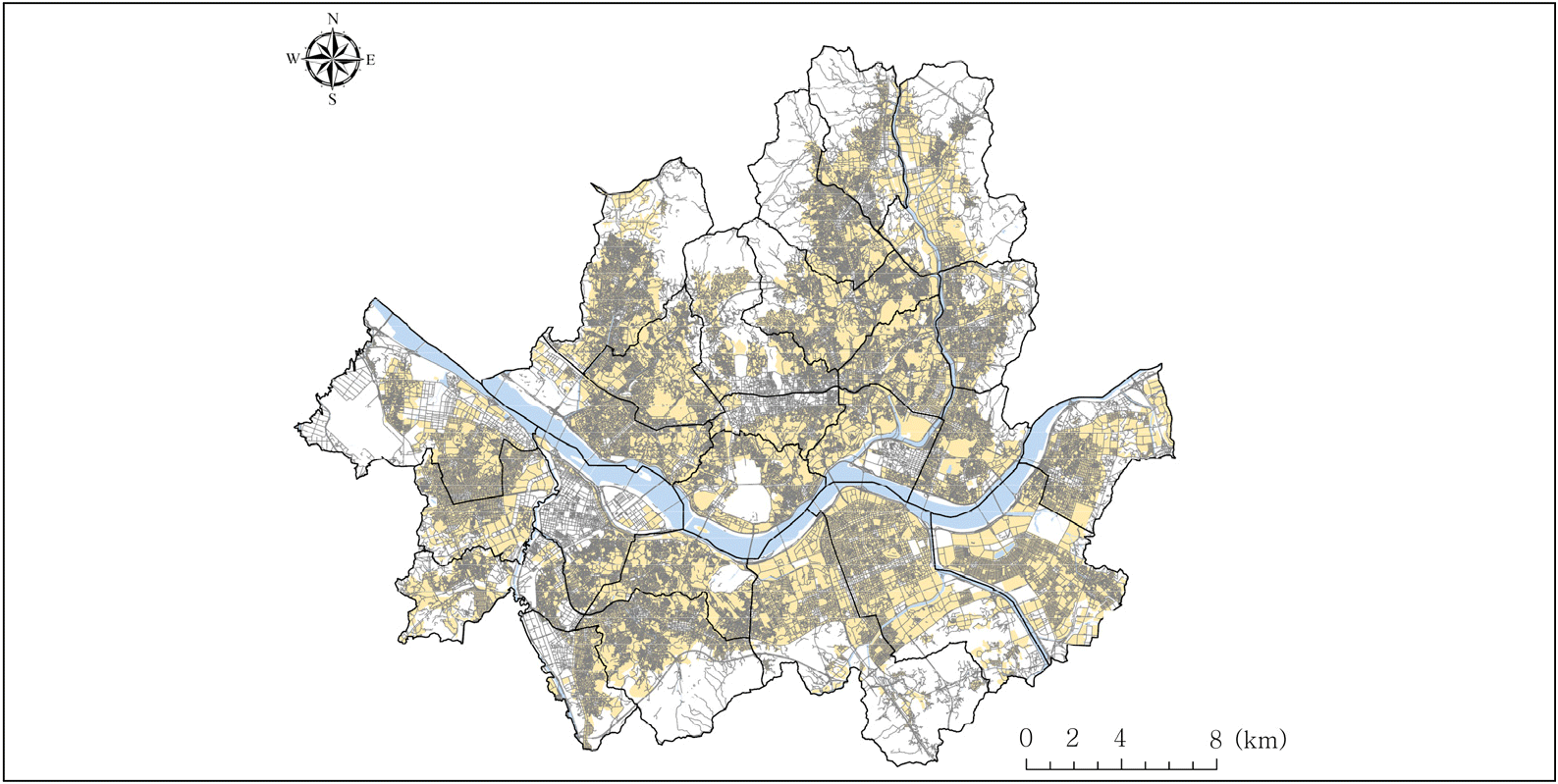
 도로 중심선,
도로 중심선,  한강,
한강,  주거 지역,
주거 지역,  서울 자치구 경계
서울 자치구 경계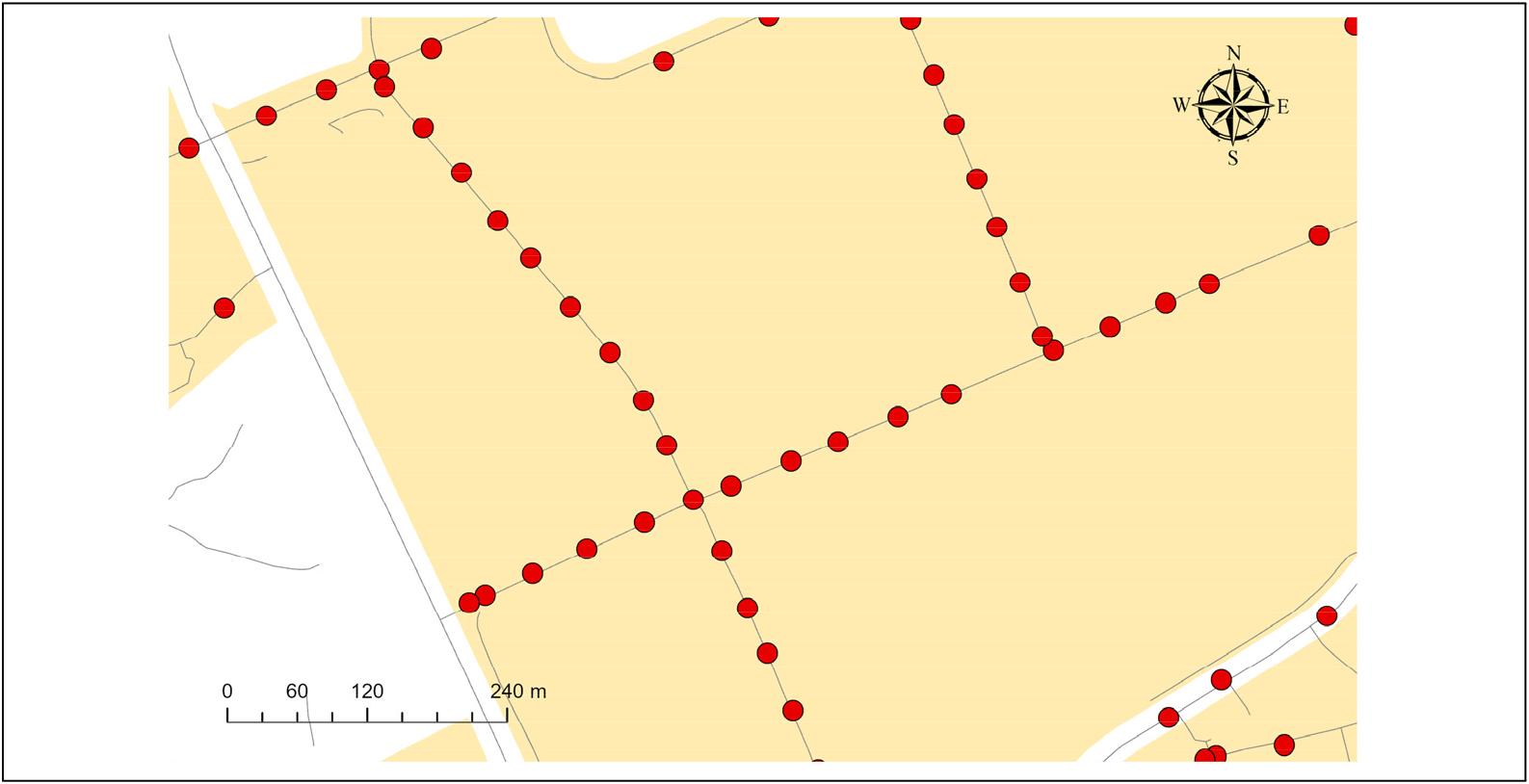
 도로 중심선,
도로 중심선,  촬영 지점,
촬영 지점,  주거지역
주거지역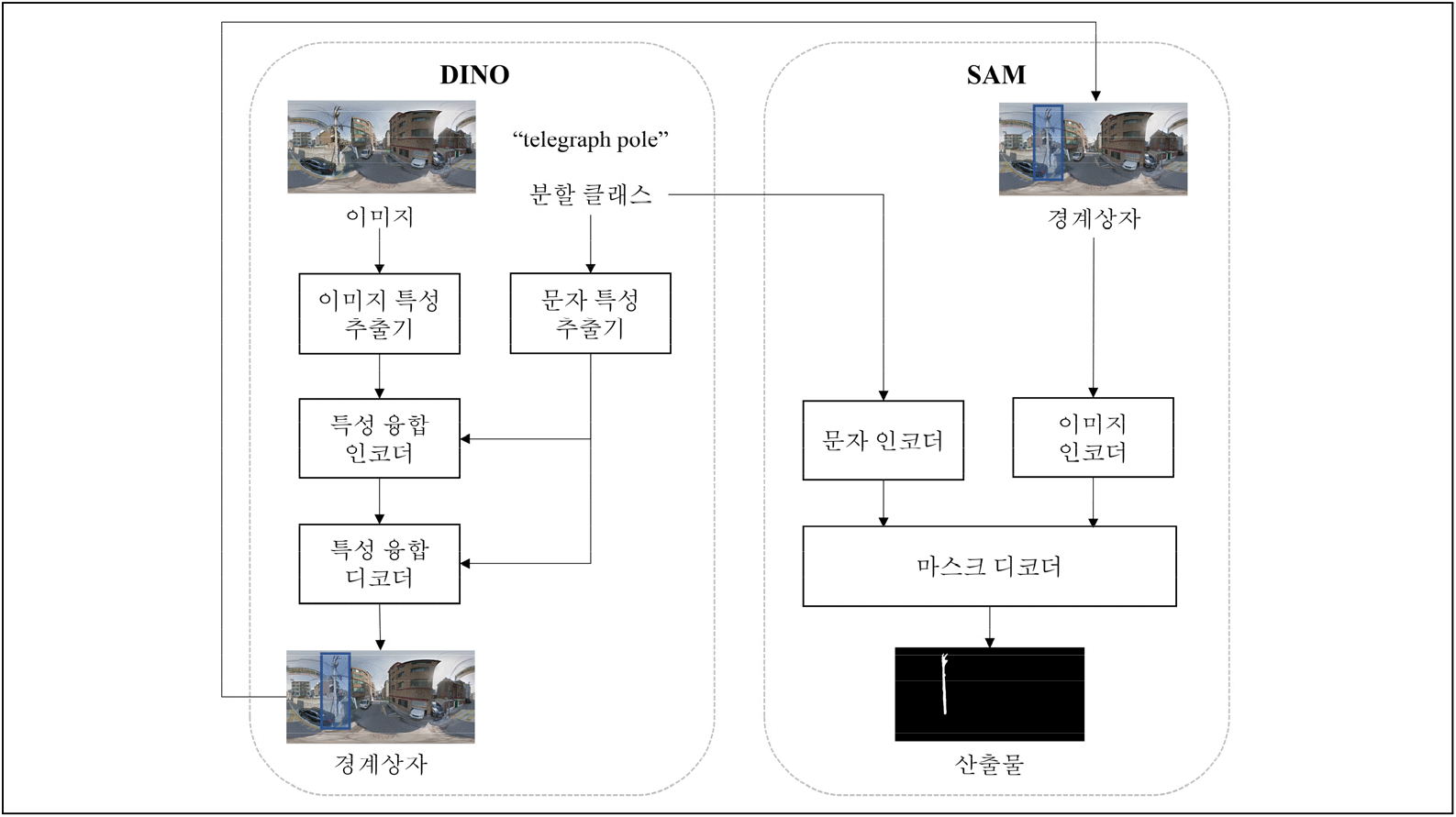
 모듈,
모듈,  모델
모델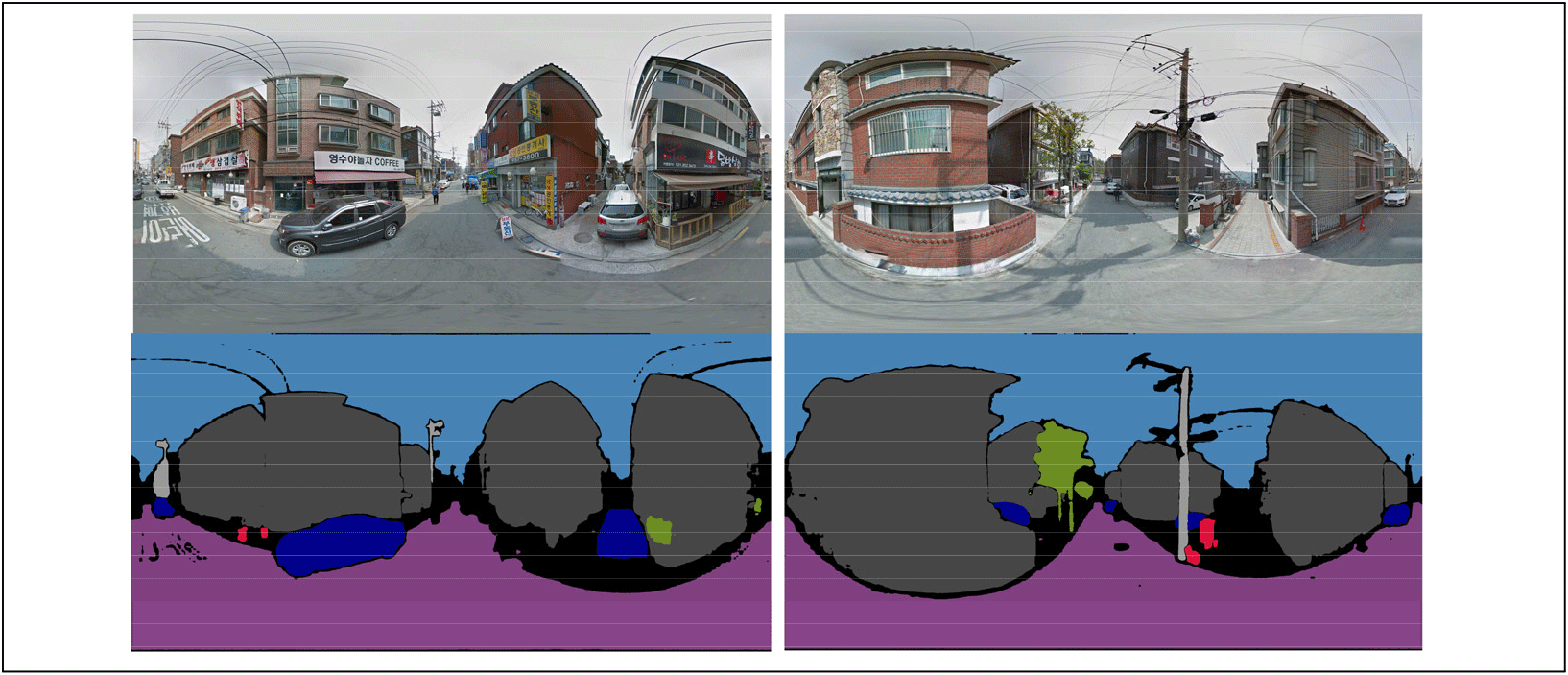
 건물,
건물,  나무,
나무,  이동수단,
이동수단,  도로,
도로,  전봇대,
전봇대,  쓰레기
쓰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