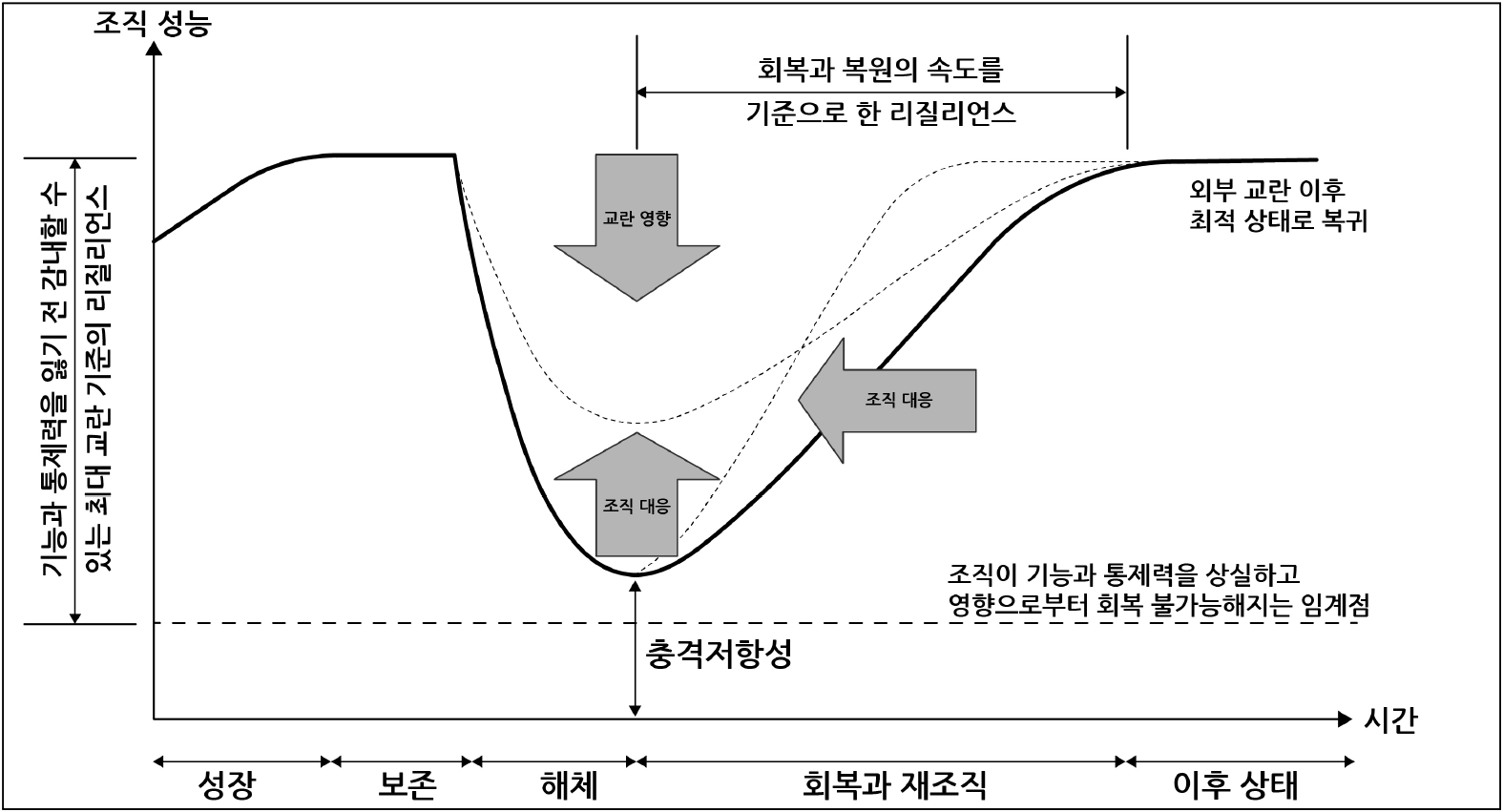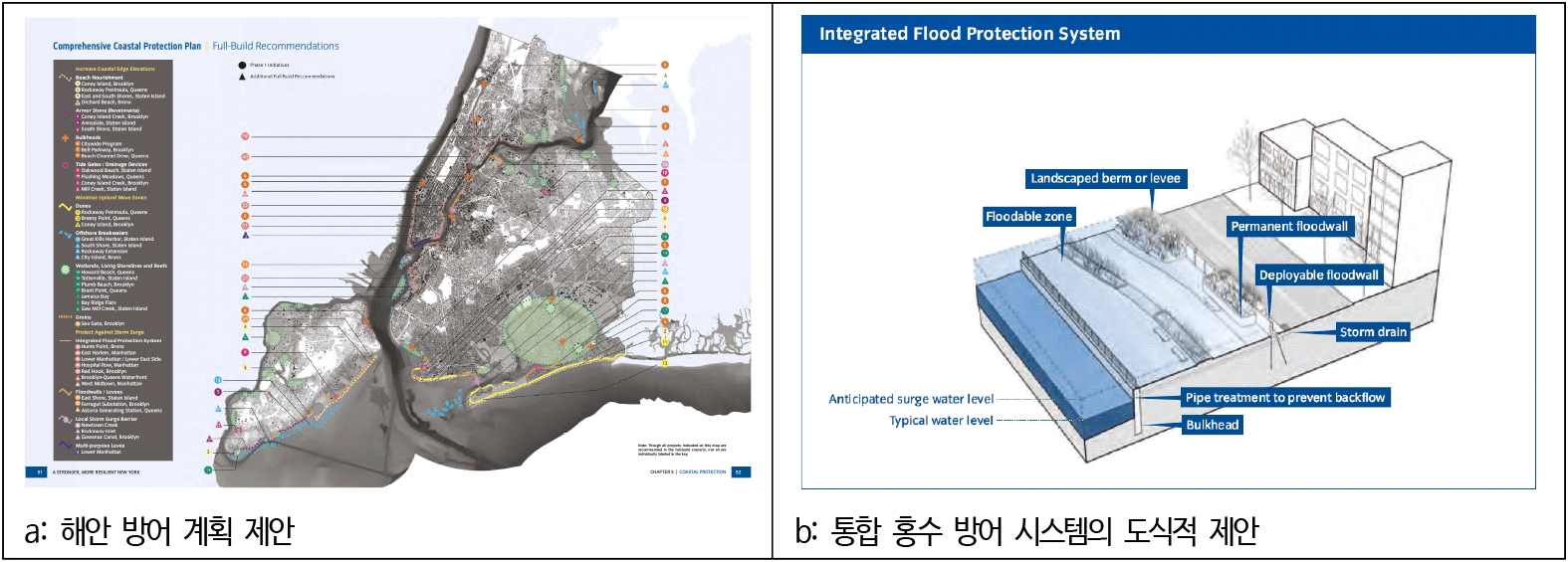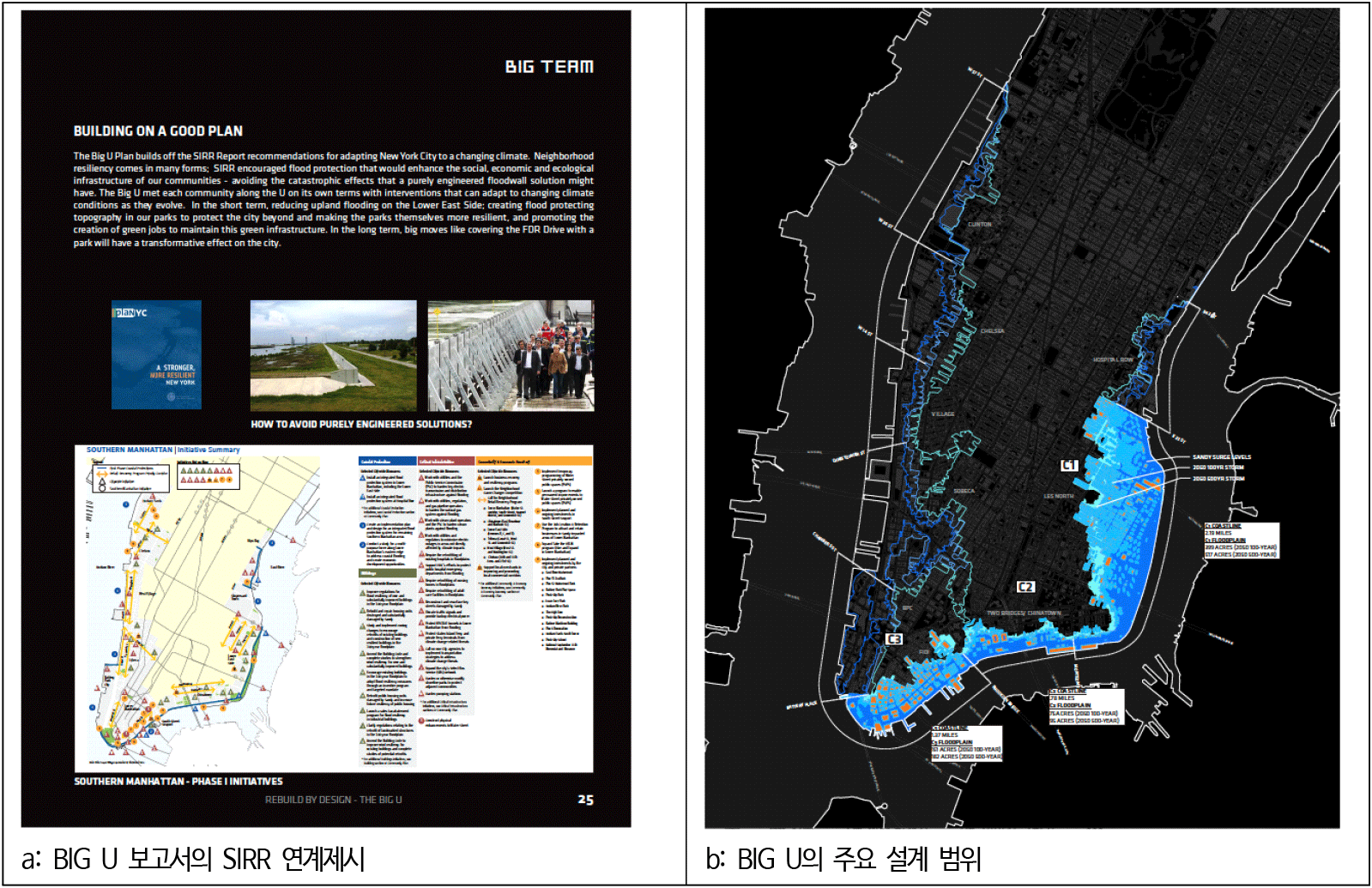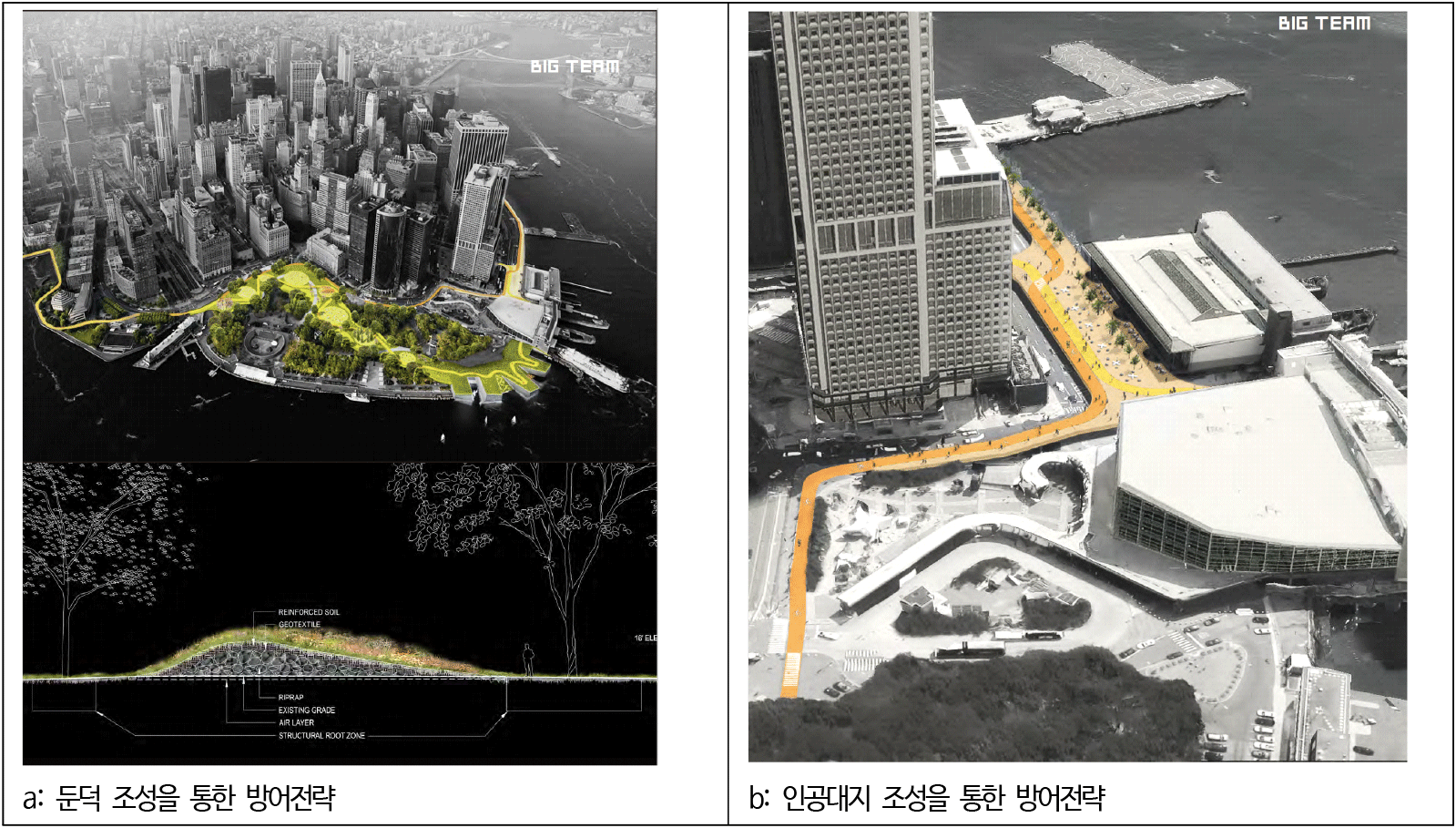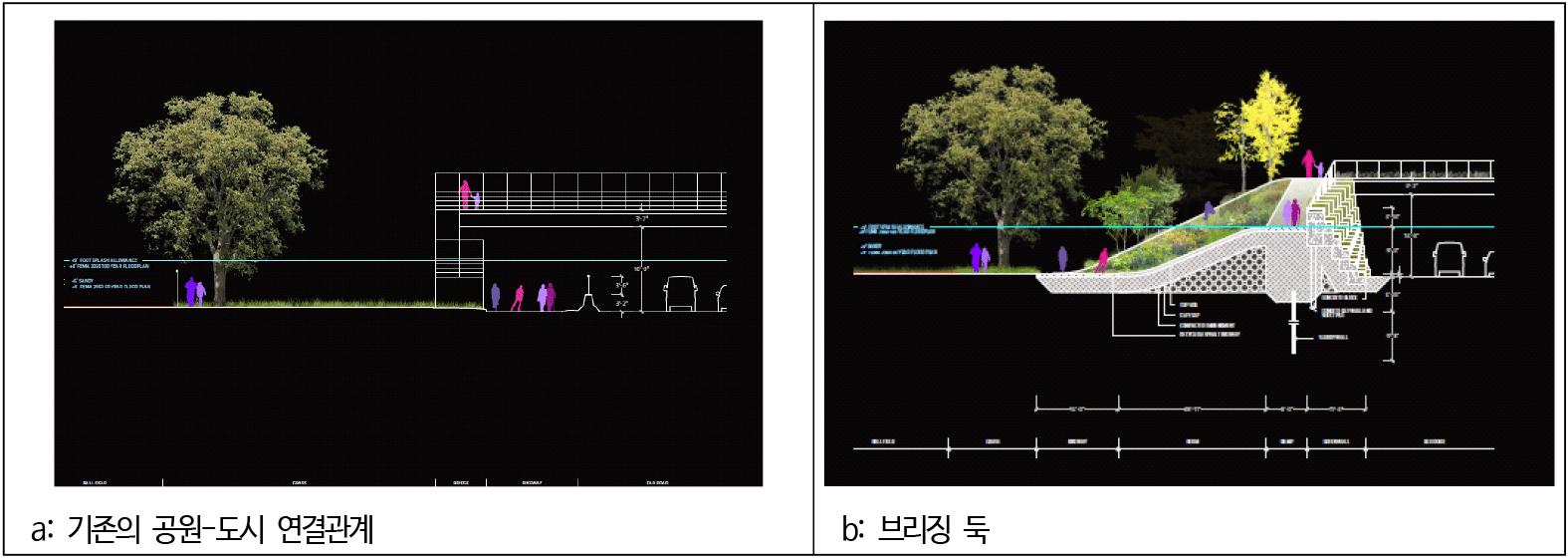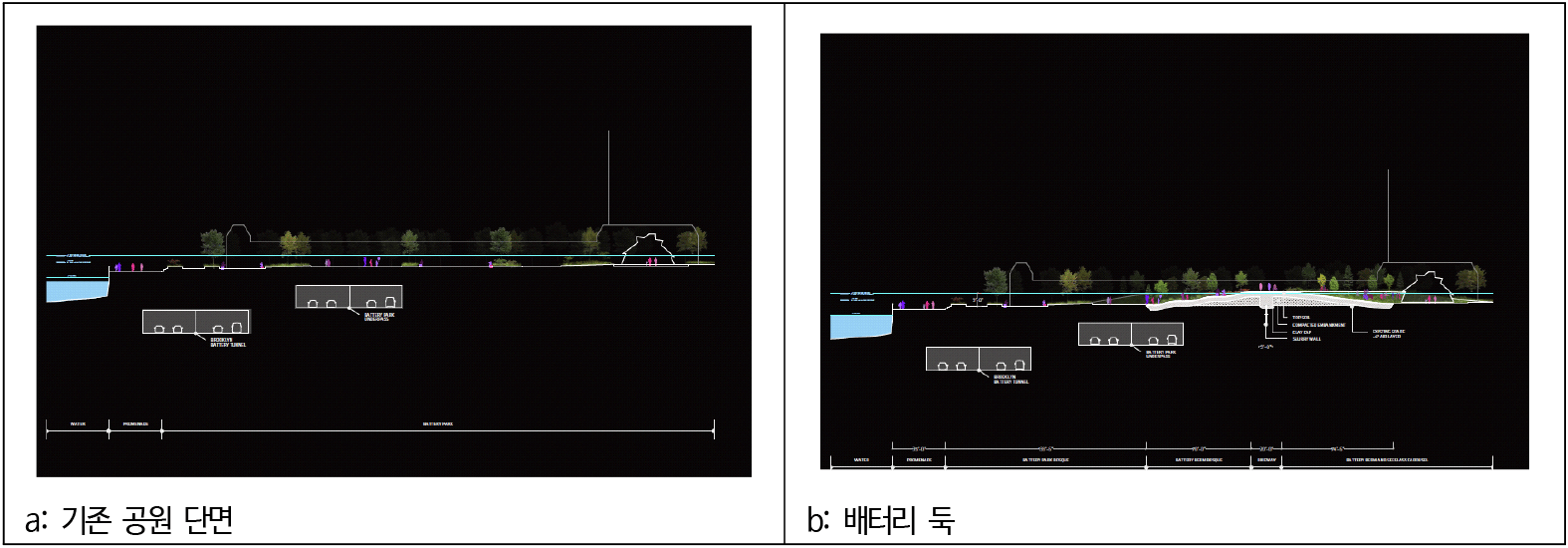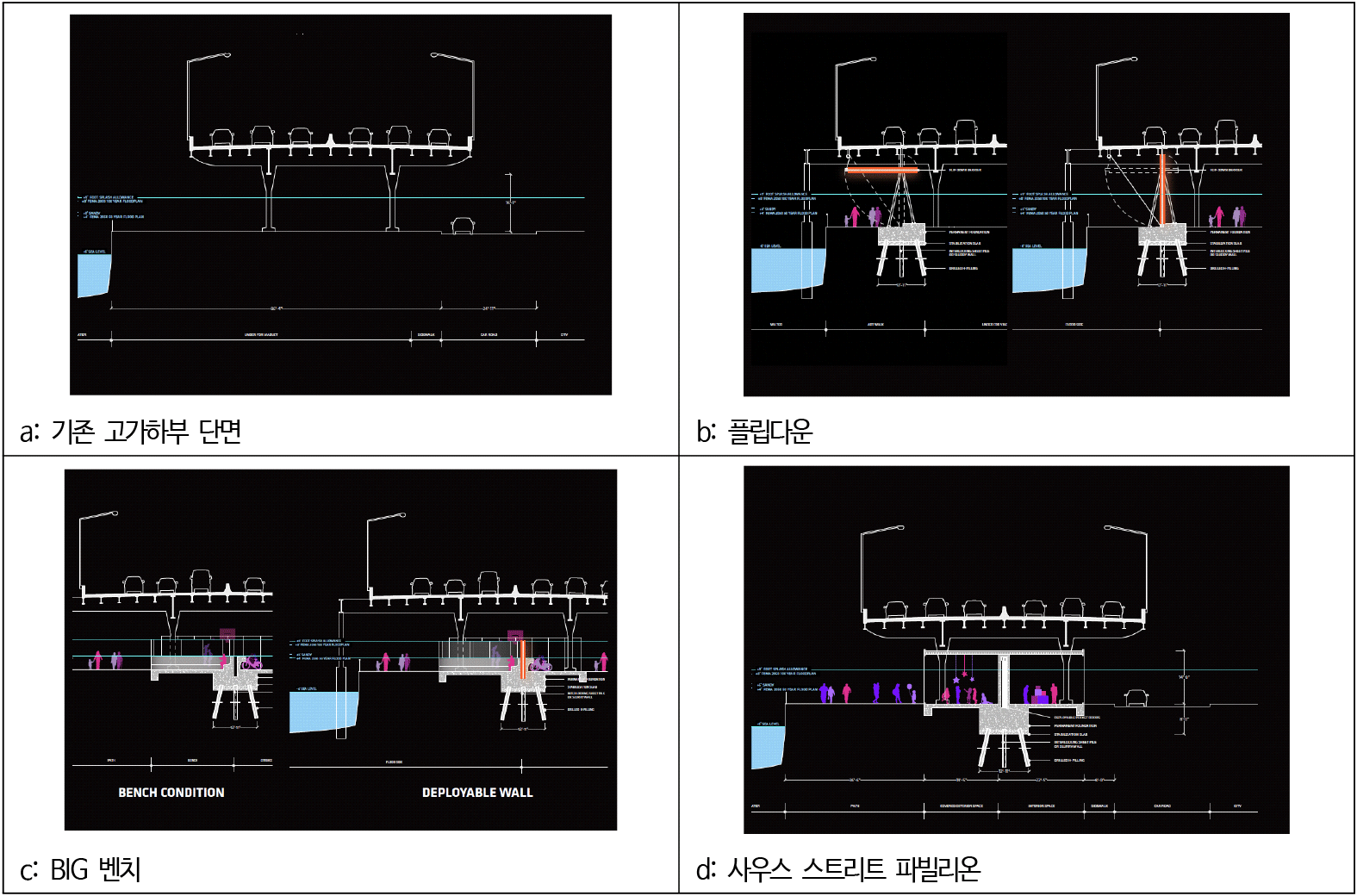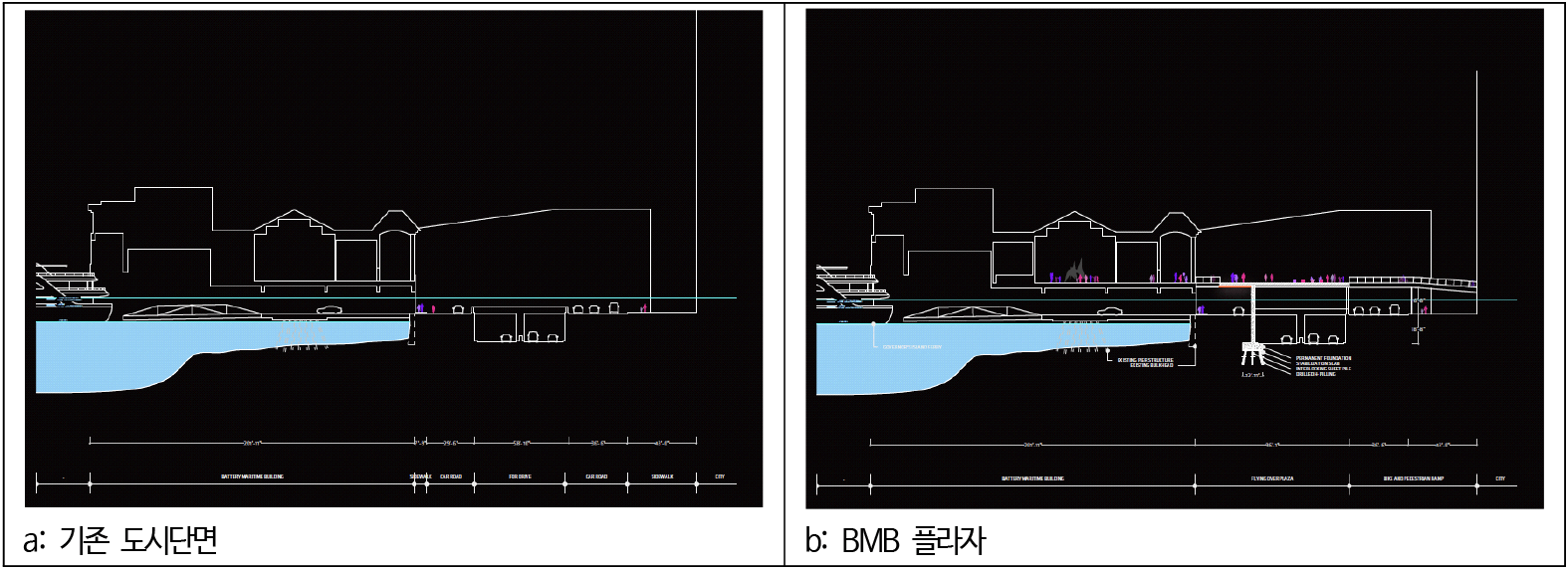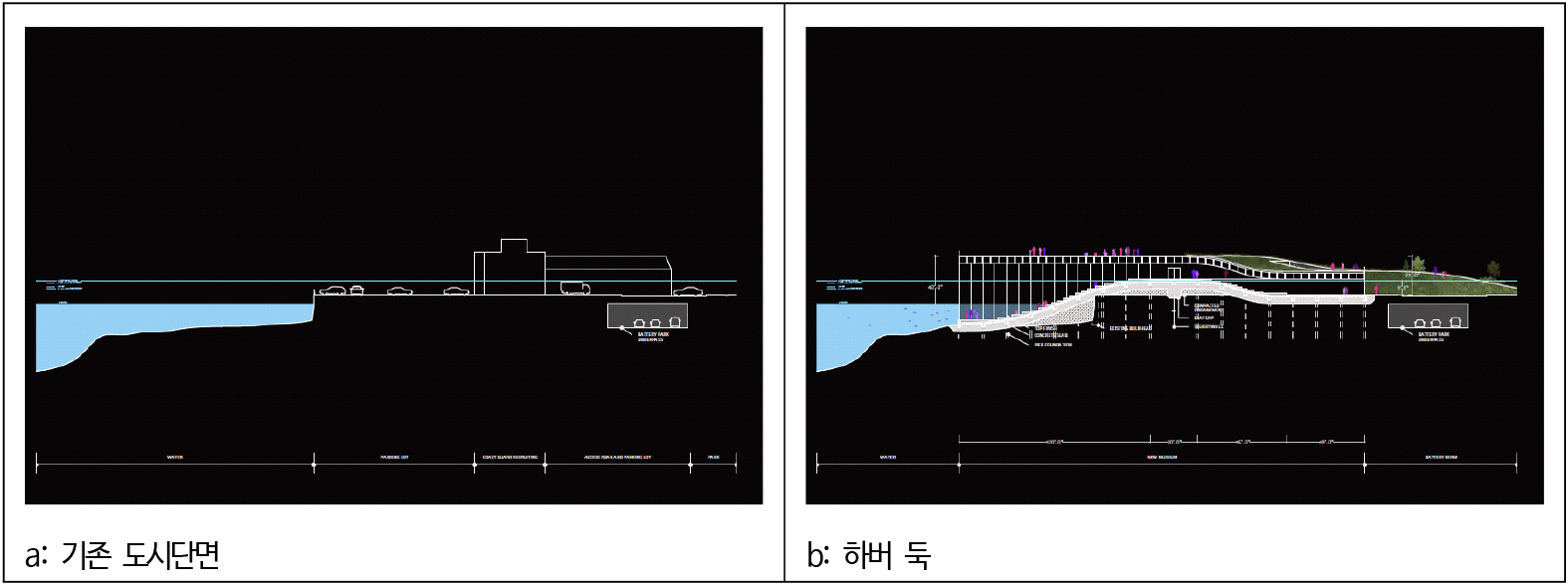1. 서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도시적 피해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3년 발생한 허리케인 샌디로 인한 도시 반파는 북미권을 중심으로 도시의 재해 대응능력 강화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변동상황에 대한 대응과 회복능력으로 이해되는 속성인 ‘리질리언스(Resilience)’는 도시의 피해 회복과 복구의 기반이 되는 개념으로 부상하였다. 록펠러 재단에 의해 진행된 100 Resilient Cities(이하 ‘100RC’라 한다.)프로그램은 각국의 도시가 리질리언스 전략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UN 재해경감기구의 센다이 프레임워크는 리질리언스가 국제적 공통 지향 가치로 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리질리언스는 생태학자 C. S. Holling에 의해 학술적으로 개념화되었다. 그는 리질리언스를 시스템이 외부 충격을 흡수하면서도 본질적인 구조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리질리언스는 시스템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핵심 개념으로 발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차용되었으며, 공학 리질리언스, 생태리질리언스, 사회-생태 리질리언스, 도시 리질리언스 등으로 세분화되며 발전해왔다. 건축 및 도시 분야에서 리질리언스 재난 대응, 도시 계획, 환경 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핵심 이론으로 활용되고 있다.
리질리언스는 정책 담론을 형성하는 매개체인 동시에, 그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행 전략으로 기능하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Davoudi, 2012; Vale, 2014; Meerow et al., 2016). 정책 분야에서 리질리언스는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새로운 도시 개념으로 인식되고 되며, 기후변화와 재난에 대응하는 전략 수립의 근거로 활용되어 도시계획과 설계의 주요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실행 전략는 다양한 분야에서 취약성을 다각도로 진단·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 즉 ‘리질리언스 디자인 프로세스’가 정립되었다. 이와 같은 취약성 대응 기반의 전략 도출 방식은 건축, 도시계획, 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리질리언스 구현의 핵심 방법론으로 자리잡았다.
리질리언스가 도입된 이래 그것의 이론적 정의와 실행전략 간의 개념적 간극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실행 전략의 검토와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실행 방법론과 리질리언스 이론 간의 개념적 정합성을 고찰하며, 구체적으로는 일반적인 리질리언스 구현 방법론으로 자리잡은 취약성 대응에 기반한 리질리언스 디자인 프로세스의 적용 사례를 분석한다. 디자인 과정의 주요 의사결정 흐름, 전략의 구체화 방식을 리질리언스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리질리언스 디자인 프로세스의 실제 적용 방식과 특성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취약성 대응 기반 리질리언스 디자인이 리질리언스 개념을 구현하는 전략으로서 적절성을 지니는지 검토하며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리질리언스 디자인 전략에 대한 담론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는 뉴욕의 리질리언스 디자인 사례인 ‘BIG U’의 리질리언스 디자인 프로세스와 설계안을 고찰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2013년 진행된 국제 설계 공모 리빌드 바이 디자인(Rebuild by Design)의 당선작인 BIG U는 BIG(Bjarke Ingels Group)팀에 의하여 설계되었으며, 뉴욕시 동남부 해안선을 대상지로 복합 방호 인프라구축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 프로젝트는 2020년 첫 착공이 이루어진 이후 순차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BIG U는 리질리언스 정책 담론을 설계 실행과 연계한 대표 사례이며. 이에 리질리언스 디자인 전략에 대한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의 범위는 BIG U의 디자인 의사결정 과정이다. BIG U는 지역의 사회적 특성과 취약성 진단을 바탕으로 하는 리질리언스 디자인 과정을 통해 해안 방어 인프라를 지역의 맥락에 특화된 전략으로 구체화 하였다. BIG U의 디자인 제안과 설계과정은 발간된 설계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리질리언스 논리에 의한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디자인 전략의 구체적 적용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BIG U의 설계보고서 통해 리질리언스 개념을 실질적인 공간 전략으로 구체화하는 디자인 의사결정 과정을 고찰한다. 이후 도출된 디자인 전략을 적응주기1)를 바탕으로 고한한 해석틀을 통해 검토한다. 이를 통해 취약성 대응에 기반한 디자인 방법론의 특성을 도출하고, 동시에 리질리언스 개념을 구현하는 전략으로서 타당성을 지니는지 검토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리질리언스는 생태학자 C. S. Holling의 논문 ‘Resilience and Stability of Ecological Systems(1973)’을 통해 최초로 개념화되었으며, 리질리언스는 ‘시스템이 외부 충격을 흡수하면서도 본질적인 구조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었다. Holling은 리질리언스를 생태 시스템 해석의 새로운 관점으로 제안하였으며, 이는 안정성(Stability)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접근방식이 변화와 교란을 겪는 생태계에 적용하는 것이 한계를 지닌다는 그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안정성에 기반한 관리는 시스템의 리질리언스를 저하시키며, 이는 교란 요인에 대한 대응력 약화로 이어진다. 그가 제시한 사례에서 리질리언스 저하된는 시스템 붕괴로 이어지고, 그 복귀는 비가역적인 양상을 보인다(Holling, 1973). Holling의 연구는 이후 리질리언스를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고, 적응 주기(Adaptice Cycle), Panarchy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해 변화와 교란에 대한 시스템 대응을 해석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Walker et al.(2004)은 리질리언스를 ‘외부의 충격에도 시스템이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속성’으로 정의하고 리질리언스, 적응력(Adaptability), 변환 능력(Transformability) 간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사회-생태 리질리언스 개념을 제안하였다. 사회-생태 리질리언스 모델에서 리질리언스는 인간이 적응과 변환을 통해 조절 가능한 속성으로 정의되며, 이는 리질리언스를 시스템에 내제된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 및 회복력으로 보았던 기존 개념과 차별화된다. 적응력은 시스템, 혹은 시스템 내 행위자가 임계값(Thresholds), 안정영역(Basin of Attraction)을 조정하는 것을 통해 리질리언스를 강화하여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며, 변환 능력은 기존 시스템이 지속력을 잃었을 때 근본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창출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연구에서 제시된 적응력과 변환 능력은 리질리언스와는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실천적 또는 정책적 담론에서는 리질리언스를 구성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다(Folke et al., 2010; Meerow et al., 2016).
Linnenluecke and Griffiths(2010)는 리질리언스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적응주기와 사회-생태 리질리언스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통합한 리질리언스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그림 1 참조). 프레임워크는 적응주기의 구성 요소인 성장(Regeneration), 보존(Conservation), 해체(Release), 재조직(Regeneration)과 사회-생태 리질리언스의 임계값(Thresholds)을 교란 이후 리질리언스가 작용하는 역학적 과정으로 재구성하였다. 리질리언스는 교란상황이 발생하였을 시 조직 성능(Organizational Performance)의 저하를 최소화하는 능력인 충격 저항성(Impact Resistance)과, 교란 이후 신속한 복구를 능력인 조직 대응(Organizational Responce)으로 구성된다. 즉, 리질리언스를 갖춘 시스템은 교란 상황에서 성능저하가 덜하며, 교란 이후 정상 수준의 성능으로 빠르게 복구되는 성질을 지닌다.
Holling의 개념 제안 이후, 리질리언스는 이론적으로 지속적인 해석과 확장을 거쳐 왔다. 초기에는 시스템에 내제하는 속성 중 하나로 정의되었으나, 이후에는 그 자체가 분석의 대상이 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의되고 구체화되었다. 오늘날의 담론에서 리질리언스는 시스템이 충격이나 교란에 직면했을 때의 대응 능력으로 이해되며, 기능 유지, 피해 회복, 구조 전환 등 다양한 차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도시 정책 영역에서 리질리언스는 도시의 재해 대응력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재난과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 방식으로 부각되고 있다. Karydi(2024)에 따르면, 리질리언스는 도시화, 기후변화, 글로벌화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담론의 중심 개념으로 자리 잡았으며, 정책 수립의 방향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록펠러 재단의 주도로 2013년 시행된 100RC 프로그램은 도시 리질리언스 구현을 목표로 참여도시의 리질리언스 전략 수립을 지원하였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100개의 도시들은 자체적인 리질리언스 평가를 바탕으로 리질리언스 전략을 도출하였다. 평가는 Arup에 의해 개발된 평가틀인 City Resilience Framework(이하 ‘CRF’라 한다.)을 통해 이루어졌다2). 각 도시는 보건과 웰빙, 경제와 사회, 인프라와 환경, 리더십과 전략의 4가지 분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의 리질리언스 목표와 정책을 수립하였다(Arup, 2014). 100RC 프로그램은 도시 리질리언스 구축 과정에서 취약성 진단과 대응 전략 수립을 핵심적 절차로 정립시킨 것으로 평가받는다(Galderisi et al., 2020).
리빌드 바이 디자인(Rebuild by Design)과 리질리언트 바이 디자인(Resilient by Design)은 리질리언스를 도시 디자인에 도입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는다. 2013년부터 1년간 진행된 리빌드 바이 디자인은 허리케인 샌디 이후 진행된 국제 디자인 공모전으로, 재난 이후의 복원 및 회복을 주제로 하였다. 공모는 지역의 문제요소를 분석하고, 지역 주민과 지역 전문가와 협업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2017년부터 1년간 진행된 리질리언트 바이 디자인은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디자인 공모전이다. 기후 변화에 대한 사전대응을 주제로하여 리빌드 바이 디자인과 절차적으로 유사한 구조로 진행되었다 두 사례 모두 공간적으로 리질리언스를 구현하고자한 시도로 평가받으며, 각각 6개, 9개의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지역 참여에 기반한 설계안 개발을 지원받았다(최혜영과 서영애, 2018: 49. 재인용).
센다이 프레임워크(Sendai Framework)는 UN 재해경감기구(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UNISDR)가 2015년 유엔 재해위험경감 세계회의에서 채택한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국제지침이다.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경제적 손실, 피해 발생을 줄이고, 사회 경제적 환경적 복원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대 우선행동으로 ‘재난위험 이해 증진,’ ‘재난위험관리의 강화’, ‘리질리언스를 위한 재난위험 완화에 대한 투자’, ‘복구 과정에서 <더 나은 재건> 추구’를 제시했다. 센다이 프레임워크는 재난관리정책에서 리질리언스가 글로벌 정책 의제로 채택된 전환점이 되었으며, 재해 이후 대응에 중점이 맞추던 이전의 재난 대응을 위험의 구조적 원인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Aitsi-Selmi et al., 2015).
리질리언스의 대두 이후, 개념적용 양상과 실현방법론을 검토하는 다양한 후속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는 리질리언스가 개념 모호성을 지닌 채로 활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체계적 검토에 이은 구체적인 실천전략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리질리언스는 정책 담론에서 빈번히 활용되고 있지만 정의가 분야별로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념과 실행 전략 간의 괴리 또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Davoudi(2012)에 따르면, 리질리언스는 생태학, 도시계획, 사회학, 정책학 등 다양한 분야를 연결하는 연결개념(Bridging Concept)이며, 다분야적 통섭의 도구로 정책과 학문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하지만 명확한 방법론적 기반 없이 다양한 분야에 개념이 차용되면서 개념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치적 수사(Rhetoric)로 남용되는 양상을 띔을 지적하였다. 또한 기후 변화 분야의 적용에서 리질리언스는 여전히 공학 리질리언스3) 관점에 머물러 있으며, 시스템의 선형적으로 인식에 기반한 기존 시스템 보존에 집중한다고 비판하였다.
Meerow et al.(2016)은 도시분야에서 리질리언스를 활용한 연구의 개념 정의를 종합하였다. 연구는 도시의 정의, 평형상태 이해, 리질리언스 메커니즘 등 다양한 관점에서 도시 리질리언스에 대한 개념적 긴장(Conceptual Tensions)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연구에서 도시 리질리언스를 ‘도시가 충격을 받았을 때 기능을 유지하거나 빠르게 회복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필요한 경우 시스템 자체를 전환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최혜영과 서영애, 2018, 재인용). 리질리언스 실행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여하는 논쟁적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수혜대상, 대응요인, 대응시점 등에 대한 맥락적 판단이 관여되야 함을 강조하였다.
Davison et al.(2016)은 리질리언스가 개념적 논의 단계에서는 다방면의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실제 적용을 위한 구체적 행동지침이나 평가 체계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리질리언스의 개념 정의가 분야마다 상이하며, 공통 정의가 부재한 상황이 리질리언스를 정책 및 계획 수립 단계에서 구체적 행동 지침으로 전환하는 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한고 지적하였다. 리질리언스가 개념적 논의와 적용간의 간극을 보완하지 못할 경우 수사적 장치에 그칠 것을 경고하며, 공통 정의를 도출하고, 측정 가능한 평가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Shamsuddin(2020)의 연구는 도시 리질리언스 개념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과정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였다. 그는 연구를 통해 리질리언스 정의 방식은 구현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구현과정의 검토가 리질리언스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정의에 다시 영향을 끼치는 순환적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리질리언스를 단순히 이론적 개념이 아닌 실행 중심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 리질리언스의 개념과 실제 적용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는 간극을 보완하는 구현방식의 개발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여러 분야에서 리질리언스의 실무적 적용을 위한 리질리언스 프로세스 가이드가 발간되고 있으며, 도시 취약성 평가에 이은 대응과 리질리언스 구현을 연관짓는다. 제안되는 리질리언스 프로세스는 공통적으로 ‘다방면의 취약성 요인 식별 - 대응방안 도출 - 평가’ 의 구조를 가지며, 다양한 도시 데이터와 커뮤니티 조사를 통한 지역 취약 요인 식별에 이은 대응을 핵심 과정으로 제시한다(표 1 참조).
미국 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은 2022년 발간한 ‘Implementing the Steps to Resilience’ 를 통해 리질리언스 전략 실행을 위한 5단계 실천 프로세스를 제시했다. NOAA가 제시하는 리질리언스 전략의 핵심 요소는 취약성 매핑, 다층적 평가지표 개발, 커뮤니티 참여를 통한 취약성 평가(Assess Vulnerability & Risk)이다. 데이터 수집에 이은 취약성 평가 결과를 리질리언스 전략 수립과, 투자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Gardiner et al., 2022).
미국 건축사 협회(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는 2023년 발간한 ‘Resilience Design Toolkit’을 통해 취약성 평가에 기반한 리질리언스 디자인 프로세스를 구체화했다. 리질리언스 프로젝트의 설계과정은 5가지 절차로 나누어 제시된다. 재해에 대한 위험 및 취약성을 평가하고, 결과를 기반으로 한 솔루션 전략 도출이 그 핵심이다. 데이터에 기반해 지역의 재해 위험성을 평가하고, 재해로 인한 주 영향(Primary Impacts)와 2차영향(Secondary Impacts)를 도출해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디자인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2023).
유엔해비타트(UN-Habitat)는 2024년 복합적이고 상호작용적인 도시 진단을 통한 리질리언스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그를 위해 다층적 취약성 평가(Multilayerd Vulnerability Assessment: MVA) 모델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유엔해비타트는 리질리언스 프로세스를 준비-매핑 및 분석-전략개입의 총 3단계로 정의하였다. 특히 매핑 및 분석 과정에서 취약성 중첩지도를 작성을 통한 다층적 취약성 평가가 진행된다. 취약성 중첩 지도 작성에는 기후변화, 도시화, 생물다양성의 세가지 관점이 개입되며, MVA를 통해 이들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통합한다. 유엔해비타트는 이를 기반으로 다차원적 취약성이 집중된 지역을 식별하고, 식별 결과를 리질리언스 전략 수립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UN-Habitat, 2024).
국내에서는 리질리언스 평가체계와 지표를 구축해 도시 및 디자인을 분석하여 함의점을 도출하는 연구들과, 리질리언스 프로젝트가 지니는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표 2 참조).
이성희와 김정곤(2016)은 리질리언스를 체계화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잠재력과 연결성에 기반한 ‘리질리언트 시티 평가기준’을 도출했다. 독일의 함부르크 워터사이클 엔펠더 아우(Hamburg Water Cycle Jenfelder Au)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분석하였으며, 사례도시가 이상기후와 에너지고갈을 위험요소로 인식하고 ‘도시 물 관리 전환’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음을 보였다. 이후 리질리언스 시티의 개념과 모델 도입, 제도적 방안 마련 등 지속적 연구의 확장을 제안하였다.
이혜민 등(2017)은 도시 방재 기능 개선을 통한 리질리언스 향상을 위해 그린인프라가 제시되고 있음을 보이고, 여러 재해 유형에 따라 그린인프라의 적용 유형과 활용 가능성을 도출하였다. 그린인프라가 제공하는 방재기능이 도시 리질리언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기 위하여는 멀티스케일 전략에 따라 도시 내 그린인프라 전략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전략이 필요하며, 그린인프라의 적용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확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최혜영과 서영애(2018)는 CRF를 활용해 분석틀을 구축하고, 리질리언스 개념을 기반으로 리빌드 바이 디자인과 리질리언스 바이 디자인과 리질리언트 바이 디자인 설계 공모 출품작들을 평가 및 분석하였다. 이후 설계 프로세스 특성을 준비, 조사 및 분석, 계획 및 설계, 실행의 4단계에 따라 과정적으로 분석하였다. 리질리언스 디자인은 도시 공간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설계 전략이며, 일상적 도시계획과 대형공원의 설계전략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가진다고 진단하였다.
표희진(2018)은 100RC 프로그램에 참여한 도시 중 로테르담, 멜버른, 뉴올리언스의 리질리언스 도시 설계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문턱(Thresholds), 적응주기, 파나키(Panarchy)를 기반으로 한 분석틀을 통해 각 측면의 도시설계 기법과 그 특징을 정리하였다. 기존 도시 시스템 및 기능의 강화, 유기적 결합 형태, 신기술의 적용, 네트워킹 구조 등을 리질리언스 설계 특성으로 제시하였으며, 각 재해 대응 설계기법을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리질리언스 도시 설계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장사정(2022)은 리질리언스개념을 활용해 도시 방재공원의 방재력에 대한 평가지표를 구축하였다., 도시생활권 공원의 리질리언스와 연계된 속성을 다양성(Diversity), 내구성(Robustness), 대체성(Redundancy), 신속성(Rapidity), 자원동원성(Resourcefulness)의 다섯가지로 제안하고, 도시방재공원의 방재력 평가지표를 구축해 국내 생활권 지진대피공원의 방재력을 평가하였다.
전진현(2023)은 리질리언트 바이 디자인 공모전과 스펀지 시티 프로젝트를 리질리언스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기후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미래 변수에 대응하는 제안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들은 생태적이고 조경적인 방식의 채택, 과정중심적 설계의 지향, 단일기능의 대입이 아닌 다양한 기능의 통합시도 등을 특징으로 지님을 보였다.
국내 선행연구들은 리질리언스를 기반으로 분석틀을 고안하고, 도시 방재와 연관된 프로젝트를 평가하여 각 디자인 요인이 도시 리질리언스에 기여하는 바를 평가하였다. 이는 리질리언스 개념이 적용된 프로젝트의 일반적 특성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리질리언스 개념이 어떻게 프로젝트 구현 과정에 영향을 끼치며, 결과물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연구대상 및 분석 개요
A Stronger, More Resilient New York(이하 ‘SIRR 보고서’라고 한다)은 뉴욕시가 2013년 발간한 리질리언스 정책 보고서로, 허리케인 샌디 이후 구성된 특별 기획단인 Special Initiative for Rebuilding and Resiliency(이하 ‘SIRR’이라 한다.)에 의해 작성되었다. SIRR은 당시 블룸버그 시장의 주도 하에 구성되었으며, 뉴욕시의 기후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종합적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활동하였다. SIRR 보고서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을 넘어, 도시가 외부 충격을 견디고, 적응하며,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리질리언스의 핵심으로 제시하며, 위협요인에 대한 단순한 방어보다는 회복력 있는 도시구조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City of New York, 2013).
보고서는 도시의 기후재난 위험상황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실행과제(Initiative) 형식으로 제안하는 구조를 취한다. 리스크 진단 단계에서는 허리케인 샌디 당시 확인된 지역 별 취약점을 분석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해 미래 도시 리스크를 평가한다. 리스크 진단과 대응 도출은 Coastal Protection, Buildings, Insurance, Utilities, Liquid Fuels, Healthcare, Telecommunications, Transportation, Parks, Water and Wastewater, Other critical Networks의 11가지 영역에서 진행되었다. 이후, 도시 해안구역을 Brooklyn-Queens Waterfront, Staten Island East & South Shores, South Queens, Southern Brooklyn, Southern Manhattan의 5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리질리언스 목표를 총 257개의 실행과제로 제안한다. 정책, 인센티브, 프로그램 도입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였으며, 해안선 보호(Coastal Protection), 건축환경 개선(Buildings), 중요 인프라 강화(Critical Infrastructure), 커뮤니티 및 경제 회복력(Community & Economic Recovery)을 중심으로 전략을 구체화하였다. 리질리언스 전략은 100년 빈도 홍수구역 내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한 홍수 회복탄력성 기준 강화, 홍수구역 내 요양시설의 구조적 보강 의무화, 사업체 회복 및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이 포함된다(그림 2a 참조).
이 중 방호 인프라 구축과 연관된 해안석 보호에 대한 정책제안은 Increase Coastal Edge Elevations, Minimize Upland Wave Zones, Protect Against Storm Surge의 세가지 측면에서 제안되며, 지역 특성에 기반하여 Beach Nourishment, Dunes, Multi-purpose Levee, Floodwall 등의 디자인 방안이 지정되었다. BIG U의 대상지인 맨해튼 동남부 해안에 제시된 방안은 통합 홍수 방어벽(Integrated Flood Wall)이며, 방어 시스템을 다양한 요소와 통합하고, 맞춤화할 수 있는 구조로 발전시키는 것을 제안하였다. 통합 홍수 방어벽은 주변의 도시환경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디자인 구현 예시를 도식적으로 제안하였다(그림 2b 참조).
BIG U는 2013년 허리케인 샌디(Hurricane Sandy) 이후 미국 연방정부가 추진한 리빌드 바이 디자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된 국제 공모전에서 당선된 리질리언스 설계 프로젝트이다. BIG U는 Bjarke Ingels Group(BIG)이 주도한 설계팀의 제안한 계획으로, 맨해튼 동부와 남부 연안을 대상으로 SIRR이 제안한 해안선 방어 대책을 리질리언스 디자인 과정을 통해 구체화하였다(그림 3 참조). 맨해튼 동남부 해안 지역을 인접 지역의 특성에 따라 이스트 리버 파크(East River Park), 투 브릿지스/차이나 타운(Two Bridges/ChinaTown), 배터리 투 브루클릿 브릿지(Battery to Brooklyn Bridge)로 나누어 디자인을 제안하였다(BIG Team, 2014).
테일러드 리질리언시(Taylored Resiliency)로 소개되는 BIG U의 리질리언스 디자인 프로세스는, 지역의 특성과 취약성에 대응해 디자인 전략을 도출하는 디자인 접근이다. 각 해안 지역의 물리, 문화적 특성은 현장 답사와 시민 참여 워크숍을 통해 조사하여 도출되었고,, 도출된 요인 대한 대응은 홍수 방어 전략에 통합되었다. 이러한 디자인 과정을 통해 SIRR이 제시한 해안선 방어 전략은 방호둑, 인공대지, 둑덕조성 등의 전략 등으로 구체화 되었다(그림 4 참조).
BIG U는 East Side Coastal Resiliency(ESCR), Brooklyn Bridge Montgomery Coastal Resilience(BMCR), Lower Manhattan Coastal Resilience(LMCR), Battery Park City Resilience Projects 의 4가지로 재분할되어 구현되고 있다. 동부 해안선 계획인 ESCR과 브루클린 브리지–몽고메리 구간인 BMCR은 각각 2022년, 2020년 착공하여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며, Battery park지역은 2023년 착공하여 순차적으로 공사가 완료되고 있다(https://rebuildbydesign.org/work/funded-projects/the-big-u/).
연구는 문헌을 기반으로 한 사례조사로 이루어지며, 허리케인 샌디 이후 작성된 SIRR 보고서의 리질리언스 전략을 연계하여 구체화한 프로젝트인 BIG U를 연구대상으로 선정였다. BIG U 프로젝트가 제시한 8개의 리질리언스 디자인 전략 중 단면계획이 제시된 7개의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디자인 전략을 공원, 고가하부, 업무지구의 4가지 범위로 재범주화 하였다(표 3 참조). 문헌 고찰의 주요 범위는 BIG U의 설계보고서에 나타나는 리질리언스 디자인 과정이며, 디자인 과정의 주요 의사결정 흐름, 전략의 구체화 방식, 구역별 구현 방안을 리질리언스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 디자인 제안 | 위치 | |
|---|---|---|
| 공원 | 브리징 둑 | 이스트 리버 파크 |
| 배터리 파크 | 배터리 투 브루클린 브릿지 | |
| 고가하부 | 플립다운 | 투 브릿지스 / 차이나 타운 |
| BIG 벤치 | 투 브릿지스 / 차이나 타운 | |
| 사우스 스트리트 파빌리온 | 배터리 투 브루클린 브릿지 | |
| 남부 연안 | 하버 둑 | 배터리 투 브루클린 브릿지 |
| BMB 플라자 | 배터리 투 브루클린 브릿지 |
분석은 두 단계를 걸쳐 이루어진다. 먼저, BIG U의 리질리언스 디자인 전략을 대응요인, 대응방식, 대응시점으로 세 요소로 구분하여 구조화한다. 이후 리질리언스 전략을 리질리언스 주기의 틀에 따라 유형화한다. 이러한 구조화와 유형화를 토대로 BIG U가 제시하는 리질리언스 디자인의 전략특성과 함의를 도출한다.
본 연구는 Meerow et al.(2016)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디자인 전략을 맥락화한 뒤, 리질리언스 주기에 따라 각 전략의 리질리언스 특성을 유형화한다. 디자인 맥락화는 대응요인, 대응방식, 대응시점의 세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한다. 대응요인은 도시가 직면한 교란 요인 또는 취약성을 의미하며, 디자인 전략은 이를 해결하거나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대응방식은 이러한 요인에 대한 구체적 설계 접근으로, 성능 향상, 성능 유지, 성능 저하 최소화, 전환의 방식으로 구분된다. 대응시점은 디자인 전략이 작동하는 시간적 국면을 의미하며, 일상 상황, 교란 상황, 교란 이후로 구분된다.
이후 리질리언스 디자인 전략을 리질리언스 주기에 대응하여 유형화하고, 해석한다(표 4 참조). 도시의 일상적 상황에 대한 대응은 리질리언스 주기 관점에서 ‘성장’ 및 ‘보존’에 대응된다. 도시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하는 리질리언스 전략은 ‘성장’에 대응하며, 도시에 내제된 취약요인에 대응하는 것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도시 시스템의 성능을 유지하는 리질리언스 전략은 ‘보존’에 대응하며, 예측되는 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차단 으로 구현될 수 있다. 시스템 교란이 발생하였을 때의 대응은 리질리언스 주기 관점에서 ‘해체’ 및 ‘재조직’에 대응된다. 도시 시스템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는 리질리언스 전략은 ‘해체’에 대응하며, 교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구현할 수 있다. 교란으로 인해 시스템 성능이 급감한 해체 상황에서, 새로운 체제를 구현하는 것은 ‘재조직’에 대응한다. 이는 해체 이후 이전으로의 원상복구가 아닌 새로운 도시제도와 구조 재편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 리질리언스 주기 | 전략 유형 | 시점 | 특징 |
|---|---|---|---|
| 성장 | 성능 향상 | 도시 일상 상황 | 도시 성능의 보수와 강화 |
| 보존 | 성능 유지 | 도시 일상 상황 | 도시 성능의 유지 및 보호 |
| 해체 | 성능 저하 최소화 | 교란 상황 | 교란에 의한 도시 성능 저감에 대한 예방과 저감 |
| 재조직 | 전환 | 교란 이후 | 교란에 의한 도시 기능의 붕괴 이후 복구능력 |
해석 과정에서는 Linnenluecke and Griffiths(2010)의 리질리언스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리질리언스 주기에서 ‘해체’와 ‘재조직’에 대응하는 전략이 리질리언스 개념과 정합성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한다. 구체적으로는 교란상황에서도 시스템 성능저하를 최소하하고 기능을 유지하며, 교란으로 인한 해체 이후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이 도시 리질리언스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다.
4. 리질리언스관점의 BIG U 프로젝트 분석
동부 이스트 리버 파크(East River Park) 지역과 남부 배터리 파크(Battery Park) 지역에는 기존의 공원과 물리적으로 결합된 둑(Berm)이 재해대응 시스템으로 제안되었다. 방호둑은 도시의 취약성 및 특성과 결합하여 구체화 되었으며, 특히 기존 공원의 기능과 가치를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동부 해안에 위치한 브리징 둑(Bridging Berm) 프로젝트는 이스트 리버 파크와 도시를 연결하는 육교 구조체를 다기능 방호둑으로 변형하는 디자인을 제안한다. 기존 도시 단면에서(그림 5a) FDR 드라이브(FDR Drive)는 홍수 발생 시 수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된다. 브리징 둑 프로젝트는 홍수위에 대응하는 방벽을 구축하고, 공원 및 도시 경관환경과 통합하는 구체화방식을 제안한다(그림 5b 참조). BIG 팀은 염분에 취약한 단일수종 식재, 고속도로의 차량에서 배출되는 유해배기가스, 취약계층에 대한 공원 접근성 부족, 기존 공원의 기능과 경관 유지 필요 등을 이스트 리버 파크 인근의 취약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식재계획의 경우, 에디알 드라이브와 마주하는 벽면에는 내염성이 강한 식물을 포켓공간에 배치하며, 그를 통해 차량 배기가스를 정화하고 동시에 방호벽의 미관을 개선하였다. 공원 접근성의 경우, 고속도로와 방벽으로 인해 저하되는 공원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와 공원을 연결하는 교량을 확충하고, 장애인법을 준수하는 경사로를 완만하게 배치해 누구나 편리하게 공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기존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둑은 넓은 경사면으로 배치하고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여 더욱 넓은 공공공간을 확보하고, 기존 스포츠 필드가 위치한 구역은 폭이 좁아지도록 계획하고, 수상택시 선착장, 수영장 등의 시설을 추가로 배치한다.
남부 해안의 배터리 파크에 통합되는 배터리 둑(Battery Berm) 프로젝트는 기존의 공원과 홍수방지대책을 통합한다. 배터리 파크 인근 시설은 홍수 발행시 직접적으로 수해에 노출되며, 공원은 도시와 해안 사이의 경계를 형성하고 있다(그림 6a 참조). BIG 팀은 조사를 통해 허리케인 샌디 당시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공원의 고도가 주변의 피해 저감 요인이었다는 지역 특성을 도출하였다. 둑은 기존 공원에 인공 구조물이 개입하는 것이 유발하는 이질감을 저하하고, 공원 공간의 양분을 막기위해 위하여 상부가 녹화된 둔덕으로 제안되어 기존 공원과 일체화된다(그림 6b 참조).
동부 해안을 가로지르는 FDR 드라이브의 하부에는 차이나 타운(China Town)과 사우스 스트리트 시포트(South Street Seaport)지역에 3가지 프로젝트가 제안되었으며, 가동식 방벽을 여러 프로그램과 통합하였다.
먼저 차이나 타운 지역에는 플립다운(Flipdown)프로젝트와 BIG 벤치(BIG Bench)프로젝트가 제안되었다. 고가하부 비활성화가 지역의 범죄 위험성을 증진는 점과, 고밀도 주거지에 대응하는 적합한 공공시설이 부재한 점이 지역의 대한 특성 및 취약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도출요인에 대응하여 두 설계안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고가하부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플립다운 프로젝트는 재해 상황 시 상부에서 하강하는 구조체를 통해 FDR 드라이브와 통합된 방호기능을 구현하고, 야간조명을 패널에 통합하여 고가 하부의 조도를 개선해 쾌적한 공공공간을 조성한다(그림 7b 참조). BIG 벤치 프로젝트는 높이 약 1.2m의 벤치를 지그재그 형식으로 배치한다. 벤치는 허리케인 샌디 당시의 홍수위에 대응하며, 차수벽과 결합하는 것을 통해 유사시에는 더 큰 규모의 홍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다양한 여가시설을 추가적으로 배치하며, 사회교류공간, 스케이트보드파크, 레크리에이션공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한다(그림 7c 참조).
BIG 팀은 사우스 스트리트 시포트 지역의 특성과 취약성을 주변부에 위치한 시장이 도시의 주요 관광자원 역할을 하고 있는 점과, 고가하부가 지역과 수변을 연결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도출하었다. 사우스 스트리트 파빌리온(South Street Pavilion)은 은 고가하부에 선형의 파빌리온을 배치하고, 구조체를 차수벽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파빌리온을 상업공간 및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통해 지역 상업특성과 결합한 활성화를 유도한다(그림 7d 참조).
남부 금융지구 인근 연안은 도심과 밀접한 지역으로, 제안된 프로젝트들은 방호대책을 도시 공공시설과 통합한다. 해당 리질리언스 전략은 공공공간을 확장시킨다는 특징을 가지며, 이는 고층건물의 밀집으로 인한 여가공간 저하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기반한다. 방호벽이 인공대지의 구조체로 활용되거나 해안선과 연계되어 설계된 건축물이 방호역할을 하는 양상을 띄며, 이를 통해 도시의 공간적 규모를 확장한다.
BMB 플라자(BMB Plaza)는 배터리 매리타임 빌딩(Battery Maritime Building)인근에 해안선 방어와 공공공간 창출을 도모하는 통합형 방호벽이다(그림 8a 참조). BIG 팀은 인근에 홍수 발생 시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가 위치하며, 빌딩과 차도 중심의 공간 구성으로 인해 도시 여가공간이 부족한 점을 취약성 및 특성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고가 공공광장 및 수변산책로의 하부 구조체인 방호벽은 지하차도의 벽체를 상부로 확장하여 실내화한다. 제안된 인공대지는 기존 지역에 부족했던 여가시설을 확장하며, 서부 배터리파크와 동부 FDR 드라이브 하부의 리질리언스 전략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작동한다(그림 8b 참조).
하버 둑(Harber Berm) 프로젝트는 방호 성능을 갖춘 문화공간이 홍수방어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수밀성능을 지닌 건물 구조체를 방호수단으로 활용하고, 지역 전체의 공간 구조를 재조정하는 것을 통해 홍수 방어 기능을 구현한다. 해안선을 따라 건설되는 해양박물관은 지역의 전반적인 고도를 상승시며, 동시에 녹지로 조성된 상부는 도시의 영역을 확장한다(그림 9a, 9b 참조).
BIG U가 대응하는 주요 교란은 홍수로 인한 피해와 방호벽으로 인한 도시 성능 저하이다. 두 교란요인에 대한 BIG U의 디자인 대응은 현재의 시스템 성능을 가능한 유지하고, 예측되는 교란 및 시스템 성능 저하를 미연에 차단하는 성격을 띈다. 이는 리질리언스 주기 상에서 시스템 성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는 개입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보존’ 및 ‘해체’ 시점에 대응된다(표 5 참조).
먼저, BIG U의 주요 디자인 제안은 홍수 대응에 기반한다. 홍수방어대책은 둑, 차수벽, 시설 구조체 구축 등으로 지역의 기존 환경에 따라 다르게 최적화되었다. 개념적으로는 홍수를 방어하는 차수벽을 구현한다는 공통점을 지니며, 시설물 고도는 연방재난관리청의 예측 홍수위에 기반하여 계획되었다. 차수벽은 기존 홍수방어대책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홍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재 시스템이다.
동시에 BIG 팀은 방호벽을 기존 도시가치에 대한 교란요인으로 인식한다. 방호벽은 홍수로 인한 교란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조사 및 시민 참여 워크샵 과정에서 경관과 공공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소로 지적되었다. East River Park지역의 경우, 방호둑은 공원 접근성을 저해하며, 경관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요소로 인식되었다. 디자인 전략은 이에 대응해 접근로를 확충하고, 조경계획과 통합된 방호둑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Battery 지역의 경우, 공원과 인접한 방호벽은 공원 시설을 양분하거나, 도시와 공원간의 연결을 저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인식되었으며, 공원의 기능을 유지한채로 지형을 재조정하여 홍수위에 대응하는 디자인을 통해 대응하였다.
지역 취약성 도출과 대응은 경관, 환경, 여가 등의 여러 가치를 포괄하였으며, 차수벽을 다양한 방식으로 복합화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취약성 요인에 대한 대응은 여가, 환경, 활성화 측면에서 도시의 저하된 시스템 성능을 증진시키는 개입으로 이어지며, 이는 리질리언스 주기 관점에서 ‘성장’에 대응한다(표 6 참조).
공공 여가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통합 방호벽을 통한 공공시설의 양적 확충을 시도하였다. BIG 팀은 남부 금융지구와 차이나 타운 인근 고가하부 시설에 공공시설의 추가확충을 제안하였다. 각각은 주거, 혹은 업무시설의 고밀도 개발로 인해 공공공간이 부족한 지역으로, 인공대지를 조성해 새로운 공공공간 확충하거나, 고가하부에 문화 및 여가시설을 배치하는 해법이 제시된다.
지역의 생태 안정성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새로운 식재 계획수립이 제안됐다. 이스트 리버 파크 지역의 경우, 단일 수종이 식재된 도시의 녹지생태계가 해수로 인한 염분과 및 고속도로로 인한 매연에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이 진단되었으며, 식재 다양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제안되었다.
공간 활성화와 이용 촉진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지역 특성에 대응하는 시설을 방호벽에 통합하였다. 도시 동남부 해안을 관통하는 FDR 드라이브의 고가하부공간은 도시의 방범적 위험을 야기하는 취약요인으로 인식된다. 주거 밀집 지역인 차이나 타운인근의 고가하부에는 공공 여가시설을 확충하고, 상업시설이 밀집한 사우스 스트리트 시포트인근의 고가하부에는 여가, 상업 및 문화시설 배치를 통한 공간활성화가 제안되었다.
BIG U는 홍수 방어 인프라를 취약성 요인에 대한 대응 및 개선 방안과 통합한 리질리언스 디자인을 제안한다. 프로젝트는 선행 도시계획에서 제안된 ’다목적 방벽’ 개념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표 7과 같다.
리질리언스 주기에 비추어 볼 때, BIG U의 디자인 전략은 도시의 다층적 가치와 시스템 성능의 현상 유지 및 향상을 지향한다. 이는 ’시스템 교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도시 기능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요약될 수 있다. 각 취약성 요인에 대한 대응은 저하된 시스템 성능의 회복 및 향상을 촉진하는 방안이며, 방호 인프라가 오히려 시스템 성능을 저해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전반적인 도시기능 보존을 목표로한다. 특히, 주된 교란 요인인 홍수에 대한 방어책은 도시 시스템이 교란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도시 공간 측면에서, BIG U는 홍수 방어 시설을 단순한 방재 수단으로 한정하지 않고 여가 공간의 확충 및 도시 공간 활성화의 기회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BIG 팀이 도출한 취약요인은 도시의 교란 대응력을 저하하는 요소라기 보다는 여가, 문화, 안전 등 일상생활에서의 부정적 우려 상황을 초래하는 요소이다. 이는 도시를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기존의 도시계획이 추구해오던 지향점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며, 고유한 리질리언스적 특성으로 대응시키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BIG U의 리질리언스 전략은 ‘교란상황에서도 시스템 성능을 유지하며, 교란으로 인한 해체 이후의 전환’ 능력인 리질리언스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BIG U는 리질리언스 주기 중 시스템이 해체되기 이전에 작동하는 사전 예방적 대응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교란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차단하는 접근에 가깝다. BIG U 프로젝트의 전략은 시스템 해체 이후가 아닌, 사전시점인 평상시의 도시 상태에 중점을 둔 디자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리질리언스 대책 수립 시 대응의 시점과 중점가치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뉴욕의 리질리언스 디자인 프로젝트인 BIG U의 리질리언스 디자인 프로세스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뉴욕의 리질리언스 접근은 재난 이후의 대응력과 복구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 수립을 기반으로 전개되었으며, BIG U 프로젝트는 이러한 정책 제안을 리질리언스 디자인 프로세스에 따라 구체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도시 공간과 사회적 기능을 방호 인프라와 통합함으로써, 해당 프로젝트는 단순한 물리적 방어를 넘어 도시 재생과 공공 가치 증진을 동시에 도모하는 디자인 전략으로 확장되었다.
취약성 대응에 기반한 BIG U의 리질리언스 디자인은 재해에 대한 방어를 도시 환경의 증진과 통합하는 효과를 낳았다는 의의를 가진다. 리질리언스 디자인 프로세스의 적용은 홍수 방어 시설 구축을 여가 공간 확충과 도시 공간 활성화의 기회로 전환하였으며, 지역의 물리적, 문화적, 기후적 특성을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지역단위의 특성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유도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도시계획의 목표를 구체화한 측면이 있으며, 리질리언스 개념과 방법론은 도시가 지향해온 공간적 가치들을 구현하는 데 있어 새로운 당위성과 타당성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과 가능성을 지닌다.
그러나 리질리언스 주기에 기반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취약성 대응에 기반한 BIG U의 리질리언스 디자인 전략은 교란 이후 시스템이 재구축할 수 있는 능력과는 개념적으로 다소 구분된다. BIG U의 디자인 전략은 시스템의 해체 및 재구축 시점에 대응하기보다는 현재의 시스템을 다기능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에 가깝다. 이는 BIG U의 취약요인의 도출과 대응이 지니는 특성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취약요인의 식별과 그에 이은 대응이 곧바로 리질리언스의 구현으로 직결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연구 내용을 종합하면, 취약성 대응에 기반한 전략은 그것에 내제하는 긍정적 효과와는 별개로 정교화와 재검토가 요구된다. 취약성 도출 과정에서는 현황조사 뿐 아니라, 예측데이터와 정량적 지표 등의 활용 등 다방면의 취약성 도출 방식이 활용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출된 취약요인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다방면의 맥락적 분석과 해석이 필요하다. 국내의 리질리언스 전략에 대한 논의도 취약성 대응 전략으로 확장 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 실천을 위하여 도시의 데이터 및 지표의 구축을 위한 시도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리질리언스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 도출된 디자인 제안을 검토하는 것을 통해 리질리언스 담론의 논의를 확장하였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단일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맥락의 리질리언스 디자인 적용 사례들과 비교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전략의 개념적 정합성에 초점을 두고 디자인 과정 분석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리질리언스 디자인 프로세스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다차원적으로 확장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향후 리질리언스 구현 전략이 시스템의 붕괴와 그 이후의 재구축 과정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리질리언스는 물리적 범주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경제·정치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리질리언스 전략을 검토하는 후속 연구가 이어진다면, 도시 리질리언스 구축에 대한 논의 역시 더욱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