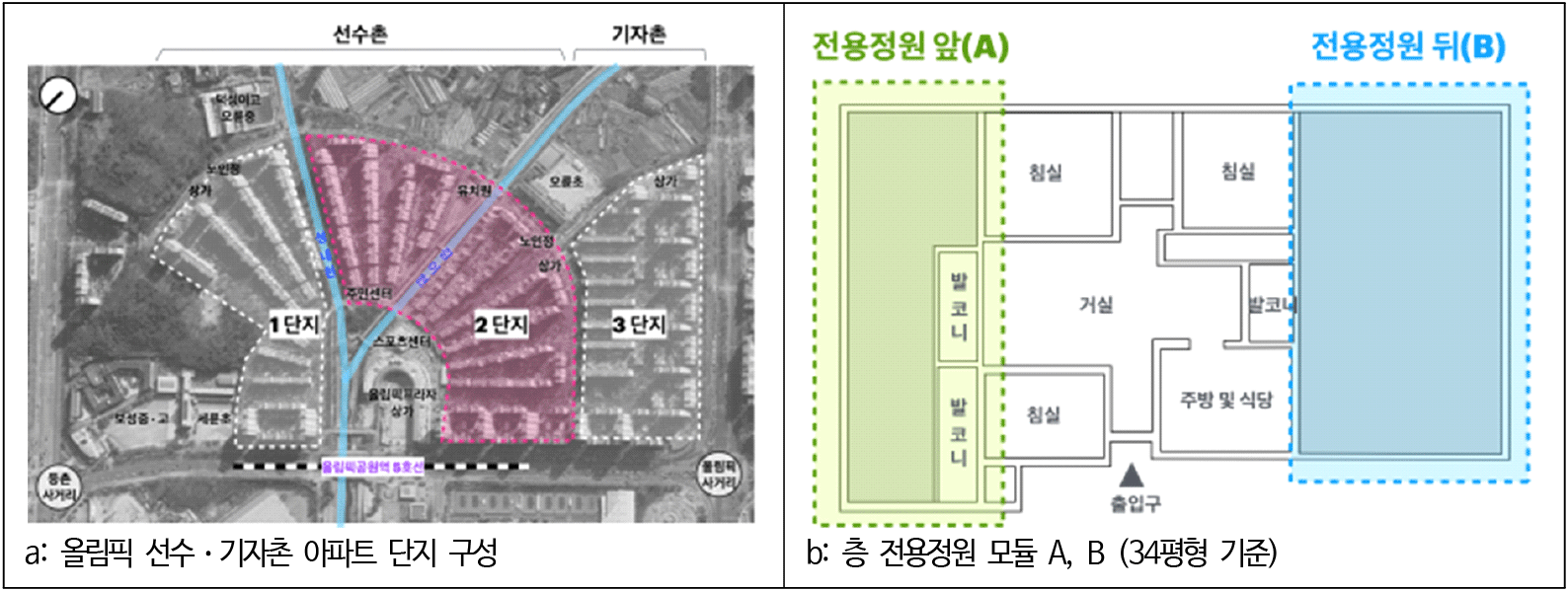1. 서론
정원은 인류의 오랜 주거 역사 속에서 집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전이 공간이자, 인공과 자연의 중간 지대에서 기능해 왔다. 살아 있는 생명체를 가꾸어 가는 장소로써 고정된 형태로 완결되지 않고, 이용자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공간과 시설이 유동적으로 구성되고 그 속에 일상적 행위가 쌓이며 다층적인 공간적 의미를 형성한다. 정원의 매개적 성격은 소유자의 특성이나 개성을 반영하는 장소가 되게한다(Ghazali, 2013). 이러한 정원의 실천성과 시간성은 정원이 고유한 장소성을 가지게 하며, 거주민의 사적이고 긴밀한 행위가 일어나는 생활 공간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한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한국의 아파트 중심의 주거 문화의 발전은 정원에 대한 논의를 단절시키고, 정원이 개인의 생활 공간에서 점차 배제되도록 하였다(길지혜와 박희성, 2022). 2024년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81.5%이고 아파트의 비율은 79.2%로 전국 주택 유형의 과반수를 넘어가고 있다(http://www.kosis.kr)아파트는 ‘주택의 대량 건설과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효율적이고 대량 공급이 가능한 주거 형태로 자리 잡았으나, 경직된 주거 문화를 형성하고 주거 유형의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계속되었다(Gelézeau, 2007). 한국의 아파트 문화에서 정원은 주거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전락하며, 거주자의 능동적인 정원 가꾸기 실천을 제한한다(이혁재 등, 2020). 정원은 일부 고급 주택의 전유물로 여겨지며 그 의미와 가치가 평가절하되었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이러한 주거 문화의 질적인 개선을 위한 대안적 해법의 하나로 전용 정원을 제안하였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는 1층에 전용 정원을 도입하여 공동 주거 내에서 개인적이고 창의적인 외부공간의 가능성을 제안한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된다(대한주택공사, 1995). 전용 정원은 입주민들이 사적으로 이용하지만, 공적 공간 내에 위치함으로써 거주자의 개성이 발현되는 개인적 공간이자 아파트라는 공동 주거 문화를 수용하며 진화한 공간이다. 약 35년 동안 거주민들의 다양한 생활 실천이 축적된 현장이며, 최근 재건축 논의1)가 이루어지면서 공급자 중심의 설계 관행에서 벗어나 거주민 중심의 주거 환경 계획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정원 가꾸기가 단독주택이나 교외에서 논의되었던 것과 달리 공동 주거 환경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정원 가꾸기 행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아파트 1층 전용 정원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정원 가꾸기 행태와 그 속에 내재된 문화적 의미를 탐구함으로써 공동 주거에서 발현된 정원 가꾸기 행위의 양상을 밝혀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전용 정원 이용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유형화하여 획일화된 아파트 환경 속 다양한 거주 문화의 실천적 양상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의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2단지 1층 전용정원2)이다. 1층 전용 정원은 공동주택의 토지, 통로, 주차장, 부속건물의 대지 등을 입주자 전체의 공용 소유로 분류하는 법적 근거3)에 따라 개인화·사유화에 대한 논란이 있는 공간이나, 공동 주거 내 쉽게 볼 수 없는 정원 가꾸기 실천이 일어나는 장소로 다양한 이용 행태와 조성 양상이 관찰되는 공간이다.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는 88올림픽 당시 기자촌으로 운영되었던 1단지와 선수촌였던 2·3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총 122동 5,540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1층은 총 514세대이다. 각 세대는 단층형(34평·40평·47평·51평·57평) 또는 복층형(49평·53평·64평)이 복합적으로 위치한다. 전용정원은 세대의 전면과 후면에 위치하고 있어 각 1층 세대에는 두 개의 전용정원이 위치한다(그림 1 참조).
그중 2단지는 단층 57평형과 복층 53평형을 제외한 모든 평형을 포함한 5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지 내 다양한 외부 환경을 접하고 있는 가장 넓은 면적의 단지로, 본 연구의 의미를 도출하는 데에 충분한 질적·양적 정원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연구의 대상지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의 2단지 총 240세대의 전정과 후정을 포함한 총 480개의 전용정원으로 한다.
본 연구는 직접 관찰조사를 통한 올림픽선수기자촌 단지 1층 전용정원의 실태를 파악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하여 그 양상을 유형화하고 해석하는 사례연구이다.
관찰조사는 정원의 조성 여부, 기능, 생산성 등 외적으로 드러나는 정원의 모습을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관찰조사는 1차(2022.04~2022.06)와 2차(2023.01~04) 총 두 차례 올림픽 선수·기자촌 아파트 현장에서 이루어졌으며, 1차 조사 당시 수목의 우거짐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정원의 관찰 데이터를 보강하기 위해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관찰조사는 사적 공간에 진입하지 않고 1m 이상의 관찰거리를 확보하였으며, 관찰조사를 위한 틀(표 1)을 이용하여 공간의 정보를 숫자로 전환하여 개인 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하였다.
관찰 된 데이터를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관찰에 활용 된 변수의 차원을 공통요인으로 축소한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질적인 의미해석을 위한 양적 분석 방법의 하나로, 측정된 다수의 자료를 처리하여 기존에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의미 있는 소수의 요인들을 추출하는 방법이다(Seo et al, 2018). 이후 다수의 관측 대상 분류에 유효한 비계층적 K-평균 군집법(K-means)을 실시하여 유형화 하고 이를 질적으로 해석한다. 적절한 유형의 수는 엘보우 기법(elbow method)을 통해 결정하였다.
2. 아파트와 정원 가꾸기의 인문 사회학적 고찰
정원은 넓은 공간 속에서 경계를 짓고 자연을 질서 있게 관리하여 미적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것으로, 자연과 만나는 일차적인 장소이자 인간이 문명적으로 개입한 문화적 산물로 정의된다(성종상, 2020). 정원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는 장소임과 동시에 실용적 기능을 겸비한 공간으로서 기능해 왔다(Stuart-Smith, 2020). 기존 정원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고급 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발전됐으나, 점차 도시적 맥락에서 커뮤니티 가든, 마을 정원, 공동체 정원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도시 정원은 단순히 녹지의 기능을 넘어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돌봄을 통해 이웃 간 교류를 유도하고 공동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공간으로 주목받는다(Glover, 2004; Alaimo, et al, 2010). 주거지의 위생과 경관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길지혜와 박희성, 2022), 이웃 간의 교류를 촉발하고 창조적 공간 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로 기능하며(심주영과 조경진, 2015), 지역을 활성화하는 경제적 역할까지 수행한다(박재민 등, 2016). 오늘날 정원은 다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는 ’복합적 도시 기반 시설’로서 도시 환경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한다. 정원 가꾸기라는 실천적 행위는 정원을 살아있으며(living), 시대적 주거 문화와 도시 조직의 변화에 따라 진화하는(evolving) 유연한 공간으로 만든다. 고정된 건축물과는 달리 거주자의 일상적 실천이 누적되어 변형되는 자생적 공간이며(심주영과 조경진, 2015), 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동시대 사림의 문화적 이해와 가치가 반영되는 복합적 문화의 구성체라 할 수 있다(Francis and Hester, 1990).
따라서 이러한 정원 논의를 우리나라의 보편적 주거 형태인 아파트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국내 아파트 조경 관련 논의는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조경 계획이나 외부 공유 공간의 물리적 구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원 가꾸기와 같은 거주자의 자발적 실천에 대한 고찰은 미흡하다. 전용정원은 폐쇄적이고 익명적인 아파트 구조 속에서도 거주자가 스스로 개입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여 단순한 조경 요소가 아닌 삶의 흔적이 축적되는 문화적 장소로 기능한다. 공동주거 단지 내에서 동시대의 주거 문화와 거주자의 생활 양상과 실천이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장이다. 전용정원은 아파트라는 일상적 주거 환경 안에서 거주자가 세계와 관계 맺고 실천을 펼쳐나가는 장으로서 아파트 주거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는 아파트라는 보편적 주거 형태 속에서 개인에게 부여된 전용정원이 어떻게 문화적, 공간적인 양상을 드러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거주자의 자율적인 실천은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 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며, 거주민 주도의 일상적 행위를 통해 정원의 물리적·정서적 특성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Rapport, 2000). 전용정원이 단순한 조경 요소를 넘어, ‘공동 주거 내에 입지한 사적 정원’이라는 문화적이고 공간적인 정원 가꾸기의 양상을 드러내는 실천의 장이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아파트라는 공동 주거 형태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주거 유형으로 정착되어 도시 공간의 구조와 주거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우리나라 도시 건조 환경에서 기반 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함을 고려할 때, 녹지나 놀이터, 주차장 등을 계획적으로 갖춘 단지형 아파트는 단독주택보다 훨씬 매력적인 선택지로 작용해 왔다(박해남, 2013). 아파트는 구조의 단일화 · 표준화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한 거주 공간으로써 주택의 대량 공급, 관리의 편리함 등의 이점은 실현하였으나, 거주 개성의 발현이나 개인적 욕구의 발현은 저해시켰다. 공동의 삶을 위한 표준화는 ‘저 골목만 돌면 우리 집’과 같은 공간의 식별이나 장소성을 축소했다. 집이란 개인의 삶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애착의 공간이며(Tuan, 1977), 인간의 본질을 규정하는 행위(Bollnow, 1963)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아파트는 획일화된 주거 문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파트 내 전용정원은 기존 아파트 단지 조경과는 구별되는 방식으로 거주자의 실천성과 개별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주거 문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는 1988년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 및 기자들에게 제공될 주거의 건설이라는 일차적 목적을 넘어 한국 주거 문화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영원한 기념비적인 장소로 남겨져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김도연, 2019). 올림픽선수기자촌은 1970년 한강 공유수면 매립 사업을 통해 진행된 잠실 일대 개발 사업의 일환이었다(고성민, 2022). 서울 올림픽의 유치가 계기가 되어 서울의 과밀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미개발지로 남아있던 강남지역의 개발이 필요했고 토지의 확보를 위해 한강 개발이 이루어졌다(손정목, 2003; 박해남, 2018). 서울 올림픽은 도심지, 불량 주택지구, 한강, 강남과 잠실 등 수도 서울의 경관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계기였다. 개최 도시의 사회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질서를 보여주어야 할 동기를 제공한 것이다(박해남, 2018). 서울시는 올림픽을 수단으로 삼아 ‘올림픽 개발’과 ‘도시 개발’을 연관 지어 수도권의 구조를 재편하고자 했다. 이에 올림픽 추진 엘리트들3)은 종합운동장과 국립 경기장뿐만 아니라 잠실 일대를 혁신적 도시 발전의 상징적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잠실지역의 경관을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며, 부유층이 거주할 수 있는 준고급 아파트의 배합을 요구했다(전두환, 2017).4)
올림픽 선수촌 및 기자촌 조성은 올림픽이라는 행사에 어울리는 상징성과 더불어 한국의 주거 문화에 획을 긋는 장소 형성이라는 목표 아래 황일인과 우규승의 안5)이 선택된다. 격자형 아파트 배치의 기자촌과 하천 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부채꼴 형 아파트 배치된 선수촌이 조합된,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형태의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졌다(건축과 환경, 1988). 추진 엘리트의 상징성 요구는 당시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볼 수 없는 조형성을 갖춘 아파트 단지 디자인을 만들어 냈다.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는 기존의 획일적 아파트 유형에서 탈피하여, 광범위한 면적을 외부 녹지 및 공공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대한주택공사, 1995). 올림픽 공원의 진입 축을 이어받아 올림픽 광장을 만들고 이를 구심점으로 건물과 공용공간을 방사형으로 구성함을 통해 건물이 다양한 면을 향하였다. 또한 외곽을 고층화하여 내향성 공간구조 형성하고 주거 단위 조직은 가로공원으로 구분하였다. 단지 내부에는 지하 주차장, 유아 놀이터, 쐐기형 녹지, 1층 전용정원 등 혁신적인 시설을 도입하였다. 다양한 주동 구성과 방사형 배치, 커뮤니티 중심의 설계를 통해 주거 공간에 상징성과 다양성을 부여하고 ‘화합과 전진’이라는 올림픽의 이념을 물리적 공간에 담아내고자 하였다(신영훈, 2001).
그중에서도 1층 전용정원은 저층부 기피 경향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되었다. 각 주동의 1층 세대에 거주민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공간을 평형대 별로 약 15~30평 제공하여 분양률을 높였다. 단순한 경제적 유인책을 넘어서 아파트라는 공동 주거 내의 개인 외부공간을 제도적으로 실현한 최초의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된다. 전용정원은 공동 주거 내에서도 개인의 실천과 장소성이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폐쇄적이고 익명적인 아파트 구조 속에서 외부와의 관계 맺기, 거주 개성의 발현이라는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드러낸다(Lindeke, 2014). 공용 대지 위에 위치하여 외부로 돌출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아파트의 내부 생활이 외부적으로 가시화되는 공간이다. 아파트 정원 가꾸기 실천의 기원적 사례로서 본 연구가 전용정원에 주목하여 거주자의 실천과 아파트 거주 문화의 내면을 파악하고자 한다.
3. 전용정원의 특성 및 유형
올림픽선수촌기자촌 아파트의 1층 전용정원은 세대 전면 또는 후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 세대의 내부 평형에 따라 다른 면적으로 설계되었다. 올림픽 선수촌 기자촌 아파트가 기존 단지 계획의 전형에서 벗어나 상징적이고 혁신적인 설계를 목적으로 함에 따라, 단지 내 방사형 단지 구성으로 다양한 방위를 조망하도록 단지가 구성되어 있다. 그에 따라 1층 전용정원은 각 주동의 위치에 따라 입지의 향이 달라져 시간별, 계절별 일조량의 차이를 보인다.
단지 내에는 마천동에서 발원한 성내천과 하남 강북 동에서 발원한 감이천이 관통하고 있고, 양재대로를 사이에 두고 올림픽공원과 마주하고 있다. 한국의 마당을 연상하는 쐐기형 녹지 마당과 양버즘나무(Platanus occidentalis) 중국단풍(Acer buergerianum), 느티나무(Zelkova serrata), 은행나무(Ginkgo biloba), 메타세콰이어(Metasequoia glyptostroboides) 가로수 길이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다채로운 외부 구조는 정원이 위치한 놀이터, 주차장, 녹지, 가로수길, 하천과 같은 인접환경의 차이를 만든다. 단층형 34평 및 40평 세대는 도로 및 놀이터, 주차장과 인접해 있고 복층형 세대는 하천, 공공 녹지와 인접한다. 가장 넓은 평형인 51평 세대는 보다 단지의 중심부에 가까우며 스포츠센터, 상가, 관리사무소와 같은 커뮤니티 시설과 보다 밀접해 있다.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전용정원의 양상을 조사·관찰하기 위해 분석의 틀을 설정했다. ‘정원입지’와 ‘자연환경’, ‘정원형태’, ‘관리정도’와 ‘정원기능’을 주요 분석 항목으로 설정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세부 요인 15개를 설정했다. 정원의 형태 분석하기 위한 틀은 선행 연구(류윤진과 조동길, 2015; 조성아, 2017; 김혜주와 이경진, 2017; 김정철, 2020; 이주희, 2020)를 참고하고 공동 주거의 특성을 고려한 항목을 연구자가 추가했다(표 1 참조).
정원입지 항목은 정원이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내부 평형’, ‘내부 층고’, ‘정원 위치’, ‘인접환경 자연성’, ‘인접환경 공공성’을 변수로 측정한다.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는 단층과 복층을 혼합한 다양한 내부 평형 설계를 도입함으로써 정원이 입지하고 있는 세대별 평형의 차이가 있다. 이에 따른 영향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내부 평형’을 입지의 변수로 설정하였다. “내부 층고”는 정원이 입지하고 있는 가구의 층고가 복층인지 단층인지를 측정한다. ‘정원위치’는 정원이 면하고 있는 위치가 아파트의 전면인지 후면인지를 구분한다. ‘인접환경 자연성’은 아파트라는 공동 주거 단지의 특성으로 인해 전용정원이 접하고 있는 다양한 외부 환경에 대한 분류이다.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의 외부공간은 도로, 주차장, 놀이터, 상가, 공공 녹지, 가로수, 하천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따른 자연성을 인공물의 개입 정도에 따라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1:매우 낮음-5:매우 높음). 인공물의 개입이 가장 많은 도로 환경은 ‘매우 낮음’. 주차장과 놀이터의 복합 환경은 ‘낮음’, 주차장과 공공 녹지의 복합 환경은 ‘보통’, 공공 녹지및 가로수길은 ‘높음’, 하천은 ‘매우 높음’의 순으로 측정하였다. ‘인접환경 공공성’은 전용정원이 인접하고 있는 환경의 내·외부인에 대한 개방 정도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한다(1:사적–4:공적). 주차장, 경로당 등 내부 입주민의 이용이 주를 이루지만 외부인의 출입도 허용되는 공간을 반사적(semi-public) 그리고 입주민의 이용이 주를 이루는 공간을 사적(private), 상가 및 하천 등 입주민 외 외부인의 방문 빈도가 높은 환경을 공적(public), 공공 녹지 및 놀이터 등 외부인의 이용이 관찰되는 환경을 반공적(semi-public)으로 구분했다.
정원의 조성과 가꾸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은 ‘일조량’ 변수로 측정한다.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의 방사형 단지 배치에 의한 향의 차이와 그에 따른 전용정원의 일조량의 정도를 네 가지로 구분한다(1:음지–4:양지). 음지는 하루 2시간 이하, 반음지는 2시간 이상 3시간 이하의 간접 광이 드는 장소이고 양지는 하루 3시간 이하 양지는 하루 5시간 이상 직사광선이 드는 장소로 구분한다. 1층 전용정원의 일조량은 아파트의 층고 인접 공공 녹지 내 식재의 수고 등의 영향을 받는다. 전용정원은 외부에 노출된 형태로 일조량 이외의 영향 변수가 여러 가지 있으나, 공동 주거의 물리적 구조로 인한 영향은 일조량 항목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이 외의 강우, 바람, 기온 등의 기후적 요인은 전체 단지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고 본 연구에서 제외한다.
정원 형태 항목은 ‘식재밀도’ 및 ‘수고’를 통한 식재 현황과 ‘차폐정도’를 분석한다. ‘식재밀도’는 정원 가꾸기 행위가 일어나지 않아 지면이 그대로 노출된 형태나, 포장재로 덮여 있는 높은 낮은 밀도에서부터 초화류, 관목 등이 풍부하게 배치된 높은 밀도까지 식재의 분포 정도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한다(1:없음–4:높음). ‘수고’는 정원에 식재된 식물의 높이에 따라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1:없음–5:1층 이상). 아파트는 주택과는 달리 수직적 구조의 특성을 가지므로 식재의 수고가 다른 세대에 영향을 주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수고의 기준을 지면에서부터 1층 층고를 기준으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정원의 경계부를 차폐 정도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한다(1:물리적-시각적 개방–4:시각적-물리적 차폐). 전용정원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물리적·시각적으로 개방된 형태에서부터 울타리로 차폐된 형태와 물리적·시각적으로 완전히 차폐된 형태로 구분된다.
정원관리 항목은 정원이 유지 및 관리 되는 ‘관리 정도’를 측정하였다. 정원이 방치된 상태에서부터 주기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까지 네 가지로 구분한다(1:안됨-4:상).
정원 기능은 정원에 존재하는 시설물을 파악하고 그 수를 측정하는 것을 통해 ‘휴양’, ‘유희’, ‘관리’, ‘생산 기능’으로 나누었다. 정원의 ‘휴양기능’은 정원에 있는 파라솔, 의자, 썬베드, 차양막 등 완상과 머무름이 가능하게 하는 시설물을 조사했다. ‘유희기능’은 놀이와 관련된 기능으로, 농구대, 골프 연습 대와 같은 운동시설과 퐁퐁이와 같은 놀이시설을 조사하였다. ‘편의기능’은 생활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창고, 빨래대, 장독대와 같은 시설을 조사하였으며, 정원의 ‘생산기능’은 텃밭, 온실, 사육장 등과 같은 시설을 측정하였다. 기능복합도는 이러한 기능이 복합된 정도를 측정했다.
분석의 틀을 통해 조사 된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의 480개의 전용정원 데이터 간 상관성이 높아, 요인분석을 통해 변수들 간 상호 연관성 이 높은 대표 요인을 추출한다. SPSS 2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요인들을 설명할 수 있는 공통속성을 추출한다.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는 0.605로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총 15개 변수에 대하여 1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공통성(community)이 0.4 이하인 ‘내부층고’, ‘일조량’ 변수를 제거했다. 일반적으로 변수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공통성의 상관계수 값이 0.4 이하이면 공통성이 낮다고 판정한다(서원진 등, 2014). 2차 요인분석을 통해 총 13개 변수의 요인값이 0.4 이상의 값을 나타내는지를 확인했으며, 요인분석의 변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KMO값은 0.612이고 변수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판별하는 Bartlett 구형검정치는 유의수준 1% 이내로 요인분석이 적합함을 확인했다. 베리믹스법(Verimax) 회전방식을 사용하여 요인 행렬의 열의 분산의 합계를 최대화함으로써 요인의 해석을 단순화했다.
제 1요인은 ‘정원의 위치’, ‘휴양기능’, ‘유희기능’, ‘기능복합도’ 총 4개 항목이 속해 있다. 전체 설명력의 24.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이다. 이 요인은 정원의 입지적 특성, 활동의 다양성, 체류 가능성, 놀이와 여가의 실현 여부등, 거주자가 정원 공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행위를 실천하는 양상을 반영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해당 요인을 ‘참여적 요인(participatory factor)’으로 명명한다. ‘참여’는 단순히 공간에 대한 접근을 넘어, 공간을 스스로 조직하고 해석하며 사용하는 능동적 활동을 의미한다. 제 2요인은 ‘아파트 내부 평형’ 항목 및 ‘편의기능’, ‘생산기능’이 속한 요인으로, 정원의 생산성과 공간 효율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실리적 요인(practicality factor)’으로 명명한다. 정원을 주거의 연장된 실용공간으로 활용하며 기능 중심적으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가치와 효용을 추구하는 상태를 설명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 요인은 전체 설명력의 12.99%를 차지하고 있다. 제 3요인은 전용정원이 위치하고 있는 ‘인접환경의 공공성’과 정원 경계부의 ‘차폐 정도’ 항목이 속해 있다. 외부인에 대한 접근성과 개방 정도로 해당 요인값이 높아질수록 공공성은 낮아지고 차폐 정도는 높아지므로 이를 ‘차단적 요인(shielding factor)’으로 명명한다. 제 4요인은 ‘인접 환경의 자연성’과 ‘정원의 수고’가 포함되어 있어, 외부 환경적인 요인과 그에 따른 내부 식재의 관계로 보고 ‘자연적 요인(Naturalness Factor)’으로 명명한다. 제 5요인은 ‘식재밀도’와 ‘관리정도’ 항목이 속해있으므로 정원의 유지 및 관리 상태를 설명하는 ‘관리적 요인(maintenance factor)’으로 명명한다. 제 4요인과 5요인은 각각 전체 변량의 10.31%와 9.49%를 설명한다.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공통 요인을 기반으로 1층 전용정원을 유형화 한다. 군집 1은 참여적 요인이 −1.01583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며, 실리적 요인 또한 −0.17393으로 낮아 정원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참여적이고 실용적인 기능이 떨어진다. 정원의 관리적 요인은 −0.35117로 모든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정원 가꾸기 상태를 보여, 정원이 방치 되거나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해석된다. 또한 차단적 요인이 0.65064로 높게 나타나 외부인에 대한 개방 정도가 낮고 폐쇄적 성격을 지닌 정원이다. 따라서 해당 정원을 ‘차폐 방치형 정원(screened neglected garden)’으로 명명한다(표 2, 3 참조).
군집 2는 차단적 요인이 −1.78688로 모든 군집 중 가장 낮은 값을 보인다. 이는 외부 단지 환경과의 물리적·시각적 차단이 거의 없고, 공공성 높은 외부 환경에 대해 개방적인 상태임을 나타낸다. 이와 함께 참여적 요인(−0.48081)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정원에서 거주자의 능동적 개입이나 자발적 활용 행위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의미한다. 자연적 요인이 0.13532로 소폭 양의 값을 보이며 정원이 인접한 자연 환경으로부터 시각적·정서적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원 공간의 구성과 활용이 주변 환경에 따라 반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유형을 ‘환경 반응형 정원(environmentally responsive garden)’으로 명명한다.
군집 3은 참여적 요인이 0.86737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며, 이는 거주자가 정원 구성과 이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하는 정원임을 의미한다. 반면 ‘실리적 요인’은 −0.71499로 가장 낮아, 정원의 실용적이고 편의적 목적보다 관상적 가치, 휴식, 유희 등 감성적 활용이 중심이 되는 정원이다. 차단적 요인(0.23092)과 자연적 요인(−0.01721)은 각각 중간 또는 미미한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정원의 개방성과 외부 환경과의 직접적 관계성보다는 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내부의 정원 경험이 더 강조된 구조임을 나타낸다. 관리적 요인은 0.15974로 보통 수준을 보이며, 정원조성 뿐 아니라 이용자의 유지·관리 정도를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정원을 ‘체험 여가형 정원(experiential leisure garden)’으로 명명한다.
군집 4는 ‘실리적 요인’이 1.39907로 가장 높은 값을 보여 정원의 생산성과 편의성 중심의 실용적 기능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차단적 요인’은 0.27100으로 다소 높은 값을 보여, 외부로부터의 시각적·물리적 개방성은 제한적이며 정원이 사적이고 독립된 공간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연적 요인’은 −0.14481로 낮게 나타나 외부의 자연성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거주자의 필요에 따라 구조화된 정원임을 의미한다. ‘관리적 요인’은 0.16061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정원의 실용성과 기능 유지를 위한 적절한 유지·관리가 있다. 이러한 특성들을 종합하여 해당 군집을 ‘실용 실천형 정원(practical action garden)’으로 명명한다.
4. 전용정원 유형의 해석
‘차폐 방치형 정원’은 외부인의 접근을 물리적, 시각적으로 차단하고 정원에 대한 활용도가 낮은 유형이다. 울타리나 수목, 덩굴 식물을 통해 차단이 이루어지며 높은 물리적·시각적 차폐율을 보인다. 전체 정원 중 29.2%(140개)가 해당 유형에 속한다. 정원 내 식재나 시설물은 최소한의 상태에서 유지되고 정원의 기능은 단순한 차단이나 경계 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휴식이나 유희적 기능 등 정원의 참여적 기능보다는 사적인 공간 확보에 중점을 두는 정원이다(그림 2, 3 참조).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단지는 주차장, 놀이터, 공공 녹지, 가로수, 자연 하천, 상가 등 다양한 외부공간으로 구성되어 1층 전용정원은 단지의 공간 구성만큼 다양한 외부 환경과 접하고 있다. 차폐 방치형 정원의 97.1%(134개)가 아파트의 전면에 위치해 있는데, 실내의 거실과 접하고 있는 정원이 전망하는 외부 환경의 특성에 따라 차폐의 정도가 달라진다. 전용정원이 주차장 및 놀이터, 상가와 같이 외부인이 드나드는 공공성이 높은 환경과 밀접해 있는 경우 특히 높은 물리적·시각적 차폐율을 보인다. 전용정원이 주차장과 면하고 있는 경우 내부가 잘 들여다보이지 않는 빽빽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후면 주차 금지’와 같은 경고장을 붙여놓은 것이 자주 관찰되었다. 대로변에 인접한 전용정원에서도 울타리로 차폐하여 도로의 소음 및 공해를 차단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유형은 차폐적 성격뿐 아니라 정원을 가꾸고 활용하는 참여적 요인과 관리적 요인 역시 미흡한 경향을 보인다. 정원의 대부분이 외부 공공성이 높은 전정에 위치하고 있어 정원의 사적인 이용이 제한되고 정원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관심이나 필요성이 낮아져 정원이 방치되거나 기능이 축소된다. 이러한 특성은 개인의 생활 방식과 공동체의 환경적 조건 뿐 아니라 주거 방식에도 영향을 받는다. 전세나 월세와 같이 한국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시적 거주 형태의 경우 거주민들은 정원 가꾸기의 필요를 느끼지 않거나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아파트의 분양 제도 역시 정원 가꾸기 참여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 입주민이 능동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1층의 전용정원에서 거주하게 될 때 정원 가꾸기를 부담으로 인식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원을 포장 블록으로 덮거나 유지관리가 편리한 형태로 변형하여 노동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사례가 자주 관찰된다. 짧은 거주기간 동안 다년생 식물을 키우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퇴거 시 처치의 곤란함을 느낀다.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생물의 식재나 관리는 소극적으로 되며. 정원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공간이 방치되는 양상을 띠며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적재 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해당 유형의 전용정원은 ‘확장된 외부 서비스 공간’으로 인식된다.
‘환경반응형 정원’은 인접한 자연환경의 조건과 외부 공간과의 관계에 따라 정원의 구성과 활용 양상이 변화하는 유형이다. 전체 1층 전용정원 중 약 17.9%(89개)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정원의 입지와 주변 환경 특성이 정원 구성과 상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과 구별된다.
정원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꾸어 가는 활동이기 때문에 정원의 위치, 외부 경관, 주변 녹지 상태, 공공시설의 배치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이 식재 밀도, 수고, 경계 차폐, 관리 상태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올림픽 선수기자촌 아파트는 부채꼴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1층 전용정원은 다양한 방향의 외부 환경에 노출된다. 정원이 공공녹지, 가로수길, 하천 등 자연성이 높은 환경과 인접한 경우 거주자는 외부 경관을 정원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별도의 식재를 최소화하고, 정원의 개방성과 연속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실제로 본 유형의 정원 중 약 46.5%(40개)는 자연성이 가장 높은 외부 환경에 접하고 있으며, 이들 정원은 식재 밀도가 낮고 시각적으로 개방된 구조를 띤다.
정원의 관리 상태 역시 외부 환경의 질에 따라 달라지는 특징을 보인다. 자연경관이 우수한 환경에서는 인위적인 정원 관리보다 외부 경관과의 연속성이 강조되며 식재 밀도가 낮아지고 시각적 개방성이 높아진다. 반면, 외부 환경의 자연성이 낮거나 경관이 미흡한 경우에는 거주자가 정원 내부에 추가적인 식재와 시설물을 배치하여 정원의 시각적·기능적 완결성을 보완하려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환경반응형 정원은 거주자의 주도적 기획보다는 인접한 외부 환경의 특성과 질에 반응하는 형태로 정원 공간이 형성되며, 아파트라는 폐쇄적 구조 속에서도 외부와의 관계성을 통해 유연하게 조정되는 생활 공간으로 기능한다.
‘체험 여가형 정원’는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전용정원 중 가장 적극적인 정원 이용 및 참여 양상이 관찰되는 유형이다. 정원의 식재 및 관리 상태가 우수하고 거주자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유형이다. 정원의 실용적 이용은 저조하지만, 높은 휴식 및 유희적 기능을 보인다. 전용정원의 약 32.5%(156개)가 해당 유형에 속하고 이 중 87.3%(138개)가 후정에 위치하고 있으며, 40평형대에서 해당 유형이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체험 여가형 정원은 식재 종류의 다양성과 계절성이 잘 반영된 모습을 보인다. 봄에는 꽃과 관목, 여름에는 초화류와 덩굴 식물, 가을에는 열매를 맺는 식물 등 계절 변화에 따른 정원의 적극적인 변화가 관찰되었다. 또한 차양막과 선베드, 티테이블 등 정원을 느긋하게 감사하고 즐기기 위한 완상과 휴양의 기능과 농구대, 퐁퐁이, 그네, 텐트 등 유희적 시설을 함께 배치된 모습을 보인다. 거주민의 다층적인 취향과 개성을 반영한 정원 이용의 복합도도 높은데, 정원이 단일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단순한 조경 공간을 넘어 일상과 감성, 놀이와 거주자 중심의 상호작용을 포괄하는 공간이다. 정원의 개방성은 낮은 편으로 이용자의 사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이 일어난다. 대부분의 정원이 전정보다 더 넓고 사적인 후정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자의 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아파트 내부 면적이 상대적으로 좁은 세대일수록 정원을 생활의 필수적인 외부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거나, 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 정원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그림 4, 5 참조).
공동 주거 내 전용정원은 개인의 독특한 분위기와 성향을 담는 그릇으로 기능할 뿐 아니라 주거 공간의 식별과 인지를 강화한다. 본인이 손수 키워낸 식물과 거주민의 개성과 필요에 따라 설치한 구조물은 자신의 집을 구분하는 표식이 된다. 벽을 감싸고 자라는 덩굴, 위층까지 자라는 대추나무, 계절에 따라 피고 지는 식재는 똑같이 생긴 ‘우리 집’과 ‘다른 집’을 구분하게 한다. 정원을 통해 아파트의 외관적 동일성 속에서 장소성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유형이다.
‘실용 생산형 정원’은 정원이 거주자의 실용적인 목적에 맞게 조성되고 활용되어 정원의 기능적이고 도구적인 활용이 두드러지는 유형이다.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는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보다 전용면적이 작기 때문에 서비스 공간으로 제공되는 전용정원은 실질적인 생활 공간의 연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체 전용정원 중 20.4%(98개)가 본 유형에 속한다. 정원의 단순 미학적 담론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생활의 기반 시설로의 역할을 보여준다.
실용 생산형 정원에서 가꾸기는 텃밭 가꾸기, 물건 적재, 온실 설치 등 실용적인 행태로 구체화된다. 정원에서 식물을 직접 재배하고 수확한 작물을 보관하면서 자급 자족적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용자는 채소, 허브, 과일나무 등을 직접 키우고 수확한다. 또한 이러한 일차적 식물의 생산에 국한되지 않고 비누 만들기, 차 만들기 등 이차적 생산 활동으로도 연계된다.
또한 해당 유형의 정원은 실내의 제한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창의적인 활동이나 일상 생활을 보조하는 일이 가능하도록 한다. 애완동물 사육 시설이나 목공 작업대 등이 정원에 설치되어 창조적 활동을 이끌기도 하고 빨래대, 장독대, 물건 창고 등 생활 기반 시설로써 일상생활을 보완하는 공간으로 이용된다. 정원이 거주자의 생활에 구체적으로 결합하면서 정원의 구조와 시설도 거주자의 생활 방식에 맞게 실용적으로 변용된다.
편의성이 중심이 되는 아파트 문화 속에서 전용정원은 다소 역설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원 가꾸기는 가꿈과 경작이라는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노동을 통해 살아있는 대상을 돌보고 삶을 가꾸어 나가는 실천적 거주를 가능하게 한다. 정원을 생산적 활동과 결합하여 실질적 삶의 수확물을 만들어 내고 노동을 삶의 즐거움과 일상의 일부로 수용하기도 한다.
5. 결론
표준화되고 고밀화 된 한국의 아파트 주거 환경 속에서 거주자의 자발적인 거주 실천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의 1층 전용정원을 중심으로 정원 가꾸기 양상을 분석하였다. 아파트 전용정원은 공동 주거 내 공공성과 개인성이 혼재 된 공간으로, 외부의 환경적 조건과 거주민의 개성을 담아내는 일상 생활사 속의 정원 지향적 공간이다. 전용정원은 교외 주택이나 고급 주택의 전유물이라 여겨졌던 정원 가꾸기가 도심에서 어떻게 발현하는지 보여준다.
아파트 전용정원은 단일한 형태나 목적에 한정되지 않고, 정주의 방식과 생활양식, 외부 환경의 맥락에 따라 다층적인 유형으로 구성된다. 획일화된 공동주거 환경 속에서 거주자의 개성과 주거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이자, 사적 공간과 공공 환경 사이의 관계성을 조율하는 복합적 공간으로 기능한다. 단지 내에서 자신의 집을 식별하게 하는 표식이 되며, 개인적 애착과 삶의 기억을 축적하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동시에 정원 가꾸기는 공동체와의 시선, 경계, 갈등의 조율이라는 사회적 실천을 수반하고, 편의 중심의 아파트 문화 속에서도 자발적 노동과 돌봄의 실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주거형태와 거주기간, 소유 방식에 따라 정원의 의미는 달라지며, 때로는 애착의 공간으로, 때로는 방치된 외부 서비스 공간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반된 양상은 전용정원이 단순한 물리적 부속물이 아니라, 주거 문화의 가치관과 실천이 투영되는 감정적이고 사회적인 공간임을 보여준다.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기고 재건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건축위원회는 서울 88올림픽의 상징적인 건축물로서 경제의 논리에 앞서 거주 문화의 질적 향상에 더욱 초점을 맞추겠다고 선언하였다. 이 시점에서 과거 공급자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기존 주거의 설계 관행을 뒤로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공간 이용 양상 파악을 들여다보는 것이 주요한 설계과제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아파트 1층 전용 정원에서 일어나는 정원 가꾸기 활동을 분석하고 해석함을 통해 공동의 공간에서 거주민이 거주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용해 왔는지 그 내면적 욕구와 실태의 한 단면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공동주거 내 정원 가꾸기는 도시 고밀화와 아파트 표준화가 야기한 주거 정체성의 위기 속에서 거주자의 주체적 실천을 통해 장소성과 생활문화의 다양성을 회복하려는 시도임을 보여준다. 공동체와의 연결, 사적 공간의 형성, 외부 환경과의 조화 속에서 새로운 주거문화를 구축과 정원을 매개로 한 주민 실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공동 주거 내 정원 이용 양상을 파악하는데, 정원의 물리적 환경과 기능에 집중하여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의 인구학적 특성, 정원의 조성과 이용, 관리 등에 대한 정성적 분석이 부족한데 한계가 있다. 이는 정원을 가꾸는 행위가 거주 애착 및 재건축 추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전세 및 자가 등 거주 유형에 따라 정원 조성 양상이 달라지는 등 보다 질적인 해석에 향후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