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파리는 17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500개 거리를 ‘정원 거리(rues-jardin)’로 재구성하는 등 도시 가로수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기후 적응과 삶의 질이라는 구호 아래, 도심 한복판의 나무들이 도시 구조를 다시 짜는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기후 변화 시대의 가로수에 대한 주목은 역설적으로 그간 가로수가 얼마나 철저히 배경으로 존재해왔는지를 드러낸다. 우리는 도시에서 매일 나무를 마주치지만, 그것은 ‘마주친다기보다는 지나친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경험이다. 대부분의 도시 나무는 ‘가로수(街路樹)’로서 이동 경로의 주변부에 열 지어 서 있고, 도로와 나란히 배치되어 공간을 직선으로 분할하며,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형식으로 존재한다. 이처럼 질서정연한 배치는 오히려 나무를 시야에서 지워버린다. 가로수의 기하학적 구성은 동물이 아닌 식물에 대한 무감각, 이른바 ‘식물맹(plant blindness)’(Wandersee and Schussler, 1999)을 더욱 심화시킨다. 이 논문은 그렇게 배경이 되어버린 도시 나무, 즉 가로수의 형식에 다시 주목함으로써 그것을 도시 경관의 전경으로 불러내고자 한다.
가로수라는 도시적 형식이 어떻게 탄생하고 확산되었는지 묻는 데 있어, 파리는 분석의 출발점이자 핵심 사례다. 파리는 르네상스기 정원 양식의 실험, 절대군주의 공간 조직, 19세기 오스만의 근대 도시계획을 모두 경험한 도시로, 도시 경관에서 나무를 열 지어 심는 방식이 오랜 시간에 걸쳐 제도화된 곳이다. 특히 파리의 가로수 경관은 절대왕정기 이래로 전세계 도시 가로의 전범이 되어 왔다(Kostof, 1991; Lawrence, 2008). 이 연구는 도시로 이행하는 정원의 형식들이 실험되고 확장되는 시기인 16세기 말부터 19세기 후반의 파리 사례에 주목하여 가로수가 도시 구조로 자리 잡는 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도시 가로수의 의미를 조명한 최근 연구들과도 연결되며 동시에 그들과 구별된다. 예컨대 소냐 듐펠만(Sonja Dümpelmann)은『Seeing Trees』에서 현대 도시의 가로수를 환경 정치, 시민 저항, 돌봄의 윤리를 둘러싼 갈등의 장으로 조명하며, 가로수를 정치생태학적 공간으로 해석했다(Dümpelmann, 2019). 이러한 연구들을 비롯해 최근 논의들은 가로수를 사회적 주체로 재위치시켰다. 헨리 로렌스(Henry Lawrence)의『City Trees』는 이러한 흐름의 고전적 토대를 마련한 연구로, 16–19세기 유럽을 무대로 가로수가 광장·공원·가로로 도입되는 과정을 추적하며, 그것이 공공성·국가 정체성과 맞물려 도시 경관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는 과정을 보여주었다(Lawrence, 2008). 그러나 이러한 가로수의 사회적 의미는 특정한 형식적 조건 속에서 발생했음에도 기존 연구는 그 형식 자체를 충분히 조명하지는 않았다.
이 지점에서 기디언 샤피로(Gideon Shapiro)의 연구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는 파리의 산책로(promenade)를 분석하며 정원 예술의 형식이 제2제국기의 도시계획으로 확장된 과정을 밝힘으로써 가로수길이 정원 형식의 연속선 위에 있음을 드러냈다. 그는 특히 장-샤를 아돌프 알팡(Jean-Charles Adolphe Alphand) 등 조경가들의 실천을 중심으로 정원 미학이 어떻게 근대 도시 경관의 구성 원리로 전이되었는지 파악하며, 가로수길이 정원에서 비롯되어 근대 도시계획의 경관 모델이 되었다고 해석한다(Shapiro, 2015).
이들 선행 연구는 도시 공간의 배경으로 인식되던 나무를 전경으로 호출하고 그 존재가 지닌 사회적 의미를 조명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와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본 연구는 듐펠만, 로렌스, 샤피로의 논의가 교차하는 자리에서, 정원에서 비롯된 가로수 형식이 근대적 도시 공간으로 이행한 과정을 탐구하고자 한다. 가로수의 의미는 무엇보다 나무의 기하학적 배치라는 정원적 형식 원리 속에서 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원 형식이 근대적 공공 도로의 인프라로 정착한 과정을 16세기 말에서 19세기 후반까지 추적한다. 즉, 가로수의 형식을 분석의 중심에 두고, 강력한 도시 경관의 전범을 탄생시킨 파리 사례를 가로수길이라는 형식이 성립되는 과정을 재구성할 것이다.
2. 도회적 정원: 외곽의 펠멜과 쿠르
16세기 말엽과 17세기 초반, 파리의 외곽에서 정원의 알레1) 형식을 본뜬 여가 공간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절대왕정의 서막을 연 앙리 4세는 당대 유럽 상류층 사이에서 유행하던 스포츠인 펠멜(paille-maille)2)을 위한 경기 공간을 조성했다(Figure 1 참조). 펠멜은 현대의 크리켓과 유사하게 긴 막대기로 공을 쳐서 목표 지점을 통과시키는 경기로, 직선으로 길게 조성된 레인(lane)을 필요로 했다. 앙리 4세는 이 경기 공간에 정원에서 사용되던 알레 형식을 적용해, 양측에 나무를 일렬로 심은 간단하면서도 상징적인 산책로를 형성한 것이다. 이는 도시 외곽에 조성된 초기 가로수길의 선례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펠멜 사례를 통해 정원의 알레 형식이 도시 경계와 접점을 형성하며 새로운 도시 경관의 형식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고 본다. 요컨대 알레가 정원을 넘어 도시 경관의 구성 요소로 기능하기 시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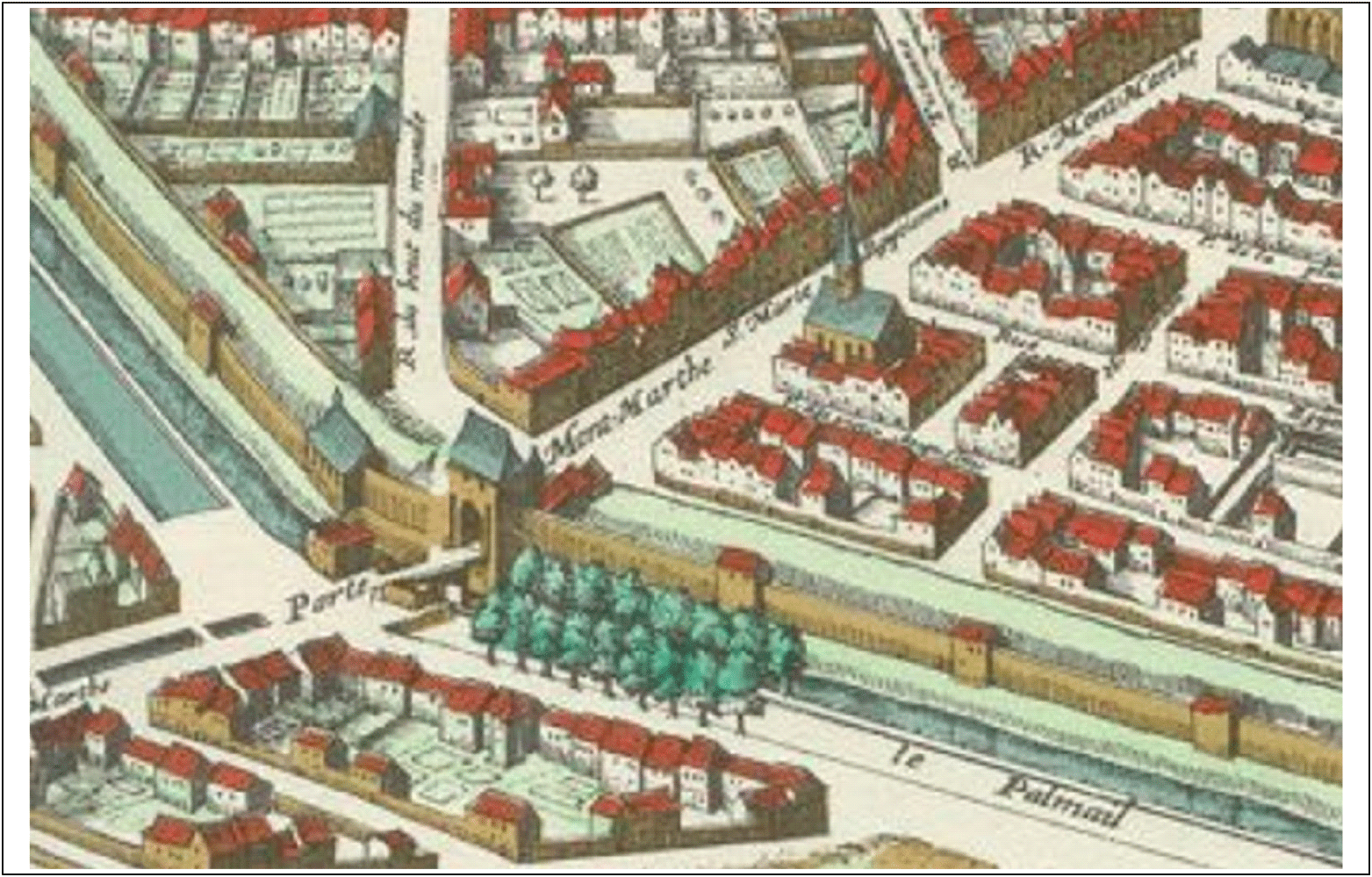
당시 성벽으로 둘러싸인 파리는 이미 과밀 상태였으며, 여가 공간을 위한 부지를 도시 내부에서 확보하는 일은 물리적·경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했다. 따라서 펠멜은 도시와 인접하면서도 성벽 바깥에 위치한 외곽부에 조성되었다. 펠멜을 위한 레인은 1597년과 1604년 두 차례에 걸쳐 조성되었으며(Laurian, 2019: 288), 모두 성벽에 외접한 직선의 형태였다. 펠멜 경기는 17세기 초반을 기점으로 인기가 점차 줄어들었지만, 이 경기 공간에 조성된 나무 산책로는 이후에도 산책과 사교의 장소로 활용되며 도시 외곽 경관의 일부 남게 되었다(Figure 2 참조). 비록 펠멜은 규모가 작고 국소적이었지만, 도시 외곽에 정원의 알레 형식이 이식된 초기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도시 경관에 알레를 재현한 펠멜의 시도는 곧 보다 거대한 경관 조성으로 이어졌으며, 그 핵심에는 앙리 4세의 왕비들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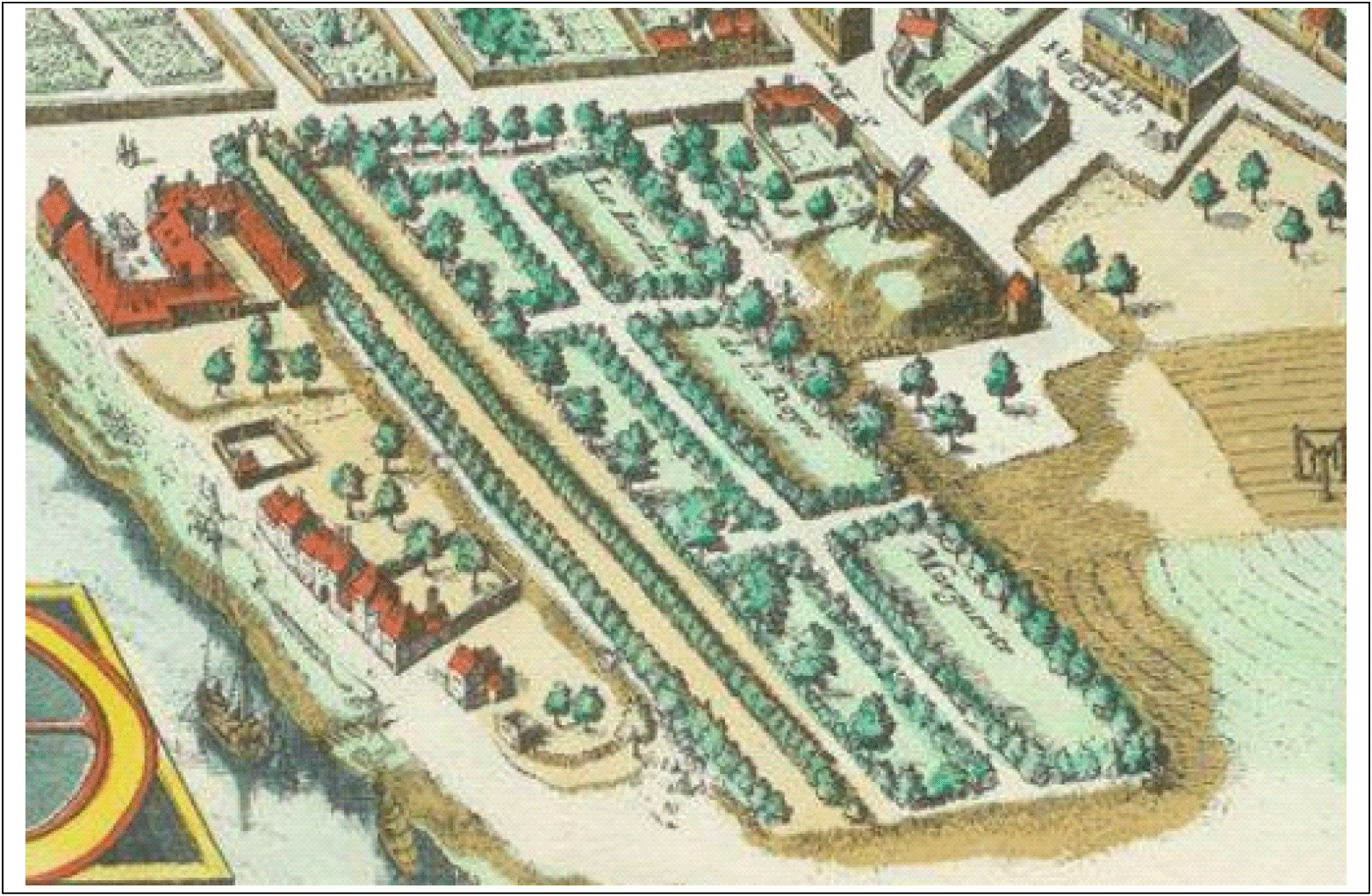
17세기 초반, 앙리 4세의 두 왕비였던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와 마리 드 메디시스는 각각 파리 동쪽 외곽에 산책로 용도의 쿠르(cours)를 조성했다. 마르그리트는 앙리 4세와 이혼한 뒤에도 여전히 왕녀로서 정치적·문화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센강 좌안에 산책로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쿠르는 나무를 포함하지 않았다. 반면 마리 드 메디시스는 루이 13세를 섭정하며 정치적 영향력이 절정에 달했던 1616년 센강 우안에 장대한 산책로인 쿠르 라렌(Cours la Reine)을 조성했는데(Lawrence, 2008: 34), 이곳에는 나무가 있었다(Figure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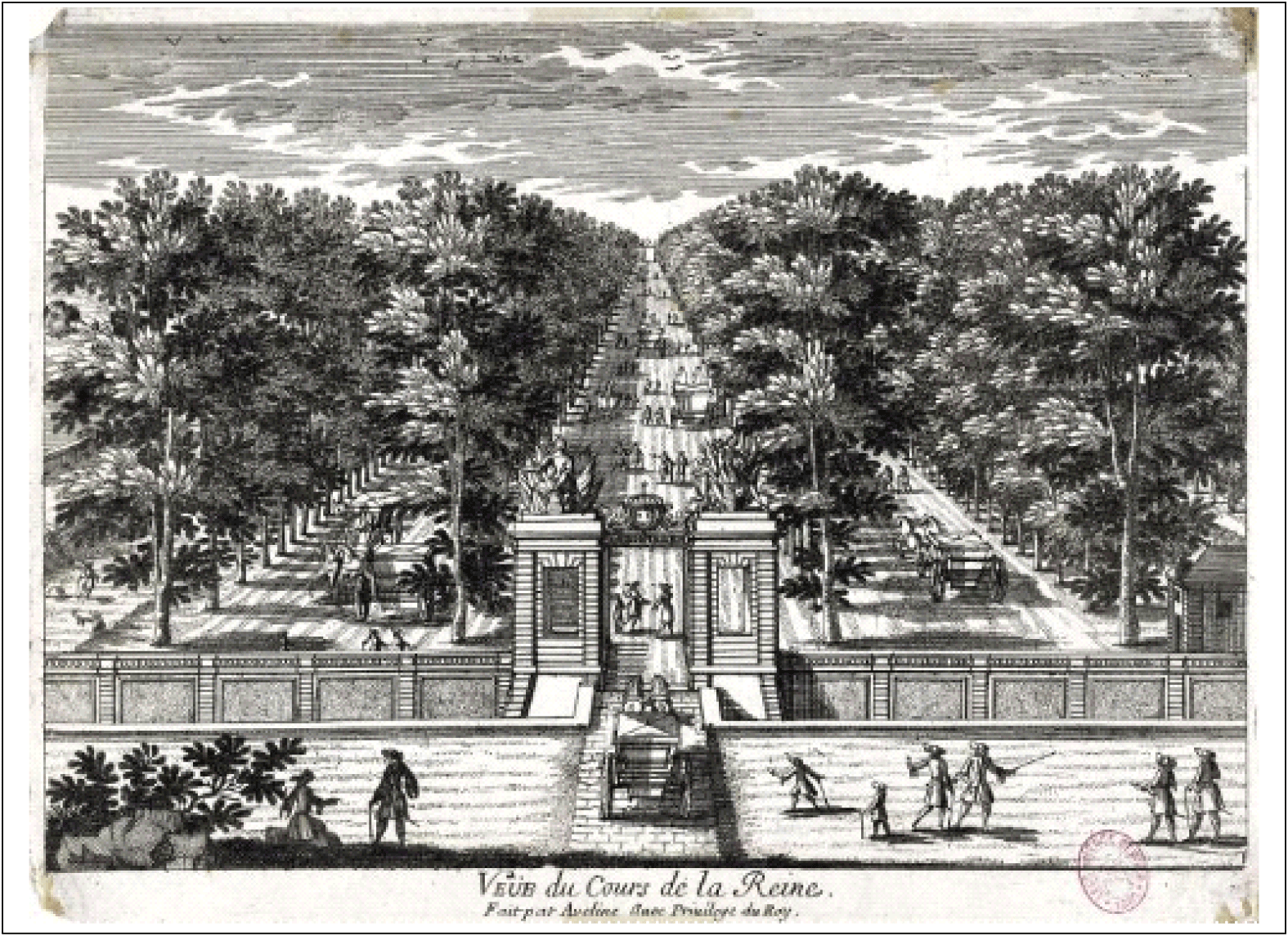
유행하던 마차 산책을 수용하기 위해 기존 알레 형식을 대규모로 확장한 결과였다. 네 줄의 나무에 의해 선형 공간이 세 구역으로 구분되었고, 각 구역은 다시 양방향 차선으로 나뉘어 총 여섯 개의 평행한 길이 형성되었다. 이중 양쪽 끝의 길은 보행로로 사용되었고, 중앙에는 마차가 통행할 수 있는 복수의 차선이 마련되었다. 로렌스에 따르면, 쿠르 라렌은 유럽 최초로 마차 통행을 위한 도로에 나무를 통합한 사례였다(Lawrence, 2008: 35). 이에 더해 이 논문은 쿠르 라렌 사례가 도보 중심이었던 정원의 알레 형식을 차륜 교통을 위한 공간으로 확장한 선구적 시도였다고 본다.
쿠르 라렌의 중앙 차선과 가장자리 보행로를 결합한 구조는 현대 도시 가로와 형식적으로 매우 유사하며, 정원 형식이 도시 가로를 구성하는 원리로 이식된 중요한 계기를 보여준다. 즉, 마차 산책이라는 상류층의 새로운 여가 문화를 수용하기 위해 계획된 쿠르 라렌은 정원의 경관 형식이 사교 공간을 넘어 차량 중심의 공간으로 확장된 초기 사례였다. 이후 쿠르 라렌은 프랑스를 넘어 유럽 상류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유럽 각지에 전파되었고(Laurian, 2019), 이에 따라 쿠르라는 대형 알레 형식이 마차 산책 문화를 수용하는 도시 경관의 모델로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Figure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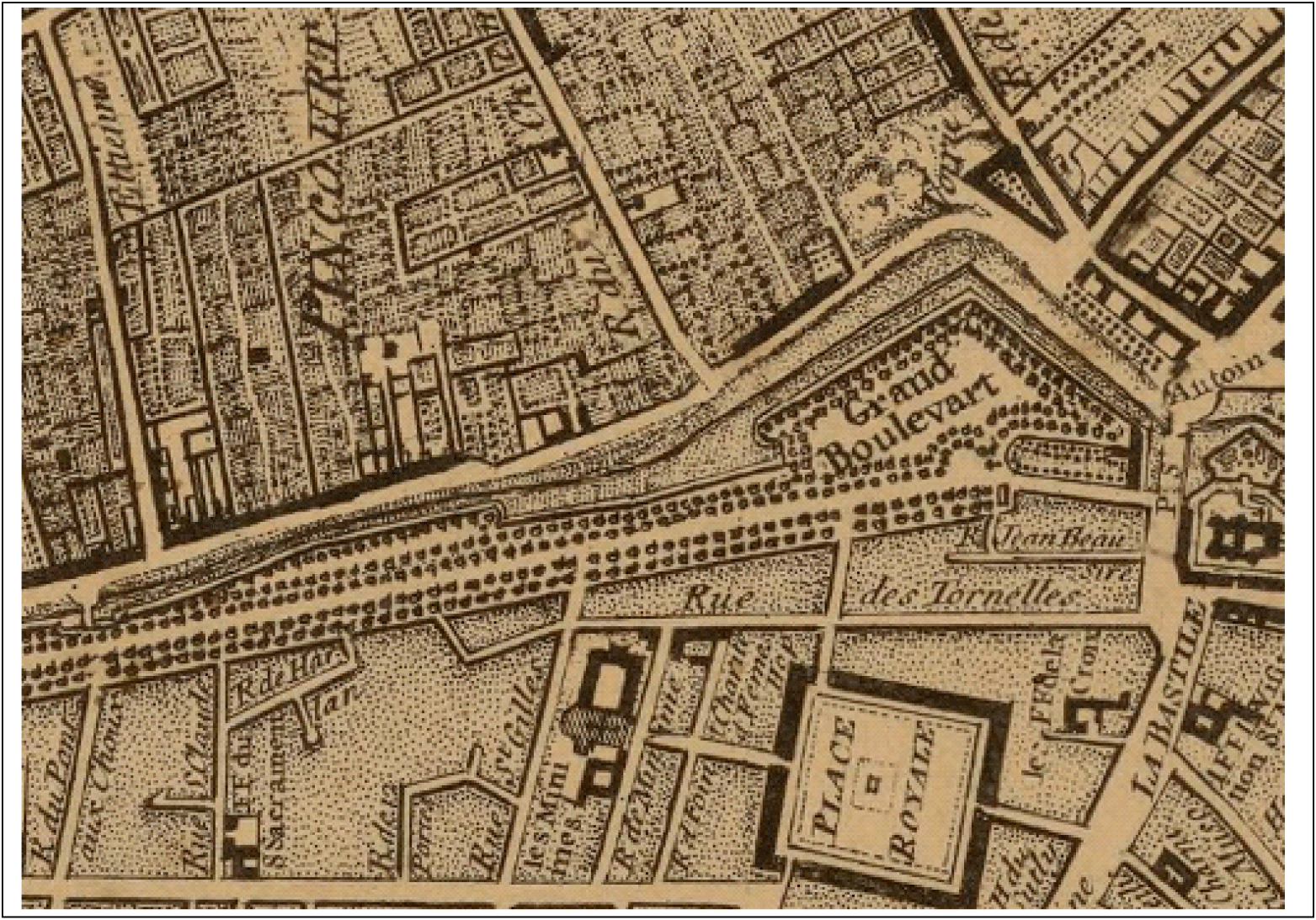
정원에서 도시로 알레의 형식이 확산하는 것과 더불어, 쿠르는 사회적 기능 면에서도 정원과 도시를 매개하는 전이 공간의 성격을 띠었다. 쿠르는 정원의 구성 요소였던 알레를 독자적 경관 형식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기존 정원과 구분되지만, 사교를 위한 위요된 공간이라는 점에서는 당대 프랑스 정원의 핵심 기능을 공유했다. 쿠르 라렌의 방문객들은 쿠르 라렌에서 마차놀이와 춤을 즐기고 밤에 튀일리 정원에서 도보 산책을 했다. 이러한 일련의 동선에 따라 쿠르 라렌과 튀일리 정원은 “보고 보이는”(황주영, 2013: 375) 산책을 위한 사교의 장으로 기능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들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 않았다. 펠멜과 쿠르에서 사교를 즐길 수 있는 이들은 귀족과 부유한 부르주아 계층에 한정되었다. 쿠르 라렌의 담장과 도랑은 외부로부터 시선과 접근을 차단했으며 일반 대중의 출입은 제한되었다. 제한된 접근성의 측면은 펠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초기 가로수길의 사례들은 특정 사회 계층을 위한 사회적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준공공공간”의 성격을 띠었다(Lawrence, 2008, 46). 즉 초기 나무 산책로들은 성벽의 외곽에서 도시 경관과 접점을 형성하면서도 정원의 사회적 기능과 배타적 특성을 공유했다. 따라서 펠멜과 쿠르는 정원과 도시 사이의 중간지대에 위치한 ‘도회적 정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상 펠멜과 쿠르 사례를 통해 16세기 말과 17세기 초에 정원의 알레가 절대왕정을 상징하는 경관 형식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도회적 정원’인 펠멜과 쿠르는 알레 형식이 전통적 정원의 경계를 넘어 도시와 결합하려는 가로수 경관의 초기 모델을 제시한다. 특히 쿠르 라렌은 도보 산책을 위한 알레를 차선과 보행로를 갖춘 마차 산책로로 활용함으로써 정원의 형식이 도시 가로의 구성 원리로 확장되는 전환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절대왕권의 정점을 찍는 루이 14세의 불바르와 아비뉴에서 알레 형식은 전례 없는 규모의 산책로로 한층 더 확장된다.
3. 정원을 넘어: 도시의 아비뉴와 불바르
프랑스 절대왕정의 쿠르와 펠멜은 알레 형식을 도시의 산책로로 변용한 초기 사례였다. 그러나 이들 공간은 여전히 도시 외곽에 위치했고 도시 내부 구조와 체계적으로 결합되지는 않았다. 알레 형식은 17세기 후반, 태양왕 루이 14세의 바로크 공간 기획 속에서 기존 도시 구조에 유기적으로 통합되기 시작한다. 이때 탄생한 새로운 경관의 형태가 바로 불바르(boulevard)와 아비뉴(avenue)이다. 불바르와 아비뉴는 전반적 형식에서는 환상형과 방사형으로 구별되지만, 공통적으로 폭 30m가 넘는 압도적 규모의 ‘가로수길’의 형태로 조성된다. 이 연구는 루이 14세의 불바르와 아비뉴가 정원의 기하학적 알레 형식을 도시 경관의 조직 원리로 확장한 대표 사례로 해석한다.
루이 14세는 1670년대 앙리 4세가 펠멜을 조성했던 중세 성벽을 허물고 그 위에 나무를 심는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프랑스군이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되면서 요새화가 불필요해진 정세가 있었고, 루이 14세의 유년 시절 프롱드의 난(1648–1652) 동안 도시의 요새를 활용해 왕권에 대항한 세력에 대한 정치적 기억이 작용했다(Lawrence, 2008: 38). 즉 파리 성벽은 잠재적 위협이 되는 도시 구조였으며, 루이 14세는 성곽에 나무가 심어진 산책로를 조성함으로써 보다 개방적으로 도시 구조를 개편한 것이다(Figure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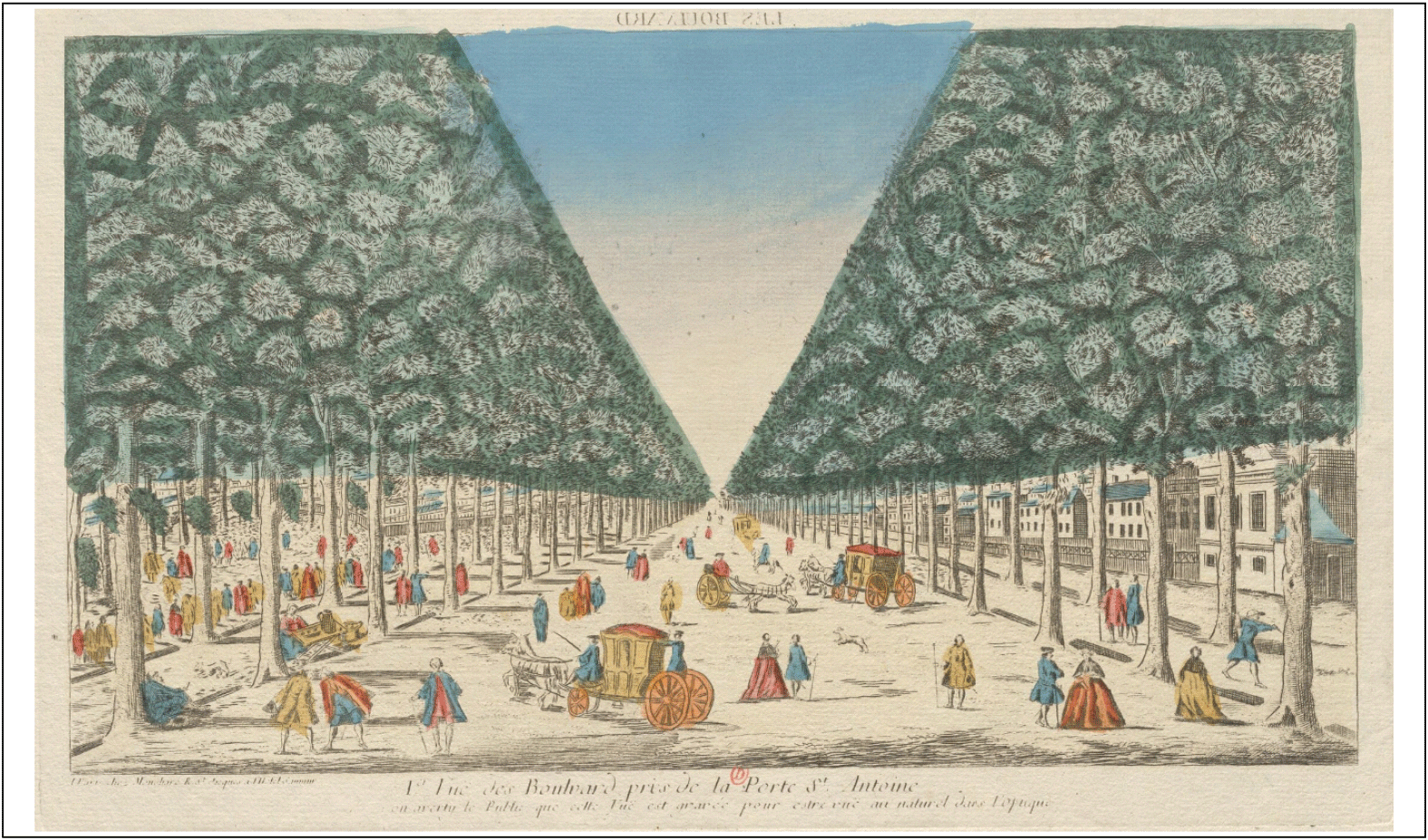
성곽 터에 총 너비 30m에 이르는 거대한 산책로가 조성되었다. 이 산책로는 쿠르 라렌과 마찬가지로 알레 형식을 변용한 마차용 산책로였다. 네 줄의 나무 열은 공간을 정확하게 오등분했으며, 양쪽에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훗날 불바르로 불리울 이 산책로는 나무 사이의 간격이 4m였던 쿠르 라렌과 다르게 6m였으며 환상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도시적 규모를 지녔다. 새로운 성곽 위 산책로는 루이 14세 재위기에는 동쪽의 포르트 생앙투안(Porte Saint-Antoine)에서 서쪽의 포르트 생오노레(Porte Saint-Honoré)까지 이어졌으며, 루이 16세에 이르러 완성된다(Bernard, 1970).
이 새로운 유형의 산책로는 파리 외곽 일부분에 존재했던 쿠르와 펠멜과는 달리 기존 도시 조직에 기반하는 하나의 체계를 이루었다. 이 산책로는 성벽 위 산책로라는 뜻의 ‘쿠르 오 랑파르(cours aux Remparts)’로 알려졌으나, 첫 번째로 완공된 구역이 흔히 ‘불바르 드 생앙투안(boulevard de Saint-Antoine)’으로 불리면서 결국 불바르 혹은 그랑 불바르로 통칭된다. 이것이 두 세기 후 프랑스를 넘어 영미권의 도로 체계 속 ‘대로’를 지칭하는 ‘블러바드(boulevard)’의 유래이기도 하다(Lawrence, 1988).
불바르는 성벽을 허물고 나무를 심음으로써 주변 도시 조직에 물리적으로 더욱 열린 특성을 갖게 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기존 절대왕정의 여가 공간에 비해 개방된 특성을 가졌다(Figure 5 참조). 1670년 왕실 칙령에 따르면, 루이 14세는 “부르주아와 도시 주민들을 위한 미화를 위해…” 새로운 도시 성벽에 나무를 심었다(Sauval, 1724; Rabreau, 1991). 즉, 불바르는 절대군주의 권력과 은혜를 상류층 너머 공공에 과시하려는 미화 프로젝트였으며, 일종의 ‘공공공간’으로 기획된 것이다. 이후 18세기에 이르면 급증하는 부르주아 계층과 팽창하는 도시는 불바르라는 경관 형식에 대중적 생동감을 불어넣기 시작한다. 특히 도시 북서부 불바르를 중심으로 여가를 위한 카페, 극장, 레스토랑이 즐비하게 되면서 점차 위락 구역의 성격을 띄게 된다.
17세기 후반 루이 14세 시기에 장대한 바로크적 가로수길 모델이 등장하며 이로 인해 정원의 질서가 도시의 공공 공간으로 확장한다. 태양왕의 고전주의적 아비뉴는 베르사유의 경계를 뚫고 외부로 발산한다. 훗날 샹젤리제로 거듭나는 튀일리 아비뉴는 튀일리 정원의 중심 축을 따라 확장되고, 베르사유의 세 갈래 길 역시 베르사유 궁전의 축을 중심으로 방사한다. 이때 튀일리 아비뉴 확장과 베르사유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고전적 정원을 조직하는 형식 원리를 정원에 출입하는 진입로, 즉 아비뉴에 적용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인물이 앙드레 르 노트르(André Le Nôtre)다. 아비뉴란 본래 교외적 특성이 강했으나 절대군주의 아비뉴는 상징적 축을 재현하는 알레를 대규모로 확대·확장한 것이었다(Kostof, 1991: 232). 베르사유와 튀일리 아비뉴는 기념비적 건축과 정원의 축으로 이어지는 장대한 가로수길이 된다. 태양왕의 아비뉴는 개인의 권력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탄생했으나, 동시에 정원에 원형을 둔 가로수길의 형식을 도시계획에 통합한 사례이기도 했다.
튀일리 정원은 이탈리아의 정원 전통을 프랑스 파리에 직접 도입한 사례로, 1570년 이탈리아에서 온 왕비인 카트린 드 메디시스(Catherine de Médicis)를 위해 설계한 정원이었다. 1670년대 르 노트르는 튀일리 정원의 중심축을 형성하는 알레와 이어지는 넓은 길을 설계했다. 아비뉴에는 느릅나무, 플라타너스, 가시칠엽수가 줄지어 심겼다(Dorion, 2013). 이 아비뉴는 훗날 샹젤리제로 명명되기 전까지 튀일리 아비뉴로 불렸다. 튀일리 아비뉴에는 2열의 느릅나무가 양쪽에 열식되었고, 르 노트르가 확립한 프랑스 정형식 정원의 대칭 양식 화단이 조성되었다(Lawrence, 2008). 튀일리 아비뉴는 쿠르 라렌의 남측에 위치했고 나무를 심은 넓은 산책로라는 점에서 유사했다. 그러나 튀일리 정원의 축을 따르지 않은 쿠르 라렌과 달리 튀일리 아비뉴에서는 명료한 축이 정원의 담장을 뚫고 길게 확장한다(Figure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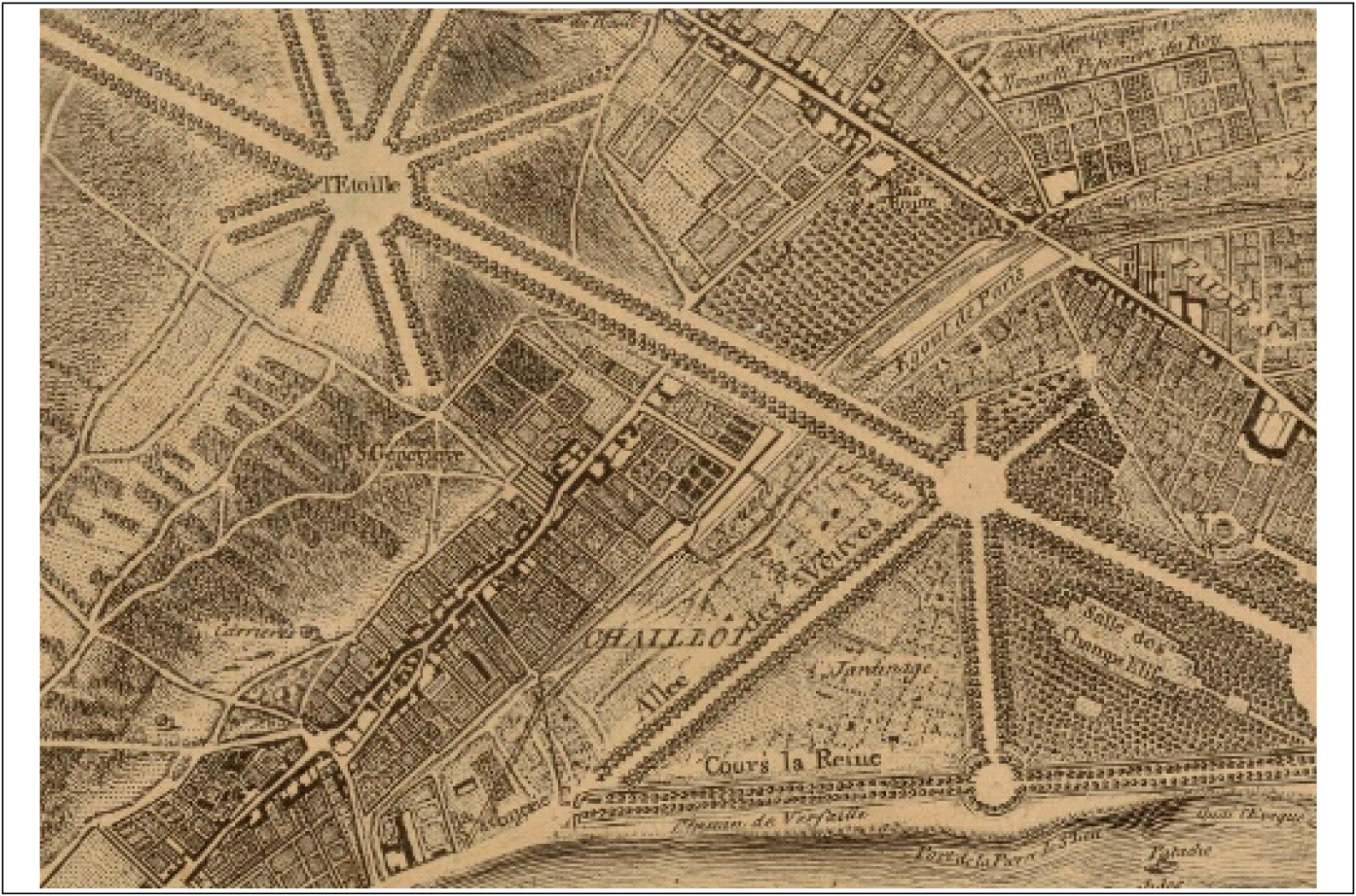
도시의 외연이 확장됨에 따라 튀일리 아비뉴는 축선을 따라 바깥쪽으로 연장을 거듭한다. 르 노트르는 넓은 산책로를 궁전과 롱 퐁(Rond Point)으로 확장했다. 1710년에 비로소 샹젤리제라는 이름 얻게 된 튀일리 아비뉴는 롱 퐁을 넘어 현재 에투알 광장(Place d’étoile)이 있는 곳까지 연장된다. 1774년에는 현재의 포르 마요(Porte Maillot)까지 연장된다(Dorion, 2013). 불바르가 팽창하는 도시를 옥죄는 벨트의 형태였던 반면, 샹젤리제와 같은 바로크 아비뉴는 기존의 폐쇄적 구조를 뚫고 연장될 수 있었다.
이후 샹젤리제는 튀일리 정원과 쿠르 라렌과 함께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가장 인기 있는 도시 공간으로 상류층의 사랑을 받았으며, 혁명 이후에는 대중의 장소로 거듭난다(Figure 7 참조). 특히 19세기에는 샹젤리제의 나무들이 성숙해 매우 볼륨감 있는 정육면체 형태로 전정되었는데, 이로 인해 도시의 ‘녹색 캐비닛(cabinets de verdure)’으로 불리며 나무가 특징적인 거리의 이미지를 구축한다(Dorian, 2013). 지금도 샹젤리제 거리의 나무들은 파리의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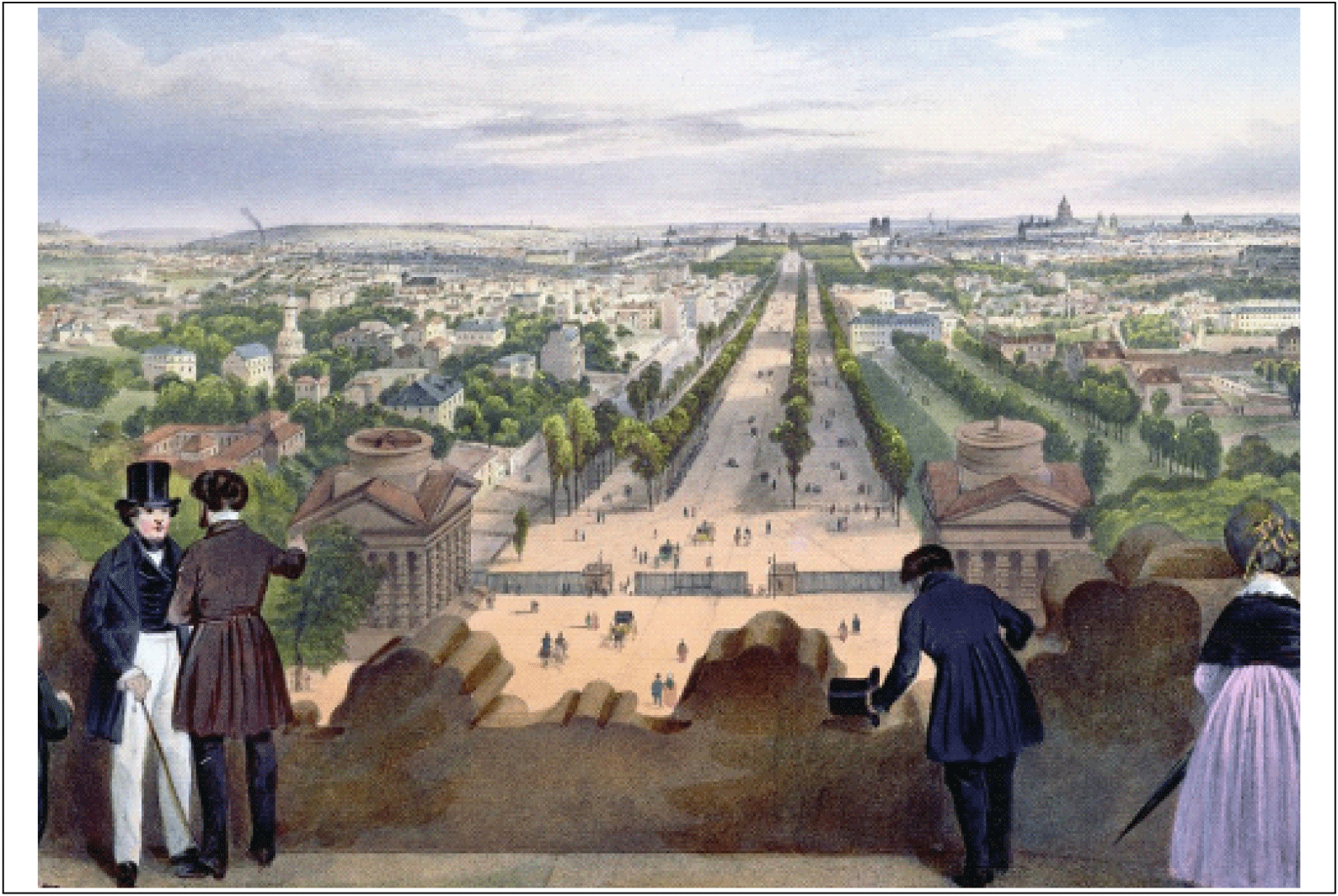
샹젤리제가 튀일리 정원에서 뻗어 나왔다면 베르사유의 트리비움, 즉 세 갈래길은 베르사유 궁전에서 뻗어 나오는 것이었다. 세 아비뉴가 하나로 합쳐지는 트리비움은 로마의 피아자 델 포폴로(Piazza del Popolo)에서 선례를 찾을 수 있으며,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1630년대 대저택의 정원과 함께 나타난다. 그러나 베르사유의 아비뉴들에는 반드시 나무가 있었다. 세 아비뉴는 거위발 모양으로 합쳐졌다(Figure 8 참조). 양쪽의 두 아비뉴는 파리 아비뉴를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었는데, 파리 아비뉴보다는 폭이 약간 좁았다. 파리 아비뉴의 폭은 60m로 세 길 중 가장 넓었다. 세 아비뉴 모두 양측에 두 열씩, 총 네 열로 나무가 심겼다. 쿠르와 불바르와 마찬가지로 나무 열은 양 옆의 좁은 길과 중앙의 넓은 길로 공간을 분할했다.

세 갈래길은 파리에 위치하지는 않았지만 절대군주의 궁전과 도시인 베르사유와 파리는 지정학적으로 긴밀히 연결된 공간이었다. 두 공간의 연결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소가 바로 세 갈래길의 중앙 아비뉴였다. 1685년 건설된 이 아비뉴는 파리를 향하는 길이라는 뜻에서 파리 아비뉴(Avenue de Paris)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파리 아비뉴는 실제로 파리로 연결되는 길이기도 했다. 파리 아비뉴 이전 파리와 베르사유를 잇는 길은 급한 경사를 우회하는 길과 구불구불한 길뿐이었다. 직선 도로를 위한 4년간의 대규모 토목공사가 베르사유 궁전의 건축에 동반되었다(Williams, 1977). 파리 아비뉴를 위해 언덕이 잘렸고 호수가 메워졌다. 파리와 베르사유를 잇는 가장 합리적인 길이자 폭 60m에 이르는 장엄한 파리 아비뉴에는 대신 나무가 심겨 태양왕을 위한 녹색 전망을 제공했다(Figure 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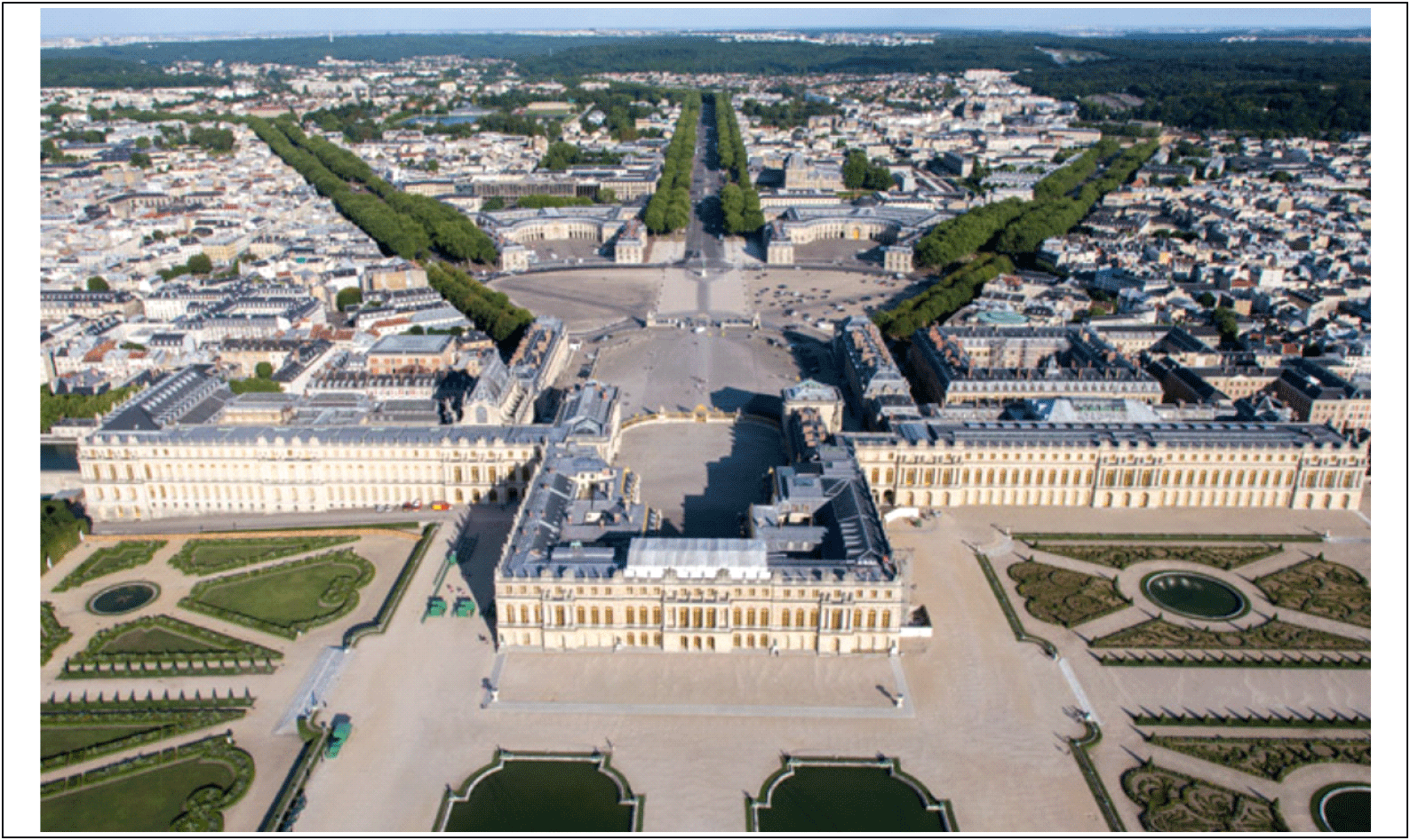
불바르와 아비뉴의 사례는 정원의 알레가 도시적 규모와 체계 속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불바르는 성벽을 허물고 나무 열을 심어 환상형 산책로를 만들며, 알레 형식을 도시 외곽을 따라 둘러싼 거대한 선형 공간으로 변용했다. 아비뉴는 정원의 기하학적 축선을 도시 공간으로 연장해 방사형의 대규모 가로수길을 탄생시켰다. 이로써 알레는 정원의 내부 질서를 넘어 도시 조직의 기하학적 원리로 확장되었고, 시간이 지나며 공간의 용도가 변해도 그 형식은 유지‧ 재생산되었다. 절대왕정의 권력 공간이었던 일부 아비뉴는 18-19세기에 도시공원이나 오락 공간으로 변모했으며, 샹젤리제는 교외 개발과 상업 시설의 집적 속에서 다양한 계층이 모이는 만남의 장소로 자리 잡았다(Shapiro, 2015: 194). 이어 19세기 후반, 나폴레옹 3세와 오스만 시장은 파리 개조 사업을 통해 도시를 관통하는 방사형 도로 체계를 건설하는데, 이때 채택한 형식은 루이14세의 아비뉴 및 불바르 형식과 동일했다. 결국 아비뉴와 불바르는 정원에서 비롯된 형식을 계승·확장하며, 근대적 공공 도로의 모델로 나아간다.
4. 도시의 기반으로: 근대적 도로 체계로서 불바르
19세기 중반, 오스만이 주도한 파리 개조 사업은 정원의 공간 형식이 도시 구조의 원리로 전면적으로 확장되는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튀일리와 베르사유에서 구현되었던 직선, 반복, 축선, 분절의 원리는 이제 도시 전체의 도로 체계 속에 적용되었고, 나무는 더 이상 사교 공간의 부속물이 아니라 도시의 위생, 질서, 통치 가능성을 시각화하는 인프라의 일부로 기능하게 되었다. 절대왕정기의 경관 모델은 오스만 체제 아래서 대규모로 철거되면서 직선 도로망 속에 재조합되며, 근대 도시의 형식적 기반으로 자리 잡는다. 이 장에서는 도시계획을 통해 가로수가 어떻게 ‘산책로의 요소’에서 ‘도시의 구조’로 확립되었는지 보건·위생 담론과 도로 설계 원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9세기 파리 개조 사업을 시행한 오스만 체제 아래서 절대왕정의 경관 모델들이 융합하며 근대 도로 체계의 가로수길이 탄생한다. 근대 도시계획을 통해 정원의 기하학적 공간 질서가 도시 차원에서 재해석되고 확장된 것이다. 19세기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며 나무는 비로소 도시의 필수품으로 동원된다. 파리의 중심부는 극도로 과밀하여 위생 문제와 교통 체증이 심각했다. 특히 1832년과 1849년, 파리에서 콜레라를 비롯한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깨끗한 공기와 물에 대한 공공의 요구가 커졌다.
따라서 도시 ‘나무’의 효용이 17세기 이후 보건상의 이유로 강조되어 왔다. 특히 18세기 중후반부터는 나무가 공기를 정화하고 전염병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의학 이론이 널리 퍼졌다.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유럽과 미국 도시에서 의사들과 언론은 “푸른 나무가 거리, 교회 마당, 공터에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고, 도시에서 나무는 도시의 아름다움과 공공의 건강을 동시에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다(Beamish, 2018). 나무는 시각적 쾌적성이나 권력 과시의 기능을 넘어 악취와 습기, ‘나쁜 공기(miasma)’로 대표되는 위생 환경의 개선에 기여하는 중요한 도시의 구성 요소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보건적 효용에 대한 인식은 계몽주의 도시계획에도 반영된다. 18세기 중반 이상적인 도시 공간에 대한계몽주의적 구상은 장엄(magnificence), 위생(hygiene), 명료성(clarity), 모범(emulation)이라는 네 가지 원리로 구성되었다(Etlin, 1994). 로렌스에 따르면, 도시 공간의 나무 식재는 이 네 가지 원리 각각에 기여하는 요소였지만 근대 도시에서 주목 받은 나무의 기여는 단연 위생이었다(Lawrence, 2008: 61). 19세기 들어 이러한 담론은 제국의 도시 개조 프로젝트와 맞물리게 된다. 도시 위생 개선은 단지 기술적 필요만이 아니라 제국의 부국강병과 통치 역량을 과시하는 정치적 과제이기도 했다(Rosen, 1993).
1833년부터 1848년까지 파리 지사를 역임한 랑뷔토 백작(Claude-Philibert Barthelot, comte de Rambuteau)의 도시 행정의 구호는 “물, 공기, 그늘”이었다(Lawrence, 2008: 191). 그는 도시의 위생과 미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로에 나무를 식재하고, 저수지와 하수관을 정비하며, 포장된 보행로를 구축하는 등 인프라 전반을 개선하려 노력했다. 그의 재임기 동안 파리에는 두 개의 주요 저수지가 신설되었고, 하수관 길이는 기존의 3km에서 무려 295km로 증가했다. 가로는 자갈 포장에서 돌 포장으로 전환되었고, 새로운 보도와 광장 설계도 함께 도입되었다(Landau, 1992). 특히 랑뷔토는 도시 환경의 물리적 표준화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보도 폭의 규격화’를 시도했는데, 이 기준은 이후 나무 식재 간격 등 가로수를 통합한 근대 도시설계의 초기 사례 중 하나였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재정 확보와 법적 권한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도심부의 밀집된 구조와 비좁은 골목길을 전면적으로 개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나무를 심기에는 공간적 제약이 컸고, 특히 중세적 미로 구조를 간직한 구획에서는 가로수 식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랑뷔토는 샹젤리제, 강변 도로, 광장 주변 등 여유 공간이 있는 지역에 가로수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후임자 오스만의 도시 개조 사업에 결정적인 방향을 제공했다. 그의 도시 행정은 나무를 공공 경관의 필수 인프라로 인식하고 계획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토대를 닦았다는 점에서 오스만 체제의 선례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스만은 광범위한 도시계획을 실현하며 도시 전역에 나무를 심는다. 1850년 공공 위생을 명분으로 한 토지 수용이 합법화된 데 더해 나폴레옹 3세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받아 오스만은 ‘파리 개조 사업’을 통해 전례 없는 스케일로 파리 전역을 재구성했다. 이때 가로수길은 더 이상 특정 장소의 산책로나 휴식 공간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관통하는 공공 도로의 일반적 형식으로 확립된다. 근대의 공공 도로는 단순한 통행로가 아니라 물리적 순환을 위한 복합 인프라였다. 도로에는 나무와 관련된 공기의 순환뿐 아니라 담수 공급, 폐기물 처리, 차량 통행, 자본과 물자의 흐름을 위한 설비들이 통합되었다(Choay, 1975). 나무는 이제 지상의 가스등, 아스팔트 포장, 보도블록은 물론 지하의 상하수도관, 배수 시설 등과 함께 도시를 구성하는 필수 구조로 편입되었다. 도시 개조와 함께 거리에는 45,000그루 이상의 나무가 식재되었다(Lawrence, 2008). 도시는 나무를 도시화시켰고, 가로수는 도시 인프라의 일부로 재정의되었다.
19세기 중반 이전까지 ‘불바르’는 주로 도시 외곽을 따라 이어진 순환형 산책로를 의미했다. 원래 성벽이 있었던 자리에 조성된 이 공간은 도시 미화와 여가를 위한 산책로로 재편되며 절대왕정기의 공공 경관으로 기능했다. 루이 14세 시기에 조성된 그랑 불바르 역시 이러한 기원을 공유하며, 도심을 에워싼 수목 가로의 선례로 존재했다. 그러나 이 기존의 불바르는 도심의 외곽이라는 공간적 한계를 갖고 있었으며 축선적 기하 질서나 방사형 도시계획의 적극적 도입과는 거리가 있었다.
오스만이 이러한 외곽 불바르를 도시 중심부로 끌어들이고 축선적이고 방사형의 형태로 재편하면서 불바르의 형식과 의미는 재정의된다. 랑뷔토가 절대왕정의 불바르를 지면 높이로 내리고 포장하여 도시 가로에 통합했다면, 오스만은 근대적 불바르를 제도화했다. 또한 기존 절대왕정의 가로수길이 도시 주변부를 에워쌌다면, 근대화된 파리에서 가로수길은 도시를 모든 방향으로 가로지르게 된다. 즉 불바르는 도시 주변부의 환상형 산책로에서 도심부를 가로지르는 방사형의 공공 도로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제 19세기 후반 근대적 불바르와 함께 가로수는 도시 전역의 길 위에 이식되었다.
이 과정에서 불바르는 절대왕정이 시도했던 다양한 공간 형식이 혼종된 경관이었다. 우선 르 노트르의 정형식 정원에서 비롯된 ‘알레’의 기하학적 질서와 축선 원리가 도입되었고, 역시 알레의 형식에 뿌리를 둔 샹젤리제나 파리 아비뉴 같은 바로크 도시계획의 방사형 경관도 불바르의 전범이 되었다. 동시에 기존 불바르의 주변부로서의 특성 역시 일정 부분 계승되면서 알레, 아비뉴, 기존 불바르의 세 형식이 도시 내부에서 결합된 새로운 ‘혼종적 대로’가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빈 땅이나 옛 성벽의 터에 조성된 전근대 도시의 산책로들과 달리, 근대 가로수길은 도시의 기존 환경을 광범위하게 철거한 개발의 결과였다. 1861년 뉴욕타임스는 파리 개조 사업의 불바르에 대해 “울창한 주택 숲을 가로지르는 선”이라 묘사했다(Johnston, 1861). 이 ‘선’은 정원의 축선처럼 도시를 분할하고 정렬하며 도시를 기하학적으로 제도했다. 불바르는 도시의 기존 맥락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도시 구조를 가시화했다. 불바르 위에 심어진 가로수는 도시 기하학의 녹색 강조선이 된 것이다.
또한 새로운 불바르의 규모는 옛 불바르의 장대함을 뛰어넘었다. 파리 산책로와 식재 부서의 책임자 장 샤를 알팡(Jean-Charles Alphand)은 도로 폭과 유형에 따라 식재 방식을 체계적으로 계획했는데(Aphand and Hochereau, 1886), 대부분의 도로 폭은 26m 이상이었고 일부는 70m에 달했다(Figure 10). 먼저 가로수는 건물에서 최소 5m 이상 떨어져 심는 것이 원칙이었고 일반적으로 도로 양쪽에 각 한 줄씩, 나무가 두 줄 배치되었으며, 폭 36m 이상 도로에는 양측에 두 줄씩 심겼다. 도로 폭이 40m 이상일 경우 중앙 분리대까지 포함해 한 줄이 추가되어 다섯 줄의 가로수가 식재되기도 했다. 쿠르 라렌에서 마차와 산책자를 분리하던 나무는 이제 도시 가로에서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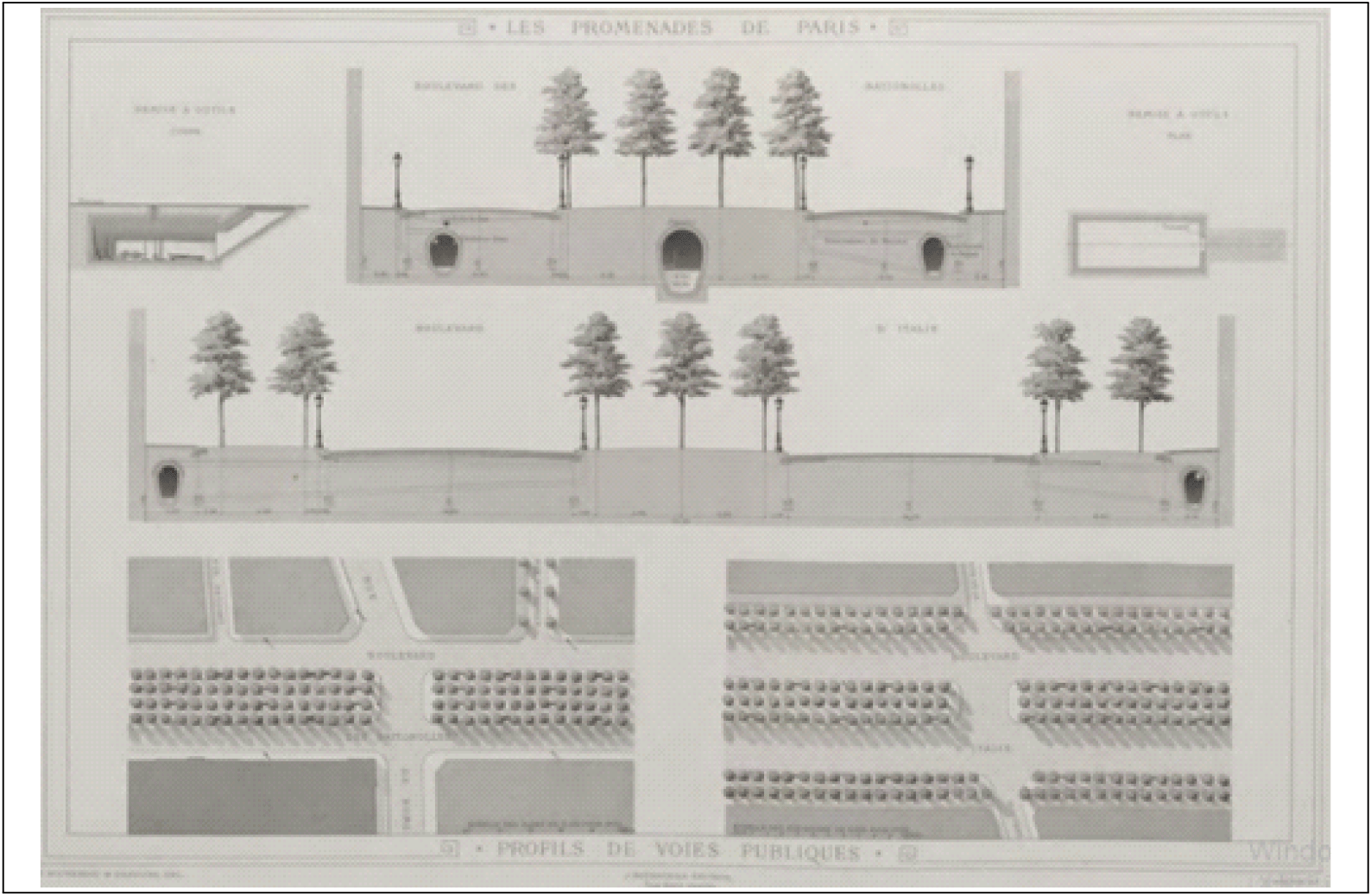
그러나 거대한 기하학적 구성은 아이러니하게도 인간과 나무 사이의 거리를 오히려 멀어지게 하기도 했다. 장대한 도로 폭과 통행의 분절 속에서 가로수는 도시 곳곳에 편재하게 되었지만 도시민의 일상과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했다. 다시 말해, 정원에서 휴먼 스케일로 인간의 시선과 행로를 안내하던 알레의 나무들이 절대왕정과 근대 도시화를 거치며 가로수가 되면서 도시를 조직하는 기하학적 선분으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불바르, 즉 근대 도시 가로는 나무를 활용해 도시를 인간이 통치 가능한 공간으로 조직하는 근대 기하학의 현현이라고 볼 수 있다.
5. 나가며
이 연구는 가로수가 도시의 구조적 단위로 자리 잡게 되는 과정에서 정원의 형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파리라 사례를 중심으로 추적하였다. 연구의 출발점은 ‘가로수 형식이 어떻게 도시 구조로 이행했는가’라는 문제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16세기 말에서 19세기 후반까지 파리에서 나타난 초기 가로수길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외곽부의 펠멜과 쿠르는 정원의 알레가 도시로 전이되는 초기 모델이었고, 루이 14세 시기의 불바르와 아비뉴는 알레 형식이 도시 조직의 일부로 확장되는 계기였다. 이어 19세기 중반 오스만의 도시 개조 사업은 알레 형식을 근대적 공공 도로의 일반적 원리로 확립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정원의 알레가 산책로에서 도로 인프라로 전환되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정원에서 도시로 이행하는 가로수길 형식이 성립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펠멜과 쿠르, 불바르와 아비뉴, 그리고 오스만의 불바르로 이어지는 변천은 가로수길이 사회적 기능과 공간적 용도를 달리하면서도 일관되게 기하학적 형식을 계승해온 과정을 보여준다. 알레에서 출발한 직선적 배치와 반복, 축선의 원리는 귀족적 사교 공간, 권력의 기념비 공간, 근대 도시의 위생적 장소 속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띠었지만, 언제나 동일한 형식적 기반을 유지했다. 이 연구는 가로수의 사회문화적 의미 및 기능에 대한 기존 논의에 더해 그 의미를 가능하게 한 형식의 지속과 재생산에 주목함으로써, 정원에서 도시로 이어진 가로수길의 형식사가 근대 도시 경관의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했음을 밝혔다.
정원의 기하학적 형식은 나무를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고 공간을 직선으로 분할했으며, 그 방식에 따라 가로수를 도시의 일부로 편입시켰다. 이 형식은 나무를 인간의 동선을 규율하는 장치로 대상화하고 배경화했지만(Braverman, 2014), 동시에 도시 전역에 나무를 확산시키는 조건이 되었다. 바로 이 점에서 가로수길의 형식은 통제와 공존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근대 도시의 기하학은 나무를 권력과 질서의 도구로 삼으면서도, 역설적으로 인간과 비인간이 오랫동안 나란히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도시 곳곳에서 가로수를 당연한 풍경으로 경험하는 것은 이러한 형식적 유산 덕분이다.
전 세계적으로 ‘정원 도시’를 표방하는 오늘날, 가로수라는 유산을 다시 사유할 필요가 있다. 가로수는 도시를 대표하는 자연으로 자리 잡아 왔으며, 그에 대한 태도는 곧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를 반영하고 형성한다. 정원에서 유래하여 근대에 고착된 도시 형식은 가로수를 통해 인간과 자연을 이분법적으로 구획해 왔다. 이 형식은 도시 환경에 깊숙이 뿌리내려 쉽게 해체할 수 없지만, 그 의미는 새롭게 재구성될 수 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자연 관계를 심화시키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맥락에서 재부상한 정원 도시 담론은, 가로수를 비롯한 자연을 인간을 위한 도구로 환원할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러나 가로수를 도시를 함께 살아내는 반려종(companion species, Haraway, 2008)으로 돌보는 관점은, 정원 도시를 사회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재구성하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